[이슈&토크] 빈발하는 ‘의료 분쟁’…실태와 대응법은?
입력 2014.11.11 (23:25)
수정 2014.11.12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신현호 변호사
▷ 앵커 :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병원을 상대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표현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의료 분쟁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은 어떤지,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10,000건 이상 의료 분쟁이 1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된다는데, 이런 추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은 건가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에 한 84건에서 2000년 519건, 2013년 1,101건으로 매년 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기 정도의 패소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조정이나 화해 등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는 경우가 약 55% 전후 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피해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완전 승소,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만족스러워할 텐데, 그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이라는 게 원래 조금 더 청구를 하기 때문에 완전 승소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승소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위자료 정도 받고 그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중재원 이란 게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사실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 법문화가 조정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 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환자 측에서 분쟁 조정을 원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 앵커 : 아, 병원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재원이 최종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화해 권고에 그치고 있는데요. 화해 권고가 되더라도 역시 또 의료 기관이든 환자든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앵커 : 이 강제 개시 제도가 그럼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되겠군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강제 개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의료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환자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사실은 제일 큰 게, 가능하면 진료 기록이나 CCTV든 부검이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료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민사 소송만 할지, 고소도 같이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행정 고발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황하게 되거나 분노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를 보면 의료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 저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그 소위에서 통과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본회의에서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입증 책임 전환도 이제는 고려돼야 한다, 이런 여론은 강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법제에서도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의사가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판례 이론이 있습니다. 개연성 이론이나 사실상의 추정 이론이나 입증 방해로 인한 과실 추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판례 이론을 통해서 환자 측의 권리 구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보상의 문제인데요. 그 보상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의료 행위 자체가 사회적 공익 행위가 허용된 위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 기금화 시켜서 사회가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호 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병원을 상대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표현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의료 분쟁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은 어떤지,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10,000건 이상 의료 분쟁이 1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된다는데, 이런 추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은 건가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에 한 84건에서 2000년 519건, 2013년 1,101건으로 매년 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기 정도의 패소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조정이나 화해 등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는 경우가 약 55% 전후 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피해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완전 승소,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만족스러워할 텐데, 그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이라는 게 원래 조금 더 청구를 하기 때문에 완전 승소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승소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위자료 정도 받고 그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중재원 이란 게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사실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 법문화가 조정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 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환자 측에서 분쟁 조정을 원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 앵커 : 아, 병원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재원이 최종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화해 권고에 그치고 있는데요. 화해 권고가 되더라도 역시 또 의료 기관이든 환자든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앵커 : 이 강제 개시 제도가 그럼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되겠군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강제 개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의료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환자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사실은 제일 큰 게, 가능하면 진료 기록이나 CCTV든 부검이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료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민사 소송만 할지, 고소도 같이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행정 고발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황하게 되거나 분노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를 보면 의료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 저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그 소위에서 통과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본회의에서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입증 책임 전환도 이제는 고려돼야 한다, 이런 여론은 강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법제에서도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의사가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판례 이론이 있습니다. 개연성 이론이나 사실상의 추정 이론이나 입증 방해로 인한 과실 추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판례 이론을 통해서 환자 측의 권리 구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보상의 문제인데요. 그 보상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의료 행위 자체가 사회적 공익 행위가 허용된 위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 기금화 시켜서 사회가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호 변호사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토크] 빈발하는 ‘의료 분쟁’…실태와 대응법은?
-
- 입력 2014-11-11 23:46:28
- 수정2014-11-12 20: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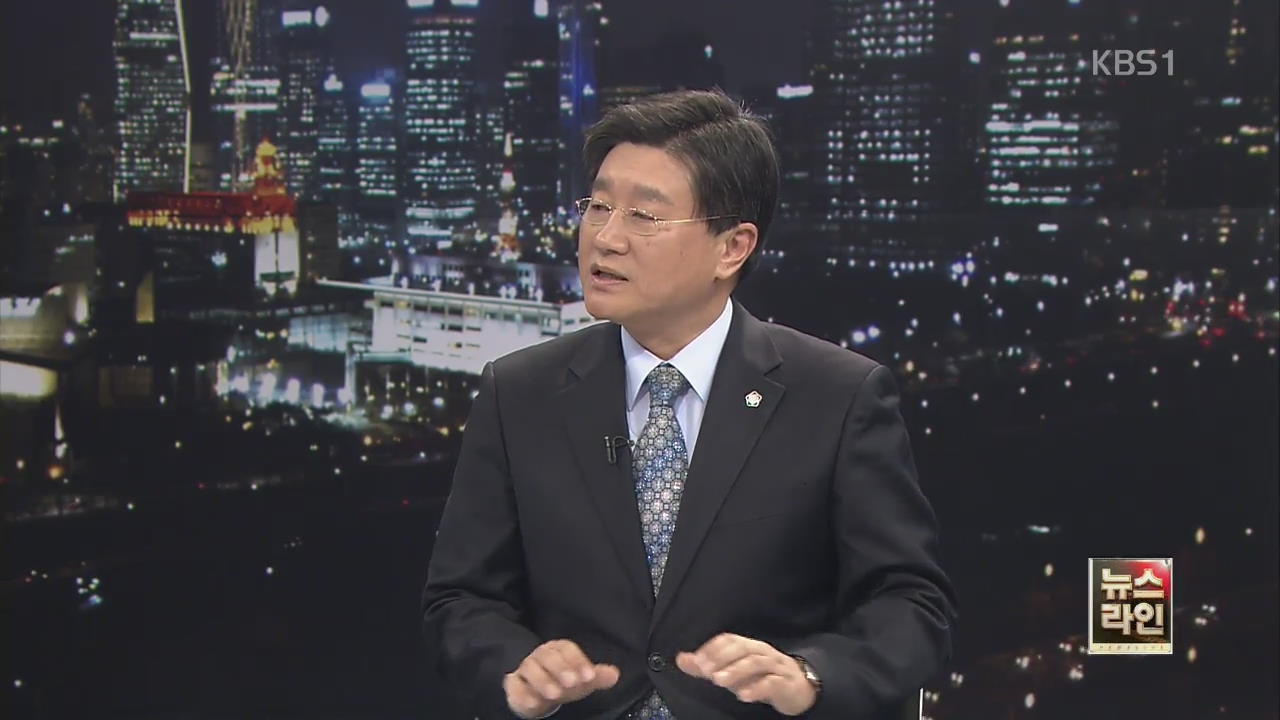
[출연] 신현호 변호사
▷ 앵커 :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병원을 상대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표현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의료 분쟁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은 어떤지,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10,000건 이상 의료 분쟁이 1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된다는데, 이런 추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은 건가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에 한 84건에서 2000년 519건, 2013년 1,101건으로 매년 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기 정도의 패소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조정이나 화해 등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는 경우가 약 55% 전후 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피해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완전 승소,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만족스러워할 텐데, 그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이라는 게 원래 조금 더 청구를 하기 때문에 완전 승소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승소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위자료 정도 받고 그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중재원 이란 게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사실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 법문화가 조정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 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환자 측에서 분쟁 조정을 원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 앵커 : 아, 병원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재원이 최종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화해 권고에 그치고 있는데요. 화해 권고가 되더라도 역시 또 의료 기관이든 환자든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앵커 : 이 강제 개시 제도가 그럼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되겠군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강제 개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의료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환자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사실은 제일 큰 게, 가능하면 진료 기록이나 CCTV든 부검이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료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민사 소송만 할지, 고소도 같이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행정 고발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황하게 되거나 분노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를 보면 의료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 저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그 소위에서 통과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본회의에서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입증 책임 전환도 이제는 고려돼야 한다, 이런 여론은 강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법제에서도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의사가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판례 이론이 있습니다. 개연성 이론이나 사실상의 추정 이론이나 입증 방해로 인한 과실 추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판례 이론을 통해서 환자 측의 권리 구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보상의 문제인데요. 그 보상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의료 행위 자체가 사회적 공익 행위가 허용된 위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 기금화 시켜서 사회가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호 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환자가 병원을 상대하는 것을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표현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의료 분쟁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은 어떤지,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10,000건 이상 의료 분쟁이 1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된다는데, 이런 추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많은 건가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에 한 84건에서 2000년 519건, 2013년 1,101건으로 매년 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기 정도의 패소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조정이나 화해 등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는 경우가 약 55% 전후 되기 때문에 일반 사건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앵커 : 하지만 피해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완전 승소,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만족스러워할 텐데, 그 비율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이라는 게 원래 조금 더 청구를 하기 때문에 완전 승소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승소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위자료 정도 받고 그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 중재원 이란 게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사실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 법문화가 조정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 개시 제도가 없습니다. 환자 측에서 분쟁 조정을 원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응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 앵커 : 아, 병원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군요?
▶ 신현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재원이 최종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화해 권고에 그치고 있는데요. 화해 권고가 되더라도 역시 또 의료 기관이든 환자든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앵커 : 이 강제 개시 제도가 그럼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되겠군요?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강제 개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의료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환자 입장에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사실은 제일 큰 게, 가능하면 진료 기록이나 CCTV든 부검이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들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자료를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민사 소송만 할지, 고소도 같이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행정 고발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황하게 되거나 분노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를 보면 의료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신현호 변호사 :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된 저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그 소위에서 통과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본회의에서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입증 책임 전환도 이제는 고려돼야 한다, 이런 여론은 강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법제에서도 입증 책임이 전환돼서 의사가 무과실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판례 이론이 있습니다. 개연성 이론이나 사실상의 추정 이론이나 입증 방해로 인한 과실 추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판례 이론을 통해서 환자 측의 권리 구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보상의 문제인데요. 그 보상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의료 행위 자체가 사회적 공익 행위가 허용된 위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 기금화 시켜서 사회가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금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호 변호사 :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지구촌] APEC 정상회의 폐막…성과는?](https://news.kbs.co.kr/data/news/2014/11/11/2965056_1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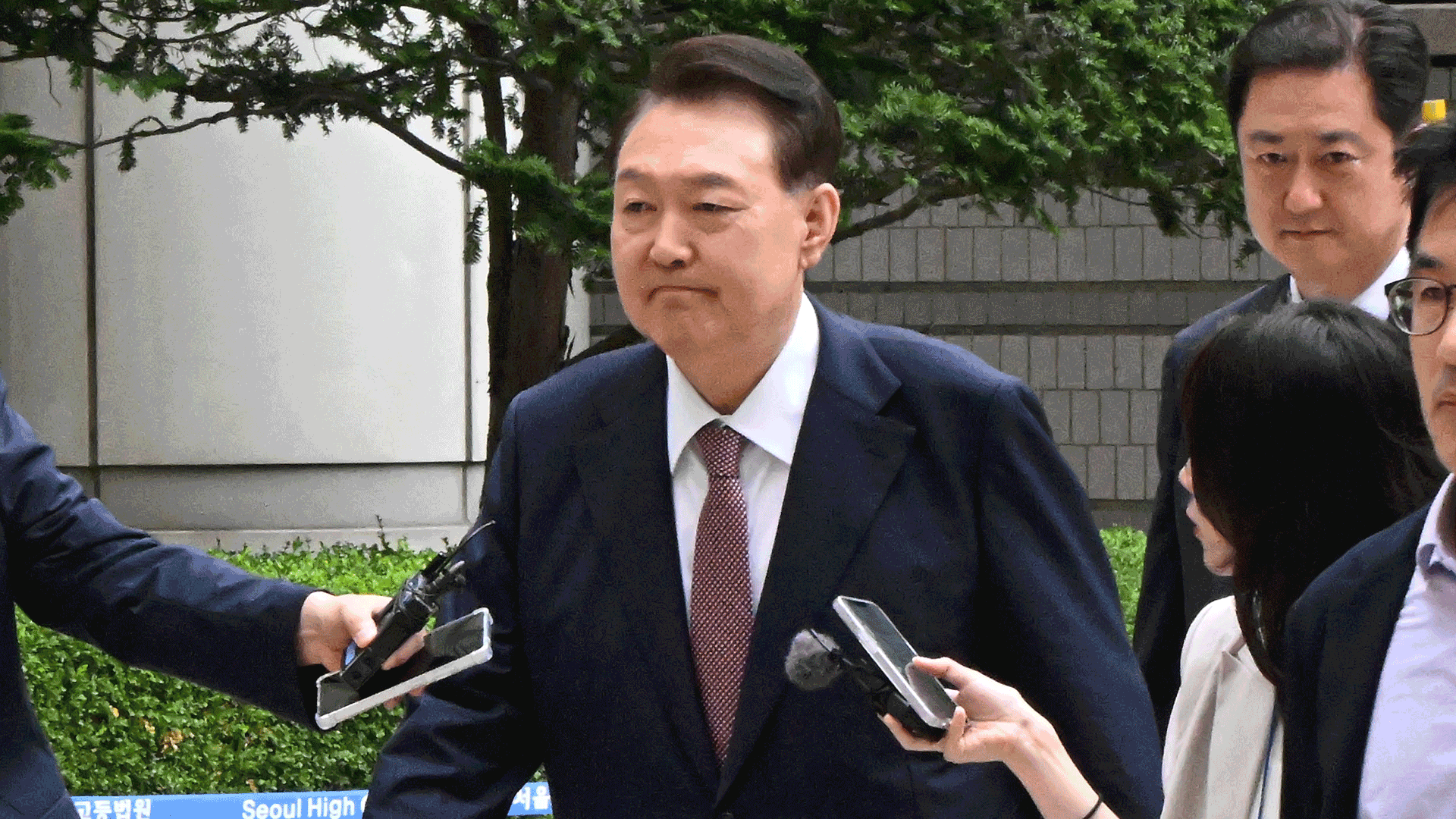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