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열정 페이’로 버티는 민간 소년범 시설
입력 2015.05.10 (17:33)
수정 2015.05.10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사법형 그룹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들을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대신,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해서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민간시설인데,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며 열정과 헌신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사법형 그룹홈’의 운영 실태를 파헤친 국제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멀쩡한 사람 빚쟁이가 돼서 못살겠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국제신문이 지난 3월 보도한 ‘사법형 그룹홈’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는 운영자의 하소연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실제 이런 시설들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언론들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시설들이 잘 되고 있다 란 식으로 단편적으로 보도 됐던 부분이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사법형 그룹홈 운영자들이 얘기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부산·경남 1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수입은 6,010만 5,148원에 불과했다. 수입 중 법원 보조금의 비중은 55.9%였다. 기부금은 물론 국선 보조인 수당(사법형 그룹홈 운영자가 소년범 사건처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할 때 받는 대가)도 운영비로 쓰였다. 평균 인력 2.8명은 대부분 '무보수'였다."
사실상 교정시설이면서도 그에 맞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운영자가 사비를 털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국가교정시설을 민간에 기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를테면 4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로 바꿔가면서 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창원지법에 따르면 2011~2012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평균 44.1%였다. 사법형 그룹홈을 거친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30%대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시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반 쉼터나 일반 그룹홈은 아동 청소년법상으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라든지 운영비 각종 들어가는 모든 돈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법형 그룹홈은 전혀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라도 사법형 그룹홈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교정시설을 민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해 공적 기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본은 오사카에 슈토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무원수만 70명이에요. 선생님이 20~30명, 이렇게 되니까 거의 1:1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나서주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법형 그룹홈’ 문제를 의제화한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사법형 그룹홈을 미담 중심의 기존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다뤄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이 아이들을 자신들마저 포기해버리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치는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은 개인 희생, 열정 페이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사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사법형 그룹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들을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대신,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해서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민간시설인데,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며 열정과 헌신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사법형 그룹홈’의 운영 실태를 파헤친 국제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멀쩡한 사람 빚쟁이가 돼서 못살겠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국제신문이 지난 3월 보도한 ‘사법형 그룹홈’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는 운영자의 하소연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실제 이런 시설들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언론들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시설들이 잘 되고 있다 란 식으로 단편적으로 보도 됐던 부분이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사법형 그룹홈 운영자들이 얘기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부산·경남 1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수입은 6,010만 5,148원에 불과했다. 수입 중 법원 보조금의 비중은 55.9%였다. 기부금은 물론 국선 보조인 수당(사법형 그룹홈 운영자가 소년범 사건처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할 때 받는 대가)도 운영비로 쓰였다. 평균 인력 2.8명은 대부분 '무보수'였다."
사실상 교정시설이면서도 그에 맞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운영자가 사비를 털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국가교정시설을 민간에 기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를테면 4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로 바꿔가면서 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창원지법에 따르면 2011~2012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평균 44.1%였다. 사법형 그룹홈을 거친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30%대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시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반 쉼터나 일반 그룹홈은 아동 청소년법상으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라든지 운영비 각종 들어가는 모든 돈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법형 그룹홈은 전혀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라도 사법형 그룹홈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교정시설을 민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해 공적 기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본은 오사카에 슈토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무원수만 70명이에요. 선생님이 20~30명, 이렇게 되니까 거의 1:1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나서주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법형 그룹홈’ 문제를 의제화한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사법형 그룹홈을 미담 중심의 기존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다뤄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이 아이들을 자신들마저 포기해버리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치는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은 개인 희생, 열정 페이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사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목 이 기사] ‘열정 페이’로 버티는 민간 소년범 시설
-
- 입력 2015-05-10 17:33:47
- 수정2015-05-10 22:07:04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사법형 그룹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들을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대신,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해서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민간시설인데,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며 열정과 헌신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사법형 그룹홈’의 운영 실태를 파헤친 국제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멀쩡한 사람 빚쟁이가 돼서 못살겠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국제신문이 지난 3월 보도한 ‘사법형 그룹홈’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는 운영자의 하소연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실제 이런 시설들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언론들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시설들이 잘 되고 있다 란 식으로 단편적으로 보도 됐던 부분이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사법형 그룹홈 운영자들이 얘기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부산·경남 1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수입은 6,010만 5,148원에 불과했다. 수입 중 법원 보조금의 비중은 55.9%였다. 기부금은 물론 국선 보조인 수당(사법형 그룹홈 운영자가 소년범 사건처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할 때 받는 대가)도 운영비로 쓰였다. 평균 인력 2.8명은 대부분 '무보수'였다."
사실상 교정시설이면서도 그에 맞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운영자가 사비를 털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국가교정시설을 민간에 기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를테면 4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로 바꿔가면서 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창원지법에 따르면 2011~2012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평균 44.1%였다. 사법형 그룹홈을 거친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30%대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시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반 쉼터나 일반 그룹홈은 아동 청소년법상으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라든지 운영비 각종 들어가는 모든 돈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법형 그룹홈은 전혀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라도 사법형 그룹홈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교정시설을 민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해 공적 기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본은 오사카에 슈토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무원수만 70명이에요. 선생님이 20~30명, 이렇게 되니까 거의 1:1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나서주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법형 그룹홈’ 문제를 의제화한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사법형 그룹홈을 미담 중심의 기존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다뤄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이 아이들을 자신들마저 포기해버리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치는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은 개인 희생, 열정 페이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사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사법형 그룹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들을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대신, 가정처럼 보호하고 교육해서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민간시설인데,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며 열정과 헌신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사법형 그룹홈’의 운영 실태를 파헤친 국제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멀쩡한 사람 빚쟁이가 돼서 못살겠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국제신문이 지난 3월 보도한 ‘사법형 그룹홈’의 열악한 실태를 보여주는 운영자의 하소연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실제 이런 시설들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언론들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런 시설들이 잘 되고 있다 란 식으로 단편적으로 보도 됐던 부분이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죠.”
사법형 그룹홈 운영자들이 얘기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부산·경남 1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수입은 6,010만 5,148원에 불과했다. 수입 중 법원 보조금의 비중은 55.9%였다. 기부금은 물론 국선 보조인 수당(사법형 그룹홈 운영자가 소년범 사건처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할 때 받는 대가)도 운영비로 쓰였다. 평균 인력 2.8명은 대부분 '무보수'였다."
사실상 교정시설이면서도 그에 맞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운영자가 사비를 털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국가교정시설을 민간에 기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를테면 4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로 바꿔가면서 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창원지법에 따르면 2011~2012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평균 44.1%였다. 사법형 그룹홈을 거친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비행률은 30%대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보호시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반 쉼터나 일반 그룹홈은 아동 청소년법상으로 공동생활 가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라든지 운영비 각종 들어가는 모든 돈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사법형 그룹홈은 전혀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라도 사법형 그룹홈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녹취> 국제신문(2015. 3. 5) : “교정시설을 민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테두리 내로 편입해 공적 기원을 확대해야 한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일본은 오사카에 슈토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무원수만 70명이에요. 선생님이 20~30명, 이렇게 되니까 거의 1:1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하루빨리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나서주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법형 그룹홈’ 문제를 의제화한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사법형 그룹홈을 미담 중심의 기존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다뤄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 이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뷰> 김화영(국제신문 기자) : “이 아이들을 자신들마저 포기해버리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치는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은 개인 희생, 열정 페이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사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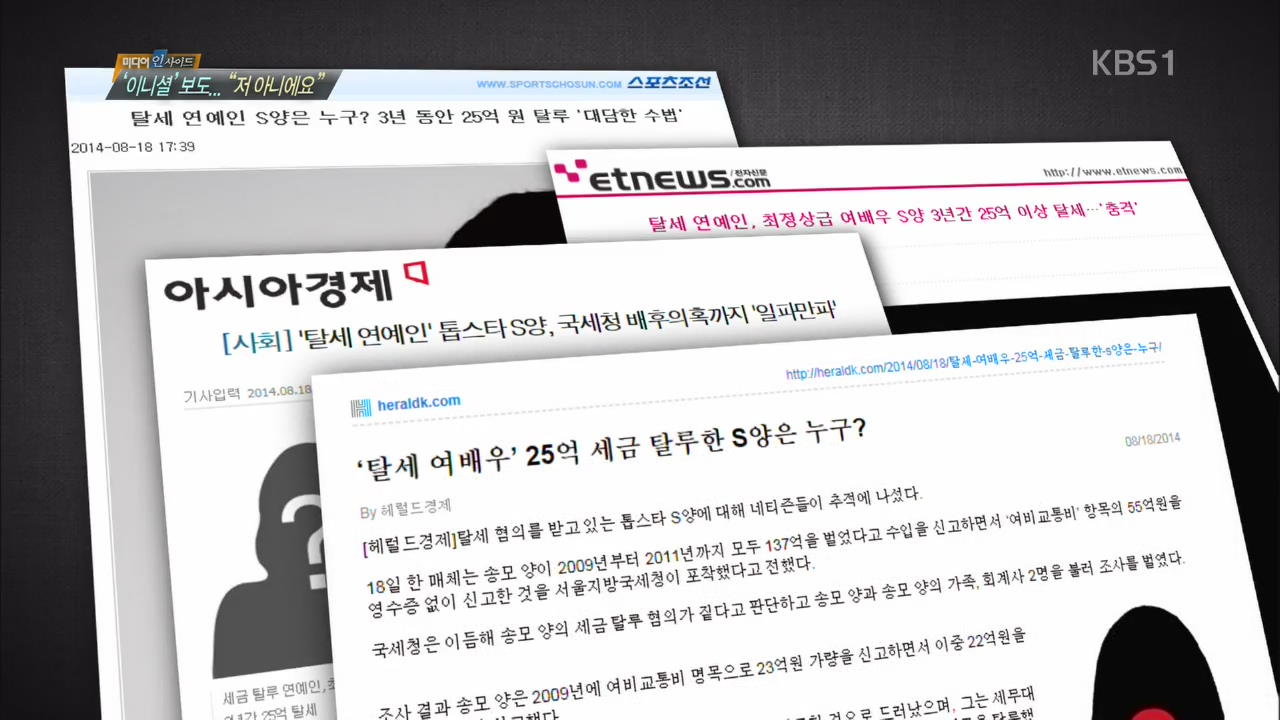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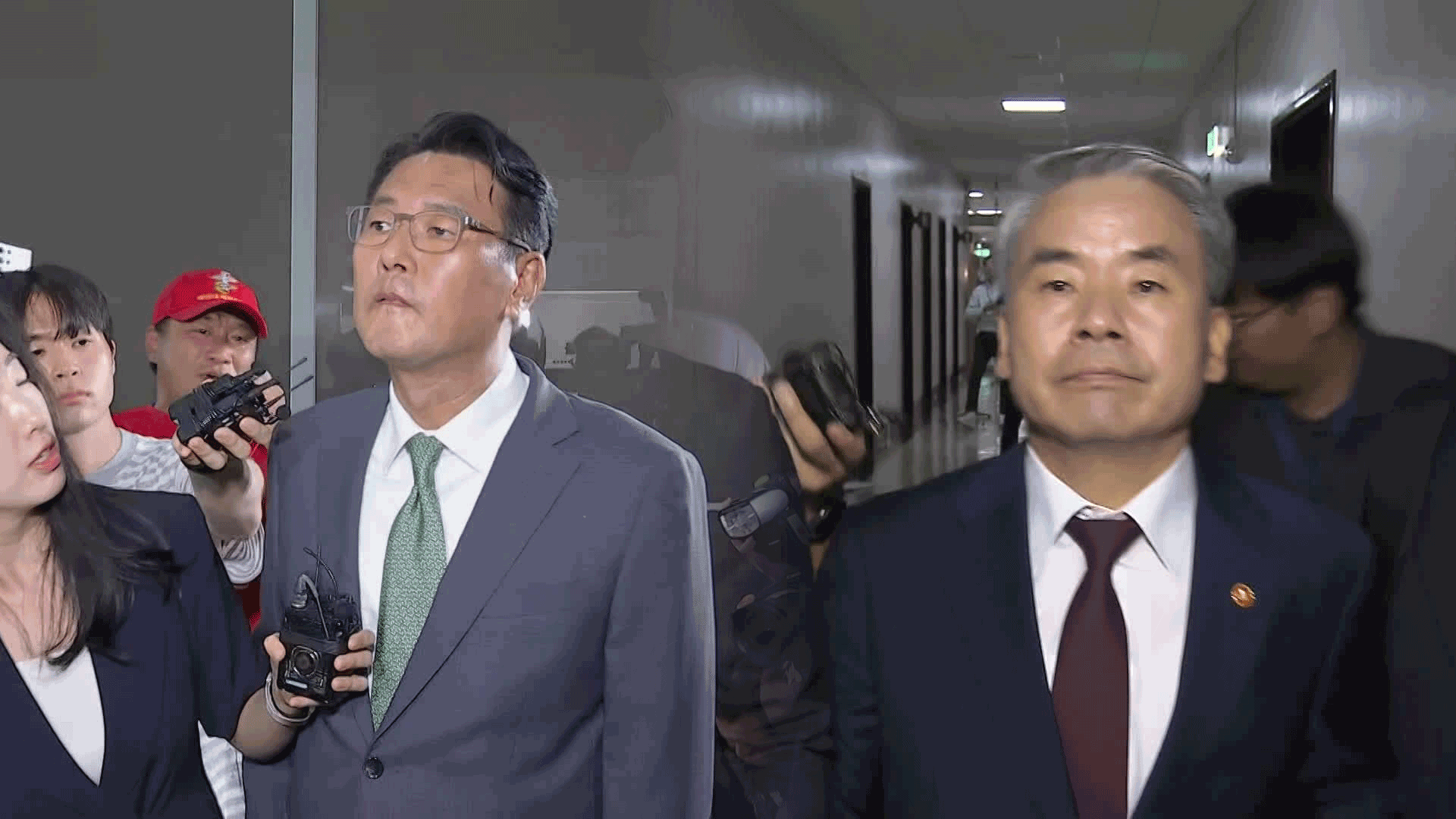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