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미래로] ‘보령의 딸’이 된 탈북 안내원
입력 2016.01.16 (08:20)
수정 2016.01.16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남북통일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통일로 미래로>입니다.
요즘에는 생소하지만 과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버스마다 따로 안내원이 있었는데요,
충남 보령에선 지금도 이 버스 안내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안내원들은 북녘에서 온 탈북민 출신이어서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보령시 마을 어르신들에게 딸처럼 사랑받는다는 탈북민 버스 안내원들을 홍은지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리포트>
마을을 출발한 버스가 시골길을 내달립니다.
한 시간에 한 대뿐인 이 버스는 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영하의 추위에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어르신.
이곳의 버스는 안내원이 타고 있는 일명 ‘오라이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화연(보령 주민/80살) : "안내양 버스 타고 갔잖아, 지금. 그 아가씬가 아줌만가 (안내양이) 매우 상냥해서 사람들을 매우 따르게 해, 좋아."
90년대 이후로는 사라진 줄 알았던 버스 안내원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게다가 이 버스의 안내원은 탈북민이어서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이 버스를 타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 버스는 출발부터 북적입니다.
승객의 대부분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탈북민 홍순희 씨입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다 우리 엄마들이고 다 우리 아버지들이야. 물어보세요. 다 엄마, 아버지야."
승하차 때 부축은 물론이고, 장보따리도 옮겨 주며 곰살맞은 딸처럼 챙기는데요.
지금은 7년 경력의 최고참 안내원이지만, 처음엔 낯선 말투 때문에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답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할 바엔 왜 이걸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 말투에 오해를 하셨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순희 씨에 대한 칭찬으로 어르신들의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버스 탈 때) 이런 거 못 들고 오면 들어 주고 얼마나 좋아 내려 주고. 얼마나 잘해 준다고 우린 이런데(무릎) 아프고 잘 못하잖아. 노인네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축해서 다 내려 주고."
순희 씨가 버스 안내원이 된 지도 벌써 7년째, 그 사이 순희 씨처럼 북에서 내려온 또 다른 후배 안내원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보령시만의 특별한 두 탈북 안내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찾아온 휴식 시간,
이럴 때 힘이 되는 건 후배 안내원이자 고향 동생인 영옥 씨인데요.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같은 곳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또 울고 또 서로 받아 주고. 속상할 땐 서로 농담 삼아 험담도 늘어놓고. 좋은 소리 궂은소리 나눠 가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어쨌든."
낯선 땅에서 만나 이제는 친자매 같은 이들에겐 남에게 말하기 힘든 같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제가 중국은 넘어온 걸 알고 북한에서 집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헤어져 다니면서 엄마를 찾자, 그렇게 헤어져 다니기 시작했는데 둘이 (영영) 헤어진 거죠."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북한에서) 셋을 낳고 둘을 잃어버리고. 하나는 아직 행방을 몰라요. 북한에서 잃어버리고 왔어요. 혼자서 어디 가서 살아있는지...살아있는지만 확인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살기 위해 사선을 넘었지만 자식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두 사람...
그래도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있어 큰 위로가 됩니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영옥 씨가 나설 차례.
영옥 씨의 버스도 장터로 가는 어르신들로 금세 자리가 채워집니다.
<인터뷰> 유봉조(보령 주민/80살) : "전부 늙은이들 (짐) 가지고 오는 거 올려 주고 전부 그러잖아. 내려놔 주고. 나보고 지금 어디 가시느냐고 (안부 묻고) 악수하고 그랬잖아."
영옥 씨가 안내원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째,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챙기다보니 이제는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윤균(보령 주민/72살) : "(안내원 없는 다른 버스 타면 허전하겠어요?) 그렇죠. 해 버릇해서. (안내양이) 친절하게 해 준 게 버릇되니까."
몸은 고되지만 어르신들과 반갑게 인사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영옥 씨,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엄마들도 다 딸처럼 대해 주시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인터뷰> 최병섭(대천여객 운전기사) : "저도 편하고 손님들도 편하고. 오늘 같은 날은 장날이기 때문에 보따리, 물건이 많아서 이런 것 도와주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라며 어르신들의 두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탈북 버스 안내원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들이 어디서 사는지 어느 손님이 어디서 내리시는지, 이제는 한 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동네는 내 고향집이라고, 그냥 제2의 고향이에요."
오늘도 보령시의 ‘오라이 버스’는 힘차게 달립니다.
남북통일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통일로 미래로>입니다.
요즘에는 생소하지만 과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버스마다 따로 안내원이 있었는데요,
충남 보령에선 지금도 이 버스 안내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안내원들은 북녘에서 온 탈북민 출신이어서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보령시 마을 어르신들에게 딸처럼 사랑받는다는 탈북민 버스 안내원들을 홍은지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리포트>
마을을 출발한 버스가 시골길을 내달립니다.
한 시간에 한 대뿐인 이 버스는 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영하의 추위에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어르신.
이곳의 버스는 안내원이 타고 있는 일명 ‘오라이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화연(보령 주민/80살) : "안내양 버스 타고 갔잖아, 지금. 그 아가씬가 아줌만가 (안내양이) 매우 상냥해서 사람들을 매우 따르게 해, 좋아."
90년대 이후로는 사라진 줄 알았던 버스 안내원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게다가 이 버스의 안내원은 탈북민이어서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이 버스를 타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 버스는 출발부터 북적입니다.
승객의 대부분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탈북민 홍순희 씨입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다 우리 엄마들이고 다 우리 아버지들이야. 물어보세요. 다 엄마, 아버지야."
승하차 때 부축은 물론이고, 장보따리도 옮겨 주며 곰살맞은 딸처럼 챙기는데요.
지금은 7년 경력의 최고참 안내원이지만, 처음엔 낯선 말투 때문에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답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할 바엔 왜 이걸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 말투에 오해를 하셨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순희 씨에 대한 칭찬으로 어르신들의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버스 탈 때) 이런 거 못 들고 오면 들어 주고 얼마나 좋아 내려 주고. 얼마나 잘해 준다고 우린 이런데(무릎) 아프고 잘 못하잖아. 노인네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축해서 다 내려 주고."
순희 씨가 버스 안내원이 된 지도 벌써 7년째, 그 사이 순희 씨처럼 북에서 내려온 또 다른 후배 안내원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보령시만의 특별한 두 탈북 안내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찾아온 휴식 시간,
이럴 때 힘이 되는 건 후배 안내원이자 고향 동생인 영옥 씨인데요.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같은 곳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또 울고 또 서로 받아 주고. 속상할 땐 서로 농담 삼아 험담도 늘어놓고. 좋은 소리 궂은소리 나눠 가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어쨌든."
낯선 땅에서 만나 이제는 친자매 같은 이들에겐 남에게 말하기 힘든 같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제가 중국은 넘어온 걸 알고 북한에서 집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헤어져 다니면서 엄마를 찾자, 그렇게 헤어져 다니기 시작했는데 둘이 (영영) 헤어진 거죠."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북한에서) 셋을 낳고 둘을 잃어버리고. 하나는 아직 행방을 몰라요. 북한에서 잃어버리고 왔어요. 혼자서 어디 가서 살아있는지...살아있는지만 확인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살기 위해 사선을 넘었지만 자식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두 사람...
그래도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있어 큰 위로가 됩니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영옥 씨가 나설 차례.
영옥 씨의 버스도 장터로 가는 어르신들로 금세 자리가 채워집니다.
<인터뷰> 유봉조(보령 주민/80살) : "전부 늙은이들 (짐) 가지고 오는 거 올려 주고 전부 그러잖아. 내려놔 주고. 나보고 지금 어디 가시느냐고 (안부 묻고) 악수하고 그랬잖아."
영옥 씨가 안내원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째,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챙기다보니 이제는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윤균(보령 주민/72살) : "(안내원 없는 다른 버스 타면 허전하겠어요?) 그렇죠. 해 버릇해서. (안내양이) 친절하게 해 준 게 버릇되니까."
몸은 고되지만 어르신들과 반갑게 인사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영옥 씨,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엄마들도 다 딸처럼 대해 주시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인터뷰> 최병섭(대천여객 운전기사) : "저도 편하고 손님들도 편하고. 오늘 같은 날은 장날이기 때문에 보따리, 물건이 많아서 이런 것 도와주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라며 어르신들의 두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탈북 버스 안내원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들이 어디서 사는지 어느 손님이 어디서 내리시는지, 이제는 한 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동네는 내 고향집이라고, 그냥 제2의 고향이에요."
오늘도 보령시의 ‘오라이 버스’는 힘차게 달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로 미래로] ‘보령의 딸’이 된 탈북 안내원
-
- 입력 2016-01-16 08:22:42
- 수정2016-01-16 08:34:24

<앵커 멘트>
남북통일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통일로 미래로>입니다.
요즘에는 생소하지만 과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버스마다 따로 안내원이 있었는데요,
충남 보령에선 지금도 이 버스 안내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안내원들은 북녘에서 온 탈북민 출신이어서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보령시 마을 어르신들에게 딸처럼 사랑받는다는 탈북민 버스 안내원들을 홍은지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리포트>
마을을 출발한 버스가 시골길을 내달립니다.
한 시간에 한 대뿐인 이 버스는 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영하의 추위에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어르신.
이곳의 버스는 안내원이 타고 있는 일명 ‘오라이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화연(보령 주민/80살) : "안내양 버스 타고 갔잖아, 지금. 그 아가씬가 아줌만가 (안내양이) 매우 상냥해서 사람들을 매우 따르게 해, 좋아."
90년대 이후로는 사라진 줄 알았던 버스 안내원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게다가 이 버스의 안내원은 탈북민이어서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이 버스를 타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 버스는 출발부터 북적입니다.
승객의 대부분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탈북민 홍순희 씨입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다 우리 엄마들이고 다 우리 아버지들이야. 물어보세요. 다 엄마, 아버지야."
승하차 때 부축은 물론이고, 장보따리도 옮겨 주며 곰살맞은 딸처럼 챙기는데요.
지금은 7년 경력의 최고참 안내원이지만, 처음엔 낯선 말투 때문에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답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할 바엔 왜 이걸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 말투에 오해를 하셨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순희 씨에 대한 칭찬으로 어르신들의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버스 탈 때) 이런 거 못 들고 오면 들어 주고 얼마나 좋아 내려 주고. 얼마나 잘해 준다고 우린 이런데(무릎) 아프고 잘 못하잖아. 노인네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축해서 다 내려 주고."
순희 씨가 버스 안내원이 된 지도 벌써 7년째, 그 사이 순희 씨처럼 북에서 내려온 또 다른 후배 안내원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보령시만의 특별한 두 탈북 안내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찾아온 휴식 시간,
이럴 때 힘이 되는 건 후배 안내원이자 고향 동생인 영옥 씨인데요.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같은 곳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또 울고 또 서로 받아 주고. 속상할 땐 서로 농담 삼아 험담도 늘어놓고. 좋은 소리 궂은소리 나눠 가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어쨌든."
낯선 땅에서 만나 이제는 친자매 같은 이들에겐 남에게 말하기 힘든 같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제가 중국은 넘어온 걸 알고 북한에서 집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헤어져 다니면서 엄마를 찾자, 그렇게 헤어져 다니기 시작했는데 둘이 (영영) 헤어진 거죠."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북한에서) 셋을 낳고 둘을 잃어버리고. 하나는 아직 행방을 몰라요. 북한에서 잃어버리고 왔어요. 혼자서 어디 가서 살아있는지...살아있는지만 확인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살기 위해 사선을 넘었지만 자식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두 사람...
그래도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있어 큰 위로가 됩니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영옥 씨가 나설 차례.
영옥 씨의 버스도 장터로 가는 어르신들로 금세 자리가 채워집니다.
<인터뷰> 유봉조(보령 주민/80살) : "전부 늙은이들 (짐) 가지고 오는 거 올려 주고 전부 그러잖아. 내려놔 주고. 나보고 지금 어디 가시느냐고 (안부 묻고) 악수하고 그랬잖아."
영옥 씨가 안내원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째,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챙기다보니 이제는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윤균(보령 주민/72살) : "(안내원 없는 다른 버스 타면 허전하겠어요?) 그렇죠. 해 버릇해서. (안내양이) 친절하게 해 준 게 버릇되니까."
몸은 고되지만 어르신들과 반갑게 인사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영옥 씨,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엄마들도 다 딸처럼 대해 주시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인터뷰> 최병섭(대천여객 운전기사) : "저도 편하고 손님들도 편하고. 오늘 같은 날은 장날이기 때문에 보따리, 물건이 많아서 이런 것 도와주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라며 어르신들의 두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탈북 버스 안내원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들이 어디서 사는지 어느 손님이 어디서 내리시는지, 이제는 한 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동네는 내 고향집이라고, 그냥 제2의 고향이에요."
오늘도 보령시의 ‘오라이 버스’는 힘차게 달립니다.
남북통일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통일로 미래로>입니다.
요즘에는 생소하지만 과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버스마다 따로 안내원이 있었는데요,
충남 보령에선 지금도 이 버스 안내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안내원들은 북녘에서 온 탈북민 출신이어서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보령시 마을 어르신들에게 딸처럼 사랑받는다는 탈북민 버스 안내원들을 홍은지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리포트>
마을을 출발한 버스가 시골길을 내달립니다.
한 시간에 한 대뿐인 이 버스는 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요.
영하의 추위에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어르신.
이곳의 버스는 안내원이 타고 있는 일명 ‘오라이 버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화연(보령 주민/80살) : "안내양 버스 타고 갔잖아, 지금. 그 아가씬가 아줌만가 (안내양이) 매우 상냥해서 사람들을 매우 따르게 해, 좋아."
90년대 이후로는 사라진 줄 알았던 버스 안내원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게다가 이 버스의 안내원은 탈북민이어서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이 버스를 타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 버스는 출발부터 북적입니다.
승객의 대부분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탈북민 홍순희 씨입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다 우리 엄마들이고 다 우리 아버지들이야. 물어보세요. 다 엄마, 아버지야."
승하차 때 부축은 물론이고, 장보따리도 옮겨 주며 곰살맞은 딸처럼 챙기는데요.
지금은 7년 경력의 최고참 안내원이지만, 처음엔 낯선 말투 때문에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답니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할 바엔 왜 이걸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제 말투에 오해를 하셨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순희 씨에 대한 칭찬으로 어르신들의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버스 탈 때) 이런 거 못 들고 오면 들어 주고 얼마나 좋아 내려 주고. 얼마나 잘해 준다고 우린 이런데(무릎) 아프고 잘 못하잖아. 노인네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축해서 다 내려 주고."
순희 씨가 버스 안내원이 된 지도 벌써 7년째, 그 사이 순희 씨처럼 북에서 내려온 또 다른 후배 안내원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보령시만의 특별한 두 탈북 안내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찾아온 휴식 시간,
이럴 때 힘이 되는 건 후배 안내원이자 고향 동생인 영옥 씨인데요.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같은 곳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또 울고 또 서로 받아 주고. 속상할 땐 서로 농담 삼아 험담도 늘어놓고. 좋은 소리 궂은소리 나눠 가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어쨌든."
낯선 땅에서 만나 이제는 친자매 같은 이들에겐 남에게 말하기 힘든 같은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제가 중국은 넘어온 걸 알고 북한에서 집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헤어져 다니면서 엄마를 찾자, 그렇게 헤어져 다니기 시작했는데 둘이 (영영) 헤어진 거죠."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북한에서) 셋을 낳고 둘을 잃어버리고. 하나는 아직 행방을 몰라요. 북한에서 잃어버리고 왔어요. 혼자서 어디 가서 살아있는지...살아있는지만 확인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생사를) 모르고 있어요."
살기 위해 사선을 넘었지만 자식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두 사람...
그래도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있어 큰 위로가 됩니다.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영옥 씨가 나설 차례.
영옥 씨의 버스도 장터로 가는 어르신들로 금세 자리가 채워집니다.
<인터뷰> 유봉조(보령 주민/80살) : "전부 늙은이들 (짐) 가지고 오는 거 올려 주고 전부 그러잖아. 내려놔 주고. 나보고 지금 어디 가시느냐고 (안부 묻고) 악수하고 그랬잖아."
영옥 씨가 안내원 일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째,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챙기다보니 이제는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윤균(보령 주민/72살) : "(안내원 없는 다른 버스 타면 허전하겠어요?) 그렇죠. 해 버릇해서. (안내양이) 친절하게 해 준 게 버릇되니까."
몸은 고되지만 어르신들과 반갑게 인사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 영옥 씨,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인터뷰> 이영옥(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엄마들도 다 딸처럼 대해 주시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인터뷰> 최병섭(대천여객 운전기사) : "저도 편하고 손님들도 편하고. 오늘 같은 날은 장날이기 때문에 보따리, 물건이 많아서 이런 것 도와주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라며 어르신들의 두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탈북 버스 안내원들,
<인터뷰> 홍순희(탈북 버스 안내원) : "엄마들이 어디서 사는지 어느 손님이 어디서 내리시는지, 이제는 한 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동네는 내 고향집이라고, 그냥 제2의 고향이에요."
오늘도 보령시의 ‘오라이 버스’는 힘차게 달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요즘 북한은] 北 예술단 다시 전면에…우상화 노골화 외](https://news.kbs.co.kr/data/news/2016/01/16/3216502_30.jpg)
![[북한영상] 백령도의 일출](https://news.kbs.co.kr/data/news/2016/01/16/3216504_50.jpg)
![[속보] 법원, ‘조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data/layer/904/2025/07/20250731_8KrWe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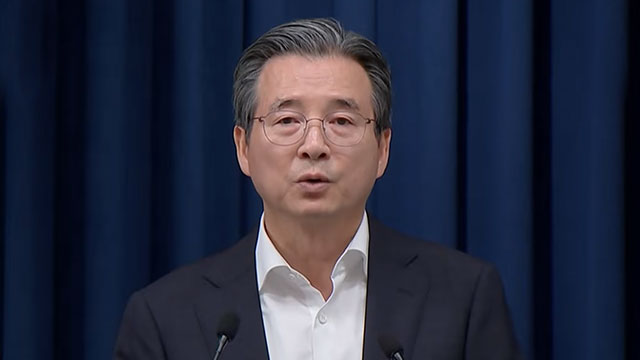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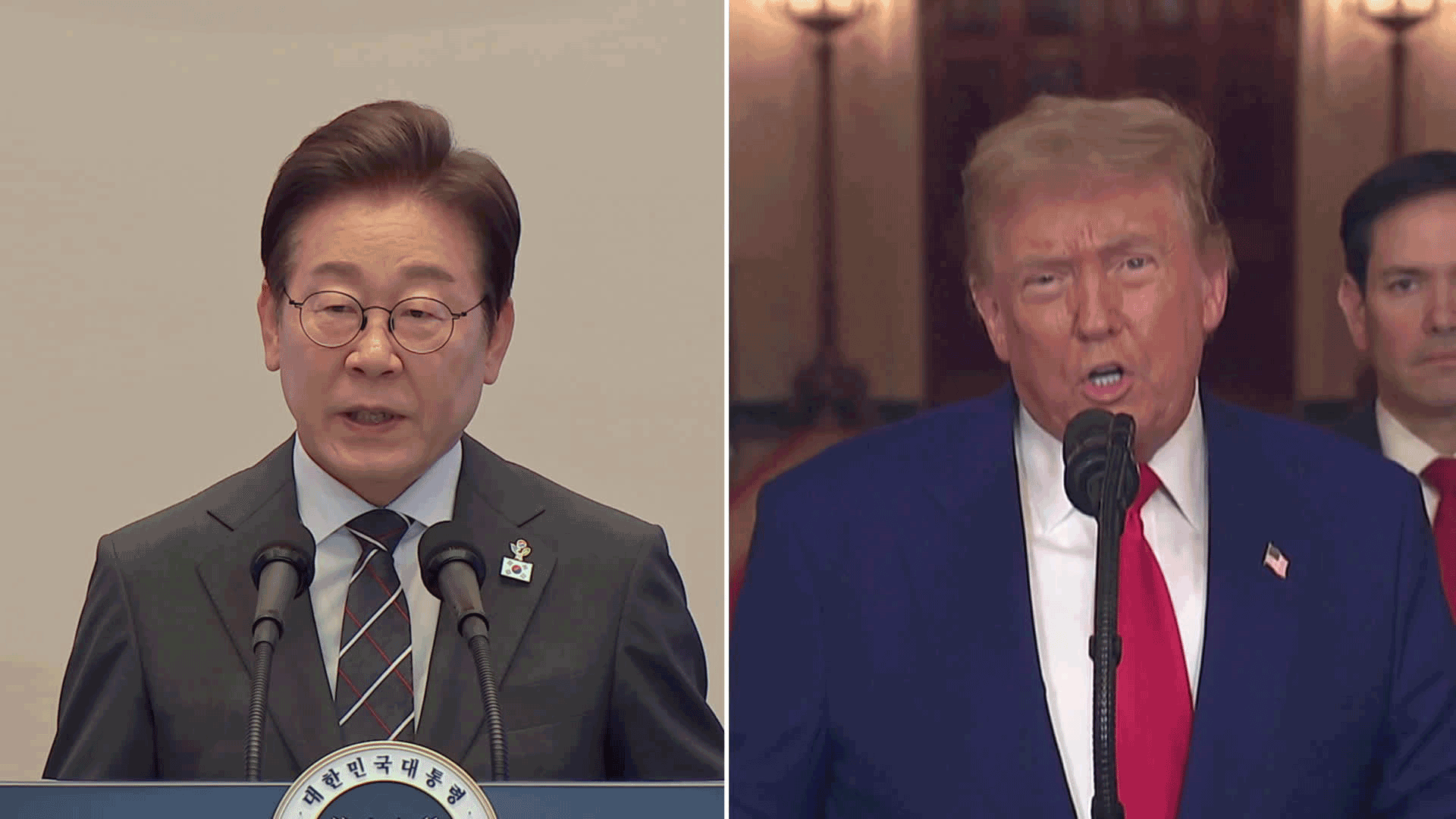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