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로 밤더위 더 극심…숙면법은?
입력 2016.08.02 (08:12)
수정 2016.08.02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요즘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 열대야는 예년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여름 내내 평균 8.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에만 열대야 일수가 열흘이나 됐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다는 199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7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도 나흘로 예년보다는 많았지만, 열대야 일수는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열대야가 늘어난 것은 습도와 바람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습도는 80%가 넘어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수증기가 이불 역할을 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람마저 덜 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바람이 15% 정도 약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열기가 빌딩 숲에 갇히는 데다, 에어컨 실외기나 자동차 열기가 밤새 공급돼, 열대야가 더 극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한낮의 폭염도 심하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탓에 여름 나기가 더 힘겹게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한여름의 열대야가 일상화할 거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는 기울지만 도심은 열기로 이글거립니다.
저녁 6시쯤에도 아스팔트 위 기온은 폭염 수준인 33도에 육박합니다.
도심의 빌딩이나 아스팔트는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데도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70년대와 최근의 열대야 일수를 비교하면 녹지가 많은 강화군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울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온난화의 경향도 낮보다 밤이 더 뚜렷합니다.
전반적인 온난화 속에서 40여 년 동안 한낮 최고기온의 상승 폭보다 새벽녘 최저기온의 상승 폭이 30% 이상 컸습니다.
해외 연구진은 대기 중에서도 지면에 접해있는 대기경계층에 주목했습니다.
경계층은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최고 2km 높이까지 늘어나지만 밤에는 대기가 안정되며 수 백m로 줄어듭니다.
온난화로 늘어난 열이 밤에는 얇은 공기층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녹취> 박성찬(기상청 기후정책과 사무관) : "만일 온실가스를 현재 추세대로 계속해서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 열대야 일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20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대도시는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 멘트>
이런 열대야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몸의 적당한 수면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입니다.
그런데 외부 기온이 25도를 넘게되면 수면 효율이 50%대, 절반으로 떨어져서 뒤척이거나 자주 깨게 되는 등 수면 조절이 잘 안됩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체온과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가 같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열대야로 잠을 못 자면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틀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28%, 사흘 지속되면 31%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면 피로가 누적되고, 노약자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로 누적을 막고 체력 회복을 위해선 잠깐 동안의 낮잠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 2시 이전에 한 시간 이내로 낮잠을 자면 수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잠들기 전 에어컨과 선풍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어 방 안 온도를 낮춰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만일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쯤 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열대야로 나타나는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 열대야는 예년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여름 내내 평균 8.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에만 열대야 일수가 열흘이나 됐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다는 199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7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도 나흘로 예년보다는 많았지만, 열대야 일수는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열대야가 늘어난 것은 습도와 바람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습도는 80%가 넘어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수증기가 이불 역할을 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람마저 덜 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바람이 15% 정도 약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열기가 빌딩 숲에 갇히는 데다, 에어컨 실외기나 자동차 열기가 밤새 공급돼, 열대야가 더 극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한낮의 폭염도 심하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탓에 여름 나기가 더 힘겹게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한여름의 열대야가 일상화할 거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는 기울지만 도심은 열기로 이글거립니다.
저녁 6시쯤에도 아스팔트 위 기온은 폭염 수준인 33도에 육박합니다.
도심의 빌딩이나 아스팔트는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데도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70년대와 최근의 열대야 일수를 비교하면 녹지가 많은 강화군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울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온난화의 경향도 낮보다 밤이 더 뚜렷합니다.
전반적인 온난화 속에서 40여 년 동안 한낮 최고기온의 상승 폭보다 새벽녘 최저기온의 상승 폭이 30% 이상 컸습니다.
해외 연구진은 대기 중에서도 지면에 접해있는 대기경계층에 주목했습니다.
경계층은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최고 2km 높이까지 늘어나지만 밤에는 대기가 안정되며 수 백m로 줄어듭니다.
온난화로 늘어난 열이 밤에는 얇은 공기층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녹취> 박성찬(기상청 기후정책과 사무관) : "만일 온실가스를 현재 추세대로 계속해서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 열대야 일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20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대도시는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 멘트>
이런 열대야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몸의 적당한 수면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입니다.
그런데 외부 기온이 25도를 넘게되면 수면 효율이 50%대, 절반으로 떨어져서 뒤척이거나 자주 깨게 되는 등 수면 조절이 잘 안됩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체온과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가 같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열대야로 잠을 못 자면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틀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28%, 사흘 지속되면 31%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면 피로가 누적되고, 노약자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로 누적을 막고 체력 회복을 위해선 잠깐 동안의 낮잠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 2시 이전에 한 시간 이내로 낮잠을 자면 수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잠들기 전 에어컨과 선풍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어 방 안 온도를 낮춰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만일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쯤 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열대야로 나타나는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온난화로 밤더위 더 극심…숙면법은?
-
- 입력 2016-08-02 08:16:02
- 수정2016-08-02 09:19:22

<기자 멘트>
요즘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 열대야는 예년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여름 내내 평균 8.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에만 열대야 일수가 열흘이나 됐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다는 199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7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도 나흘로 예년보다는 많았지만, 열대야 일수는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열대야가 늘어난 것은 습도와 바람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습도는 80%가 넘어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수증기가 이불 역할을 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람마저 덜 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바람이 15% 정도 약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열기가 빌딩 숲에 갇히는 데다, 에어컨 실외기나 자동차 열기가 밤새 공급돼, 열대야가 더 극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한낮의 폭염도 심하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탓에 여름 나기가 더 힘겹게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한여름의 열대야가 일상화할 거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는 기울지만 도심은 열기로 이글거립니다.
저녁 6시쯤에도 아스팔트 위 기온은 폭염 수준인 33도에 육박합니다.
도심의 빌딩이나 아스팔트는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데도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70년대와 최근의 열대야 일수를 비교하면 녹지가 많은 강화군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울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온난화의 경향도 낮보다 밤이 더 뚜렷합니다.
전반적인 온난화 속에서 40여 년 동안 한낮 최고기온의 상승 폭보다 새벽녘 최저기온의 상승 폭이 30% 이상 컸습니다.
해외 연구진은 대기 중에서도 지면에 접해있는 대기경계층에 주목했습니다.
경계층은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최고 2km 높이까지 늘어나지만 밤에는 대기가 안정되며 수 백m로 줄어듭니다.
온난화로 늘어난 열이 밤에는 얇은 공기층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녹취> 박성찬(기상청 기후정책과 사무관) : "만일 온실가스를 현재 추세대로 계속해서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 열대야 일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20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대도시는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 멘트>
이런 열대야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몸의 적당한 수면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입니다.
그런데 외부 기온이 25도를 넘게되면 수면 효율이 50%대, 절반으로 떨어져서 뒤척이거나 자주 깨게 되는 등 수면 조절이 잘 안됩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체온과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가 같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열대야로 잠을 못 자면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틀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28%, 사흘 지속되면 31%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면 피로가 누적되고, 노약자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로 누적을 막고 체력 회복을 위해선 잠깐 동안의 낮잠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 2시 이전에 한 시간 이내로 낮잠을 자면 수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잠들기 전 에어컨과 선풍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어 방 안 온도를 낮춰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만일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쯤 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열대야로 나타나는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올해 열대야는 예년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여름 내내 평균 8.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에만 열대야 일수가 열흘이나 됐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다는 199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7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도 나흘로 예년보다는 많았지만, 열대야 일수는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열대야가 늘어난 것은 습도와 바람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습도는 80%가 넘어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수증기가 이불 역할을 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람마저 덜 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바람이 15% 정도 약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열기가 빌딩 숲에 갇히는 데다, 에어컨 실외기나 자동차 열기가 밤새 공급돼, 열대야가 더 극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한낮의 폭염도 심하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 탓에 여름 나기가 더 힘겹게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한여름의 열대야가 일상화할 거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는 기울지만 도심은 열기로 이글거립니다.
저녁 6시쯤에도 아스팔트 위 기온은 폭염 수준인 33도에 육박합니다.
도심의 빌딩이나 아스팔트는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데도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70년대와 최근의 열대야 일수를 비교하면 녹지가 많은 강화군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서울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온난화의 경향도 낮보다 밤이 더 뚜렷합니다.
전반적인 온난화 속에서 40여 년 동안 한낮 최고기온의 상승 폭보다 새벽녘 최저기온의 상승 폭이 30% 이상 컸습니다.
해외 연구진은 대기 중에서도 지면에 접해있는 대기경계층에 주목했습니다.
경계층은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최고 2km 높이까지 늘어나지만 밤에는 대기가 안정되며 수 백m로 줄어듭니다.
온난화로 늘어난 열이 밤에는 얇은 공기층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녹취> 박성찬(기상청 기후정책과 사무관) : "만일 온실가스를 현재 추세대로 계속해서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 열대야 일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20일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우 대도시는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 멘트>
이런 열대야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몸의 적당한 수면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입니다.
그런데 외부 기온이 25도를 넘게되면 수면 효율이 50%대, 절반으로 떨어져서 뒤척이거나 자주 깨게 되는 등 수면 조절이 잘 안됩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체온과 수면을 조절하는 부위가 같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열대야로 잠을 못 자면 심장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틀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28%, 사흘 지속되면 31%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면 피로가 누적되고, 노약자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로 누적을 막고 체력 회복을 위해선 잠깐 동안의 낮잠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오후 2시 이전에 한 시간 이내로 낮잠을 자면 수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잠들기 전 에어컨과 선풍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어 방 안 온도를 낮춰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밤 더위가 더 심해질 거란 점입니다.
만일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배출할 경우 21세기 중반쯤 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7~8월 대부분 기간에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열대야로 나타나는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

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최영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이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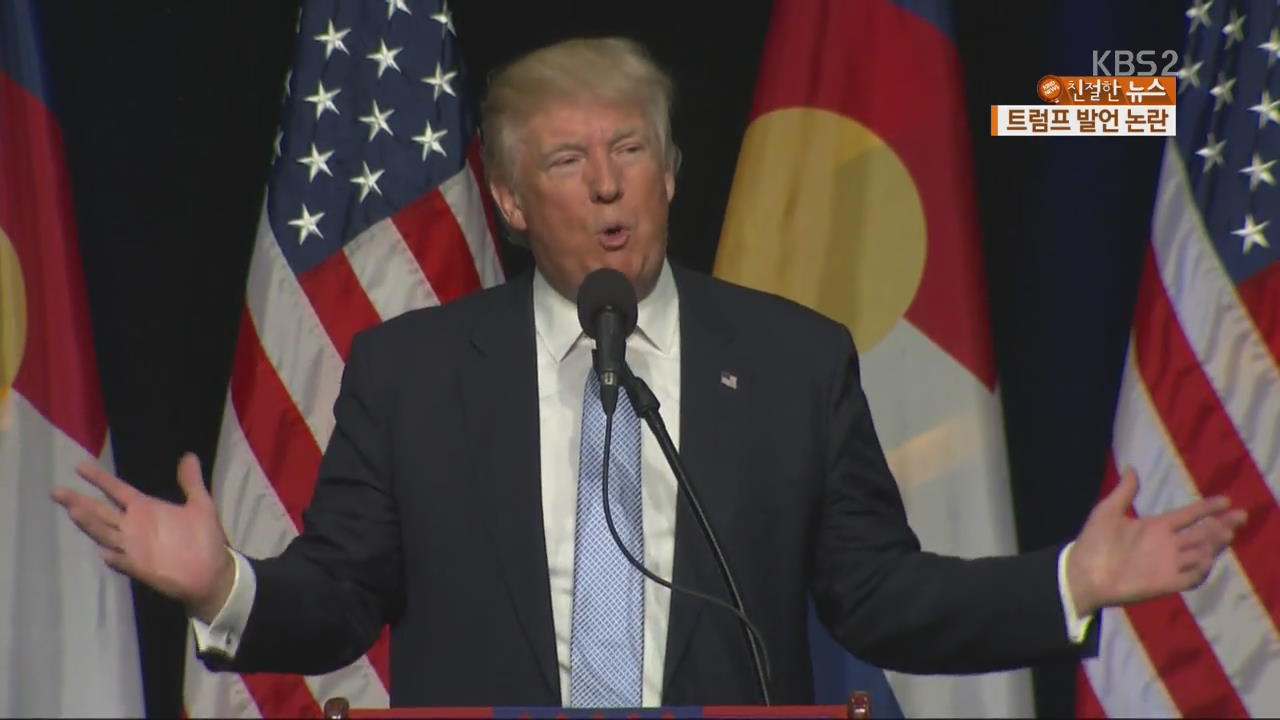
![[단독] 제2의 ‘김건희·이진숙 논란’ 막을까…<br>‘교육부 직권검증’ 입법 추진](/data/layer/904/2025/07/20250713_X3MaM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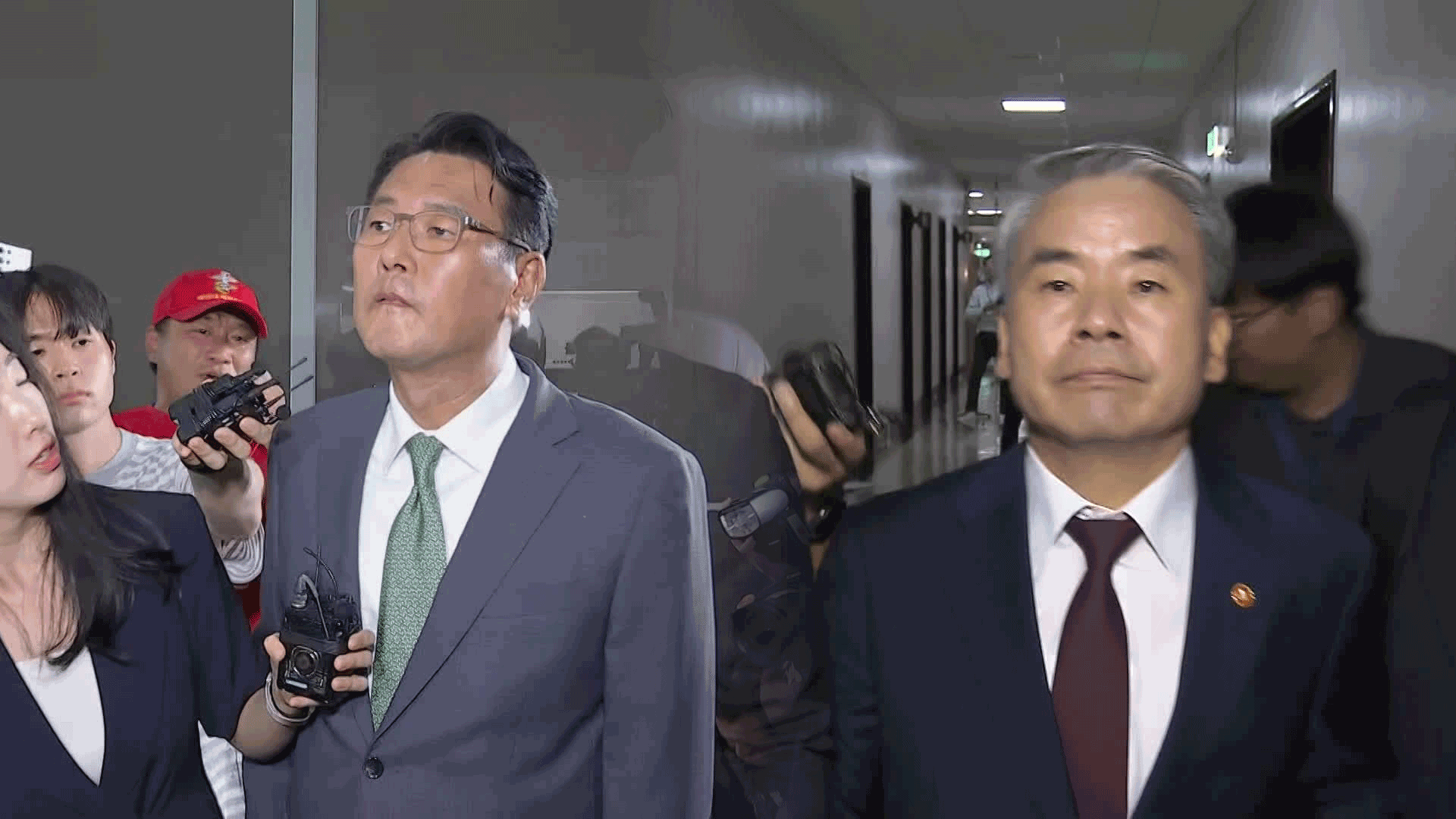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