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K] “민족 정기 끊으려고”…끊나지 않은 아픔 노치마을 ‘목돌’
입력 2021.03.04 (19:38)
수정 2021.03.04 (2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 백두대간이 지나는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
마을회관 옆, 수령 500년을 훌쩍 넘은 둥치 굵은 당산나무 곁에 기이한 형태의 돌 5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나사 모양의 흔치 않은 생김새에, 반원 두 개를 한 쌍으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대 '목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며 일본이 백두대간에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덕음봉에서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맥)이 사람으로 따지면 목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그럽니다. (그 부위에) 숨을 못 쉬는 장치를 했다 해서 ‘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 조임돌’ 혹은 ‘잠금돌’이라고도 부르는 이 목돌 하나의 크기는 가로 120㎝에 세로 95㎝, 두께 40㎝, 무게는 100kg이 넘습니다.
일제가 우리 명산 주요 혈맥마다 길을 내거나 쇠말뚝을 박았다는 설이 있지만, 이처럼 거대 석물이 확인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1998년 경 경지정리 때 마을 앞 방죽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목돌.
15년 가까이 운봉읍 주촌리 한 주택의 정원석으로 쓰이다가, 지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노치마을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이게 그냥 부숴서 버릴 게 아니고, 기왕이면 일제가 행했던 행위들에 대한 것을 교육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차원의 의미들도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이 된 방죽 자리는 마을 뒤 덕음산에서 마주보이는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사람의 신체 중 목이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곳입니다.
["길이가 여기서 내가 200m로 알고 있어요. 200m고, 여기 넓이가 한 20m 돼요. '목돌'을 양쪽 머리 하나씩 박아놓고, 이 쪽에 2개, 저 쪽에 2개.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원래는 야트막한 둔덕으로 되어 있어 ‘날등’이라 불렸다는데, 일제가 길이 100m, 폭 20m에 4m의 깊이로 파서 만든 방죽에 모두 3쌍의 목돌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았다는 겁니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방죽을 팔 때 3년을 팠대요. 이 근방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3년을 팠대, 3년을. 저 방죽을. 부역을 시킨 것이지.”]
[박상진/남원시 노치마을 : "지금 저 돌이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놨던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동네, 또 이 부근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목돌이 설치되면서 기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땅에서 피가 솟고, 지리산이 4일간 울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지리산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마을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마을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은 목돌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지리산 주변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세 분이 나온다고 그랬어. 사전에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죽을 파고 '목돌'을 설치를 하고….”]
[오진환/남원시 노치마을 : “보면 우리는 참 서럽지. 왜 그러냐면 우리 부락에서 인재가 많이 났대요, 옛날에. 났는데, 일본인들이 인물이 못나게끔 여기다가 방죽을 파버렸어, 한 200m를.”]
일제가 한반도 곳곳에 박아놓았다는 쇠말뚝의 운명을 빼닮은 거대 목돌.
하지만 목돌이 마을로 옮겨진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쌍의 목돌 중 아직 찾지 못한 한 개의 목돌이 백두대간의 목을 바짝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가 지금도 계속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남원이나 전라남북도에 인물이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고 그래. 그 놈들이 우리에게 너무 설움을 줬다 그거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지.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혀.”]
끊어진 백두대간 구간을 다시 이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이병채/전 남원문화원장 : “노치마을과 고리봉 구간의 백두대간 복원 사업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행정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백두대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 것을….”]
그러나 목돌에 대한 사료나 문헌이 없고,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객관화되지 않았다며 남원시에서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토와 민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나머지 목돌 하나를 찾아야 한다는 노치마을 사람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6개인데 5개만 갖다 놨으니까 항상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서 갖다가 놨으면 좋겠어요.”]
백두대간이 지나는 노치마을에 행해진 지난 날 일제의 악행과, 그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도 일제 청산의 또 다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마을회관 옆, 수령 500년을 훌쩍 넘은 둥치 굵은 당산나무 곁에 기이한 형태의 돌 5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나사 모양의 흔치 않은 생김새에, 반원 두 개를 한 쌍으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대 '목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며 일본이 백두대간에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덕음봉에서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맥)이 사람으로 따지면 목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그럽니다. (그 부위에) 숨을 못 쉬는 장치를 했다 해서 ‘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 조임돌’ 혹은 ‘잠금돌’이라고도 부르는 이 목돌 하나의 크기는 가로 120㎝에 세로 95㎝, 두께 40㎝, 무게는 100kg이 넘습니다.
일제가 우리 명산 주요 혈맥마다 길을 내거나 쇠말뚝을 박았다는 설이 있지만, 이처럼 거대 석물이 확인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1998년 경 경지정리 때 마을 앞 방죽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목돌.
15년 가까이 운봉읍 주촌리 한 주택의 정원석으로 쓰이다가, 지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노치마을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이게 그냥 부숴서 버릴 게 아니고, 기왕이면 일제가 행했던 행위들에 대한 것을 교육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차원의 의미들도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이 된 방죽 자리는 마을 뒤 덕음산에서 마주보이는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사람의 신체 중 목이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곳입니다.
["길이가 여기서 내가 200m로 알고 있어요. 200m고, 여기 넓이가 한 20m 돼요. '목돌'을 양쪽 머리 하나씩 박아놓고, 이 쪽에 2개, 저 쪽에 2개.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원래는 야트막한 둔덕으로 되어 있어 ‘날등’이라 불렸다는데, 일제가 길이 100m, 폭 20m에 4m의 깊이로 파서 만든 방죽에 모두 3쌍의 목돌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았다는 겁니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방죽을 팔 때 3년을 팠대요. 이 근방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3년을 팠대, 3년을. 저 방죽을. 부역을 시킨 것이지.”]
[박상진/남원시 노치마을 : "지금 저 돌이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놨던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동네, 또 이 부근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목돌이 설치되면서 기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땅에서 피가 솟고, 지리산이 4일간 울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지리산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마을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마을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은 목돌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지리산 주변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세 분이 나온다고 그랬어. 사전에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죽을 파고 '목돌'을 설치를 하고….”]
[오진환/남원시 노치마을 : “보면 우리는 참 서럽지. 왜 그러냐면 우리 부락에서 인재가 많이 났대요, 옛날에. 났는데, 일본인들이 인물이 못나게끔 여기다가 방죽을 파버렸어, 한 200m를.”]
일제가 한반도 곳곳에 박아놓았다는 쇠말뚝의 운명을 빼닮은 거대 목돌.
하지만 목돌이 마을로 옮겨진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쌍의 목돌 중 아직 찾지 못한 한 개의 목돌이 백두대간의 목을 바짝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가 지금도 계속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남원이나 전라남북도에 인물이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고 그래. 그 놈들이 우리에게 너무 설움을 줬다 그거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지.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혀.”]
끊어진 백두대간 구간을 다시 이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이병채/전 남원문화원장 : “노치마을과 고리봉 구간의 백두대간 복원 사업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행정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백두대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 것을….”]
그러나 목돌에 대한 사료나 문헌이 없고,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객관화되지 않았다며 남원시에서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토와 민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나머지 목돌 하나를 찾아야 한다는 노치마을 사람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6개인데 5개만 갖다 놨으니까 항상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서 갖다가 놨으면 좋겠어요.”]
백두대간이 지나는 노치마을에 행해진 지난 날 일제의 악행과, 그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도 일제 청산의 또 다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4K] “민족 정기 끊으려고”…끊나지 않은 아픔 노치마을 ‘목돌’
-
- 입력 2021-03-04 19:38:56
- 수정2021-03-04 20:42:36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 백두대간이 지나는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
마을회관 옆, 수령 500년을 훌쩍 넘은 둥치 굵은 당산나무 곁에 기이한 형태의 돌 5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나사 모양의 흔치 않은 생김새에, 반원 두 개를 한 쌍으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대 '목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며 일본이 백두대간에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덕음봉에서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맥)이 사람으로 따지면 목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그럽니다. (그 부위에) 숨을 못 쉬는 장치를 했다 해서 ‘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 조임돌’ 혹은 ‘잠금돌’이라고도 부르는 이 목돌 하나의 크기는 가로 120㎝에 세로 95㎝, 두께 40㎝, 무게는 100kg이 넘습니다.
일제가 우리 명산 주요 혈맥마다 길을 내거나 쇠말뚝을 박았다는 설이 있지만, 이처럼 거대 석물이 확인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1998년 경 경지정리 때 마을 앞 방죽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목돌.
15년 가까이 운봉읍 주촌리 한 주택의 정원석으로 쓰이다가, 지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노치마을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이게 그냥 부숴서 버릴 게 아니고, 기왕이면 일제가 행했던 행위들에 대한 것을 교육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차원의 의미들도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이 된 방죽 자리는 마을 뒤 덕음산에서 마주보이는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사람의 신체 중 목이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곳입니다.
["길이가 여기서 내가 200m로 알고 있어요. 200m고, 여기 넓이가 한 20m 돼요. '목돌'을 양쪽 머리 하나씩 박아놓고, 이 쪽에 2개, 저 쪽에 2개.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원래는 야트막한 둔덕으로 되어 있어 ‘날등’이라 불렸다는데, 일제가 길이 100m, 폭 20m에 4m의 깊이로 파서 만든 방죽에 모두 3쌍의 목돌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았다는 겁니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방죽을 팔 때 3년을 팠대요. 이 근방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3년을 팠대, 3년을. 저 방죽을. 부역을 시킨 것이지.”]
[박상진/남원시 노치마을 : "지금 저 돌이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놨던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동네, 또 이 부근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목돌이 설치되면서 기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땅에서 피가 솟고, 지리산이 4일간 울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지리산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마을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마을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은 목돌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지리산 주변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세 분이 나온다고 그랬어. 사전에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죽을 파고 '목돌'을 설치를 하고….”]
[오진환/남원시 노치마을 : “보면 우리는 참 서럽지. 왜 그러냐면 우리 부락에서 인재가 많이 났대요, 옛날에. 났는데, 일본인들이 인물이 못나게끔 여기다가 방죽을 파버렸어, 한 200m를.”]
일제가 한반도 곳곳에 박아놓았다는 쇠말뚝의 운명을 빼닮은 거대 목돌.
하지만 목돌이 마을로 옮겨진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쌍의 목돌 중 아직 찾지 못한 한 개의 목돌이 백두대간의 목을 바짝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가 지금도 계속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남원이나 전라남북도에 인물이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고 그래. 그 놈들이 우리에게 너무 설움을 줬다 그거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지.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혀.”]
끊어진 백두대간 구간을 다시 이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이병채/전 남원문화원장 : “노치마을과 고리봉 구간의 백두대간 복원 사업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행정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백두대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 것을….”]
그러나 목돌에 대한 사료나 문헌이 없고,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객관화되지 않았다며 남원시에서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토와 민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나머지 목돌 하나를 찾아야 한다는 노치마을 사람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6개인데 5개만 갖다 놨으니까 항상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서 갖다가 놨으면 좋겠어요.”]
백두대간이 지나는 노치마을에 행해진 지난 날 일제의 악행과, 그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도 일제 청산의 또 다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마을회관 옆, 수령 500년을 훌쩍 넘은 둥치 굵은 당산나무 곁에 기이한 형태의 돌 5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나사 모양의 흔치 않은 생김새에, 반원 두 개를 한 쌍으로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대 '목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겠다며 일본이 백두대간에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덕음봉에서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맥)이 사람으로 따지면 목에 해당되는 부위라고 그럽니다. (그 부위에) 숨을 못 쉬는 장치를 했다 해서 ‘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 조임돌’ 혹은 ‘잠금돌’이라고도 부르는 이 목돌 하나의 크기는 가로 120㎝에 세로 95㎝, 두께 40㎝, 무게는 100kg이 넘습니다.
일제가 우리 명산 주요 혈맥마다 길을 내거나 쇠말뚝을 박았다는 설이 있지만, 이처럼 거대 석물이 확인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1998년 경 경지정리 때 마을 앞 방죽에서 처음 발견되었다는 목돌.
15년 가까이 운봉읍 주촌리 한 주택의 정원석으로 쓰이다가, 지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노치마을로 옮겨지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김현식/남원문화원 사무국장 : “이게 그냥 부숴서 버릴 게 아니고, 기왕이면 일제가 행했던 행위들에 대한 것을 교육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차원의 의미들도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이 된 방죽 자리는 마을 뒤 덕음산에서 마주보이는 고리봉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사람의 신체 중 목이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곳입니다.
["길이가 여기서 내가 200m로 알고 있어요. 200m고, 여기 넓이가 한 20m 돼요. '목돌'을 양쪽 머리 하나씩 박아놓고, 이 쪽에 2개, 저 쪽에 2개.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원래는 야트막한 둔덕으로 되어 있어 ‘날등’이라 불렸다는데, 일제가 길이 100m, 폭 20m에 4m의 깊이로 파서 만든 방죽에 모두 3쌍의 목돌을 설치하여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았다는 겁니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방죽을 팔 때 3년을 팠대요. 이 근방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3년을 팠대, 3년을. 저 방죽을. 부역을 시킨 것이지.”]
[박상진/남원시 노치마을 : "지금 저 돌이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놨던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동네, 또 이 부근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목돌이 설치되면서 기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땅에서 피가 솟고, 지리산이 4일간 울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 지리산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마을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마을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맥을 끊어놓은 목돌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계석/(사)전통문화보존회 이사장 : “(지리산 주변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세 분이 나온다고 그랬어. 사전에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죽을 파고 '목돌'을 설치를 하고….”]
[오진환/남원시 노치마을 : “보면 우리는 참 서럽지. 왜 그러냐면 우리 부락에서 인재가 많이 났대요, 옛날에. 났는데, 일본인들이 인물이 못나게끔 여기다가 방죽을 파버렸어, 한 200m를.”]
일제가 한반도 곳곳에 박아놓았다는 쇠말뚝의 운명을 빼닮은 거대 목돌.
하지만 목돌이 마을로 옮겨진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쌍의 목돌 중 아직 찾지 못한 한 개의 목돌이 백두대간의 목을 바짝 조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가 지금도 계속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남원이나 전라남북도에 인물이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고 그래. 그 놈들이 우리에게 너무 설움을 줬다 그거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지.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혀.”]
끊어진 백두대간 구간을 다시 이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이병채/전 남원문화원장 : “노치마을과 고리봉 구간의 백두대간 복원 사업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행정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백두대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한 것을….”]
그러나 목돌에 대한 사료나 문헌이 없고,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객관화되지 않았다며 남원시에서는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우리 국토와 민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 나머지 목돌 하나를 찾아야 한다는 노치마을 사람들.
[유복수/남원시 노치마을 : “6개인데 5개만 갖다 놨으니까 항상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여기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서 갖다가 놨으면 좋겠어요.”]
백두대간이 지나는 노치마을에 행해진 지난 날 일제의 악행과, 그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도 일제 청산의 또 다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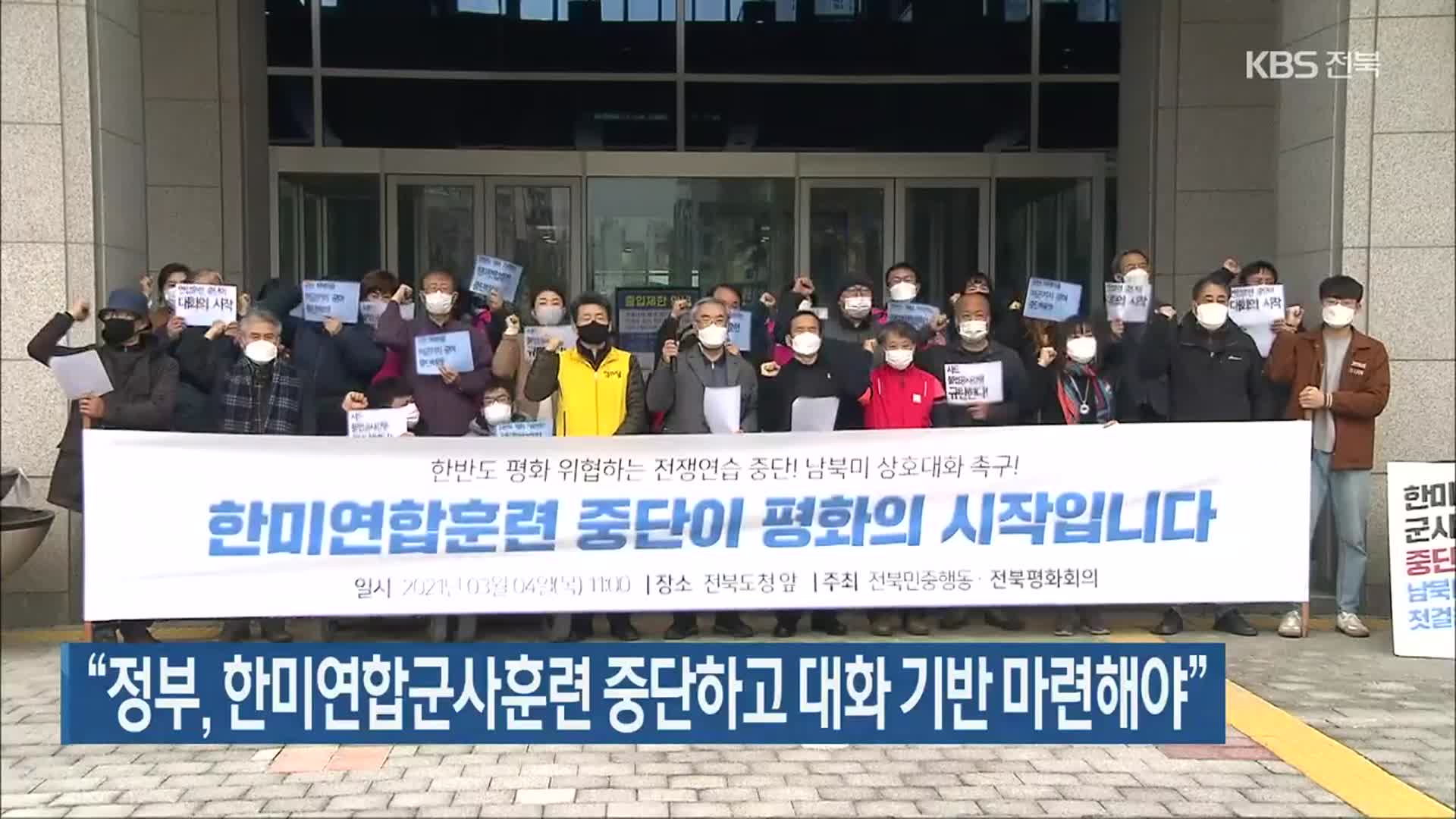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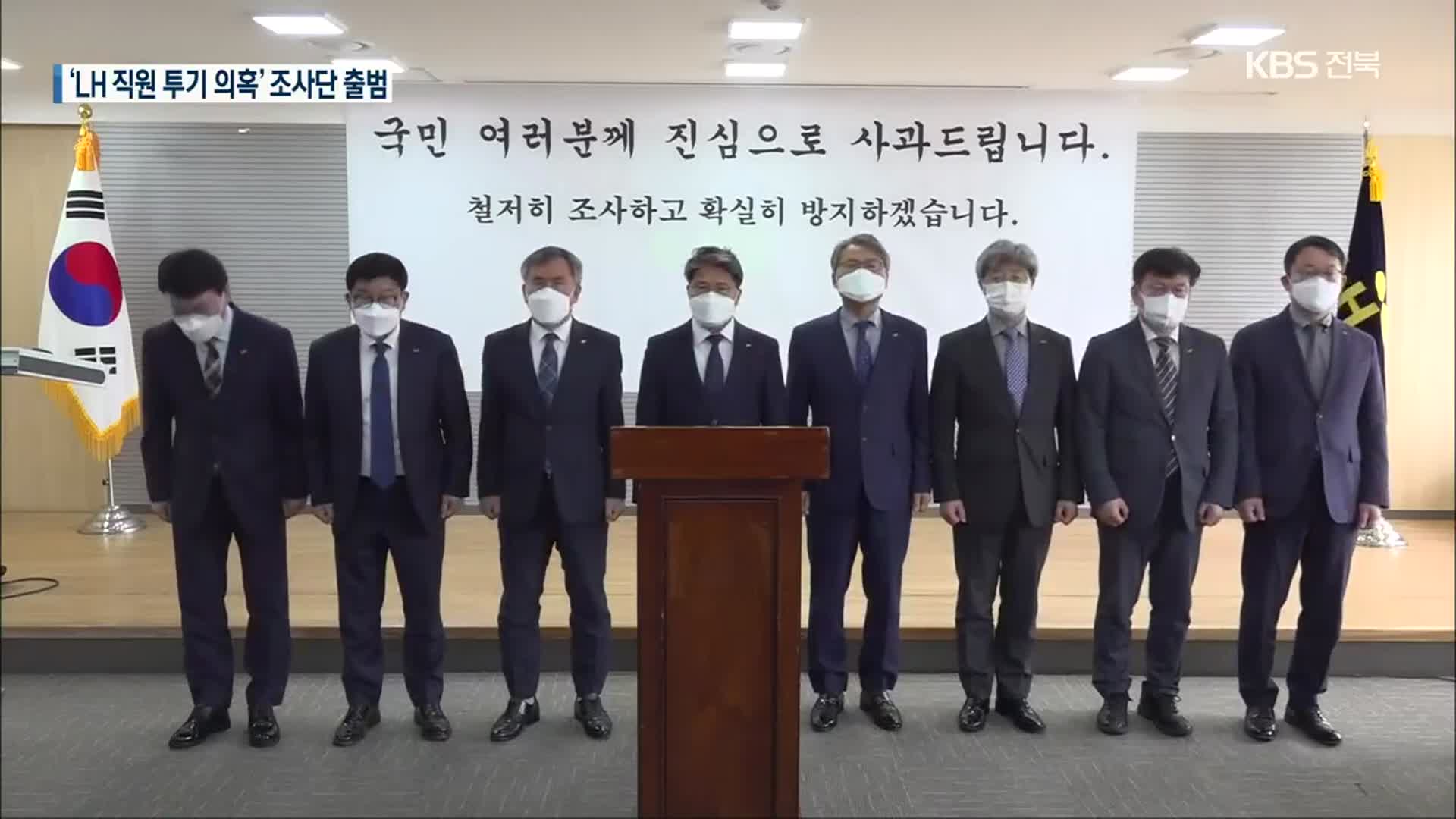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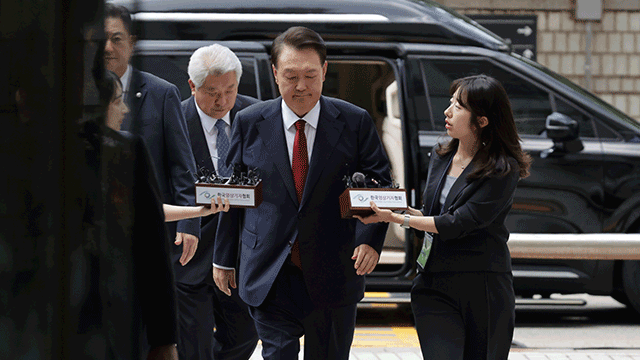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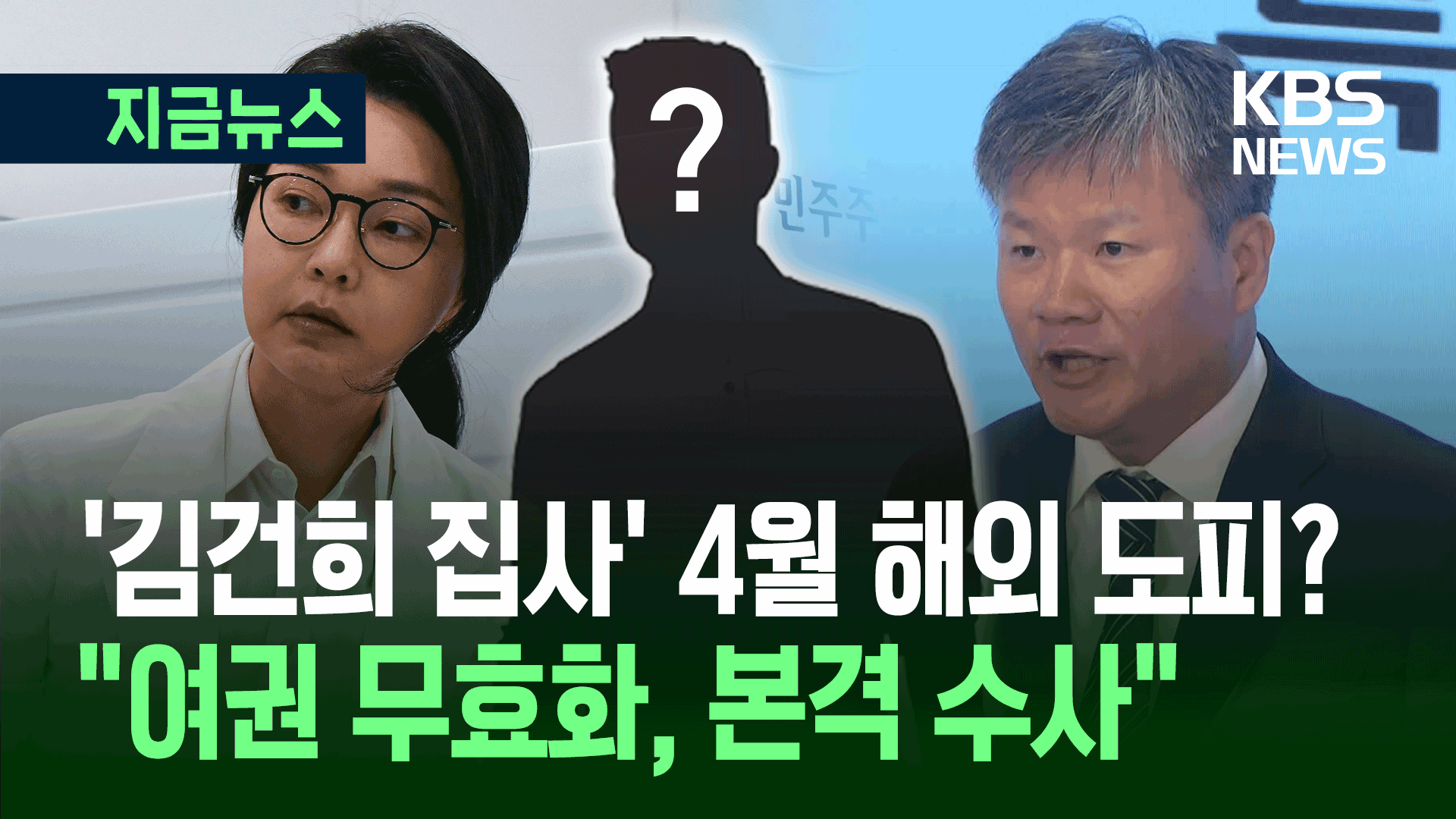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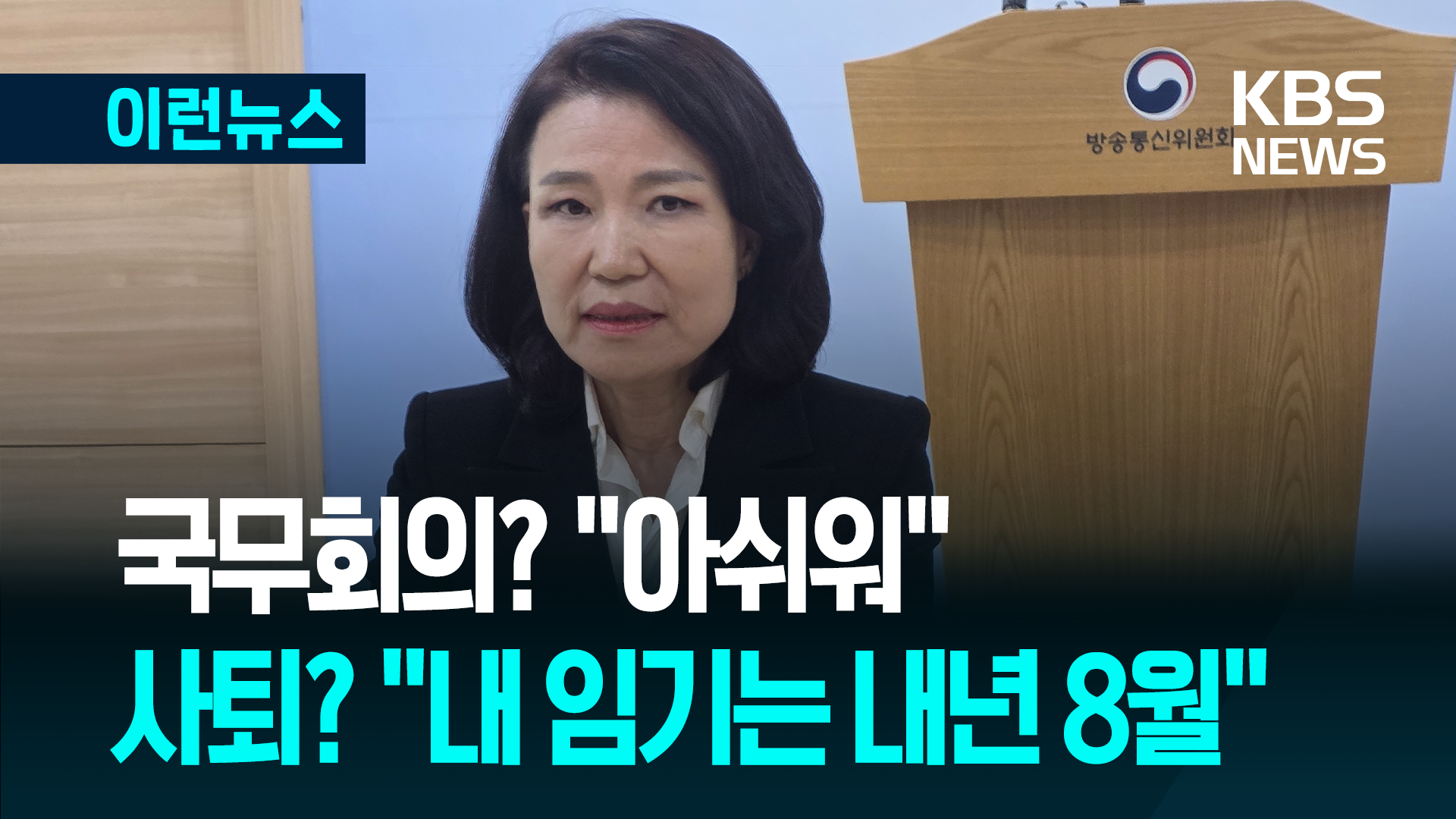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