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카카오 먹통’ 후폭풍…배터리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나
입력 2022.10.25 (18:05)
수정 2022.10.25 (1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복구는 사실상 다 됐지만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배터리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과학부 신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발화 지점으로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잖아요.
어떤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하 3층에 있던 SK온의 리튬이온배터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튄 뒤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정전 같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이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은택/카카오 대표 : "리튬 배터리에서 난 화재가 위에 있는 케이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서버가 다운, 수천 대의 서버가 다운됐거든요."]
[앵커]
그럼 리튬이온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불꽃이 배터리 쪽에서 튀었다고 해도 배터리 내부 결함 뿐 아니라 과충전 방지 장치 이상, 단락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터리 모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SK C&C와 카카오, 배터리 제조사 간의 법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배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화재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다보니 계속 써도 되나 불안감이 좀 듭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부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적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이 잘 이동하도록 돕는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와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 전해액이 셀 경우에도 발화 위험성이 높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고도 분리막 결함이 원인이었고, 2년 전 서울 강남 KT 데이터센터 화재도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계가 화재 취약성을 계속 보완해온데다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배터리에 갑자기 불이 붙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재필/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화학공학과 교수 : "보호회로까지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내부적인 결함이나 작동상의 오류, 보호회로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폭발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앵커]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이 급격하게 번져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조 같은 곳에 담그거나 대량의 물을 장시간 부어야 꺼질까 말까 하다는 건데요.
현장 영상을 보시면, 겹겹이 쌓여있는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이 새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관련 소방 보고서를 봐도, 1500kg 상당의 할로겐 가스가 방사됐지만 발화 장소가 넓은데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적혀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배터리 화재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기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비상전원공급장치에 모두 쓰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우 충전율을 제한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 기준이 있는데, 비상전원공급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상전원공급장치에는 그동안 납축전지가 많이 사용됐는데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가 기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카카오 먹통 사태,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복구는 사실상 다 됐지만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배터리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과학부 신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발화 지점으로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잖아요.
어떤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하 3층에 있던 SK온의 리튬이온배터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튄 뒤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정전 같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이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은택/카카오 대표 : "리튬 배터리에서 난 화재가 위에 있는 케이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서버가 다운, 수천 대의 서버가 다운됐거든요."]
[앵커]
그럼 리튬이온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불꽃이 배터리 쪽에서 튀었다고 해도 배터리 내부 결함 뿐 아니라 과충전 방지 장치 이상, 단락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터리 모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SK C&C와 카카오, 배터리 제조사 간의 법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배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화재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다보니 계속 써도 되나 불안감이 좀 듭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부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적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이 잘 이동하도록 돕는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와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 전해액이 셀 경우에도 발화 위험성이 높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고도 분리막 결함이 원인이었고, 2년 전 서울 강남 KT 데이터센터 화재도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계가 화재 취약성을 계속 보완해온데다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배터리에 갑자기 불이 붙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재필/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화학공학과 교수 : "보호회로까지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내부적인 결함이나 작동상의 오류, 보호회로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폭발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앵커]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이 급격하게 번져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조 같은 곳에 담그거나 대량의 물을 장시간 부어야 꺼질까 말까 하다는 건데요.
현장 영상을 보시면, 겹겹이 쌓여있는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이 새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관련 소방 보고서를 봐도, 1500kg 상당의 할로겐 가스가 방사됐지만 발화 장소가 넓은데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적혀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배터리 화재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기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비상전원공급장치에 모두 쓰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우 충전율을 제한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 기준이 있는데, 비상전원공급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상전원공급장치에는 그동안 납축전지가 많이 사용됐는데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가 기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카카오 먹통’ 후폭풍…배터리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나
-
- 입력 2022-10-25 18:05:12
- 수정2022-10-25 18:19:14

[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복구는 사실상 다 됐지만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배터리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과학부 신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발화 지점으로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잖아요.
어떤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하 3층에 있던 SK온의 리튬이온배터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튄 뒤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정전 같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이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은택/카카오 대표 : "리튬 배터리에서 난 화재가 위에 있는 케이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서버가 다운, 수천 대의 서버가 다운됐거든요."]
[앵커]
그럼 리튬이온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불꽃이 배터리 쪽에서 튀었다고 해도 배터리 내부 결함 뿐 아니라 과충전 방지 장치 이상, 단락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터리 모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SK C&C와 카카오, 배터리 제조사 간의 법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배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화재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다보니 계속 써도 되나 불안감이 좀 듭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부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적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이 잘 이동하도록 돕는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와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 전해액이 셀 경우에도 발화 위험성이 높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고도 분리막 결함이 원인이었고, 2년 전 서울 강남 KT 데이터센터 화재도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계가 화재 취약성을 계속 보완해온데다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배터리에 갑자기 불이 붙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재필/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화학공학과 교수 : "보호회로까지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내부적인 결함이나 작동상의 오류, 보호회로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폭발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앵커]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이 급격하게 번져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조 같은 곳에 담그거나 대량의 물을 장시간 부어야 꺼질까 말까 하다는 건데요.
현장 영상을 보시면, 겹겹이 쌓여있는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이 새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관련 소방 보고서를 봐도, 1500kg 상당의 할로겐 가스가 방사됐지만 발화 장소가 넓은데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적혀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배터리 화재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기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비상전원공급장치에 모두 쓰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우 충전율을 제한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 기준이 있는데, 비상전원공급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상전원공급장치에는 그동안 납축전지가 많이 사용됐는데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가 기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카카오 먹통 사태,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복구는 사실상 다 됐지만 화재 원인을 둘러싸고 배터리 안전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과학부 신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발화 지점으로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잖아요.
어떤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하 3층에 있던 SK온의 리튬이온배터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쪽에서 불꽃이 튄 뒤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정전 같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이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은택/카카오 대표 : "리튬 배터리에서 난 화재가 위에 있는 케이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서버가 다운, 수천 대의 서버가 다운됐거든요."]
[앵커]
그럼 리튬이온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불꽃이 배터리 쪽에서 튀었다고 해도 배터리 내부 결함 뿐 아니라 과충전 방지 장치 이상, 단락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터리 모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SK C&C와 카카오, 배터리 제조사 간의 법적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배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화재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다보니 계속 써도 되나 불안감이 좀 듭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부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적은 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리튬이온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이 잘 이동하도록 돕는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과열되면서 화재와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충격으로 전해액이 셀 경우에도 발화 위험성이 높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고도 분리막 결함이 원인이었고, 2년 전 서울 강남 KT 데이터센터 화재도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업계가 화재 취약성을 계속 보완해온데다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배터리에 갑자기 불이 붙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조재필/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화학공학과 교수 : "보호회로까지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떤 내부적인 결함이나 작동상의 오류, 보호회로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폭발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앵커]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이 급격하게 번져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조 같은 곳에 담그거나 대량의 물을 장시간 부어야 꺼질까 말까 하다는 건데요.
현장 영상을 보시면, 겹겹이 쌓여있는 리튬이온배터리 모듈이 새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관련 소방 보고서를 봐도, 1500kg 상당의 할로겐 가스가 방사됐지만 발화 장소가 넓은데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적혀있습니다.
[앵커]
이 같은 배터리 화재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기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비상전원공급장치에 모두 쓰이고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우 충전율을 제한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 기준이 있는데, 비상전원공급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상전원공급장치에는 그동안 납축전지가 많이 사용됐는데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가 기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
-

신지수 기자 js@kbs.co.kr
신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ET] 한 마리에 ‘130만 원’…잡히면 버린다던 생선이었는데?](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economy_time/2022/10/25/30_5586366.jpg)
![[ET] 40년 거래했는데…푸르밀 ‘사업 종료’에 농가 상경 집회](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economy_time/2022/10/25/50_558636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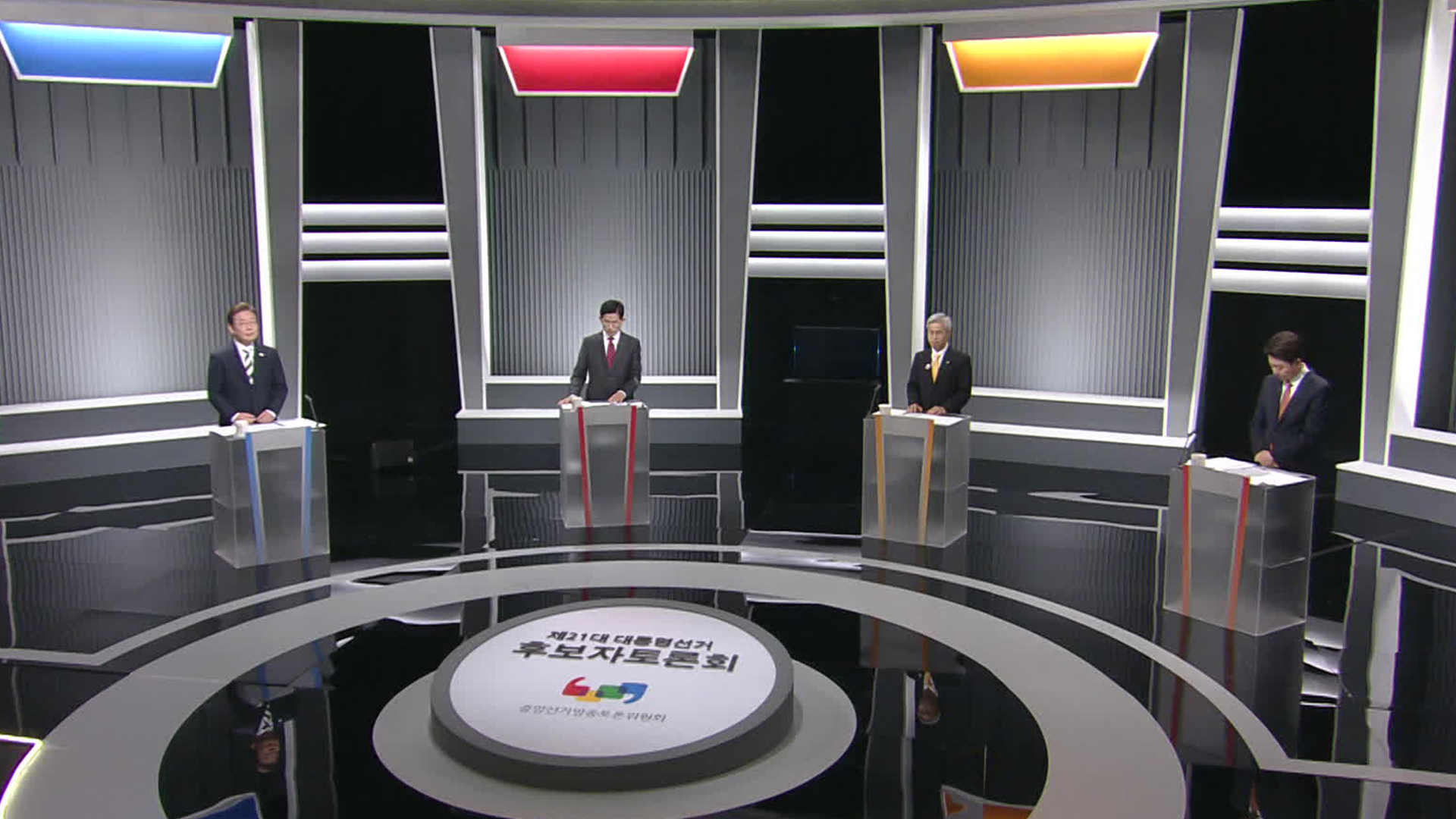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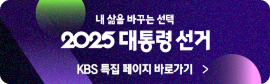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