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명절이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여 음식 만들고, 차례지내느라 무척 분주하죠.
그래도 전통 방식 그대로 철저하게 예를 갖추는 종갓집만큼 바쁜 곳도 없을 듯 싶은데요.
최서희 기자, 종갓집 설맞이 풍경,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리포트>
네, 요즘은 차례를 생략하는 집도 많아졌고요, 인터넷으로 차례상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는 시대인데요.
300년 동안 한곳에 머물며 전통 방식대로 차례를 지내는 종가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차례상을 외국인 종부가 차리는 집안도 있는데요, 종갓집의 다양한 설맞이 현장, 함께 보시죠.
경북 칠곡. 이곳은 광주 이씨 일가가 13대째 살고 있는 종가집입니다.
집 안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인터뷰> 이영진(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부) : “대대로 내려오는 유기거든요. 제가 시집왔을 때 한 20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여섯 살 아이부터 여든 한 살의 문중 어른까지 100여 명의 식구들이 모이다 보니 마루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설 전날 밤, 광주 이씨 종가에서는 사당에 묵은세배를 드립니다.
묵은세배는 조상님께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세배입니다.
<인터뷰> 이필주(광주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옛날에는 묵은세배가 어느 가문이든지 다 제도가 있었는데 근간에 내려오면서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당에 묵은세배를 마치면 이웃에 사는 친척 어른들께도 세배를 드립니다.
<현장음>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빌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다음 날. 종갓집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온 문중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씨의 손자인 6살 동균 군은 아직 어려서 종손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기특하게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예를 갖춥니다.
<인터뷰> 이필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여기는 저로부터 13대조 문익공 할아버지의 위패고 다음은 4대조 위패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례상에 한꺼번에 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조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각각 따로 차례를 지냅니다.
<인터뷰> 이동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 "자랑스러워요. 자주 못보니까 이거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나중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필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예절은 누가 고쳐서 되는 게 예절이 아니고 지켜 나오던 예절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그 자체가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청주. 주택들 사이에 조금 독특한 사연을 가진 종갓집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손 지원근씨가 살고 있습니다.
지씨의 부인이자 이 집의 종부인 장유보위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입니다.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처음에 신랑이 나는 큰 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이 큰 줄 알았죠. 와보니까 집도 크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결혼 8년차인 장유보위씨는 명절 때 어머니 심부름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혼자 명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어머님 없다고 조상이 화나면 안 되죠. 잘해야죠.”
시어머니가 일러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부인을 위해 지원근씨가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지원근(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손) : “전에는 부엌 근처에 남자들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요즘은 남자들 부엌에 안 오면 간 큰 남자라고 그러잖아.”
차례 준비로 분주한 설날 아침. 지원근씨 집안은 대대로 차례상에 닭을 올려왔습니다.
<인터뷰> 지원근(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손) : “닭이 새해를 밝히는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외국인 종부가 종갓집 살림을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했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장유보위씨를 누구보다 기특해 합니다.
<인터뷰> 최숙희(지원근씨 작은 어머니) : “우리도 결혼해서 남의 집에 시집가면 힘든데 남의 나라에 와서 모르는 풍습 따라가려니까 힘들죠. 걱정했는데 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오늘 그래도 해냈다고 (생각해요) 조상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시대가 변하고 전통 문화와 예절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지만, 종갓집의 차례는 여전히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여 음식 만들고, 차례지내느라 무척 분주하죠.
그래도 전통 방식 그대로 철저하게 예를 갖추는 종갓집만큼 바쁜 곳도 없을 듯 싶은데요.
최서희 기자, 종갓집 설맞이 풍경,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리포트>
네, 요즘은 차례를 생략하는 집도 많아졌고요, 인터넷으로 차례상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는 시대인데요.
300년 동안 한곳에 머물며 전통 방식대로 차례를 지내는 종가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차례상을 외국인 종부가 차리는 집안도 있는데요, 종갓집의 다양한 설맞이 현장, 함께 보시죠.
경북 칠곡. 이곳은 광주 이씨 일가가 13대째 살고 있는 종가집입니다.
집 안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인터뷰> 이영진(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부) : “대대로 내려오는 유기거든요. 제가 시집왔을 때 한 20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여섯 살 아이부터 여든 한 살의 문중 어른까지 100여 명의 식구들이 모이다 보니 마루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설 전날 밤, 광주 이씨 종가에서는 사당에 묵은세배를 드립니다.
묵은세배는 조상님께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세배입니다.
<인터뷰> 이필주(광주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옛날에는 묵은세배가 어느 가문이든지 다 제도가 있었는데 근간에 내려오면서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당에 묵은세배를 마치면 이웃에 사는 친척 어른들께도 세배를 드립니다.
<현장음>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빌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다음 날. 종갓집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온 문중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씨의 손자인 6살 동균 군은 아직 어려서 종손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기특하게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예를 갖춥니다.
<인터뷰> 이필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여기는 저로부터 13대조 문익공 할아버지의 위패고 다음은 4대조 위패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례상에 한꺼번에 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조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각각 따로 차례를 지냅니다.
<인터뷰> 이동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 "자랑스러워요. 자주 못보니까 이거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나중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필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예절은 누가 고쳐서 되는 게 예절이 아니고 지켜 나오던 예절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그 자체가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청주. 주택들 사이에 조금 독특한 사연을 가진 종갓집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손 지원근씨가 살고 있습니다.
지씨의 부인이자 이 집의 종부인 장유보위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입니다.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처음에 신랑이 나는 큰 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이 큰 줄 알았죠. 와보니까 집도 크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결혼 8년차인 장유보위씨는 명절 때 어머니 심부름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혼자 명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어머님 없다고 조상이 화나면 안 되죠. 잘해야죠.”
시어머니가 일러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부인을 위해 지원근씨가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지원근(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손) : “전에는 부엌 근처에 남자들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요즘은 남자들 부엌에 안 오면 간 큰 남자라고 그러잖아.”
차례 준비로 분주한 설날 아침. 지원근씨 집안은 대대로 차례상에 닭을 올려왔습니다.
<인터뷰> 지원근(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손) : “닭이 새해를 밝히는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외국인 종부가 종갓집 살림을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했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장유보위씨를 누구보다 기특해 합니다.
<인터뷰> 최숙희(지원근씨 작은 어머니) : “우리도 결혼해서 남의 집에 시집가면 힘든데 남의 나라에 와서 모르는 풍습 따라가려니까 힘들죠. 걱정했는데 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오늘 그래도 해냈다고 (생각해요) 조상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시대가 변하고 전통 문화와 예절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지만, 종갓집의 차례는 여전히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 300년 된 종갓집의 설 맞이
-
- 입력 2010-02-15 08:50:29

<앵커 멘트>
명절이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여 음식 만들고, 차례지내느라 무척 분주하죠.
그래도 전통 방식 그대로 철저하게 예를 갖추는 종갓집만큼 바쁜 곳도 없을 듯 싶은데요.
최서희 기자, 종갓집 설맞이 풍경,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리포트>
네, 요즘은 차례를 생략하는 집도 많아졌고요, 인터넷으로 차례상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는 시대인데요.
300년 동안 한곳에 머물며 전통 방식대로 차례를 지내는 종가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차례상을 외국인 종부가 차리는 집안도 있는데요, 종갓집의 다양한 설맞이 현장, 함께 보시죠.
경북 칠곡. 이곳은 광주 이씨 일가가 13대째 살고 있는 종가집입니다.
집 안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인터뷰> 이영진(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부) : “대대로 내려오는 유기거든요. 제가 시집왔을 때 한 20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 여섯 살 아이부터 여든 한 살의 문중 어른까지 100여 명의 식구들이 모이다 보니 마루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설 전날 밤, 광주 이씨 종가에서는 사당에 묵은세배를 드립니다.
묵은세배는 조상님께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세배입니다.
<인터뷰> 이필주(광주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옛날에는 묵은세배가 어느 가문이든지 다 제도가 있었는데 근간에 내려오면서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를 행하고 있습니다.”
사당에 묵은세배를 마치면 이웃에 사는 친척 어른들께도 세배를 드립니다.
<현장음>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빌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다음 날. 종갓집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온 문중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씨의 손자인 6살 동균 군은 아직 어려서 종손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기특하게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예를 갖춥니다.
<인터뷰> 이필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여기는 저로부터 13대조 문익공 할아버지의 위패고 다음은 4대조 위패가 있습니다.”
하나의 차례상에 한꺼번에 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조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각각 따로 차례를 지냅니다.
<인터뷰> 이동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 "자랑스러워요. 자주 못보니까 이거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나중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필주(광주 이씨 문익공파 13대 종손) :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예절은 누가 고쳐서 되는 게 예절이 아니고 지켜 나오던 예절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는 게 그 자체가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청주. 주택들 사이에 조금 독특한 사연을 가진 종갓집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손 지원근씨가 살고 있습니다.
지씨의 부인이자 이 집의 종부인 장유보위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입니다.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처음에 신랑이 나는 큰 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이 큰 줄 알았죠. 와보니까 집도 크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결혼 8년차인 장유보위씨는 명절 때 어머니 심부름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혼자 명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어머님 없다고 조상이 화나면 안 되죠. 잘해야죠.”
시어머니가 일러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부인을 위해 지원근씨가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지원근(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손) : “전에는 부엌 근처에 남자들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요즘은 남자들 부엌에 안 오면 간 큰 남자라고 그러잖아.”
차례 준비로 분주한 설날 아침. 지원근씨 집안은 대대로 차례상에 닭을 올려왔습니다.
<인터뷰> 지원근(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손) : “닭이 새해를 밝히는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처음에는 외국인 종부가 종갓집 살림을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했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장유보위씨를 누구보다 기특해 합니다.
<인터뷰> 최숙희(지원근씨 작은 어머니) : “우리도 결혼해서 남의 집에 시집가면 힘든데 남의 나라에 와서 모르는 풍습 따라가려니까 힘들죠. 걱정했는데 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인터뷰> 장유보위(충주 지씨 첨정공파 37대 종부) : “오늘 그래도 해냈다고 (생각해요) 조상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시대가 변하고 전통 문화와 예절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지만, 종갓집의 차례는 여전히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

최서희 기자 yuri@kbs.co.kr
최서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세계는 지금] 삼바 축제 개막…브라질 들썩 外](https://news.kbs.co.kr/data/news/2010/02/15/2046785_90.jpg)
![[연예수첩] 스타들 설 연휴 촬영과 함께!](https://news.kbs.co.kr/data/news/2010/02/15/2046787_11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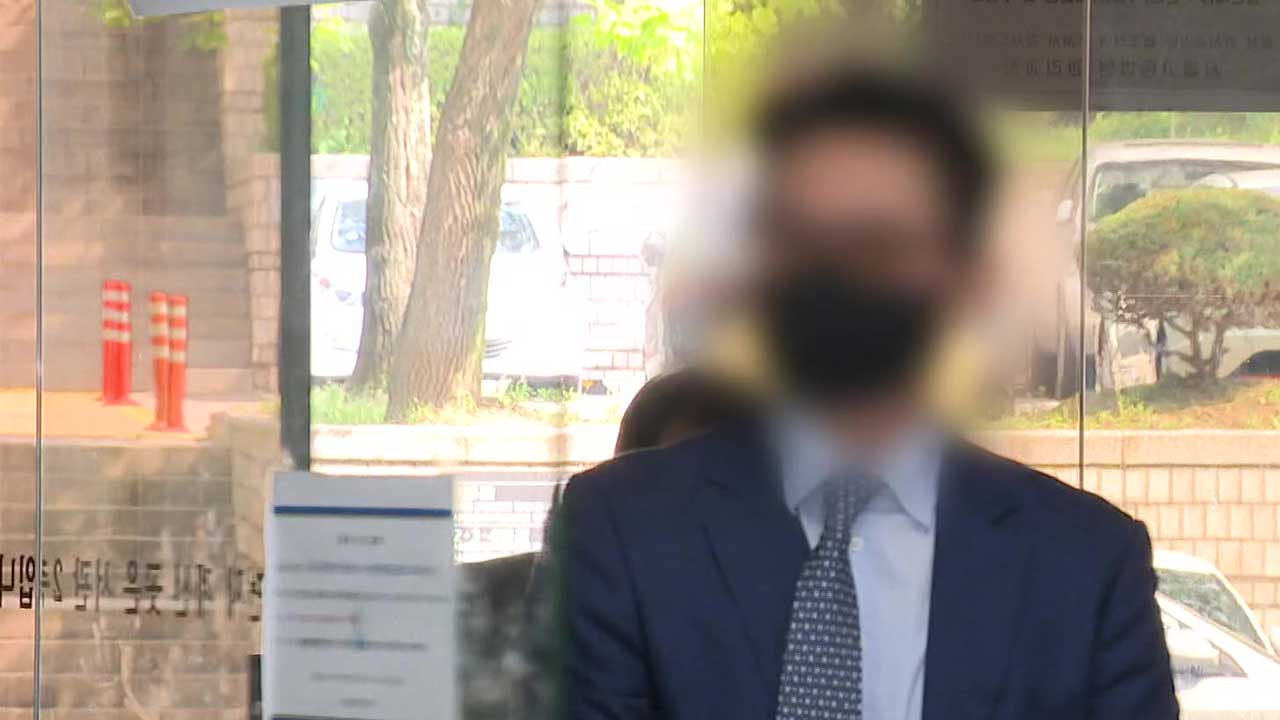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