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무섬마을을 아십니까?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경북 영주의 시골마을입니다.
최근에는 30년 전 사라진 외나무다리까지 복원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운 풍경이 남아있는 무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여 무섬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입니다.
안동 하회, 예천 회룡포처럼 낙동강 윗줄기가 휘돌아 흐르는 물돌이 마을입니다.
태백산 물줄기인 내성천과 소백산에서 흘러내린 서천이 만나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지만 여름철 홍수 피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인터뷰> 박종우(무섬 전통마을 보존회장) : "소백산에서 발원한 물이 일찍 흘러. 일찍 흘러간 뒤에 태백산 물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물이 한꺼번에 오면 범람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시차가 나. 그래서 늘 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금모래가 빛나는 백사장 한가운데에는 130미터 길이의 외나무다리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가을부터 봄까지만 설치해놓습니다.
<인터뷰> 임지은(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작은 다리같이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막상 걸으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게 약간 무섭습니다. (외나무다리가 실제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밑을 보면서 걸으니까 물이 흐르니까 이게 다리가 흔들려 보여요."
1972년 시멘트 다리가 들어서자 외나무다리는 설 자리를 잃고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30년이 지난 뒤 외나무다리를 되살렸습니다.
17세기 중반, 조선 현종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무섬마을.
지금도 50여 채의 집들이 대부분 옛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기둥 대신 둥그런 두리기둥을 쓰고 마루를 높인 뒤 난간을 설치해 가옥의 품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죽재와 해우당을 비롯해 옛 고택 9채는 지방 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세(무섬마을 주민) : "1850년경에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 어른이 의금부도사를 하시고 낙향하셔가지고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글공부 하시고, 더 높은 벼슬을 내리는 것도 마다하시고."
집집마다 남아있는 아궁이에는 아직도 장작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미음(ㅁ)자 형태의 가옥 구조는 남자들이 생활하는 사랑채와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가 서로 나뉘어 당시 양반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터뷰> 이정호(94세) : "(어르신 시집오신 다음에는 밖에 출타는 많이 하셨어요?) 못해요. 시집오면 방에 들어앉아 밥이나 해먹고 문밖에는 나가지도 못해. (그럼 고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친정에 간혹 가봤지. (그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가마 타고 갔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은 일부를 현대식으로 고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통의 멋은 잃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류인희(무섬마을 주민) :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지키던 집이니까 내려와서 살아야죠. 그래서 사는 거고, 우리는 겨울 되면 또 서울 올라가서 겨울은 나고 내려와요."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속에 옛 마을의 기품이 살아있는 곳.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적적하던 고택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집 마당에서 공연을 하니 우리 가락은 더 흥이 납니다.
<인터뷰> 박건서(경기도 성남시) : "(옛날에는) 저 앞 백사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고택 공연을 이렇게 하니까 더더군다나 운치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섬마을은 그 자체가 전통 예술의 무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 풍경은 1970년대 자칫 훼손될 뻔했습니다.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마을 뒤로 빼고 지금의 강바닥과 백사장에는 농경지를 만든다는 게 당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주민들이 중장비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공사는 취소됐습니다.
<인터뷰> 김한세(무섬마을 주민) : "물을 끊으면 마을의 혈을 끊는다고 해서 풍수지리상 끊으면 동네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격렬한 항의를 하고 노인들이 가서 드러눕고 그래서 (공사를) 못 했죠. 지금 보면 대단히 잘하신 거죠. 공사를 했으면 마을 앞에는 강도 없고 백사장도 없고."
1950년대 한국전쟁의 참화 역시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면서 마을이 상처 입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박종우(무섬 전통마을 보존회장) : "양심의 자유를 인정을 했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이런 사회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다, 이걸 인정을 했어. 절대로 고발한다든지 이래서 비명횡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무섬 동네의 자랑이야."
이렇게 마을의 분열을 막고 옛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전통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광호(문화해설사) : "여기는 터 자리가 옛날 아도서숙 자리였습니다. 아도서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이 마을 청년들의 만남의 장소, 모임의 장소, 배움의 장소. 그걸로 활용을 하면서 여기 모여서 무지한 농민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민족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섬마을은 일제 강점기 시절 항일 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보존하고 바깥세상에 알릴 것인가?
2005년 외나무다리를 복원하고 축제를 열기 시작한 이윱니다.
새신랑이 말을 타고 물을 건널 때 몸종은 고삐를 잡고 외나무다리를 건넙니다.
새색시도 가마를 타고외나무다리를 건너 시집을 옵니다. 신부의 고향이 바로 이곳 무섬마을.
실제 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마을 잔치를 열지 못하자 1년을 기다린 뒤 올해 전통혼례를 올렸습니다.
<인터뷰> 안용수(신랑) : "10년 후에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요. 그래서 조금 사고를 쳐도 크게 치려고. 마을 주민 여러분께 눈도장 찍으려고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고 일부러 결심했습니다. (여기 들어와 살 예정이세요?) 네."
백년해로한 뒤 저승에 가려면 이번에는 상여를 타고 다리를 건넙니다.
상여꾼들이 힘이 빠질 때 외나무다리는 버팀목이 됐고 망자도 외나무다리에 몸을 기대 쉬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우병기(이웃마을 주민) : "(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힘들어요. 한 번 벗겨 보여줄게. (많이 들어가셨네요?)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벌게진다고 하면. (많이 무거우세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해보면, 이게 한 30여 명이 힘을 같이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보면 힘을 합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외나무다리를 오가며 일어났기에, 주민들에게 축제는 추억 여행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물이 불어 외나무다리가 치워지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마을 뒤쪽으로 30리 먼 길을 돌아다니던 기억들도 생생합니다.
<인터뷰> 자은 스님 : "어릴 때는 이 외나무다리가 굉장히 좁았어요. 우리 손바닥만 한 것. 그때는 나무를 직접 베어서 도끼로 짜서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좁아서 조금 위험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넓어서 다니기 쉬워요. (어렸을 때 비 오면 헤엄쳐서 학교 다니시고요?) 네. 비 오면 이제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소꼬리 붙들고, 소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아니면 소꼬리를 붙들고 따라 건너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현대화와 산업화의 바람을 비켜선 탓에 마을이 쇠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컸지만, 그래도 옛 모습을 지켜온 덕분에 다시 가치를 인정받게 된 무섬마을.
보존도 개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잔잔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섬마을을 아십니까?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경북 영주의 시골마을입니다.
최근에는 30년 전 사라진 외나무다리까지 복원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운 풍경이 남아있는 무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여 무섬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입니다.
안동 하회, 예천 회룡포처럼 낙동강 윗줄기가 휘돌아 흐르는 물돌이 마을입니다.
태백산 물줄기인 내성천과 소백산에서 흘러내린 서천이 만나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지만 여름철 홍수 피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인터뷰> 박종우(무섬 전통마을 보존회장) : "소백산에서 발원한 물이 일찍 흘러. 일찍 흘러간 뒤에 태백산 물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물이 한꺼번에 오면 범람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시차가 나. 그래서 늘 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금모래가 빛나는 백사장 한가운데에는 130미터 길이의 외나무다리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가을부터 봄까지만 설치해놓습니다.
<인터뷰> 임지은(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작은 다리같이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막상 걸으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게 약간 무섭습니다. (외나무다리가 실제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밑을 보면서 걸으니까 물이 흐르니까 이게 다리가 흔들려 보여요."
1972년 시멘트 다리가 들어서자 외나무다리는 설 자리를 잃고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30년이 지난 뒤 외나무다리를 되살렸습니다.
17세기 중반, 조선 현종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무섬마을.
지금도 50여 채의 집들이 대부분 옛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기둥 대신 둥그런 두리기둥을 쓰고 마루를 높인 뒤 난간을 설치해 가옥의 품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죽재와 해우당을 비롯해 옛 고택 9채는 지방 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세(무섬마을 주민) : "1850년경에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 어른이 의금부도사를 하시고 낙향하셔가지고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글공부 하시고, 더 높은 벼슬을 내리는 것도 마다하시고."
집집마다 남아있는 아궁이에는 아직도 장작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미음(ㅁ)자 형태의 가옥 구조는 남자들이 생활하는 사랑채와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가 서로 나뉘어 당시 양반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터뷰> 이정호(94세) : "(어르신 시집오신 다음에는 밖에 출타는 많이 하셨어요?) 못해요. 시집오면 방에 들어앉아 밥이나 해먹고 문밖에는 나가지도 못해. (그럼 고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친정에 간혹 가봤지. (그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가마 타고 갔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은 일부를 현대식으로 고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통의 멋은 잃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류인희(무섬마을 주민) :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지키던 집이니까 내려와서 살아야죠. 그래서 사는 거고, 우리는 겨울 되면 또 서울 올라가서 겨울은 나고 내려와요."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속에 옛 마을의 기품이 살아있는 곳.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적적하던 고택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집 마당에서 공연을 하니 우리 가락은 더 흥이 납니다.
<인터뷰> 박건서(경기도 성남시) : "(옛날에는) 저 앞 백사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고택 공연을 이렇게 하니까 더더군다나 운치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섬마을은 그 자체가 전통 예술의 무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 풍경은 1970년대 자칫 훼손될 뻔했습니다.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마을 뒤로 빼고 지금의 강바닥과 백사장에는 농경지를 만든다는 게 당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주민들이 중장비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공사는 취소됐습니다.
<인터뷰> 김한세(무섬마을 주민) : "물을 끊으면 마을의 혈을 끊는다고 해서 풍수지리상 끊으면 동네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격렬한 항의를 하고 노인들이 가서 드러눕고 그래서 (공사를) 못 했죠. 지금 보면 대단히 잘하신 거죠. 공사를 했으면 마을 앞에는 강도 없고 백사장도 없고."
1950년대 한국전쟁의 참화 역시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면서 마을이 상처 입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박종우(무섬 전통마을 보존회장) : "양심의 자유를 인정을 했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이런 사회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다, 이걸 인정을 했어. 절대로 고발한다든지 이래서 비명횡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무섬 동네의 자랑이야."
이렇게 마을의 분열을 막고 옛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전통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광호(문화해설사) : "여기는 터 자리가 옛날 아도서숙 자리였습니다. 아도서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이 마을 청년들의 만남의 장소, 모임의 장소, 배움의 장소. 그걸로 활용을 하면서 여기 모여서 무지한 농민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민족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섬마을은 일제 강점기 시절 항일 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보존하고 바깥세상에 알릴 것인가?
2005년 외나무다리를 복원하고 축제를 열기 시작한 이윱니다.
새신랑이 말을 타고 물을 건널 때 몸종은 고삐를 잡고 외나무다리를 건넙니다.
새색시도 가마를 타고외나무다리를 건너 시집을 옵니다. 신부의 고향이 바로 이곳 무섬마을.
실제 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마을 잔치를 열지 못하자 1년을 기다린 뒤 올해 전통혼례를 올렸습니다.
<인터뷰> 안용수(신랑) : "10년 후에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요. 그래서 조금 사고를 쳐도 크게 치려고. 마을 주민 여러분께 눈도장 찍으려고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고 일부러 결심했습니다. (여기 들어와 살 예정이세요?) 네."
백년해로한 뒤 저승에 가려면 이번에는 상여를 타고 다리를 건넙니다.
상여꾼들이 힘이 빠질 때 외나무다리는 버팀목이 됐고 망자도 외나무다리에 몸을 기대 쉬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우병기(이웃마을 주민) : "(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힘들어요. 한 번 벗겨 보여줄게. (많이 들어가셨네요?)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벌게진다고 하면. (많이 무거우세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해보면, 이게 한 30여 명이 힘을 같이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보면 힘을 합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외나무다리를 오가며 일어났기에, 주민들에게 축제는 추억 여행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물이 불어 외나무다리가 치워지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마을 뒤쪽으로 30리 먼 길을 돌아다니던 기억들도 생생합니다.
<인터뷰> 자은 스님 : "어릴 때는 이 외나무다리가 굉장히 좁았어요. 우리 손바닥만 한 것. 그때는 나무를 직접 베어서 도끼로 짜서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좁아서 조금 위험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넓어서 다니기 쉬워요. (어렸을 때 비 오면 헤엄쳐서 학교 다니시고요?) 네. 비 오면 이제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소꼬리 붙들고, 소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아니면 소꼬리를 붙들고 따라 건너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현대화와 산업화의 바람을 비켜선 탓에 마을이 쇠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컸지만, 그래도 옛 모습을 지켜온 덕분에 다시 가치를 인정받게 된 무섬마을.
보존도 개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잔잔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섬마을을 아시나요?
-
- 입력 2010-10-18 07:33:22

<앵커 멘트>
무섬마을을 아십니까?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경북 영주의 시골마을입니다.
최근에는 30년 전 사라진 외나무다리까지 복원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운 풍경이 남아있는 무섬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여 무섬마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입니다.
안동 하회, 예천 회룡포처럼 낙동강 윗줄기가 휘돌아 흐르는 물돌이 마을입니다.
태백산 물줄기인 내성천과 소백산에서 흘러내린 서천이 만나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지만 여름철 홍수 피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인터뷰> 박종우(무섬 전통마을 보존회장) : "소백산에서 발원한 물이 일찍 흘러. 일찍 흘러간 뒤에 태백산 물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물이 한꺼번에 오면 범람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시차가 나. 그래서 늘 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금모래가 빛나는 백사장 한가운데에는 130미터 길이의 외나무다리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가을부터 봄까지만 설치해놓습니다.
<인터뷰> 임지은(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작은 다리같이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막상 걸으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게 약간 무섭습니다. (외나무다리가 실제로)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밑을 보면서 걸으니까 물이 흐르니까 이게 다리가 흔들려 보여요."
1972년 시멘트 다리가 들어서자 외나무다리는 설 자리를 잃고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30년이 지난 뒤 외나무다리를 되살렸습니다.
17세기 중반, 조선 현종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무섬마을.
지금도 50여 채의 집들이 대부분 옛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기둥 대신 둥그런 두리기둥을 쓰고 마루를 높인 뒤 난간을 설치해 가옥의 품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죽재와 해우당을 비롯해 옛 고택 9채는 지방 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세(무섬마을 주민) : "1850년경에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 어른이 의금부도사를 하시고 낙향하셔가지고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글공부 하시고, 더 높은 벼슬을 내리는 것도 마다하시고."
집집마다 남아있는 아궁이에는 아직도 장작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미음(ㅁ)자 형태의 가옥 구조는 남자들이 생활하는 사랑채와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가 서로 나뉘어 당시 양반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터뷰> 이정호(94세) : "(어르신 시집오신 다음에는 밖에 출타는 많이 하셨어요?) 못해요. 시집오면 방에 들어앉아 밥이나 해먹고 문밖에는 나가지도 못해. (그럼 고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친정에 간혹 가봤지. (그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가마 타고 갔지."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은 일부를 현대식으로 고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통의 멋은 잃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류인희(무섬마을 주민) :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지키던 집이니까 내려와서 살아야죠. 그래서 사는 거고, 우리는 겨울 되면 또 서울 올라가서 겨울은 나고 내려와요."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속에 옛 마을의 기품이 살아있는 곳.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적적하던 고택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집 마당에서 공연을 하니 우리 가락은 더 흥이 납니다.
<인터뷰> 박건서(경기도 성남시) : "(옛날에는) 저 앞 백사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고택 공연을 이렇게 하니까 더더군다나 운치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섬마을은 그 자체가 전통 예술의 무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 풍경은 1970년대 자칫 훼손될 뻔했습니다.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마을 뒤로 빼고 지금의 강바닥과 백사장에는 농경지를 만든다는 게 당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주민들이 중장비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공사는 취소됐습니다.
<인터뷰> 김한세(무섬마을 주민) : "물을 끊으면 마을의 혈을 끊는다고 해서 풍수지리상 끊으면 동네가 망한다 이렇게 해서 격렬한 항의를 하고 노인들이 가서 드러눕고 그래서 (공사를) 못 했죠. 지금 보면 대단히 잘하신 거죠. 공사를 했으면 마을 앞에는 강도 없고 백사장도 없고."
1950년대 한국전쟁의 참화 역시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냈습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서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면서 마을이 상처 입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박종우(무섬 전통마을 보존회장) : "양심의 자유를 인정을 했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이런 사회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다, 이걸 인정을 했어. 절대로 고발한다든지 이래서 비명횡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무섬 동네의 자랑이야."
이렇게 마을의 분열을 막고 옛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전통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김광호(문화해설사) : "여기는 터 자리가 옛날 아도서숙 자리였습니다. 아도서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이 마을 청년들의 만남의 장소, 모임의 장소, 배움의 장소. 그걸로 활용을 하면서 여기 모여서 무지한 농민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민족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섬마을은 일제 강점기 시절 항일 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보존하고 바깥세상에 알릴 것인가?
2005년 외나무다리를 복원하고 축제를 열기 시작한 이윱니다.
새신랑이 말을 타고 물을 건널 때 몸종은 고삐를 잡고 외나무다리를 건넙니다.
새색시도 가마를 타고외나무다리를 건너 시집을 옵니다. 신부의 고향이 바로 이곳 무섬마을.
실제 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신종플루 때문에 마을 잔치를 열지 못하자 1년을 기다린 뒤 올해 전통혼례를 올렸습니다.
<인터뷰> 안용수(신랑) : "10년 후에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요. 그래서 조금 사고를 쳐도 크게 치려고. 마을 주민 여러분께 눈도장 찍으려고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고 일부러 결심했습니다. (여기 들어와 살 예정이세요?) 네."
백년해로한 뒤 저승에 가려면 이번에는 상여를 타고 다리를 건넙니다.
상여꾼들이 힘이 빠질 때 외나무다리는 버팀목이 됐고 망자도 외나무다리에 몸을 기대 쉬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우병기(이웃마을 주민) : "(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힘들어요. 한 번 벗겨 보여줄게. (많이 들어가셨네요?)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벌게진다고 하면. (많이 무거우세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데 해보면, 이게 한 30여 명이 힘을 같이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보면 힘을 합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외나무다리를 오가며 일어났기에, 주민들에게 축제는 추억 여행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물이 불어 외나무다리가 치워지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마을 뒤쪽으로 30리 먼 길을 돌아다니던 기억들도 생생합니다.
<인터뷰> 자은 스님 : "어릴 때는 이 외나무다리가 굉장히 좁았어요. 우리 손바닥만 한 것. 그때는 나무를 직접 베어서 도끼로 짜서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좁아서 조금 위험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넓어서 다니기 쉬워요. (어렸을 때 비 오면 헤엄쳐서 학교 다니시고요?) 네. 비 오면 이제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소꼬리 붙들고, 소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아니면 소꼬리를 붙들고 따라 건너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현대화와 산업화의 바람을 비켜선 탓에 마을이 쇠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컸지만, 그래도 옛 모습을 지켜온 덕분에 다시 가치를 인정받게 된 무섬마을.
보존도 개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잔잔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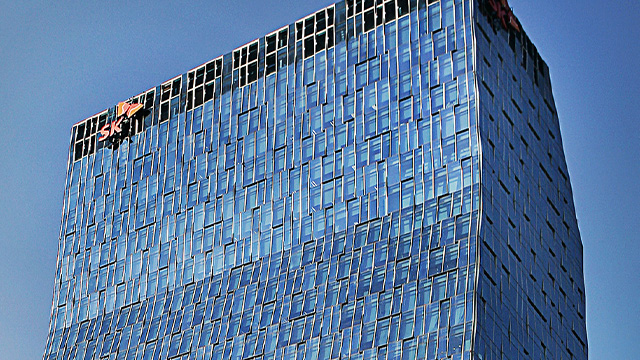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