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산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업고 학생들조차도 힘이 덜 드는 서비스 직종으로 몰리면서 산업현장의 인력구조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황상길, 김도엽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의 생산직 사원은 70%가 주부입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20대였지만 젊은이가 오지를 않아 평균연령이 40살입니다.
⊙신태수((주)경보씰텍 이사): 설령 오더라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갑니다.
다른 데로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로 전부 다 전직을 하는 거죠.
⊙기자: 부족한 인력은 병역특례 요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올해가 끝입니다.
생산현장의 인력이 고령화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조선, 기계업종일수록 심해서 3대 조선업체는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40살을 넘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봐도 사무직은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0.6세밖에 늘지 않았지만 생산직은 34.6세에서 37.4세로 2.8세나 늘었습니다.
젊은이가 줄다 보니 경력자들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는 사장되고 맙니다.
⊙양귀순((주)라우금속 이사): 40대 후반으로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가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데...
⊙기자: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우리 제품이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윤종언(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활력과 열기가 또는 조직의 어떤 역동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일본의 조선업이 우리에게 추월당한 중요한 이유가 생산직의 고령화였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타산지석입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기자: 전자업체에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의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학교 졸업 후에는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민용(고3 학생): 이런 일 하는 거 싫어요, 각자가...
혹시 커서도 납땜질하고 이런 거 닦는 거하고...
⊙기자: 생산현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바로 차별 때문입니다.
⊙홍성호(고3 학생): 생산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보수는 물론 업무 외의 생활에서도 사무직과 차별을 받는 생산직의 현실은 학생들의 진로마저 바꾸어놓았습니다.
지난 90년 80%가 취업, 10%가 진학이었던 비율은 지난해에는 취업 50%, 진학 48%의 비정상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인력들이 계속해서 생산현장을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이처럼 공장의 라인이 텅 비어버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영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승진사다리를 좀더 높이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숙련 근로자가 관리직으로 승진할 길을 열어놓는 등의 새로운 인사관리가 도입되지 않는 한 생산업체의 인력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실업고 학생들조차도 힘이 덜 드는 서비스 직종으로 몰리면서 산업현장의 인력구조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황상길, 김도엽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의 생산직 사원은 70%가 주부입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20대였지만 젊은이가 오지를 않아 평균연령이 40살입니다.
⊙신태수((주)경보씰텍 이사): 설령 오더라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갑니다.
다른 데로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로 전부 다 전직을 하는 거죠.
⊙기자: 부족한 인력은 병역특례 요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올해가 끝입니다.
생산현장의 인력이 고령화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조선, 기계업종일수록 심해서 3대 조선업체는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40살을 넘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봐도 사무직은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0.6세밖에 늘지 않았지만 생산직은 34.6세에서 37.4세로 2.8세나 늘었습니다.
젊은이가 줄다 보니 경력자들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는 사장되고 맙니다.
⊙양귀순((주)라우금속 이사): 40대 후반으로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가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데...
⊙기자: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우리 제품이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윤종언(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활력과 열기가 또는 조직의 어떤 역동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일본의 조선업이 우리에게 추월당한 중요한 이유가 생산직의 고령화였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타산지석입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기자: 전자업체에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의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학교 졸업 후에는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민용(고3 학생): 이런 일 하는 거 싫어요, 각자가...
혹시 커서도 납땜질하고 이런 거 닦는 거하고...
⊙기자: 생산현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바로 차별 때문입니다.
⊙홍성호(고3 학생): 생산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보수는 물론 업무 외의 생활에서도 사무직과 차별을 받는 생산직의 현실은 학생들의 진로마저 바꾸어놓았습니다.
지난 90년 80%가 취업, 10%가 진학이었던 비율은 지난해에는 취업 50%, 진학 48%의 비정상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인력들이 계속해서 생산현장을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이처럼 공장의 라인이 텅 비어버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영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승진사다리를 좀더 높이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숙련 근로자가 관리직으로 승진할 길을 열어놓는 등의 새로운 인사관리가 도입되지 않는 한 생산업체의 인력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산현장 젊은 피가 없다
-
- 입력 2001-08-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생산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업고 학생들조차도 힘이 덜 드는 서비스 직종으로 몰리면서 산업현장의 인력구조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황상길, 김도엽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반도체 부품 생산업체의 생산직 사원은 70%가 주부입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20대였지만 젊은이가 오지를 않아 평균연령이 40살입니다.
⊙신태수((주)경보씰텍 이사): 설령 오더라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갑니다.
다른 데로 서비스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로 전부 다 전직을 하는 거죠.
⊙기자: 부족한 인력은 병역특례 요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올해가 끝입니다.
생산현장의 인력이 고령화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특히 조선, 기계업종일수록 심해서 3대 조선업체는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40살을 넘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봐도 사무직은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0.6세밖에 늘지 않았지만 생산직은 34.6세에서 37.4세로 2.8세나 늘었습니다.
젊은이가 줄다 보니 경력자들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는 사장되고 맙니다.
⊙양귀순((주)라우금속 이사): 40대 후반으로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가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데...
⊙기자: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우리 제품이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윤종언(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활력과 열기가 또는 조직의 어떤 역동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일본의 조선업이 우리에게 추월당한 중요한 이유가 생산직의 고령화였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타산지석입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기자: 전자업체에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의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학교 졸업 후에는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민용(고3 학생): 이런 일 하는 거 싫어요, 각자가...
혹시 커서도 납땜질하고 이런 거 닦는 거하고...
⊙기자: 생산현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바로 차별 때문입니다.
⊙홍성호(고3 학생): 생산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보수는 물론 업무 외의 생활에서도 사무직과 차별을 받는 생산직의 현실은 학생들의 진로마저 바꾸어놓았습니다.
지난 90년 80%가 취업, 10%가 진학이었던 비율은 지난해에는 취업 50%, 진학 48%의 비정상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인력들이 계속해서 생산현장을 외면한다면 언젠가는 이처럼 공장의 라인이 텅 비어버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영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승진사다리를 좀더 높이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숙련 근로자가 관리직으로 승진할 길을 열어놓는 등의 새로운 인사관리가 도입되지 않는 한 생산업체의 인력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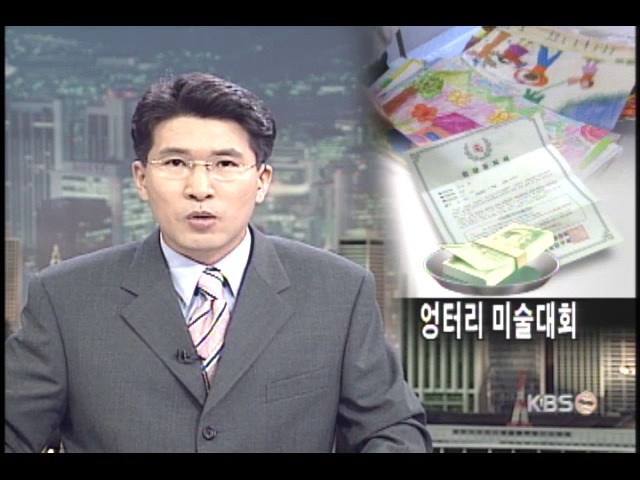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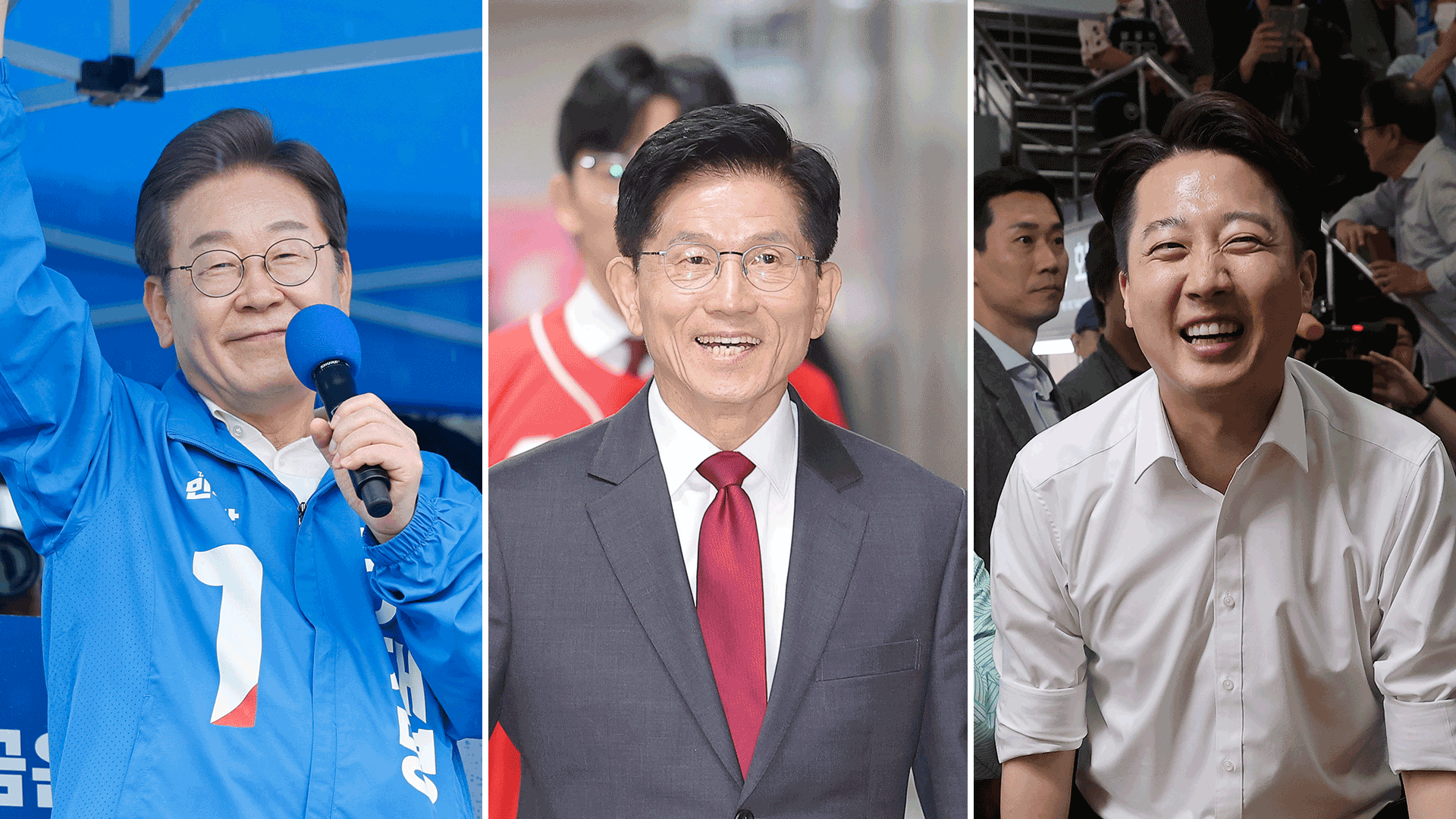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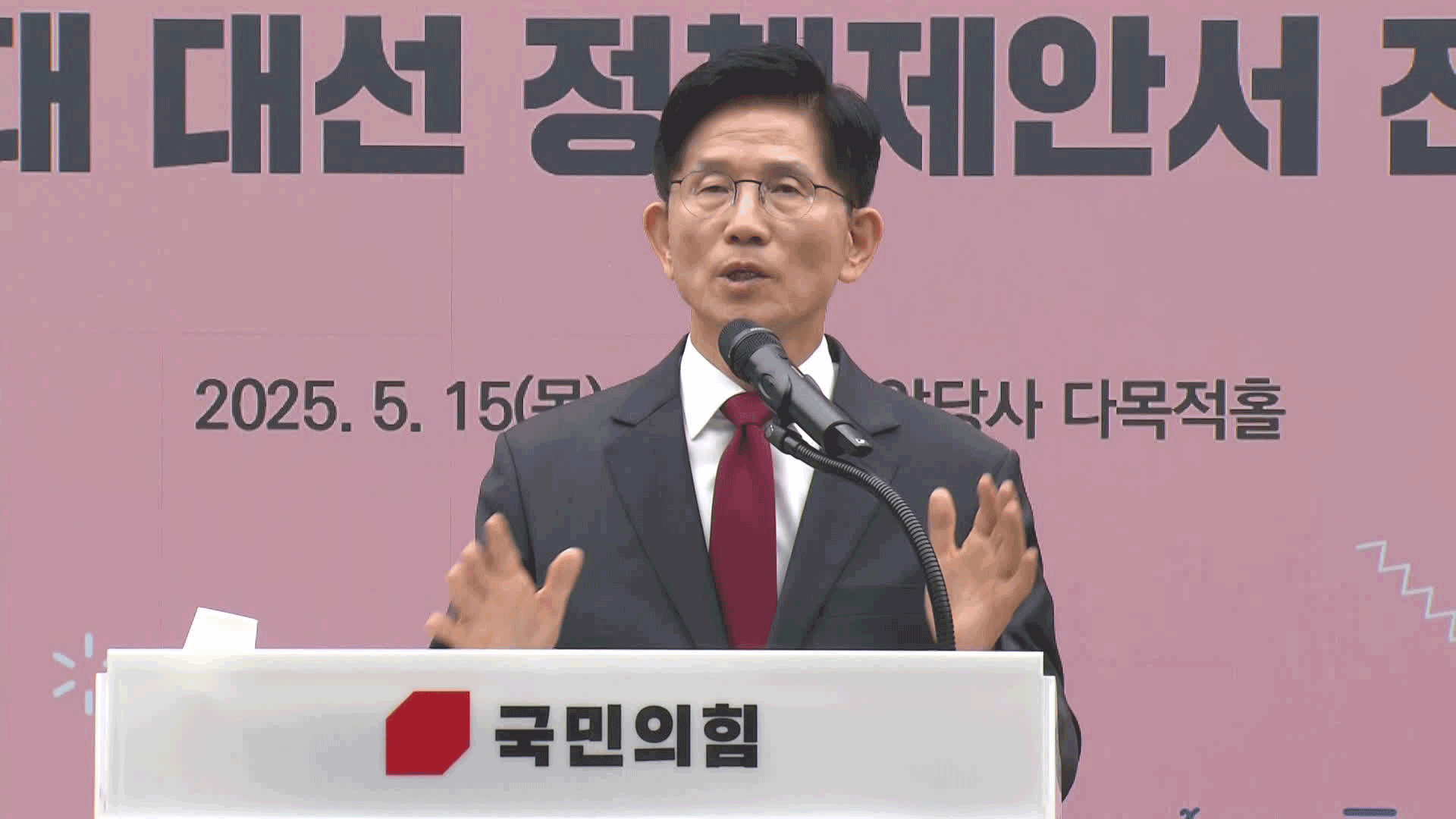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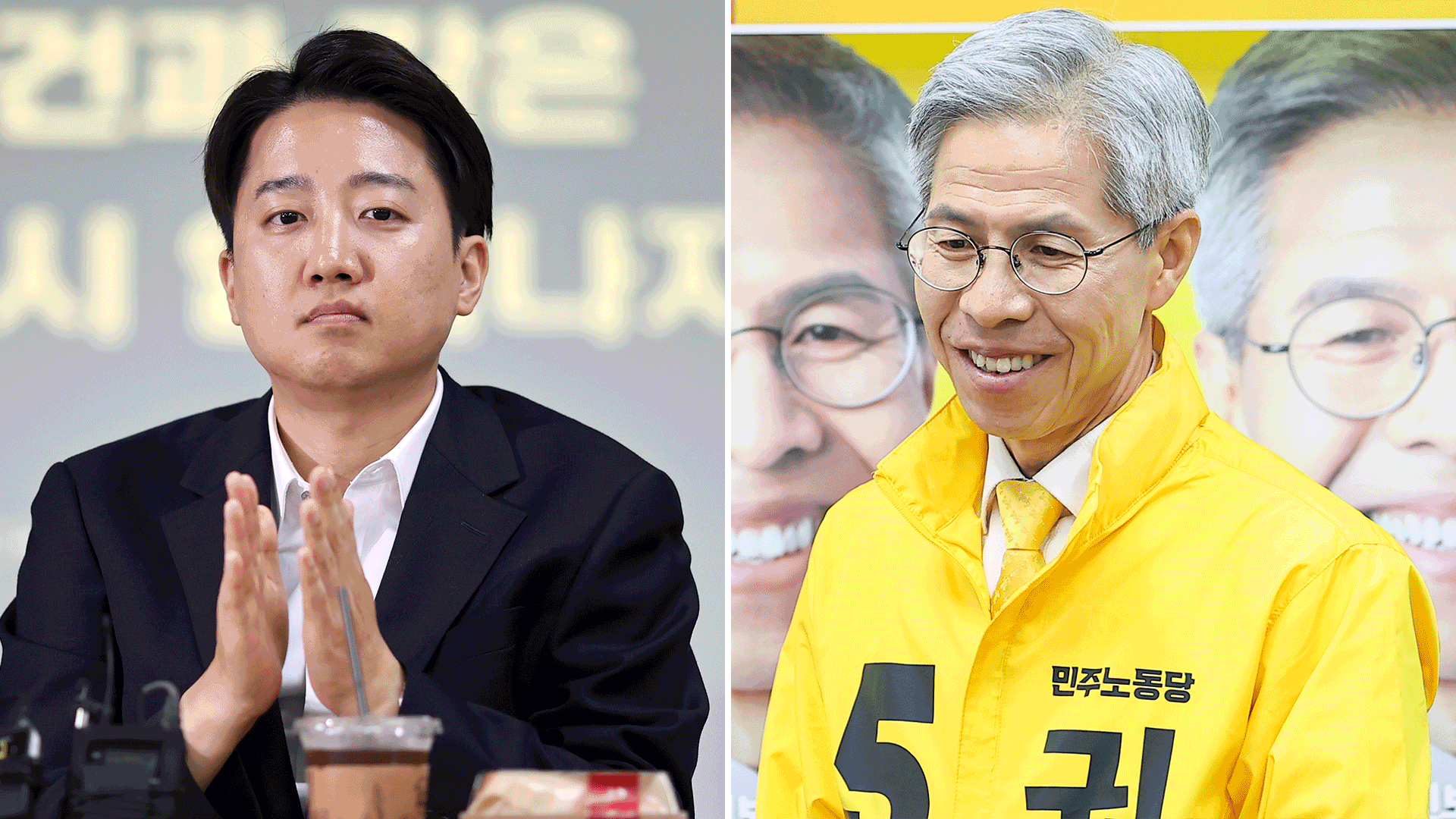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