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오는데 “방 빼”?…코로나 마주한 이재민의 집단생활 ‘딜레마’
입력 2020.09.10 (13:16)
수정 2020.09.14 (13: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섬진강 제방
■ 강변 살다 '물벼락'…집 잃고 대피소로
벌써 오래된 일인 듯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8월 8일, 전날부터 쏟아진 비는 430mm를 넘어섰고, 500년에 한 번 온다는 이 폭우에 무섭게 불어난 강물은 기어이 섬진강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물에 잠긴 강변 마을, 전북 남원시 금지면
물에 잠긴 강변 마을, 전북 남원시 금지면
강변 살던 5백 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살던 곳을 내주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들은 당장 잘 데가 필요했습니다.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노인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노인
시골 마을이라 이재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족 집에 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은 대피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 근처 문화센터에 꾸려진 대피소에는 218명이 모여들었습니다.
■ 대피소를 떠난 사람들
 이재민을 수용한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대피소
이재민을 수용한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대피소
대피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텐트에 깔개를 깔면 몸을 누일만합니다. 텐트 안에는 슬리퍼에 화장지, 심지어 속옷까지 갖춰놨습니다. 때 되면 밥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지 사실 대피소 생활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몇몇 주민들은 아직 엉망인 집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는 이재민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는 이재민
 옥상에 모기장을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
옥상에 모기장을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
흙탕 범벅이 돼 못 쓰게 된 살림들은 몽땅 버렸습니다. 장판도 걷어내고, 벽지도 뜯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보일러를 때도 젖은 콘크리트는 잘 마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 안에선 못 삽니다. 이재민들은 지금도 마당에서 밥을 끓여 먹고, 옥상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 대피소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광복절'
다시 대피소 얘기입니다. '그래도 집이 낫다'는 사람들은 대피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당 생활이 어려운 더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집이 망가진 정도가 남들보다 심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남는 걸 택했습니다.
그렇게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283, 276, 315…434명' 물난리가 지나니 이번엔 감염병이 또 극성을 부리며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막상 집 잃고 대피소로 모였을 땐 별말 없던 '거리 두기'가 다시 생활 필수 덕목이 됐습니다. 대피소 집단생활에서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안달 난 건 남원시입니다. 대피소를 격리소처럼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민들은 아침을 먹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 데 먹고 자는 대피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끔찍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모여 있으면 위험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설이 어느 순간 가장 위태로운 시설이 되자 결국 남원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태풍 오는데 어디로 가라고"
일부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옳아서입니다.
더욱이 무턱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복구가 덜 끝났을 테니, 텐트와 깔개를 빌려준다고 했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정 힘든 사람들은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도 덧붙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난리 통에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재민을 내쫓는다고 역정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생각에 대피소 밖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옥상에 텐트 치고 살라니, 못 나간다 버텼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딜레마'
[연관기사] 비워? 채워?…댐의 딜레마
■감염병 마주한 이재민의 집단생활 '딜레마'

지금 이 문제도 딜레마가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골라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해도 곤란한 결과를 낳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중얼거린 햄릿은 이 딜레마를 풀지 못해 비극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재민의 딜레마>는 비극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남았다가 감염병에 걸린 사람도, 대피소를 나갔다가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와 자연재해, 두 가지를 동시에 겪는 일을 우리 대부분은 처음 겪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딜레마라는 건 일단 생기면 풀기 고약합니다. 가장 좋은 수는 딜레마가 없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이재민 수용대책' 같은 정책적 매뉴얼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한 대처 계획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딜레마를 물리치고 효과를 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대피소에는 31명이 남았습니다. 모두 안전히, 건강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 듯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8월 8일, 전날부터 쏟아진 비는 430mm를 넘어섰고, 500년에 한 번 온다는 이 폭우에 무섭게 불어난 강물은 기어이 섬진강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물에 잠긴 강변 마을, 전북 남원시 금지면
물에 잠긴 강변 마을, 전북 남원시 금지면강변 살던 5백 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살던 곳을 내주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들은 당장 잘 데가 필요했습니다.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노인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노인시골 마을이라 이재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족 집에 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은 대피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 근처 문화센터에 꾸려진 대피소에는 218명이 모여들었습니다.
■ 대피소를 떠난 사람들
 이재민을 수용한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대피소
이재민을 수용한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대피소대피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텐트에 깔개를 깔면 몸을 누일만합니다. 텐트 안에는 슬리퍼에 화장지, 심지어 속옷까지 갖춰놨습니다. 때 되면 밥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지 사실 대피소 생활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몇몇 주민들은 아직 엉망인 집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는 이재민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는 이재민 옥상에 모기장을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
옥상에 모기장을 치고 생활하는 이재민흙탕 범벅이 돼 못 쓰게 된 살림들은 몽땅 버렸습니다. 장판도 걷어내고, 벽지도 뜯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보일러를 때도 젖은 콘크리트는 잘 마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 안에선 못 삽니다. 이재민들은 지금도 마당에서 밥을 끓여 먹고, 옥상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 대피소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광복절'
다시 대피소 얘기입니다. '그래도 집이 낫다'는 사람들은 대피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당 생활이 어려운 더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집이 망가진 정도가 남들보다 심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남는 걸 택했습니다.
그렇게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283, 276, 315…434명' 물난리가 지나니 이번엔 감염병이 또 극성을 부리며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막상 집 잃고 대피소로 모였을 땐 별말 없던 '거리 두기'가 다시 생활 필수 덕목이 됐습니다. 대피소 집단생활에서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안달 난 건 남원시입니다. 대피소를 격리소처럼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민들은 아침을 먹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 데 먹고 자는 대피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끔찍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모여 있으면 위험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설이 어느 순간 가장 위태로운 시설이 되자 결국 남원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태풍 오는데 어디로 가라고"
일부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옳아서입니다.
더욱이 무턱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복구가 덜 끝났을 테니, 텐트와 깔개를 빌려준다고 했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정 힘든 사람들은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도 덧붙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난리 통에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재민을 내쫓는다고 역정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생각에 대피소 밖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옥상에 텐트 치고 살라니, 못 나간다 버텼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딜레마'
[연관기사] 비워? 채워?…댐의 딜레마
■감염병 마주한 이재민의 집단생활 '딜레마'

지금 이 문제도 딜레마가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골라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해도 곤란한 결과를 낳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중얼거린 햄릿은 이 딜레마를 풀지 못해 비극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재민의 딜레마>는 비극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남았다가 감염병에 걸린 사람도, 대피소를 나갔다가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와 자연재해, 두 가지를 동시에 겪는 일을 우리 대부분은 처음 겪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딜레마라는 건 일단 생기면 풀기 고약합니다. 가장 좋은 수는 딜레마가 없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이재민 수용대책' 같은 정책적 매뉴얼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한 대처 계획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딜레마를 물리치고 효과를 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대피소에는 31명이 남았습니다. 모두 안전히, 건강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풍 오는데 “방 빼”?…코로나 마주한 이재민의 집단생활 ‘딜레마’
-
- 입력 2020-09-10 13:16:28
- 수정2020-09-14 13:57:07

무너진 섬진강 제방
■ 강변 살다 '물벼락'…집 잃고 대피소로
벌써 오래된 일인 듯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8월 8일, 전날부터 쏟아진 비는 430mm를 넘어섰고, 500년에 한 번 온다는 이 폭우에 무섭게 불어난 강물은 기어이 섬진강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변 살던 5백 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살던 곳을 내주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들은 당장 잘 데가 필요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이재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족 집에 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은 대피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 근처 문화센터에 꾸려진 대피소에는 218명이 모여들었습니다.
■ 대피소를 떠난 사람들

대피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텐트에 깔개를 깔면 몸을 누일만합니다. 텐트 안에는 슬리퍼에 화장지, 심지어 속옷까지 갖춰놨습니다. 때 되면 밥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지 사실 대피소 생활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몇몇 주민들은 아직 엉망인 집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흙탕 범벅이 돼 못 쓰게 된 살림들은 몽땅 버렸습니다. 장판도 걷어내고, 벽지도 뜯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보일러를 때도 젖은 콘크리트는 잘 마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 안에선 못 삽니다. 이재민들은 지금도 마당에서 밥을 끓여 먹고, 옥상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 대피소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광복절'
다시 대피소 얘기입니다. '그래도 집이 낫다'는 사람들은 대피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당 생활이 어려운 더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집이 망가진 정도가 남들보다 심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남는 걸 택했습니다.
그렇게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283, 276, 315…434명' 물난리가 지나니 이번엔 감염병이 또 극성을 부리며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막상 집 잃고 대피소로 모였을 땐 별말 없던 '거리 두기'가 다시 생활 필수 덕목이 됐습니다. 대피소 집단생활에서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안달 난 건 남원시입니다. 대피소를 격리소처럼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민들은 아침을 먹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 데 먹고 자는 대피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끔찍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모여 있으면 위험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설이 어느 순간 가장 위태로운 시설이 되자 결국 남원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태풍 오는데 어디로 가라고"
일부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옳아서입니다.
더욱이 무턱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복구가 덜 끝났을 테니, 텐트와 깔개를 빌려준다고 했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정 힘든 사람들은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도 덧붙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난리 통에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재민을 내쫓는다고 역정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생각에 대피소 밖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옥상에 텐트 치고 살라니, 못 나간다 버텼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딜레마'
[연관기사] 비워? 채워?…댐의 딜레마
■감염병 마주한 이재민의 집단생활 '딜레마'

지금 이 문제도 딜레마가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골라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해도 곤란한 결과를 낳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중얼거린 햄릿은 이 딜레마를 풀지 못해 비극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재민의 딜레마>는 비극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남았다가 감염병에 걸린 사람도, 대피소를 나갔다가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와 자연재해, 두 가지를 동시에 겪는 일을 우리 대부분은 처음 겪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딜레마라는 건 일단 생기면 풀기 고약합니다. 가장 좋은 수는 딜레마가 없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이재민 수용대책' 같은 정책적 매뉴얼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한 대처 계획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딜레마를 물리치고 효과를 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대피소에는 31명이 남았습니다. 모두 안전히, 건강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 듯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8월 8일, 전날부터 쏟아진 비는 430mm를 넘어섰고, 500년에 한 번 온다는 이 폭우에 무섭게 불어난 강물은 기어이 섬진강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변 살던 5백 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살던 곳을 내주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이들은 당장 잘 데가 필요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이재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족 집에 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은 대피소로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 근처 문화센터에 꾸려진 대피소에는 218명이 모여들었습니다.
■ 대피소를 떠난 사람들

대피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난 텐트에 깔개를 깔면 몸을 누일만합니다. 텐트 안에는 슬리퍼에 화장지, 심지어 속옷까지 갖춰놨습니다. 때 되면 밥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지 사실 대피소 생활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몇몇 주민들은 아직 엉망인 집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흙탕 범벅이 돼 못 쓰게 된 살림들은 몽땅 버렸습니다. 장판도 걷어내고, 벽지도 뜯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보일러를 때도 젖은 콘크리트는 잘 마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 안에선 못 삽니다. 이재민들은 지금도 마당에서 밥을 끓여 먹고, 옥상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 대피소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광복절'
다시 대피소 얘기입니다. '그래도 집이 낫다'는 사람들은 대피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당 생활이 어려운 더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집이 망가진 정도가 남들보다 심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남는 걸 택했습니다.
그렇게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283, 276, 315…434명' 물난리가 지나니 이번엔 감염병이 또 극성을 부리며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막상 집 잃고 대피소로 모였을 땐 별말 없던 '거리 두기'가 다시 생활 필수 덕목이 됐습니다. 대피소 집단생활에서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안달 난 건 남원시입니다. 대피소를 격리소처럼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재민들은 아침을 먹고 나면 뿔뿔이 흩어져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한 데 먹고 자는 대피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끔찍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모여 있으면 위험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설이 어느 순간 가장 위태로운 시설이 되자 결국 남원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 "태풍 오는데 어디로 가라고"
일부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이 옳아서입니다.
더욱이 무턱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복구가 덜 끝났을 테니, 텐트와 깔개를 빌려준다고 했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정 힘든 사람들은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도 덧붙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난리 통에 집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재민을 내쫓는다고 역정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생각에 대피소 밖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옥상에 텐트 치고 살라니, 못 나간다 버텼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딜레마'
[연관기사] 비워? 채워?…댐의 딜레마
■감염병 마주한 이재민의 집단생활 '딜레마'

지금 이 문제도 딜레마가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골라야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해도 곤란한 결과를 낳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중얼거린 햄릿은 이 딜레마를 풀지 못해 비극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재민의 딜레마>는 비극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 남았다가 감염병에 걸린 사람도, 대피소를 나갔다가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와 자연재해, 두 가지를 동시에 겪는 일을 우리 대부분은 처음 겪어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선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딜레마라는 건 일단 생기면 풀기 고약합니다. 가장 좋은 수는 딜레마가 없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이재민 수용대책' 같은 정책적 매뉴얼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한 대처 계획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딜레마를 물리치고 효과를 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대피소에는 31명이 남았습니다. 모두 안전히, 건강히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
-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오정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10호 태풍 하이선·9호 태풍 마이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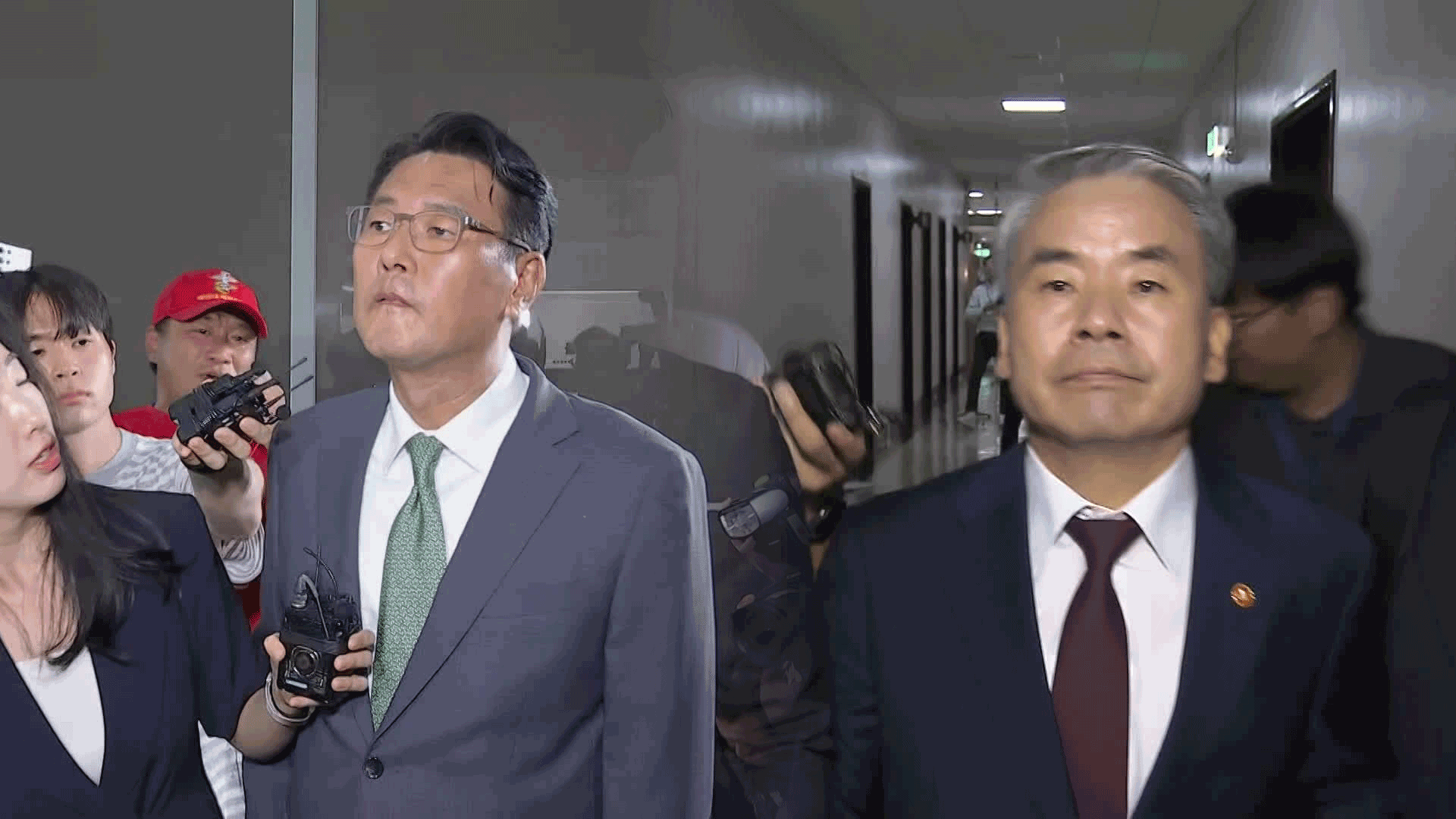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