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어촌뉴딜④ 주민을 혁신 주체로…사업 재정비 필요
입력 2020.12.17 (21:44)
수정 2020.12.17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낙후된 어촌 어항을 살리겠다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문제점을 앞서 3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짚어봅니다.
탐사K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촌뉴딜 300 사업 2차 년도에 선정된 태흥2리.
지역특산품인 옥돔을 테마로 어촌 교류센터와 옥돔 생산기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2차년도 대상지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별다른 갈등 없이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마을의 준비 덕분이라는 평갑니다.
[김흥부/태흥2리장 : "한 20여 명이 구성돼서 마을의 큰 계획과 분과별 모임도 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주민주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수인데, 지금은 단기간 성과를 내려다보니 대상지 선정 이후에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협의체 전문가/음성변조 : "장시간 접촉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정으로 계획을 내야 하는 거지,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갖다 붙여서 줄 세워서 쭉 끌어가는 방식은."]
따라서 복수의 예비 사업지를 선정한 뒤 역량 강화를 우선하고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봉수/총괄조정가 : "집중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잘 따라오는 마을들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음 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라해문/지역협의체 전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들을 청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현대화 사업과 특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많은 대상지가 SOC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어촌 정체성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동만/총괄조정가 : "오염 줄이기 설계, 또는 요즘 하는 말로 저영향설계를 꼭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기본계획 같은데 보면 그런 개념이 부족하고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과평가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예산만 교부하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성과평가를 도입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며 문제를 보완해 가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광남/총괄조정가 :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뒤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보완해서 전문적 연구 결과를 만들고."]
전체 예산이 3조 원으로 침체된 지역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촌뉴딜 300 사업.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결국,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지역을 살릴 해법을 찾는 사업이 되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 K입니다.
낙후된 어촌 어항을 살리겠다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문제점을 앞서 3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짚어봅니다.
탐사K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촌뉴딜 300 사업 2차 년도에 선정된 태흥2리.
지역특산품인 옥돔을 테마로 어촌 교류센터와 옥돔 생산기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2차년도 대상지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별다른 갈등 없이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마을의 준비 덕분이라는 평갑니다.
[김흥부/태흥2리장 : "한 20여 명이 구성돼서 마을의 큰 계획과 분과별 모임도 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주민주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수인데, 지금은 단기간 성과를 내려다보니 대상지 선정 이후에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협의체 전문가/음성변조 : "장시간 접촉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정으로 계획을 내야 하는 거지,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갖다 붙여서 줄 세워서 쭉 끌어가는 방식은."]
따라서 복수의 예비 사업지를 선정한 뒤 역량 강화를 우선하고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봉수/총괄조정가 : "집중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잘 따라오는 마을들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음 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라해문/지역협의체 전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들을 청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현대화 사업과 특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많은 대상지가 SOC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어촌 정체성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동만/총괄조정가 : "오염 줄이기 설계, 또는 요즘 하는 말로 저영향설계를 꼭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기본계획 같은데 보면 그런 개념이 부족하고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과평가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예산만 교부하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성과평가를 도입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며 문제를 보완해 가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광남/총괄조정가 :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뒤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보완해서 전문적 연구 결과를 만들고."]
전체 예산이 3조 원으로 침체된 지역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촌뉴딜 300 사업.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결국,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지역을 살릴 해법을 찾는 사업이 되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 K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탐사K] 어촌뉴딜④ 주민을 혁신 주체로…사업 재정비 필요
-
- 입력 2020-12-17 21:44:56
- 수정2020-12-17 22:08:57

[앵커]
낙후된 어촌 어항을 살리겠다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문제점을 앞서 3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짚어봅니다.
탐사K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촌뉴딜 300 사업 2차 년도에 선정된 태흥2리.
지역특산품인 옥돔을 테마로 어촌 교류센터와 옥돔 생산기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2차년도 대상지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별다른 갈등 없이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마을의 준비 덕분이라는 평갑니다.
[김흥부/태흥2리장 : "한 20여 명이 구성돼서 마을의 큰 계획과 분과별 모임도 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주민주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수인데, 지금은 단기간 성과를 내려다보니 대상지 선정 이후에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협의체 전문가/음성변조 : "장시간 접촉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정으로 계획을 내야 하는 거지,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갖다 붙여서 줄 세워서 쭉 끌어가는 방식은."]
따라서 복수의 예비 사업지를 선정한 뒤 역량 강화를 우선하고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봉수/총괄조정가 : "집중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잘 따라오는 마을들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음 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라해문/지역협의체 전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들을 청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현대화 사업과 특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많은 대상지가 SOC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어촌 정체성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동만/총괄조정가 : "오염 줄이기 설계, 또는 요즘 하는 말로 저영향설계를 꼭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기본계획 같은데 보면 그런 개념이 부족하고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과평가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예산만 교부하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성과평가를 도입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며 문제를 보완해 가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광남/총괄조정가 :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뒤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보완해서 전문적 연구 결과를 만들고."]
전체 예산이 3조 원으로 침체된 지역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촌뉴딜 300 사업.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결국,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지역을 살릴 해법을 찾는 사업이 되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 K입니다.
낙후된 어촌 어항을 살리겠다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문제점을 앞서 3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에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짚어봅니다.
탐사K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촌뉴딜 300 사업 2차 년도에 선정된 태흥2리.
지역특산품인 옥돔을 테마로 어촌 교류센터와 옥돔 생산기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2차년도 대상지 중 가장 먼저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별다른 갈등 없이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마을의 준비 덕분이라는 평갑니다.
[김흥부/태흥2리장 : "한 20여 명이 구성돼서 마을의 큰 계획과 분과별 모임도 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주민주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수인데, 지금은 단기간 성과를 내려다보니 대상지 선정 이후에야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협의체 전문가/음성변조 : "장시간 접촉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결정으로 계획을 내야 하는 거지,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갖다 붙여서 줄 세워서 쭉 끌어가는 방식은."]
따라서 복수의 예비 사업지를 선정한 뒤 역량 강화를 우선하고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봉수/총괄조정가 : "집중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잘 따라오는 마을들 우선순위를 매겨서 다음 해에는 도전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라해문/지역협의체 전문가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들을 청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현대화 사업과 특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많은 대상지가 SOC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어촌 정체성과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동만/총괄조정가 : "오염 줄이기 설계, 또는 요즘 하는 말로 저영향설계를 꼭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기본계획 같은데 보면 그런 개념이 부족하고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성과평가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어촌뉴딜 300 사업은 예산만 교부하면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별 성과평가를 도입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며 문제를 보완해 가야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광남/총괄조정가 :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적어도 5년 뒤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보완해서 전문적 연구 결과를 만들고."]
전체 예산이 3조 원으로 침체된 지역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촌뉴딜 300 사업.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하다면 결국, 토목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지역을 살릴 해법을 찾는 사업이 되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탐사 K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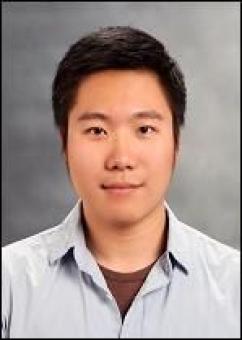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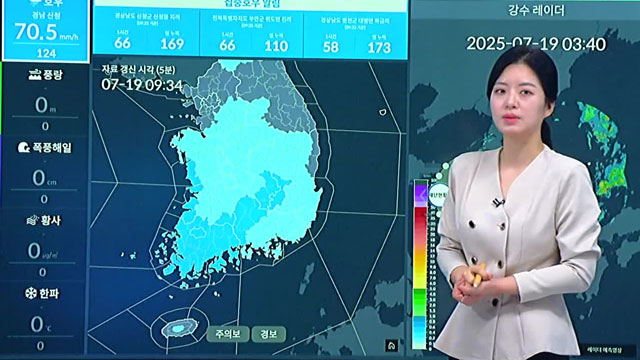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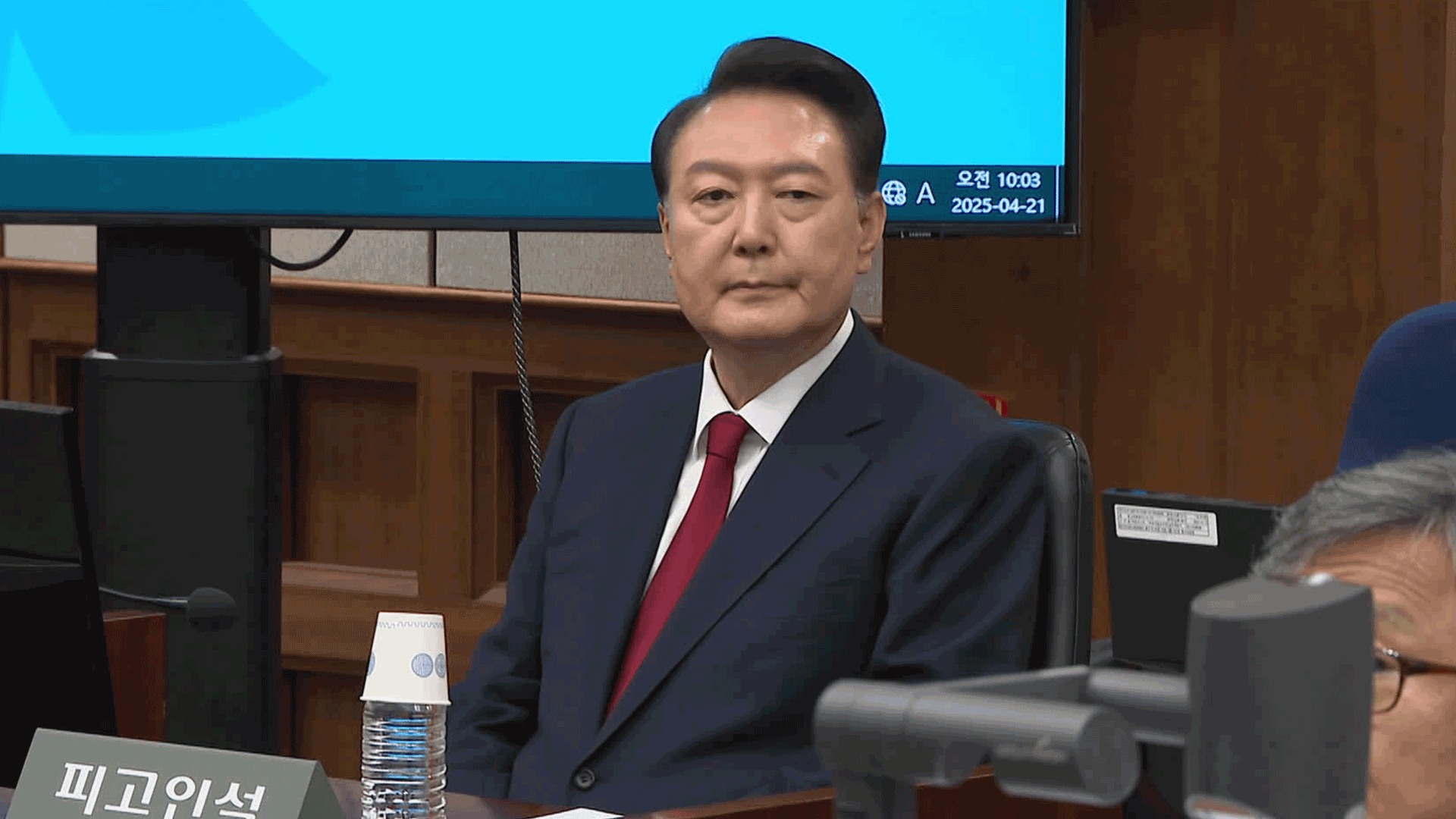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