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PICK] 강력범죄 불씨 된 층간소음…근본 원인은?
입력 2025.04.22 (20:01)
수정 2025.04.22 (20:18)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앵커가 주목한 뉴스 앵커픽 순서입니다.
'소음은 나누면 적이 됩니다'.
아파트에 붙은 이런 층간소음 경고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정 싸움을 넘어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는데, 층간소음, 과연 이웃만이 문제일까요?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오늘의 앵커픽입니다.
[리포트]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층간소음'.
불과 두 달 전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 이미 8년 전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생겼고 2023년엔 야간 상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도 진행했지만 민원은 여전합니다.
이런 층간 소음,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거나 혹은 작은 불편을 못 참는 개인들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애초에 건물을 잘못 만들어서 소리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지욱/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을 때 잘 짓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시공사별로 층간소음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상위 100대 시공사 중 민원을 겪지 않은 곳은 1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주거시설의 준공검사를 할 때 바닥 충격음 측정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층간소음 특별법'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박영민/서강대학교 연구교수 : "저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는..."]
특별법 입법 청원 나흘 만에 층간 소음 사건이 또 발생하며 제정 필요성이 커진 상황.
경실련은 오늘 성명서에서 층간 소음에 취약한 건물을 지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까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앵커픽이었습니다.
앵커가 주목한 뉴스 앵커픽 순서입니다.
'소음은 나누면 적이 됩니다'.
아파트에 붙은 이런 층간소음 경고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정 싸움을 넘어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는데, 층간소음, 과연 이웃만이 문제일까요?
'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오늘의 앵커픽입니다.
[리포트]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층간소음'.
불과 두 달 전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 이미 8년 전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생겼고 2023년엔 야간 상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도 진행했지만 민원은 여전합니다.
이런 층간 소음,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거나 혹은 작은 불편을 못 참는 개인들의 문제로만 봐야 할까요?
애초에 건물을 잘못 만들어서 소리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지욱/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을 때 잘 짓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시공사별로 층간소음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상위 100대 시공사 중 민원을 겪지 않은 곳은 1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주거시설의 준공검사를 할 때 바닥 충격음 측정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층간소음 특별법'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박영민/서강대학교 연구교수 : "저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는..."]
특별법 입법 청원 나흘 만에 층간 소음 사건이 또 발생하며 제정 필요성이 커진 상황.
경실련은 오늘 성명서에서 층간 소음에 취약한 건물을 지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까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앵커픽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여기는 전남] 여수시, 저수온 피해 양식어가 복구 계획 마련 외](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7/2025/04/22/130_823476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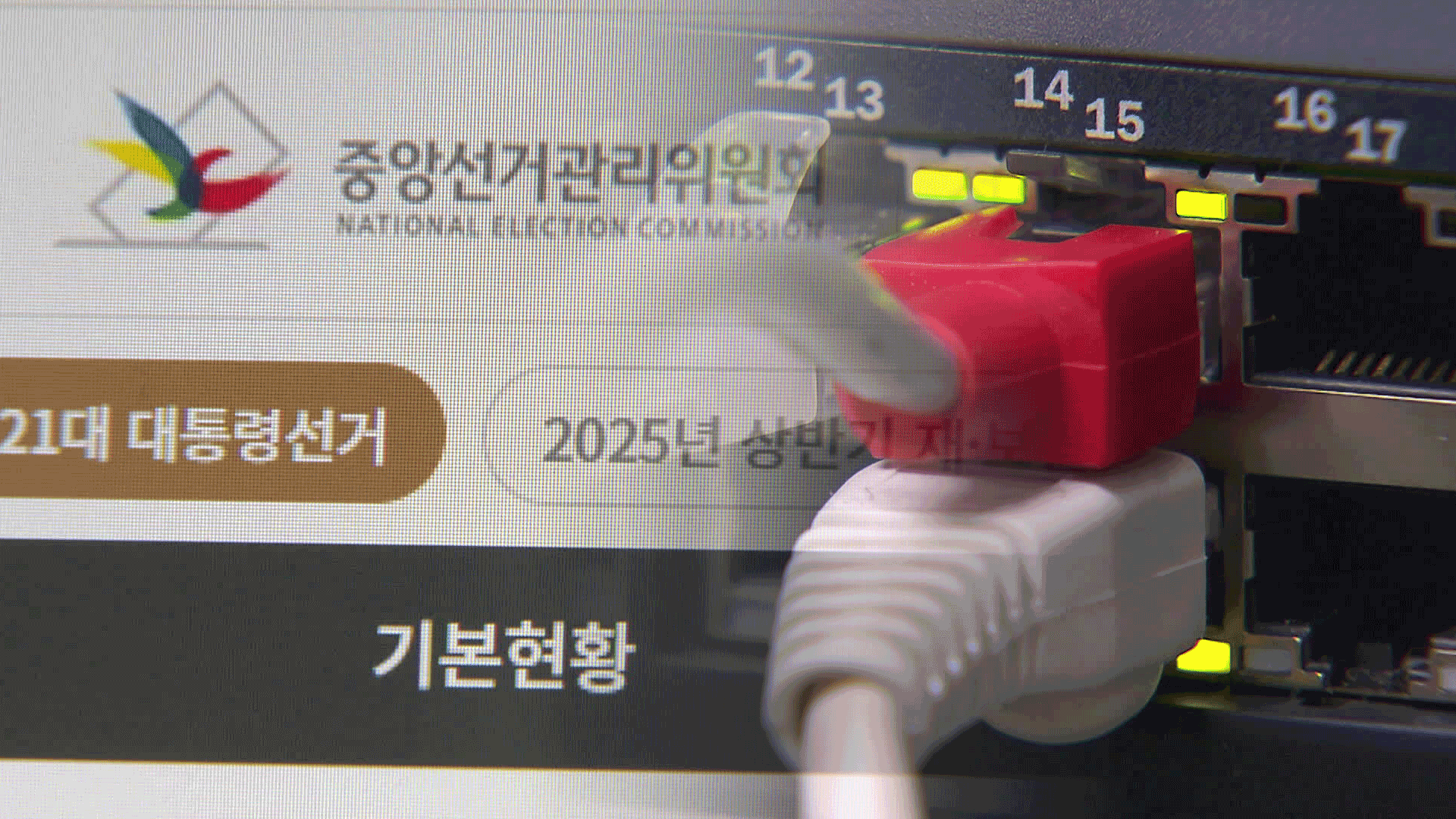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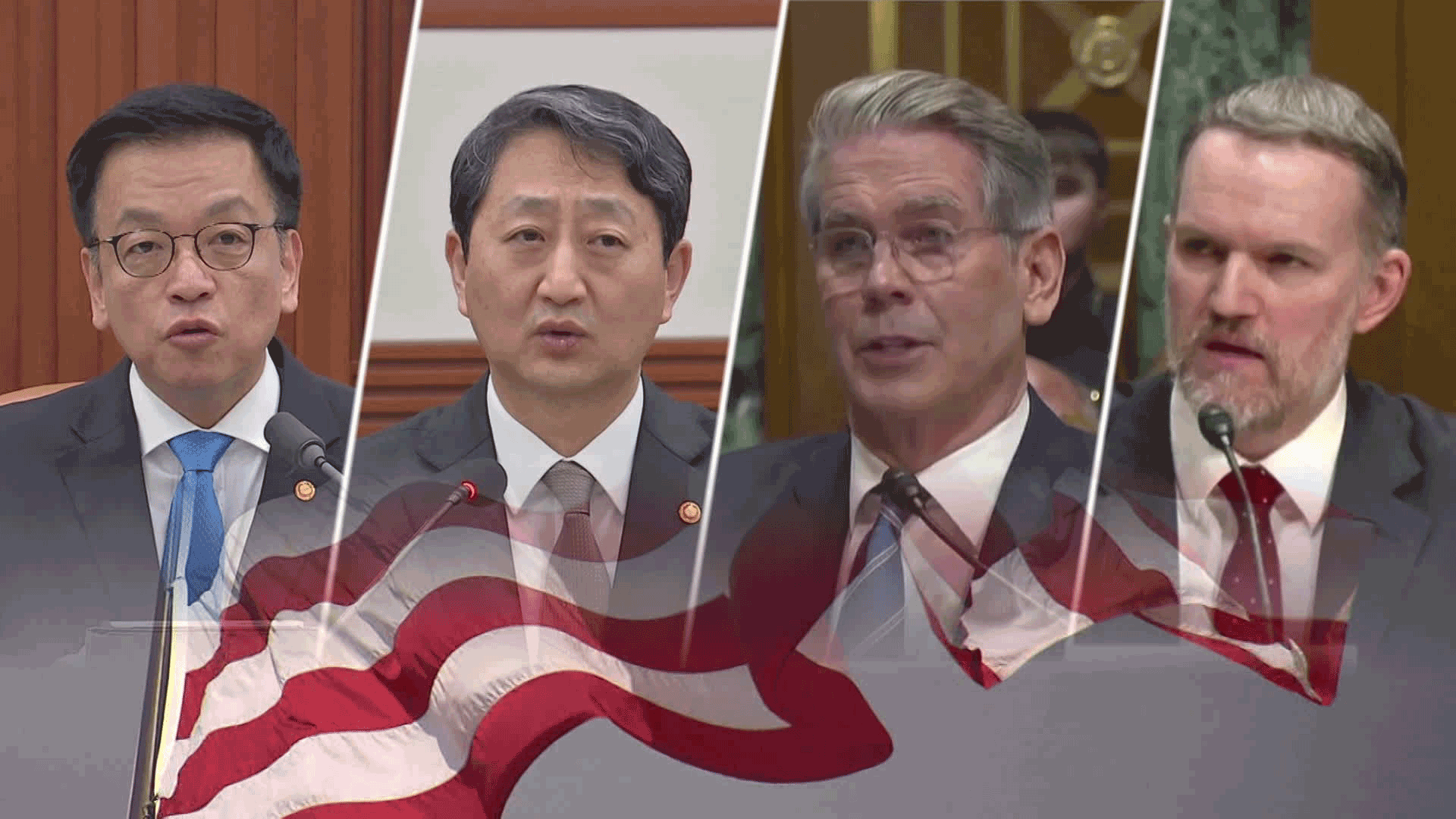
![[단독] 2억으로 10억 아파트 산다…‘지분형 주담대’ 설계 끝](/data/news/2025/04/23/20250423_T1Xfpi.png)
![[단독] 강동구 땅 꺼짐 ‘설계보다 4배 초과 굴착’…지하작업 일지 입수](/data/news/2025/04/23/20250423_If0y5m.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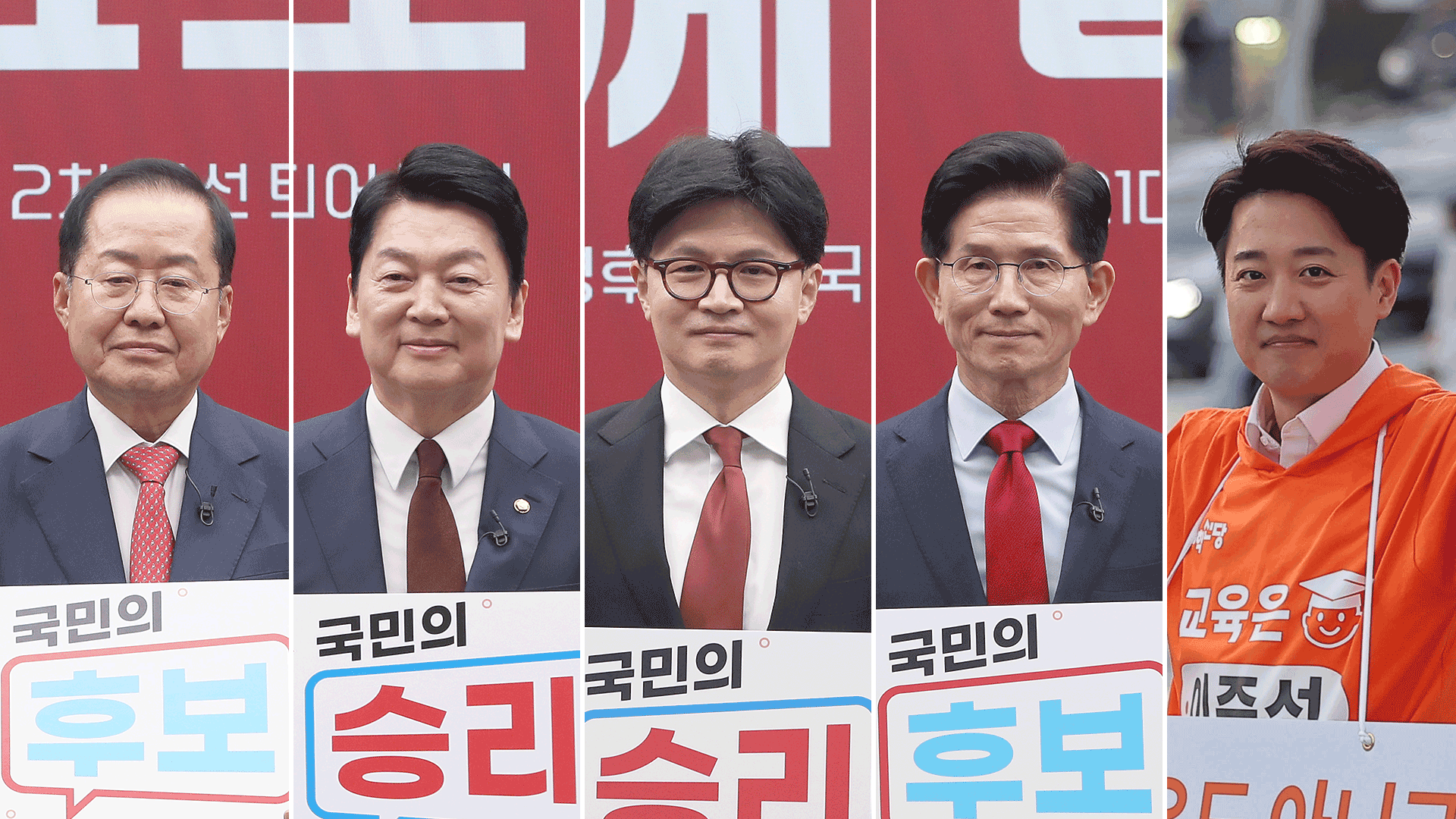
![[이슈픽] 층간소음 갈등이 보복범죄 참극으로](/data/news/title_image/newsmp4/economyconcert/2025/04/22/50_82345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