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도미도는 계속된다
입력 2011.02.27 (13:36)
수정 2011.02.27 (13: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튀니지와 이집트는 전형적인 민주화 시민혁명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이 독재 체제에 항거한 건데요.. 리비아의 경우는 이런 특성에 더해 부족간 대결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성격은 달리하지만 이제 이 지역 민주화 도미노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느낌입니다. 1989년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진 것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리비아 사태의 원인과 파장을 함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리비아는 튀니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데도 예멘과 바레인까지 시위가 확산된 뒤에야 비로소 반정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 정권은 아랍권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시작되자 내외신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관련 소식을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에 트위터와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용인구 부족으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시위 확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독특한 지배체제도 시위가 한발 늦게 시작되는데 원인이 됐습니다. 리비아에선 국내 문제나 지역 문제가 부족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첸커(워싱턴연구소): “리비아의 특징은 정부 기관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단지 부족들과 몇몇 지역 위원회만 있을 뿐이죠."
리비아 사태는 카다피의 42년 독재와 권력의 세습기도,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에 대한 리비아 민중의 분노로 촉발됐습니다.
<녹취> 누레딘 제브노운 교수(조지타운대): "카다피 정권을 축출하려는 것은 카다피가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공한 것이라곤 족벌주의, 부패, 테러와 부족 제도뿐이죠."
이점은 이집트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부족 간 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카다피는 집권 이후 자신의 부족인 카다파 출신 인사나 지지 부족에게 정부와 보안군의 주요 보직을 맡겼습니다.
이를 통해 카다파 부족 등 지지 세력들은 급성장한 반면 반대 부족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반대 세력인 와르팔라와 알주와야 부족에겐 오일머니와 공직진출에서 소외시켜 불만이 누적돼 왔습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 사태는 이집트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는 군부가 엄정중립을 유지한 데 반해 카다피는 혁명수비대와 보안군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호위하는 혁명수비대는 최대 11000명에 이르며 최신예 전투기 등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사병격인 보안군도 카다피의 셋째와 넷째, 일곱째 아들들이 정예부대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카다피가 동원할 수 있는 군병력만 11만여 명. 전체 인구가 640만 명임을 감안하면 60명 중 1명이 카다피의 사병인 셈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반정부 세력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알 이슬람 카다피(카다피 차남):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리비아는 내전에 들어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분열될 것입니다."
문제는 군과 정부에서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시위대에 대한 폭격을 거부한 채 다른 나라로 날아갔고, 측근이 카다피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다피가 군과 정부를 얼마나 오래 장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서방세계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것도 이집트와 다른 점입니다. 카다피 정권은 지난 20여년 간 미국과 외교관계를 중단한 채 지내오다 2006년에야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원유로 인해 서방국가들이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카다피는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사임 요구를 일축하고 오히려 시위대에 강경 진압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카다피(리비아 국가원수): "위대한 조상에 부끄러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엔 그의 옆에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카다피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사회가 세르비아의 경우처럼 연합군을 투입해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제 공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 정부 시위에 나선 각 부족들은 카다피에 반기를 든 정부군의 도움을 받아 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 카다피 부족들이 어떤 경로로든 무기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설 경우, 리비아는 내전의 장기화라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녹취> 제임스 필립스(헤리티지 재단): "리비아 민중은 카다피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각 지역마다 제 갈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카다피를 지지하는 트리폴리와 반대하는 벵가지 주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이제 리비아 다음 국가가 어디냐에 쏠려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불만 정도만 놓고 보면 시리아, 이라크, 예멘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가장 눈여겨볼 국가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민주화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며 부패지수도 50위 권을 기록하고 있어
반정부 시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정당체제를 폭압적으로 유지하면서 왕족 일가가 정부의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고 재산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무바라크 일가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가가 무너질 경우 나머지 아랍국가에서 자동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아랍권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국가는 튀지지와 이집트 등 6개 국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진 큰 움직임이 없는 국가는 사우디와 오만 등 모두 16개 국가에 이릅니다.
이들 국가 모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세계 역사를 뒤바꿀 변화가 시작됐다며 아랍국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는 전형적인 민주화 시민혁명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이 독재 체제에 항거한 건데요.. 리비아의 경우는 이런 특성에 더해 부족간 대결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성격은 달리하지만 이제 이 지역 민주화 도미노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느낌입니다. 1989년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진 것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리비아 사태의 원인과 파장을 함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리비아는 튀니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데도 예멘과 바레인까지 시위가 확산된 뒤에야 비로소 반정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 정권은 아랍권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시작되자 내외신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관련 소식을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에 트위터와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용인구 부족으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시위 확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독특한 지배체제도 시위가 한발 늦게 시작되는데 원인이 됐습니다. 리비아에선 국내 문제나 지역 문제가 부족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첸커(워싱턴연구소): “리비아의 특징은 정부 기관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단지 부족들과 몇몇 지역 위원회만 있을 뿐이죠."
리비아 사태는 카다피의 42년 독재와 권력의 세습기도,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에 대한 리비아 민중의 분노로 촉발됐습니다.
<녹취> 누레딘 제브노운 교수(조지타운대): "카다피 정권을 축출하려는 것은 카다피가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공한 것이라곤 족벌주의, 부패, 테러와 부족 제도뿐이죠."
이점은 이집트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부족 간 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카다피는 집권 이후 자신의 부족인 카다파 출신 인사나 지지 부족에게 정부와 보안군의 주요 보직을 맡겼습니다.
이를 통해 카다파 부족 등 지지 세력들은 급성장한 반면 반대 부족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반대 세력인 와르팔라와 알주와야 부족에겐 오일머니와 공직진출에서 소외시켜 불만이 누적돼 왔습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 사태는 이집트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는 군부가 엄정중립을 유지한 데 반해 카다피는 혁명수비대와 보안군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호위하는 혁명수비대는 최대 11000명에 이르며 최신예 전투기 등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사병격인 보안군도 카다피의 셋째와 넷째, 일곱째 아들들이 정예부대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카다피가 동원할 수 있는 군병력만 11만여 명. 전체 인구가 640만 명임을 감안하면 60명 중 1명이 카다피의 사병인 셈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반정부 세력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알 이슬람 카다피(카다피 차남):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리비아는 내전에 들어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분열될 것입니다."
문제는 군과 정부에서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시위대에 대한 폭격을 거부한 채 다른 나라로 날아갔고, 측근이 카다피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다피가 군과 정부를 얼마나 오래 장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서방세계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것도 이집트와 다른 점입니다. 카다피 정권은 지난 20여년 간 미국과 외교관계를 중단한 채 지내오다 2006년에야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원유로 인해 서방국가들이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카다피는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사임 요구를 일축하고 오히려 시위대에 강경 진압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카다피(리비아 국가원수): "위대한 조상에 부끄러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엔 그의 옆에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카다피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사회가 세르비아의 경우처럼 연합군을 투입해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제 공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 정부 시위에 나선 각 부족들은 카다피에 반기를 든 정부군의 도움을 받아 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 카다피 부족들이 어떤 경로로든 무기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설 경우, 리비아는 내전의 장기화라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녹취> 제임스 필립스(헤리티지 재단): "리비아 민중은 카다피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각 지역마다 제 갈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카다피를 지지하는 트리폴리와 반대하는 벵가지 주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이제 리비아 다음 국가가 어디냐에 쏠려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불만 정도만 놓고 보면 시리아, 이라크, 예멘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가장 눈여겨볼 국가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민주화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며 부패지수도 50위 권을 기록하고 있어
반정부 시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정당체제를 폭압적으로 유지하면서 왕족 일가가 정부의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고 재산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무바라크 일가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가가 무너질 경우 나머지 아랍국가에서 자동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아랍권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국가는 튀지지와 이집트 등 6개 국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진 큰 움직임이 없는 국가는 사우디와 오만 등 모두 16개 국가에 이릅니다.
이들 국가 모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세계 역사를 뒤바꿀 변화가 시작됐다며 아랍국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화 도미도는 계속된다
-
- 입력 2011-02-27 13:36:50
- 수정2011-02-27 13:40:31

vd
<앵커 멘트>
튀니지와 이집트는 전형적인 민주화 시민혁명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박탈당한 국민이 독재 체제에 항거한 건데요.. 리비아의 경우는 이런 특성에 더해 부족간 대결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성격은 달리하지만 이제 이 지역 민주화 도미노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느낌입니다. 1989년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진 것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리비아 사태의 원인과 파장을 함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리비아는 튀니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데도 예멘과 바레인까지 시위가 확산된 뒤에야 비로소 반정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 정권은 아랍권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시작되자 내외신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 관련 소식을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에 트위터와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용인구 부족으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시위 확산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독특한 지배체제도 시위가 한발 늦게 시작되는데 원인이 됐습니다. 리비아에선 국내 문제나 지역 문제가 부족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첸커(워싱턴연구소): “리비아의 특징은 정부 기관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부 기관이 없습니다. 단지 부족들과 몇몇 지역 위원회만 있을 뿐이죠."
리비아 사태는 카다피의 42년 독재와 권력의 세습기도,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에 대한 리비아 민중의 분노로 촉발됐습니다.
<녹취> 누레딘 제브노운 교수(조지타운대): "카다피 정권을 축출하려는 것은 카다피가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공한 것이라곤 족벌주의, 부패, 테러와 부족 제도뿐이죠."
이점은 이집트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배경에는 부족 간 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카다피는 집권 이후 자신의 부족인 카다파 출신 인사나 지지 부족에게 정부와 보안군의 주요 보직을 맡겼습니다.
이를 통해 카다파 부족 등 지지 세력들은 급성장한 반면 반대 부족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반대 세력인 와르팔라와 알주와야 부족에겐 오일머니와 공직진출에서 소외시켜 불만이 누적돼 왔습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 사태는 이집트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는 군부가 엄정중립을 유지한 데 반해 카다피는 혁명수비대와 보안군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호위하는 혁명수비대는 최대 11000명에 이르며 최신예 전투기 등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있습니다.
사병격인 보안군도 카다피의 셋째와 넷째, 일곱째 아들들이 정예부대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카다피가 동원할 수 있는 군병력만 11만여 명. 전체 인구가 640만 명임을 감안하면 60명 중 1명이 카다피의 사병인 셈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 반정부 세력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알 이슬람 카다피(카다피 차남):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리비아는 내전에 들어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분열될 것입니다."
문제는 군과 정부에서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시위대에 대한 폭격을 거부한 채 다른 나라로 날아갔고, 측근이 카다피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다피가 군과 정부를 얼마나 오래 장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서방세계의 개입 여지가 적다는 것도 이집트와 다른 점입니다. 카다피 정권은 지난 20여년 간 미국과 외교관계를 중단한 채 지내오다 2006년에야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리비아가 보유한 풍부한 원유로 인해 서방국가들이 섣불리 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카다피는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사임 요구를 일축하고 오히려 시위대에 강경 진압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카다피(리비아 국가원수): "위대한 조상에 부끄러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엔 그의 옆에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카다피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사회가 세르비아의 경우처럼 연합군을 투입해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제 공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 정부 시위에 나선 각 부족들은 카다피에 반기를 든 정부군의 도움을 받아 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 카다피 부족들이 어떤 경로로든 무기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저항에 나설 경우, 리비아는 내전의 장기화라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녹취> 제임스 필립스(헤리티지 재단): "리비아 민중은 카다피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각 지역마다 제 갈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카다피를 지지하는 트리폴리와 반대하는 벵가지 주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이제 리비아 다음 국가가 어디냐에 쏠려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불만 정도만 놓고 보면 시리아, 이라크, 예멘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가장 눈여겨볼 국가는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민주화 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며 부패지수도 50위 권을 기록하고 있어
반정부 시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정당체제를 폭압적으로 유지하면서 왕족 일가가 정부의 주요 직책을 독차지하고 재산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무바라크 일가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가가 무너질 경우 나머지 아랍국가에서 자동으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아랍권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국가는 튀지지와 이집트 등 6개 국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진 큰 움직임이 없는 국가는 사우디와 오만 등 모두 16개 국가에 이릅니다.
이들 국가 모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세계 역사를 뒤바꿀 변화가 시작됐다며 아랍국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월드리포트] 범죄 온상 ‘파벨라’의 변신](https://news.kbs.co.kr/data/news/2011/02/27/_QrU.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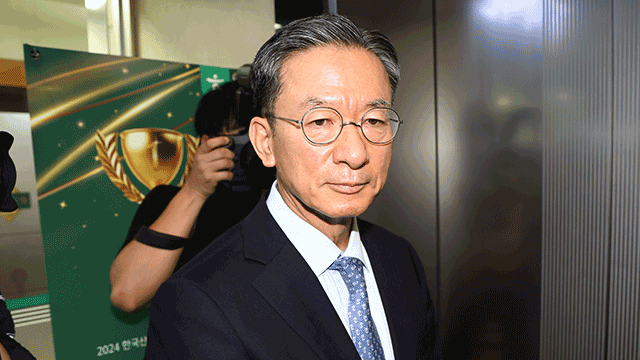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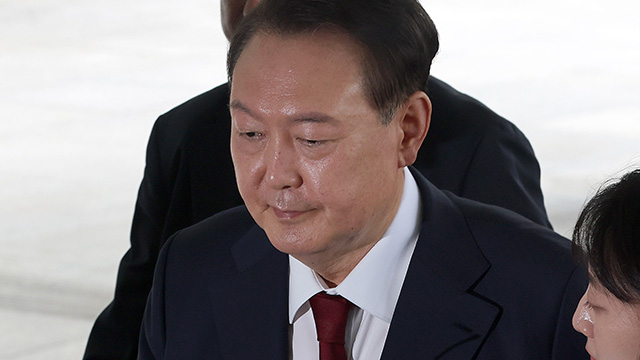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