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20미터 이상 파여 보의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끝난 낙동강 함안보,
그러나 보 하류에선 여전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침식되는 이른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하천 바닥보호공을 새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하류 100m 지점에서 강바닥이 21m가량 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침식이 계속되면 연쇄적으로 상류의 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함안보 규모가 대형 댐에 해당하는데도 댐 설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설계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황인철(녹색연합 팀장) : "작은 보의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닥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수자원 공사 측은 지난 여름, 수문 3개 가운데 2개만 개방해 물살이 빨라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강바닥이 깎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함안보는 3천여 개의 말뚝이 암반층까지 박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닥보호공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취재진의 촬영을 본사에서는 허용하고서도 현장에서는 막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 3개를 모두 열더라도 세굴현상이 일어나 보의 안전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박창근(교수/관동대학교) : "모래가 유실됐을 경우에는 기둥들이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다음주부터 함안보의 안전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함철입니다.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20미터 이상 파여 보의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끝난 낙동강 함안보,
그러나 보 하류에선 여전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침식되는 이른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하천 바닥보호공을 새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하류 100m 지점에서 강바닥이 21m가량 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침식이 계속되면 연쇄적으로 상류의 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함안보 규모가 대형 댐에 해당하는데도 댐 설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설계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황인철(녹색연합 팀장) : "작은 보의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닥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수자원 공사 측은 지난 여름, 수문 3개 가운데 2개만 개방해 물살이 빨라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강바닥이 깎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함안보는 3천여 개의 말뚝이 암반층까지 박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닥보호공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취재진의 촬영을 본사에서는 허용하고서도 현장에서는 막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 3개를 모두 열더라도 세굴현상이 일어나 보의 안전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박창근(교수/관동대학교) : "모래가 유실됐을 경우에는 기둥들이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다음주부터 함안보의 안전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함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낙동강 함안보, 세굴현상 안전성 논란
-
- 입력 2012-02-29 07:03:49

<앵커 멘트>
낙동강 함안보 아래 강바닥이 20미터 이상 파여 보의 안전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함 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끝난 낙동강 함안보,
그러나 보 하류에선 여전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침식되는 이른바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하천 바닥보호공을 새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하류 100m 지점에서 강바닥이 21m가량 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침식이 계속되면 연쇄적으로 상류의 보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함안보 규모가 대형 댐에 해당하는데도 댐 설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설계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황인철(녹색연합 팀장) : "작은 보의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닥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수자원 공사 측은 지난 여름, 수문 3개 가운데 2개만 개방해 물살이 빨라지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강바닥이 깎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함안보는 3천여 개의 말뚝이 암반층까지 박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닥보호공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취재진의 촬영을 본사에서는 허용하고서도 현장에서는 막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문 3개를 모두 열더라도 세굴현상이 일어나 보의 안전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박창근(교수/관동대학교) : "모래가 유실됐을 경우에는 기둥들이 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다음주부터 함안보의 안전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함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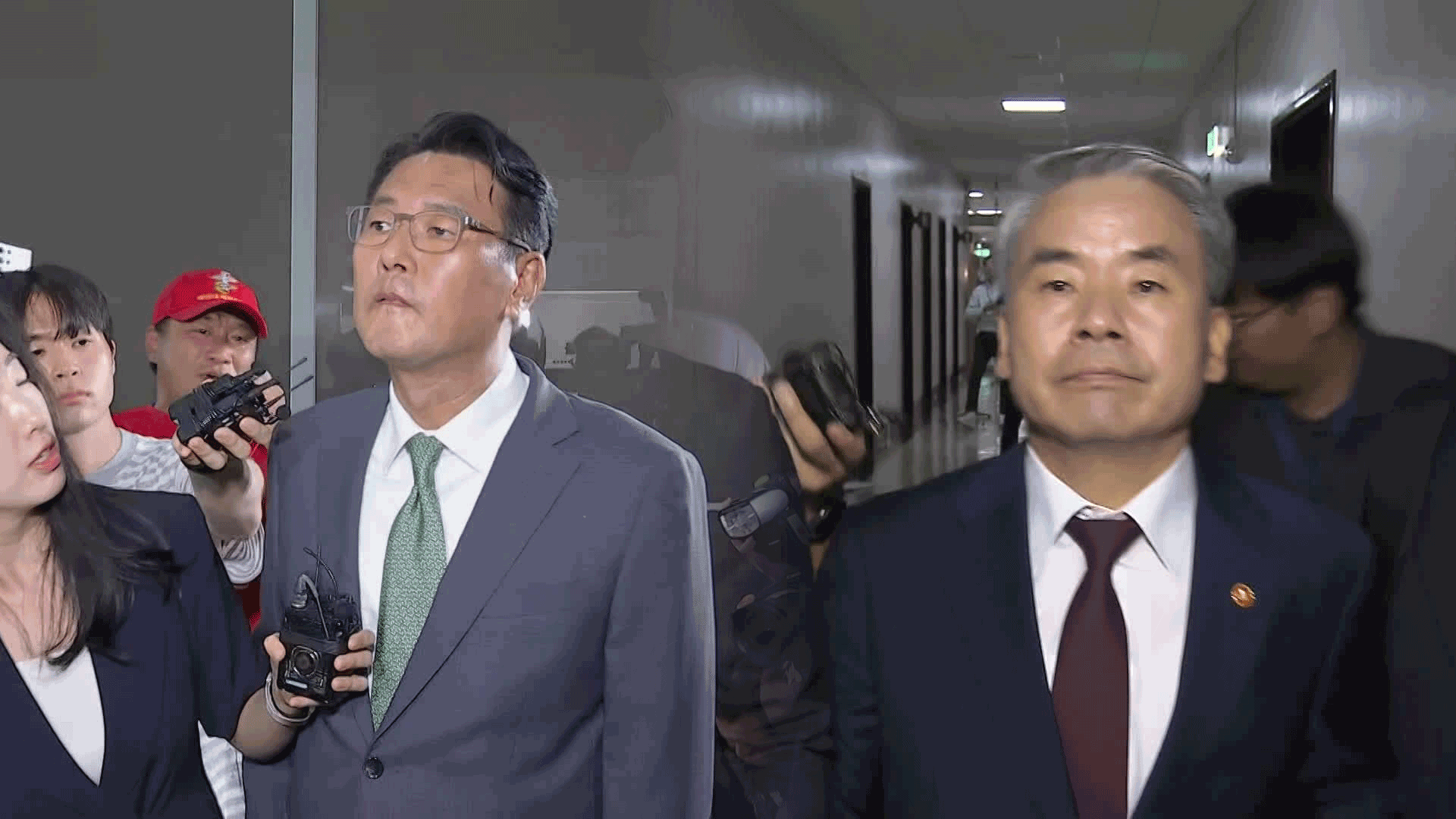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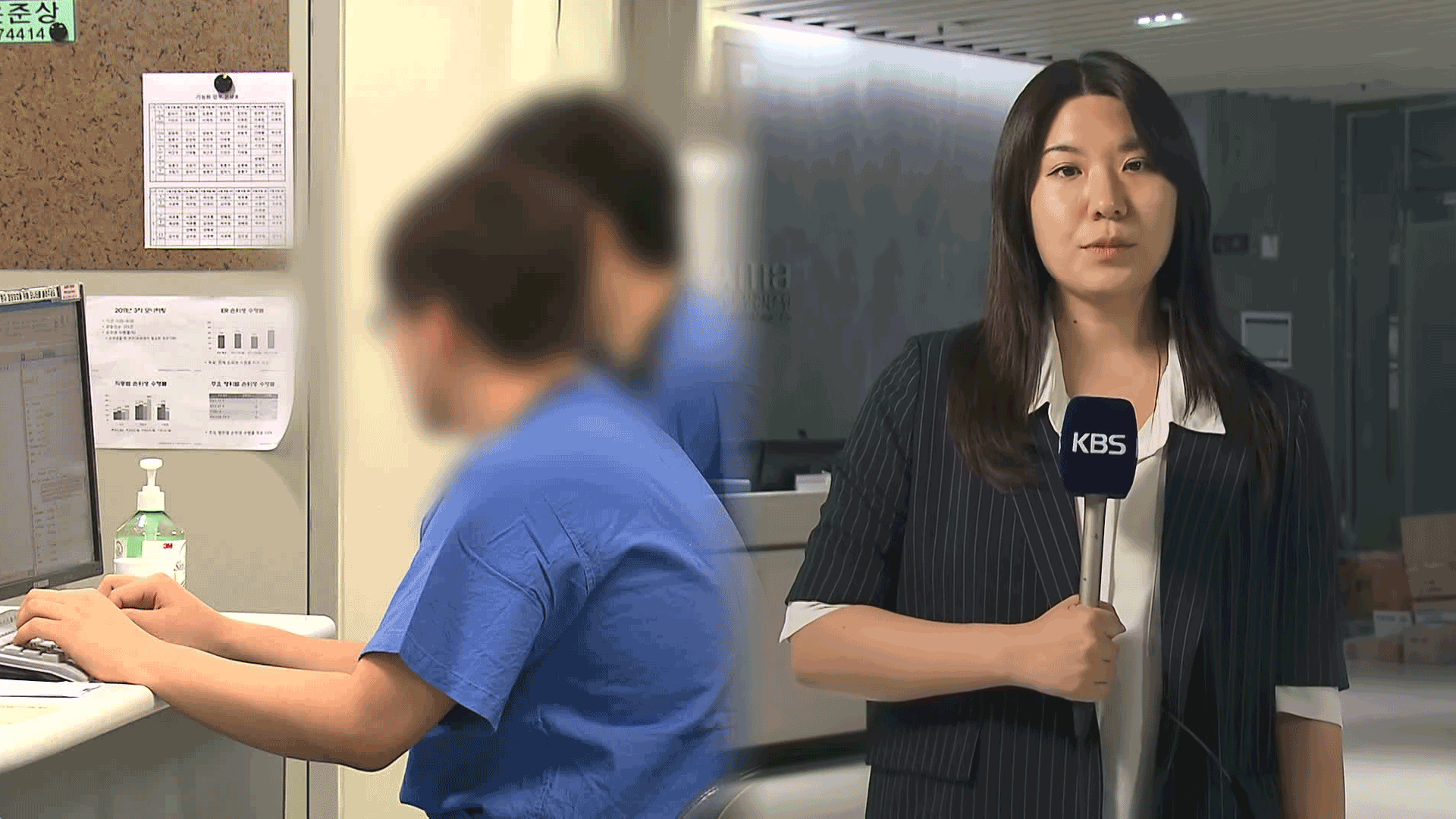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