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추억 속 직업, 우리가 이어가요!
입력 2013.04.25 (08:42)
수정 2013.04.25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옛날에는 참 흔했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나브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런 것들은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에서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 방식을 지키면서 삶에 '옛 향수'를 선물하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노태영 기자, 그때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직업인들이 있다고요?
<기자 멘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직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모두 30여 개의 직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옛날 직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옛것은 쉽게 사라지고 새것이 금방 그 자리를 채우는 요즘.
세월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일터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과 싸우며 반세기 동안 대장간을 지켜온 사람.
평생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류상준 씨입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요즘엔 농사철이니까 호미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괭이 쇠스랑 뭐 이런 거 많이 나가죠”
고된 작업이 계속되는 대장간 일. 농기구부터 공구까지.
류상준 씨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데요.
덕분에 언제나 이곳엔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하나를 만들어도 꼼꼼히 만들어주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동생과 함께 일하게 된 류상준 씨. 어린 시절에 대장간 풍경을 보고 나서 대장장이가 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아저씨는 쇠를 불에 집어넣으면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배우게 됐습니다.”
대장장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기계의 힘도 빌리게 됐지만, 여전히 가게엔 오래된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바뀌면서, 대장장이처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진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길안내도 해주고, 도우미 역할도 했던 버스 안내원! 이젠 볼 수 없는 직업인데요.
버스 차장, 또는 버스 안내양으로 불리던 버스안내원이 충남 태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늘 미소로 승객과 만나는 주인공.
2006년부터 버스 안내원으로 일한 모은숙 씨입니다.
예전에 언니들이 버스안내원을 하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던 은숙 씨.
<녹취> "안녕하세요"
이젠 어엿한 버스안내원으로 제 몫을 다합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정을 쌓고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화자(충남 태안군 근흥면) : "(버스를 탈 때) 어른들이 짐을 가지고 오면 잘 들어주고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노인분들은 기분 좋잖아요."
짐을 들어주는 일 말고도, 버스안내원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승객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안내해주는가 하면.
직접 요금을 받아 거스름돈을 챙겨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버스 안내원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버스를 타고나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금을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받아요."
버스는 추억을 싣고~ 버스 안내원은 미소를 싣고~ 오늘도 힘차게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어려우신 분들 (내리기 편하게) 내려드리고 거동 못하시는 분들 부축해드리고 그리고 거기 한 번 더 서비스로 (친절하게) 미소를 더합니다."
가게 밖은 물론이고 가게 안도 들어서자마자 타임머신을 탄 듯, 60,70년대 정취가 느껴지는 서울의 한 이발소.
35년을 한결같이 이발사 일을 해온 임근묵 씨의 일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손때 묻은 도구로 면도하는 모습하며, 물뿌리개로 머리를 감는 것까지.
모두 옛날 방식 그 대롭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 가게는 45년 정도 됐는데요. 아버님에 이어서 제가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발용품 하나하나도 옛날부터 쓰던 물품을 고스란히 쓰고 있습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도 한 45년쯤 됐습니다. 면도용 컵도 30년 가까이 됐고요.의자도 전부 20년 됐어요."
세월 따라 변한 건 바로 요금!
가게 문을 열던 45년 전 120원 했던 요금이 지금은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금이 오르고 세월이 변했어도, 단골손님들은 언제나 이 가게만 찾습니다.
<인터뷰> 이은명(서울시 신길동) : "(이 가게에 드나든 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다른 데 가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가게만 다녔죠.”
수십 년 동안 이발사와 손님으로 만난 사람들.
이젠 한 가족 같은데요.
이발사가 알아서, 손님들의 스타일을 척척 맞춰주면.
손님들은 스스로, 마무리 손질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인터뷰> 임근묵(이발사) : "옛날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발소에 오셔서) 옛날 향수도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옛날 직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때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가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참 흔했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나브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런 것들은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에서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 방식을 지키면서 삶에 '옛 향수'를 선물하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노태영 기자, 그때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직업인들이 있다고요?
<기자 멘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직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모두 30여 개의 직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옛날 직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옛것은 쉽게 사라지고 새것이 금방 그 자리를 채우는 요즘.
세월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일터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과 싸우며 반세기 동안 대장간을 지켜온 사람.
평생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류상준 씨입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요즘엔 농사철이니까 호미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괭이 쇠스랑 뭐 이런 거 많이 나가죠”
고된 작업이 계속되는 대장간 일. 농기구부터 공구까지.
류상준 씨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데요.
덕분에 언제나 이곳엔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하나를 만들어도 꼼꼼히 만들어주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동생과 함께 일하게 된 류상준 씨. 어린 시절에 대장간 풍경을 보고 나서 대장장이가 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아저씨는 쇠를 불에 집어넣으면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배우게 됐습니다.”
대장장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기계의 힘도 빌리게 됐지만, 여전히 가게엔 오래된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바뀌면서, 대장장이처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진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길안내도 해주고, 도우미 역할도 했던 버스 안내원! 이젠 볼 수 없는 직업인데요.
버스 차장, 또는 버스 안내양으로 불리던 버스안내원이 충남 태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늘 미소로 승객과 만나는 주인공.
2006년부터 버스 안내원으로 일한 모은숙 씨입니다.
예전에 언니들이 버스안내원을 하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던 은숙 씨.
<녹취> "안녕하세요"
이젠 어엿한 버스안내원으로 제 몫을 다합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정을 쌓고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화자(충남 태안군 근흥면) : "(버스를 탈 때) 어른들이 짐을 가지고 오면 잘 들어주고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노인분들은 기분 좋잖아요."
짐을 들어주는 일 말고도, 버스안내원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승객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안내해주는가 하면.
직접 요금을 받아 거스름돈을 챙겨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버스 안내원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버스를 타고나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금을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받아요."
버스는 추억을 싣고~ 버스 안내원은 미소를 싣고~ 오늘도 힘차게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어려우신 분들 (내리기 편하게) 내려드리고 거동 못하시는 분들 부축해드리고 그리고 거기 한 번 더 서비스로 (친절하게) 미소를 더합니다."
가게 밖은 물론이고 가게 안도 들어서자마자 타임머신을 탄 듯, 60,70년대 정취가 느껴지는 서울의 한 이발소.
35년을 한결같이 이발사 일을 해온 임근묵 씨의 일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손때 묻은 도구로 면도하는 모습하며, 물뿌리개로 머리를 감는 것까지.
모두 옛날 방식 그 대롭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 가게는 45년 정도 됐는데요. 아버님에 이어서 제가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발용품 하나하나도 옛날부터 쓰던 물품을 고스란히 쓰고 있습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도 한 45년쯤 됐습니다. 면도용 컵도 30년 가까이 됐고요.의자도 전부 20년 됐어요."
세월 따라 변한 건 바로 요금!
가게 문을 열던 45년 전 120원 했던 요금이 지금은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금이 오르고 세월이 변했어도, 단골손님들은 언제나 이 가게만 찾습니다.
<인터뷰> 이은명(서울시 신길동) : "(이 가게에 드나든 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다른 데 가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가게만 다녔죠.”
수십 년 동안 이발사와 손님으로 만난 사람들.
이젠 한 가족 같은데요.
이발사가 알아서, 손님들의 스타일을 척척 맞춰주면.
손님들은 스스로, 마무리 손질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인터뷰> 임근묵(이발사) : "옛날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발소에 오셔서) 옛날 향수도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옛날 직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때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가 느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제포착] 추억 속 직업, 우리가 이어가요!
-
- 입력 2013-04-25 08:44:12
- 수정2013-04-25 10:33:35

<앵커 멘트>
옛날에는 참 흔했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나브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런 것들은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에서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 방식을 지키면서 삶에 '옛 향수'를 선물하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노태영 기자, 그때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직업인들이 있다고요?
<기자 멘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직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모두 30여 개의 직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옛날 직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옛것은 쉽게 사라지고 새것이 금방 그 자리를 채우는 요즘.
세월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일터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과 싸우며 반세기 동안 대장간을 지켜온 사람.
평생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류상준 씨입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요즘엔 농사철이니까 호미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괭이 쇠스랑 뭐 이런 거 많이 나가죠”
고된 작업이 계속되는 대장간 일. 농기구부터 공구까지.
류상준 씨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데요.
덕분에 언제나 이곳엔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하나를 만들어도 꼼꼼히 만들어주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동생과 함께 일하게 된 류상준 씨. 어린 시절에 대장간 풍경을 보고 나서 대장장이가 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아저씨는 쇠를 불에 집어넣으면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배우게 됐습니다.”
대장장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기계의 힘도 빌리게 됐지만, 여전히 가게엔 오래된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바뀌면서, 대장장이처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진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길안내도 해주고, 도우미 역할도 했던 버스 안내원! 이젠 볼 수 없는 직업인데요.
버스 차장, 또는 버스 안내양으로 불리던 버스안내원이 충남 태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늘 미소로 승객과 만나는 주인공.
2006년부터 버스 안내원으로 일한 모은숙 씨입니다.
예전에 언니들이 버스안내원을 하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던 은숙 씨.
<녹취> "안녕하세요"
이젠 어엿한 버스안내원으로 제 몫을 다합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정을 쌓고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화자(충남 태안군 근흥면) : "(버스를 탈 때) 어른들이 짐을 가지고 오면 잘 들어주고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노인분들은 기분 좋잖아요."
짐을 들어주는 일 말고도, 버스안내원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승객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안내해주는가 하면.
직접 요금을 받아 거스름돈을 챙겨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버스 안내원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버스를 타고나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금을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받아요."
버스는 추억을 싣고~ 버스 안내원은 미소를 싣고~ 오늘도 힘차게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어려우신 분들 (내리기 편하게) 내려드리고 거동 못하시는 분들 부축해드리고 그리고 거기 한 번 더 서비스로 (친절하게) 미소를 더합니다."
가게 밖은 물론이고 가게 안도 들어서자마자 타임머신을 탄 듯, 60,70년대 정취가 느껴지는 서울의 한 이발소.
35년을 한결같이 이발사 일을 해온 임근묵 씨의 일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손때 묻은 도구로 면도하는 모습하며, 물뿌리개로 머리를 감는 것까지.
모두 옛날 방식 그 대롭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 가게는 45년 정도 됐는데요. 아버님에 이어서 제가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발용품 하나하나도 옛날부터 쓰던 물품을 고스란히 쓰고 있습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도 한 45년쯤 됐습니다. 면도용 컵도 30년 가까이 됐고요.의자도 전부 20년 됐어요."
세월 따라 변한 건 바로 요금!
가게 문을 열던 45년 전 120원 했던 요금이 지금은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금이 오르고 세월이 변했어도, 단골손님들은 언제나 이 가게만 찾습니다.
<인터뷰> 이은명(서울시 신길동) : "(이 가게에 드나든 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다른 데 가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가게만 다녔죠.”
수십 년 동안 이발사와 손님으로 만난 사람들.
이젠 한 가족 같은데요.
이발사가 알아서, 손님들의 스타일을 척척 맞춰주면.
손님들은 스스로, 마무리 손질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인터뷰> 임근묵(이발사) : "옛날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발소에 오셔서) 옛날 향수도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옛날 직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때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가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참 흔했던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나브로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런 것들은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에서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 방식을 지키면서 삶에 '옛 향수'를 선물하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노태영 기자, 그때 그 시절을 살고 있는 직업인들이 있다고요?
<기자 멘트>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직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모두 30여 개의 직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옛날 직업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옛것은 쉽게 사라지고 새것이 금방 그 자리를 채우는 요즘.
세월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일터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과 싸우며 반세기 동안 대장간을 지켜온 사람.
평생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류상준 씨입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요즘엔 농사철이니까 호미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괭이 쇠스랑 뭐 이런 거 많이 나가죠”
고된 작업이 계속되는 대장간 일. 농기구부터 공구까지.
류상준 씨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데요.
덕분에 언제나 이곳엔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하나를 만들어도 꼼꼼히 만들어주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동생과 함께 일하게 된 류상준 씨. 어린 시절에 대장간 풍경을 보고 나서 대장장이가 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류상준(대장간 운영) : "우리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아저씨는 쇠를 불에 집어넣으면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배우게 됐습니다.”
대장장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기계의 힘도 빌리게 됐지만, 여전히 가게엔 오래된 도구들이 가득한데요.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바뀌면서, 대장장이처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진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길안내도 해주고, 도우미 역할도 했던 버스 안내원! 이젠 볼 수 없는 직업인데요.
버스 차장, 또는 버스 안내양으로 불리던 버스안내원이 충남 태안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늘 미소로 승객과 만나는 주인공.
2006년부터 버스 안내원으로 일한 모은숙 씨입니다.
예전에 언니들이 버스안내원을 하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던 은숙 씨.
<녹취> "안녕하세요"
이젠 어엿한 버스안내원으로 제 몫을 다합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정을 쌓고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화자(충남 태안군 근흥면) : "(버스를 탈 때) 어른들이 짐을 가지고 오면 잘 들어주고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잘 가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노인분들은 기분 좋잖아요."
짐을 들어주는 일 말고도, 버스안내원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승객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안내해주는가 하면.
직접 요금을 받아 거스름돈을 챙겨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그 옛날, 버스 안내원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버스를 타고나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금을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미리 받아요."
버스는 추억을 싣고~ 버스 안내원은 미소를 싣고~ 오늘도 힘차게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인터뷰> 모은숙(버스 안내원) : "어려우신 분들 (내리기 편하게) 내려드리고 거동 못하시는 분들 부축해드리고 그리고 거기 한 번 더 서비스로 (친절하게) 미소를 더합니다."
가게 밖은 물론이고 가게 안도 들어서자마자 타임머신을 탄 듯, 60,70년대 정취가 느껴지는 서울의 한 이발소.
35년을 한결같이 이발사 일을 해온 임근묵 씨의 일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손때 묻은 도구로 면도하는 모습하며, 물뿌리개로 머리를 감는 것까지.
모두 옛날 방식 그 대롭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 가게는 45년 정도 됐는데요. 아버님에 이어서 제가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발용품 하나하나도 옛날부터 쓰던 물품을 고스란히 쓰고 있습니다.
<녹취> 임근묵(이발사) : "이도 한 45년쯤 됐습니다. 면도용 컵도 30년 가까이 됐고요.의자도 전부 20년 됐어요."
세월 따라 변한 건 바로 요금!
가게 문을 열던 45년 전 120원 했던 요금이 지금은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금이 오르고 세월이 변했어도, 단골손님들은 언제나 이 가게만 찾습니다.
<인터뷰> 이은명(서울시 신길동) : "(이 가게에 드나든 지) 한 20년 가까이 돼요. 다른 데 가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가게만 다녔죠.”
수십 년 동안 이발사와 손님으로 만난 사람들.
이젠 한 가족 같은데요.
이발사가 알아서, 손님들의 스타일을 척척 맞춰주면.
손님들은 스스로, 마무리 손질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인터뷰> 임근묵(이발사) : "옛날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이발소에 오셔서) 옛날 향수도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옛날 직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과 일터에서 그때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가 느껴집니다.
-
-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뉴스 따라잡기] 음란물 ‘맞춤 제작’ 판매 덜미](https://news.kbs.co.kr/data/news/2013/04/25/2648958_1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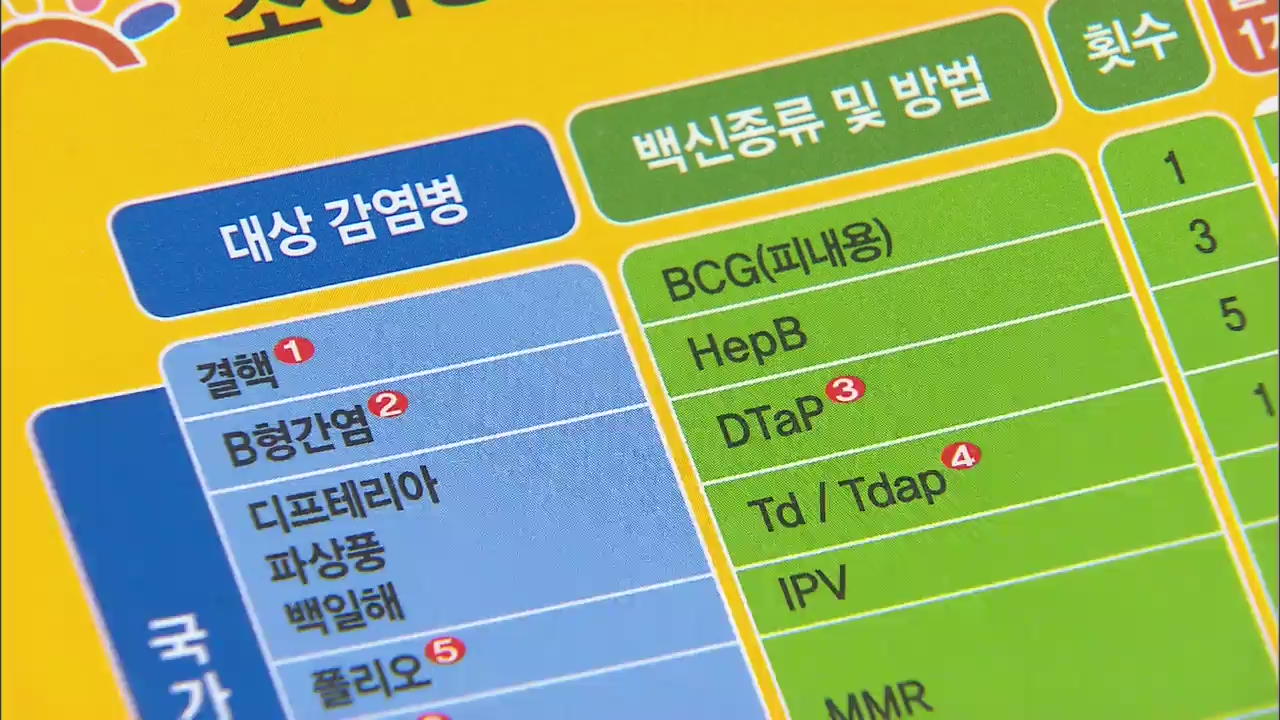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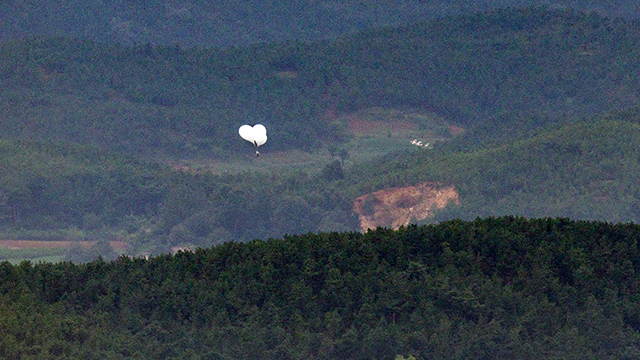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