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지붕’ 알프스, 지구온난화로 신음
입력 2013.07.13 (08:24)
수정 2013.07.13 (2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죠!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바꾼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절경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네요?
온난화에 신음하고 있는 알프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송영석 순회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알프스. 거대한 봉우리에 앉은 만년설은 오랜 세월 알프스만의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해왔습니다.
<인터뷰> 앤디 쿠츠(미국인 관광객) :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화려하기만 한 알프스의 얼굴이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상징인 하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프스와 바로 맞닿아있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그린델발트. 60 평생을 이 곳에서 살아온 아베글렌 씨는 알프스의 변화를 몸소 증언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골짜기가 된 마을 앞산 아래까지 빙하로 덮여있었다는 어린 시절 그녀의 추억이 증거입니다.
<인터뷰> 안네그레트 그루버 아베글렌(스위스 그린델발트 주민) :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산 위의 빙하가 마을까지 뻗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빙하까지 가서 만지고 놀기도 했답니다."
높이 4천미터가 넘는 알프스의 고산 융프라우. 구름에 가려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드물다고 해서 '수줍은 처녀'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융프라우 같은 높은 산들도 지구 온난화의 위세엔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이 녹아 떨어져 나간 빙하의 단면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빙하 아래 절벽을 덮고 있는 눈은 일시적인 것으로 한여름이 되면 녹아 없어집니다.
40여년 만에 검게 변한 마터호른의 얼굴도 알프스 온난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녹아왔습니다.
문제는 녹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의 빙하 감소속도가 1850년부터 1970년까지 120년 간 빙하 감소 속도의 세배나 됩니다.
지난 2006년 여름, 알프스 절경 중 하나인 에이거봉 동쪽 절벽에서 거대한 암괴가 무너져 관광객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사라진 암괴의 높이는 147미터, 5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아 없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 중부 관광도시 인터라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쿠탄넨엔 3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작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난데없이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세 번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났습니다.
<인터뷰> 월터 슬래피(스위스 쿠탄넨 주민) : “3천미터 높이에서 산사태 시작돼 저기 아래까지 쓸고 내려갔습니다. 저 아래 사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산사태가 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산사태의 1차 원인은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은 물이 암석으로 스며든 뒤 얼었다 녹았다 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 산사태를 유발한 겁니다.
산사태가 난 현장 주변 곳곳엔 이처럼 버려진 집들이 눈에 띕니다.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알베르트 폰 베르겐(스위스 쿠탄넨 주민) : “저 뒤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67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알프스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호수들마저도, 산사태가 나면 대규모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대자연의 고통에 미안함을 표하기라도 하듯, 온난화 문제 전문가들은 연구를 위해서라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올라 구멍을 뚫고, 피스톤으로 된 장비를 넣습니다.
쿠탄넨 산사태의 원인이었던 산 암석 내부의 균열이 기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알프스의 대표적인 봉우리마다 피스톤 장비를 설치해 기온과 균열 크기의 관계를 지켜봐온 연구진은 이상 기온 역시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얀 보이텔(스위스 취리히대 알프스온난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눈과 비의 양과 또 얼마나 알맞은 시기에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대신 여름에 비가 온다면 빙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알프스 빙하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2025년쯤 남은 빙하의 절반이 또 사라지고, 2050년쯤엔 알프스의 만년설을 아예 볼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알프스 스키장들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설원을 내달리는 광경은 알프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여름에도 즐겼던 알프스 스키의 낭만은 점차 추억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앞으로 30~40년 뒤면 알프스의 스키장과 리조트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룩말 무늬처럼 듬성듬성 눈으로 덮힌 산은 알프스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만년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이렇게 조금씩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이 스토커(호주인 관광객) : “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30~40년 후엔 (알프스 만년설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만년설이 정말 다 사라진다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겠죠.”
일찌감치 산업화를 이룩한 유럽인들은 100년 전부터 알프스에 철도를 깔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해왔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외화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알프스는 말없이 고통에 신음했고, 아픔은 화려함에 가려져왔습니다.
이젠, 인류가 자연의 희생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알프스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죠!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바꾼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절경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네요?
온난화에 신음하고 있는 알프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송영석 순회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알프스. 거대한 봉우리에 앉은 만년설은 오랜 세월 알프스만의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해왔습니다.
<인터뷰> 앤디 쿠츠(미국인 관광객) :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화려하기만 한 알프스의 얼굴이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상징인 하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프스와 바로 맞닿아있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그린델발트. 60 평생을 이 곳에서 살아온 아베글렌 씨는 알프스의 변화를 몸소 증언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골짜기가 된 마을 앞산 아래까지 빙하로 덮여있었다는 어린 시절 그녀의 추억이 증거입니다.
<인터뷰> 안네그레트 그루버 아베글렌(스위스 그린델발트 주민) :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산 위의 빙하가 마을까지 뻗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빙하까지 가서 만지고 놀기도 했답니다."
높이 4천미터가 넘는 알프스의 고산 융프라우. 구름에 가려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드물다고 해서 '수줍은 처녀'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융프라우 같은 높은 산들도 지구 온난화의 위세엔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이 녹아 떨어져 나간 빙하의 단면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빙하 아래 절벽을 덮고 있는 눈은 일시적인 것으로 한여름이 되면 녹아 없어집니다.
40여년 만에 검게 변한 마터호른의 얼굴도 알프스 온난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녹아왔습니다.
문제는 녹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의 빙하 감소속도가 1850년부터 1970년까지 120년 간 빙하 감소 속도의 세배나 됩니다.
지난 2006년 여름, 알프스 절경 중 하나인 에이거봉 동쪽 절벽에서 거대한 암괴가 무너져 관광객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사라진 암괴의 높이는 147미터, 5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아 없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 중부 관광도시 인터라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쿠탄넨엔 3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작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난데없이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세 번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났습니다.
<인터뷰> 월터 슬래피(스위스 쿠탄넨 주민) : “3천미터 높이에서 산사태 시작돼 저기 아래까지 쓸고 내려갔습니다. 저 아래 사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산사태가 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산사태의 1차 원인은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은 물이 암석으로 스며든 뒤 얼었다 녹았다 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 산사태를 유발한 겁니다.
산사태가 난 현장 주변 곳곳엔 이처럼 버려진 집들이 눈에 띕니다.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알베르트 폰 베르겐(스위스 쿠탄넨 주민) : “저 뒤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67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알프스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호수들마저도, 산사태가 나면 대규모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대자연의 고통에 미안함을 표하기라도 하듯, 온난화 문제 전문가들은 연구를 위해서라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올라 구멍을 뚫고, 피스톤으로 된 장비를 넣습니다.
쿠탄넨 산사태의 원인이었던 산 암석 내부의 균열이 기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알프스의 대표적인 봉우리마다 피스톤 장비를 설치해 기온과 균열 크기의 관계를 지켜봐온 연구진은 이상 기온 역시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얀 보이텔(스위스 취리히대 알프스온난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눈과 비의 양과 또 얼마나 알맞은 시기에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대신 여름에 비가 온다면 빙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알프스 빙하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2025년쯤 남은 빙하의 절반이 또 사라지고, 2050년쯤엔 알프스의 만년설을 아예 볼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알프스 스키장들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설원을 내달리는 광경은 알프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여름에도 즐겼던 알프스 스키의 낭만은 점차 추억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앞으로 30~40년 뒤면 알프스의 스키장과 리조트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룩말 무늬처럼 듬성듬성 눈으로 덮힌 산은 알프스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만년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이렇게 조금씩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이 스토커(호주인 관광객) : “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30~40년 후엔 (알프스 만년설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만년설이 정말 다 사라진다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겠죠.”
일찌감치 산업화를 이룩한 유럽인들은 100년 전부터 알프스에 철도를 깔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해왔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외화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알프스는 말없이 고통에 신음했고, 아픔은 화려함에 가려져왔습니다.
이젠, 인류가 자연의 희생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알프스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럽의 지붕’ 알프스, 지구온난화로 신음
-
- 입력 2013-07-13 10:53:28
- 수정2013-07-13 20:06:20

<앵커 멘트>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죠!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바꾼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절경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네요?
온난화에 신음하고 있는 알프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송영석 순회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알프스. 거대한 봉우리에 앉은 만년설은 오랜 세월 알프스만의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해왔습니다.
<인터뷰> 앤디 쿠츠(미국인 관광객) :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화려하기만 한 알프스의 얼굴이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상징인 하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프스와 바로 맞닿아있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그린델발트. 60 평생을 이 곳에서 살아온 아베글렌 씨는 알프스의 변화를 몸소 증언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골짜기가 된 마을 앞산 아래까지 빙하로 덮여있었다는 어린 시절 그녀의 추억이 증거입니다.
<인터뷰> 안네그레트 그루버 아베글렌(스위스 그린델발트 주민) :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산 위의 빙하가 마을까지 뻗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빙하까지 가서 만지고 놀기도 했답니다."
높이 4천미터가 넘는 알프스의 고산 융프라우. 구름에 가려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드물다고 해서 '수줍은 처녀'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융프라우 같은 높은 산들도 지구 온난화의 위세엔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이 녹아 떨어져 나간 빙하의 단면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빙하 아래 절벽을 덮고 있는 눈은 일시적인 것으로 한여름이 되면 녹아 없어집니다.
40여년 만에 검게 변한 마터호른의 얼굴도 알프스 온난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녹아왔습니다.
문제는 녹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의 빙하 감소속도가 1850년부터 1970년까지 120년 간 빙하 감소 속도의 세배나 됩니다.
지난 2006년 여름, 알프스 절경 중 하나인 에이거봉 동쪽 절벽에서 거대한 암괴가 무너져 관광객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사라진 암괴의 높이는 147미터, 5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아 없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 중부 관광도시 인터라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쿠탄넨엔 3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작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난데없이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세 번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났습니다.
<인터뷰> 월터 슬래피(스위스 쿠탄넨 주민) : “3천미터 높이에서 산사태 시작돼 저기 아래까지 쓸고 내려갔습니다. 저 아래 사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산사태가 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산사태의 1차 원인은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은 물이 암석으로 스며든 뒤 얼었다 녹았다 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 산사태를 유발한 겁니다.
산사태가 난 현장 주변 곳곳엔 이처럼 버려진 집들이 눈에 띕니다.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알베르트 폰 베르겐(스위스 쿠탄넨 주민) : “저 뒤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67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알프스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호수들마저도, 산사태가 나면 대규모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대자연의 고통에 미안함을 표하기라도 하듯, 온난화 문제 전문가들은 연구를 위해서라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올라 구멍을 뚫고, 피스톤으로 된 장비를 넣습니다.
쿠탄넨 산사태의 원인이었던 산 암석 내부의 균열이 기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알프스의 대표적인 봉우리마다 피스톤 장비를 설치해 기온과 균열 크기의 관계를 지켜봐온 연구진은 이상 기온 역시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얀 보이텔(스위스 취리히대 알프스온난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눈과 비의 양과 또 얼마나 알맞은 시기에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대신 여름에 비가 온다면 빙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알프스 빙하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2025년쯤 남은 빙하의 절반이 또 사라지고, 2050년쯤엔 알프스의 만년설을 아예 볼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알프스 스키장들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설원을 내달리는 광경은 알프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여름에도 즐겼던 알프스 스키의 낭만은 점차 추억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앞으로 30~40년 뒤면 알프스의 스키장과 리조트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룩말 무늬처럼 듬성듬성 눈으로 덮힌 산은 알프스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만년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이렇게 조금씩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이 스토커(호주인 관광객) : “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30~40년 후엔 (알프스 만년설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만년설이 정말 다 사라진다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겠죠.”
일찌감치 산업화를 이룩한 유럽인들은 100년 전부터 알프스에 철도를 깔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해왔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외화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알프스는 말없이 고통에 신음했고, 아픔은 화려함에 가려져왔습니다.
이젠, 인류가 자연의 희생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알프스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유럽의 지붕인 알프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죠! 빙하와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바꾼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절경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네요?
온난화에 신음하고 있는 알프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송영석 순회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알프스. 거대한 봉우리에 앉은 만년설은 오랜 세월 알프스만의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해왔습니다.
<인터뷰> 앤디 쿠츠(미국인 관광객) :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신이 창조한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화려하기만 한 알프스의 얼굴이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상징인 하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프스와 바로 맞닿아있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그린델발트. 60 평생을 이 곳에서 살아온 아베글렌 씨는 알프스의 변화를 몸소 증언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골짜기가 된 마을 앞산 아래까지 빙하로 덮여있었다는 어린 시절 그녀의 추억이 증거입니다.
<인터뷰> 안네그레트 그루버 아베글렌(스위스 그린델발트 주민) :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산 위의 빙하가 마을까지 뻗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빙하까지 가서 만지고 놀기도 했답니다."
높이 4천미터가 넘는 알프스의 고산 융프라우. 구름에 가려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드물다고 해서 '수줍은 처녀'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융프라우 같은 높은 산들도 지구 온난화의 위세엔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이 녹아 떨어져 나간 빙하의 단면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빙하 아래 절벽을 덮고 있는 눈은 일시적인 것으로 한여름이 되면 녹아 없어집니다.
40여년 만에 검게 변한 마터호른의 얼굴도 알프스 온난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프스의 빙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녹아왔습니다.
문제는 녹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의 빙하 감소속도가 1850년부터 1970년까지 120년 간 빙하 감소 속도의 세배나 됩니다.
지난 2006년 여름, 알프스 절경 중 하나인 에이거봉 동쪽 절벽에서 거대한 암괴가 무너져 관광객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사라진 암괴의 높이는 147미터, 50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아 없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 중부 관광도시 인터라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쿠탄넨엔 3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작고 평화로운 이 마을에 난데없이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세 번이나 대규모 산사태가 났습니다.
<인터뷰> 월터 슬래피(스위스 쿠탄넨 주민) : “3천미터 높이에서 산사태 시작돼 저기 아래까지 쓸고 내려갔습니다. 저 아래 사는 사람들도 모두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산사태가 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산사태의 1차 원인은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은 물이 암석으로 스며든 뒤 얼었다 녹았다 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 산사태를 유발한 겁니다.
산사태가 난 현장 주변 곳곳엔 이처럼 버려진 집들이 눈에 띕니다.
언제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알베르트 폰 베르겐(스위스 쿠탄넨 주민) : “저 뒤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67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알프스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호수들마저도, 산사태가 나면 대규모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대자연의 고통에 미안함을 표하기라도 하듯, 온난화 문제 전문가들은 연구를 위해서라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올라 구멍을 뚫고, 피스톤으로 된 장비를 넣습니다.
쿠탄넨 산사태의 원인이었던 산 암석 내부의 균열이 기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알프스의 대표적인 봉우리마다 피스톤 장비를 설치해 기온과 균열 크기의 관계를 지켜봐온 연구진은 이상 기온 역시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얀 보이텔(스위스 취리히대 알프스온난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눈과 비의 양과 또 얼마나 알맞은 시기에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대신 여름에 비가 온다면 빙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알프스 빙하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2025년쯤 남은 빙하의 절반이 또 사라지고, 2050년쯤엔 알프스의 만년설을 아예 볼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해도 알프스 스키장들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혀 있었습니다.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설원을 내달리는 광경은 알프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여름에도 즐겼던 알프스 스키의 낭만은 점차 추억으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앞으로 30~40년 뒤면 알프스의 스키장과 리조트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룩말 무늬처럼 듬성듬성 눈으로 덮힌 산은 알프스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 만년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이렇게 조금씩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이 스토커(호주인 관광객) : “제 자식들과 손자들이 30~40년 후엔 (알프스 만년설을)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만년설이 정말 다 사라진다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겠죠.”
일찌감치 산업화를 이룩한 유럽인들은 100년 전부터 알프스에 철도를 깔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해왔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외화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알프스는 말없이 고통에 신음했고, 아픔은 화려함에 가려져왔습니다.
이젠, 인류가 자연의 희생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알프스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
-

송영석 기자 sys@kbs.co.kr
송영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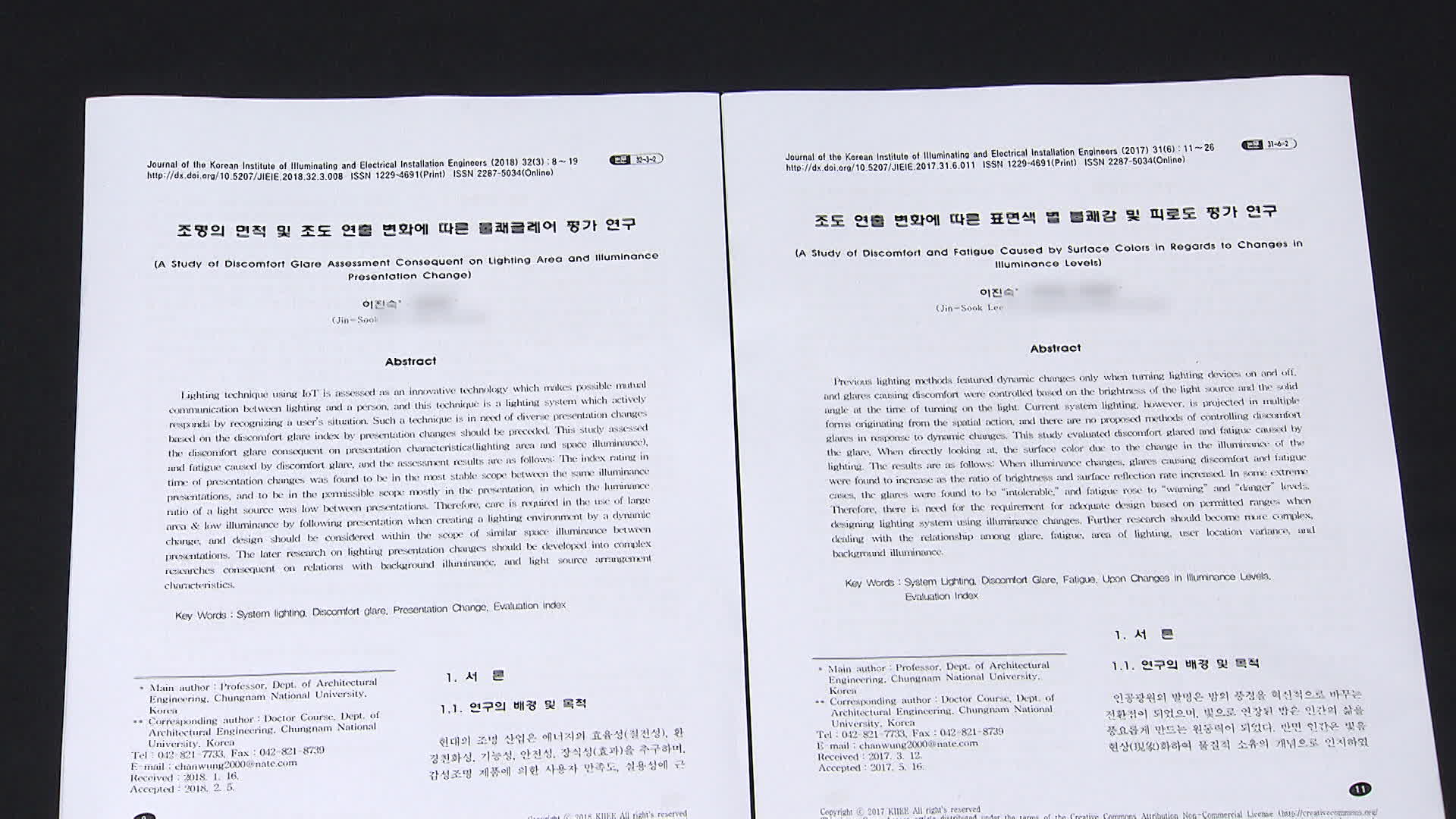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