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어제 9시 뉴스에서 독도주변 바닷속의 진기한 생태계를 생생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생태계가 바닷속에 마구 쳐진 그물과 쓰레기 투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섭 기자 :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독도 바닷속은 온갖 희귀식물과 물고기가 어우러진 생태계 보고입니다. 어린아이 크기만한 혹돔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신기하다는 듯 관찰하는 두려움 없는 원시의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곳 독도 우리땅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에도 사람의 손길이 미치면서 너무 쉽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심 20미터에서 40미터의 그물엔 언제 걸려 죽었는지 알길이 없는 물고기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독도주변 그물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3중 그물인데 이 그물은 여느 단망과는 달리 일단 걸리면 웬만한 고기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 접근한 붉은 게도 영락없이 걸려들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독도주변의 바닷속은 둘레가 거친 수직암벽이어서 바위틈에 그물이 걸릴 경우 걷어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KBS 수중촬영팀의 확인결과 이렇게 걷어올리지 못하고 쳐저있는 그물의 길이는 자그마치 40여㎞나 됐습니다. 이는 독도둘레 4㎞를 10번이나 감는 길이고 혹돔 등 희귀어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독도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명 (두성해양연구소 소장) :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유산으로써 생태보존 지역으로서의 진정한 우리의 독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명섭 기자 :
오염의 흔적은 지상도 예외가 아니어서 독도 분화구 아래쪽은 푸대자루와 고철은 말할 것도 없이 양철 식용유통과 플라스틱 간장통이 뒹글고 각종 비밀봉지와 폐플라스틱 썩은 종이로 뒤덮이는 등 도심지의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후 해안경비대와 방문객수가 늘면서 쓰레기 더미의 깊이는 1미터가 됐습니다. 짓눌려 죽은 괭이갈매기와 안보이는 바닷속에서 더 많이 죽어가는 수많은 희귀어종들은 독도의 환경파괴가 어느정도인지를 실감나게 해줍니다. 해양전문가들은 독도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천혜의 해양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땅 독도에서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도 주변 바다의 생태계 파괴 현장
-
- 입력 1996-08-23 21:00:00

⊙황현정 앵커 :
어제 9시 뉴스에서 독도주변 바닷속의 진기한 생태계를 생생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생태계가 바닷속에 마구 쳐진 그물과 쓰레기 투기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섭 기자 :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독도 바닷속은 온갖 희귀식물과 물고기가 어우러진 생태계 보고입니다. 어린아이 크기만한 혹돔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신기하다는 듯 관찰하는 두려움 없는 원시의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곳 독도 우리땅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에도 사람의 손길이 미치면서 너무 쉽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수심 20미터에서 40미터의 그물엔 언제 걸려 죽었는지 알길이 없는 물고기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습니다. 더구나 독도주변 그물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3중 그물인데 이 그물은 여느 단망과는 달리 일단 걸리면 웬만한 고기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 접근한 붉은 게도 영락없이 걸려들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독도주변의 바닷속은 둘레가 거친 수직암벽이어서 바위틈에 그물이 걸릴 경우 걷어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KBS 수중촬영팀의 확인결과 이렇게 걷어올리지 못하고 쳐저있는 그물의 길이는 자그마치 40여㎞나 됐습니다. 이는 독도둘레 4㎞를 10번이나 감는 길이고 혹돔 등 희귀어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독도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명 (두성해양연구소 소장) :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유산으로써 생태보존 지역으로서의 진정한 우리의 독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명섭 기자 :
오염의 흔적은 지상도 예외가 아니어서 독도 분화구 아래쪽은 푸대자루와 고철은 말할 것도 없이 양철 식용유통과 플라스틱 간장통이 뒹글고 각종 비밀봉지와 폐플라스틱 썩은 종이로 뒤덮이는 등 도심지의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후 해안경비대와 방문객수가 늘면서 쓰레기 더미의 깊이는 1미터가 됐습니다. 짓눌려 죽은 괭이갈매기와 안보이는 바닷속에서 더 많이 죽어가는 수많은 희귀어종들은 독도의 환경파괴가 어느정도인지를 실감나게 해줍니다. 해양전문가들은 독도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천혜의 해양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땅 독도에서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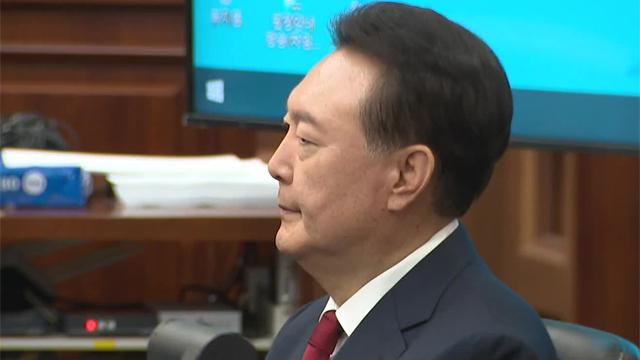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