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국 곳곳에 신도시는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학교를 짓지 못해 비상입니다.
신설 비용이 문제라는데 해법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여 세대 규모의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지굽니다.
2 차분 4천 2백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신청 넉 달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 지역에 들어설 초중고교 8 곳의 신설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진규(사업시행업체 차장):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월 정도에 분양을 할 계획이었죠."
2020년까지 인천지역에선 총규모 8천 2백 6십만 평방미터, 28만 9천 세대의 크고작은 개발사업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필요한 초중고교는 모두 156 곳.
학교당 신설비용을 평균 250억 원으로 계산하면 모두 3조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해마다 3천억 원을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긴데, 한 해 예산이 1조 8천억 원에 불과한 교육청으로선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영용(인천시교육청 학생수용팀장): "개발이 계속돼서 교육재정이 악화가 되면 교육환경은 무지하게 나빠질 겁니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빚을 내다가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까지 가겠죠."
2만 7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수완지구, 막상 학교를 짓는 곳은 없습니다.
필요한 학교는 모두 17 곳.
광주시가 결국 학교용지매입비로 280억 원을 내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당분간 입주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뷰> 윤정완(입주 예정자 대표): "학교가 개교된다란 부분을 믿을 수 있을지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7 곳의 학교가 더 지어져야 하는 대전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교부지 매입에만 4천 5백억 원 이상이 드는데, 교육청은 두 손을 든 상탭니다.
전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학교의 수는 전체 신설학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비용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잇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법을 개정해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의 부담을 줄여 남는 예산으로 냉난방 시설과 원어민 교사 확보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논립니다.
도로나 공원같은 공공시설에 학교를 포함시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 "비용도 국가적으로 적게 들고요. 이용률도 더 높아지고 이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건설교통부도 분양가 상승을 가져온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재정으로, 즉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교육당국 스스로가 재정확충과 구조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쏟아지는 신도시 계획, 정부 부처간에도 계속되는 엇박자, 학교지을 돈은 없고...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들립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전국 곳곳에 신도시는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학교를 짓지 못해 비상입니다.
신설 비용이 문제라는데 해법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여 세대 규모의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지굽니다.
2 차분 4천 2백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신청 넉 달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 지역에 들어설 초중고교 8 곳의 신설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진규(사업시행업체 차장):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월 정도에 분양을 할 계획이었죠."
2020년까지 인천지역에선 총규모 8천 2백 6십만 평방미터, 28만 9천 세대의 크고작은 개발사업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필요한 초중고교는 모두 156 곳.
학교당 신설비용을 평균 250억 원으로 계산하면 모두 3조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해마다 3천억 원을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긴데, 한 해 예산이 1조 8천억 원에 불과한 교육청으로선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영용(인천시교육청 학생수용팀장): "개발이 계속돼서 교육재정이 악화가 되면 교육환경은 무지하게 나빠질 겁니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빚을 내다가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까지 가겠죠."
2만 7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수완지구, 막상 학교를 짓는 곳은 없습니다.
필요한 학교는 모두 17 곳.
광주시가 결국 학교용지매입비로 280억 원을 내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당분간 입주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뷰> 윤정완(입주 예정자 대표): "학교가 개교된다란 부분을 믿을 수 있을지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7 곳의 학교가 더 지어져야 하는 대전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교부지 매입에만 4천 5백억 원 이상이 드는데, 교육청은 두 손을 든 상탭니다.
전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학교의 수는 전체 신설학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비용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잇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법을 개정해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의 부담을 줄여 남는 예산으로 냉난방 시설과 원어민 교사 확보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논립니다.
도로나 공원같은 공공시설에 학교를 포함시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 "비용도 국가적으로 적게 들고요. 이용률도 더 높아지고 이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건설교통부도 분양가 상승을 가져온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재정으로, 즉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교육당국 스스로가 재정확충과 구조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쏟아지는 신도시 계획, 정부 부처간에도 계속되는 엇박자, 학교지을 돈은 없고...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들립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신도시 학교신설비용 누가 내나?
-
- 입력 2007-06-17 21:20:46

<앵커 멘트>
전국 곳곳에 신도시는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학교를 짓지 못해 비상입니다.
신설 비용이 문제라는데 해법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 2천여 세대 규모의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지굽니다.
2 차분 4천 2백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신청 넉 달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 지역에 들어설 초중고교 8 곳의 신설비용을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진규(사업시행업체 차장):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월 정도에 분양을 할 계획이었죠."
2020년까지 인천지역에선 총규모 8천 2백 6십만 평방미터, 28만 9천 세대의 크고작은 개발사업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필요한 초중고교는 모두 156 곳.
학교당 신설비용을 평균 250억 원으로 계산하면 모두 3조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해마다 3천억 원을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긴데, 한 해 예산이 1조 8천억 원에 불과한 교육청으로선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영용(인천시교육청 학생수용팀장): "개발이 계속돼서 교육재정이 악화가 되면 교육환경은 무지하게 나빠질 겁니다. 결국은 교육청에서 빚을 내다가 재정적으로 파산 직전까지 가겠죠."
2만 7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광주시 수완지구, 막상 학교를 짓는 곳은 없습니다.
필요한 학교는 모두 17 곳.
광주시가 결국 학교용지매입비로 280억 원을 내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당분간 입주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뷰> 윤정완(입주 예정자 대표): "학교가 개교된다란 부분을 믿을 수 있을지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7 곳의 학교가 더 지어져야 하는 대전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교부지 매입에만 4천 5백억 원 이상이 드는데, 교육청은 두 손을 든 상탭니다.
전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학교의 수는 전체 신설학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비용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개발사업 자체가 잇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법을 개정해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의 부담을 줄여 남는 예산으로 냉난방 시설과 원어민 교사 확보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논립니다.
도로나 공원같은 공공시설에 학교를 포함시켜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교흥(열린우리당 의원): "비용도 국가적으로 적게 들고요. 이용률도 더 높아지고 이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건설교통부도 분양가 상승을 가져온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재정으로, 즉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교육당국 스스로가 재정확충과 구조 개선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쏟아지는 신도시 계획, 정부 부처간에도 계속되는 엇박자, 학교지을 돈은 없고...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들립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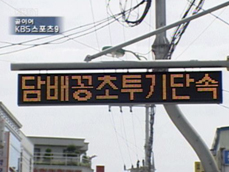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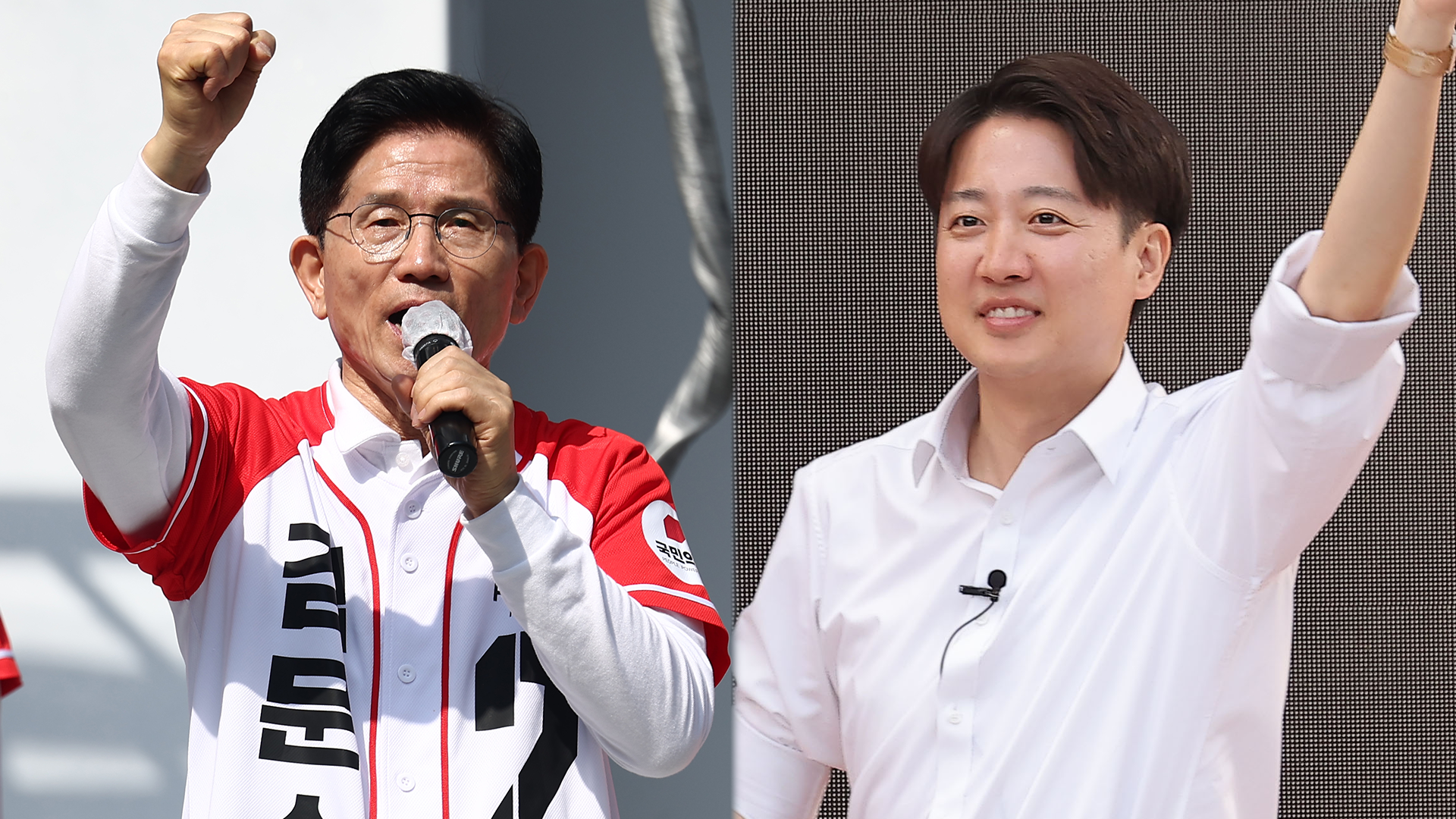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