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의료비 지출 ‘눈덩이’…위기의 건보
입력 2010.11.09 (22:08)
수정 2010.11.09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7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했죠.
다른 나라도 배우고 싶어할만큼 잘 뿌리 내렸다 하지만, 알고보면 적자가 엄청 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쓰는 의료비 보시죠. 최근 5년동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OECD국가랑 비교해도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적자가 1조 3천억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한국인이 유난히 아픈데가 많은 것도 아닐테고 왜 이리 의료비를 많이 쓸까요?
먼저 오수호 기자가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리포트>
한 대형병원 내과 진료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감기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세이지만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습니다.
<인터뷰> 장세동(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아무래도 동네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빨리 낫지 않을까.."
진료비가 비싼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선호하다보니 건강 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2살 아기가 감기에 걸려 처방받은 약은 무려 9개.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 중복 처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 OO(주부) : "(약)종류가 많아서 약사한테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아무래도 (약)종류가 많으면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처방 약은 한 번에 평균 4개 정도로 다른 선진국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늘어나고 처방 약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처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
큰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습관과 이것 저것 자꾸 진료를 권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가벼운 병에도 큰 병원을 가다보니 막상 정말 중병 환자가 밀리기도 하고, 건강보험 부담도 늘고 오수호 기자 ! 정말 걱정 되는데, 이러다 전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건 노인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과잉진료 탓이 큰데요.
이런 추세라면 1년에 77조원인 현재의 의료비 지출이 10년 뒤엔 연 15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 평균 7만원 정도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17만원 정도로 훌쩍 뛰어 GDP, 국내총생산의 10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앞서 수십년 전부터 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덴마크와 벨기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부인 닐센 씨는 몸이 아플 때마다 동네 병원에 있는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 갑니다.
<인터뷰> 닐슨 닐센(감기 환자) : "기침이 나고 목이 부어서 평소대로 주치의한테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주치의는 무리하게 수술이나 입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국민의 99%는 거주지 10km 안에 있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큰 병원에 가려면 먼저 주치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벨기에에선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를 통일해서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이 무릎 수술 환자가 낸 수술비는 5천유로, 우리 돈 8백만원 정도로 어느 지역,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비용은 똑같습니다.
<인터뷰> 베르트 위넨(벨기에 건강보험공단 조사관) : "의과대학 교수건 시골 작은 도시 의사건 환자에게 요구되는 진료비는 모두 똑같다."
또 매년 초면 과거 진료비 평균을 감안한 1년 진료비 총액이 질병마다 정해지다보니 의사들도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됐습니다.
덴마크에선 의사가 특정 약 이름을 쓰지 않고 성분명을 처방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같은 성분을 가진 약 가운데 가장 싼 약을 찾아 조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피어 노케어(약국 운영자) : "만약 제도를 어기면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한다"
덕분에 전체 의료비에서 약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우리나라의 1/3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럽의 이런 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시범 사업 외에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와 약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벨기에도 의사 약사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환자도 의료계도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7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했죠.
다른 나라도 배우고 싶어할만큼 잘 뿌리 내렸다 하지만, 알고보면 적자가 엄청 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쓰는 의료비 보시죠. 최근 5년동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OECD국가랑 비교해도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적자가 1조 3천억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한국인이 유난히 아픈데가 많은 것도 아닐테고 왜 이리 의료비를 많이 쓸까요?
먼저 오수호 기자가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리포트>
한 대형병원 내과 진료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감기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세이지만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습니다.
<인터뷰> 장세동(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아무래도 동네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빨리 낫지 않을까.."
진료비가 비싼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선호하다보니 건강 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2살 아기가 감기에 걸려 처방받은 약은 무려 9개.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 중복 처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 OO(주부) : "(약)종류가 많아서 약사한테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아무래도 (약)종류가 많으면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처방 약은 한 번에 평균 4개 정도로 다른 선진국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늘어나고 처방 약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처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
큰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습관과 이것 저것 자꾸 진료를 권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가벼운 병에도 큰 병원을 가다보니 막상 정말 중병 환자가 밀리기도 하고, 건강보험 부담도 늘고 오수호 기자 ! 정말 걱정 되는데, 이러다 전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건 노인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과잉진료 탓이 큰데요.
이런 추세라면 1년에 77조원인 현재의 의료비 지출이 10년 뒤엔 연 15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 평균 7만원 정도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17만원 정도로 훌쩍 뛰어 GDP, 국내총생산의 10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앞서 수십년 전부터 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덴마크와 벨기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부인 닐센 씨는 몸이 아플 때마다 동네 병원에 있는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 갑니다.
<인터뷰> 닐슨 닐센(감기 환자) : "기침이 나고 목이 부어서 평소대로 주치의한테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주치의는 무리하게 수술이나 입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국민의 99%는 거주지 10km 안에 있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큰 병원에 가려면 먼저 주치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벨기에에선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를 통일해서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이 무릎 수술 환자가 낸 수술비는 5천유로, 우리 돈 8백만원 정도로 어느 지역,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비용은 똑같습니다.
<인터뷰> 베르트 위넨(벨기에 건강보험공단 조사관) : "의과대학 교수건 시골 작은 도시 의사건 환자에게 요구되는 진료비는 모두 똑같다."
또 매년 초면 과거 진료비 평균을 감안한 1년 진료비 총액이 질병마다 정해지다보니 의사들도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됐습니다.
덴마크에선 의사가 특정 약 이름을 쓰지 않고 성분명을 처방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같은 성분을 가진 약 가운데 가장 싼 약을 찾아 조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피어 노케어(약국 운영자) : "만약 제도를 어기면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한다"
덕분에 전체 의료비에서 약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우리나라의 1/3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럽의 이런 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시범 사업 외에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와 약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벨기에도 의사 약사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환자도 의료계도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뉴스] 의료비 지출 ‘눈덩이’…위기의 건보
-
- 입력 2010-11-09 22:08:53
- 수정2010-11-09 22:14:45

<앵커 멘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7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했죠.
다른 나라도 배우고 싶어할만큼 잘 뿌리 내렸다 하지만, 알고보면 적자가 엄청 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쓰는 의료비 보시죠. 최근 5년동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OECD국가랑 비교해도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적자가 1조 3천억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한국인이 유난히 아픈데가 많은 것도 아닐테고 왜 이리 의료비를 많이 쓸까요?
먼저 오수호 기자가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리포트>
한 대형병원 내과 진료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감기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세이지만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습니다.
<인터뷰> 장세동(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아무래도 동네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빨리 낫지 않을까.."
진료비가 비싼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선호하다보니 건강 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2살 아기가 감기에 걸려 처방받은 약은 무려 9개.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 중복 처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 OO(주부) : "(약)종류가 많아서 약사한테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아무래도 (약)종류가 많으면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처방 약은 한 번에 평균 4개 정도로 다른 선진국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늘어나고 처방 약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처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
큰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습관과 이것 저것 자꾸 진료를 권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가벼운 병에도 큰 병원을 가다보니 막상 정말 중병 환자가 밀리기도 하고, 건강보험 부담도 늘고 오수호 기자 ! 정말 걱정 되는데, 이러다 전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건 노인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과잉진료 탓이 큰데요.
이런 추세라면 1년에 77조원인 현재의 의료비 지출이 10년 뒤엔 연 15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 평균 7만원 정도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17만원 정도로 훌쩍 뛰어 GDP, 국내총생산의 10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앞서 수십년 전부터 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덴마크와 벨기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부인 닐센 씨는 몸이 아플 때마다 동네 병원에 있는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 갑니다.
<인터뷰> 닐슨 닐센(감기 환자) : "기침이 나고 목이 부어서 평소대로 주치의한테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주치의는 무리하게 수술이나 입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국민의 99%는 거주지 10km 안에 있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큰 병원에 가려면 먼저 주치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벨기에에선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를 통일해서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이 무릎 수술 환자가 낸 수술비는 5천유로, 우리 돈 8백만원 정도로 어느 지역,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비용은 똑같습니다.
<인터뷰> 베르트 위넨(벨기에 건강보험공단 조사관) : "의과대학 교수건 시골 작은 도시 의사건 환자에게 요구되는 진료비는 모두 똑같다."
또 매년 초면 과거 진료비 평균을 감안한 1년 진료비 총액이 질병마다 정해지다보니 의사들도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됐습니다.
덴마크에선 의사가 특정 약 이름을 쓰지 않고 성분명을 처방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같은 성분을 가진 약 가운데 가장 싼 약을 찾아 조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피어 노케어(약국 운영자) : "만약 제도를 어기면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한다"
덕분에 전체 의료비에서 약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우리나라의 1/3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럽의 이런 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시범 사업 외에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와 약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벨기에도 의사 약사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환자도 의료계도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7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했죠.
다른 나라도 배우고 싶어할만큼 잘 뿌리 내렸다 하지만, 알고보면 적자가 엄청 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쓰는 의료비 보시죠. 최근 5년동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OECD국가랑 비교해도 그렇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적자가 1조 3천억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한국인이 유난히 아픈데가 많은 것도 아닐테고 왜 이리 의료비를 많이 쓸까요?
먼저 오수호 기자가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리포트>
한 대형병원 내과 진료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감기나 복통 같은 가벼운 증세이지만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습니다.
<인터뷰> 장세동(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 "아무래도 동네병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빨리 낫지 않을까.."
진료비가 비싼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선호하다보니 건강 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2살 아기가 감기에 걸려 처방받은 약은 무려 9개.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 중복 처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손 OO(주부) : "(약)종류가 많아서 약사한테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아무래도 (약)종류가 많으면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처방 약은 한 번에 평균 4개 정도로 다른 선진국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늘어나고 처방 약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처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
큰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습관과 이것 저것 자꾸 진료를 권하는 의료계의 관행이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가벼운 병에도 큰 병원을 가다보니 막상 정말 중병 환자가 밀리기도 하고, 건강보험 부담도 늘고 오수호 기자 ! 정말 걱정 되는데, 이러다 전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건 노인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과잉진료 탓이 큰데요.
이런 추세라면 1년에 77조원인 현재의 의료비 지출이 10년 뒤엔 연 15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달 평균 7만원 정도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17만원 정도로 훌쩍 뛰어 GDP, 국내총생산의 10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앞서 수십년 전부터 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덴마크와 벨기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부인 닐센 씨는 몸이 아플 때마다 동네 병원에 있는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 갑니다.
<인터뷰> 닐슨 닐센(감기 환자) : "기침이 나고 목이 부어서 평소대로 주치의한테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평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주치의는 무리하게 수술이나 입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국민의 99%는 거주지 10km 안에 있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큰 병원에 가려면 먼저 주치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벨기에에선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를 통일해서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이 무릎 수술 환자가 낸 수술비는 5천유로, 우리 돈 8백만원 정도로 어느 지역,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비용은 똑같습니다.
<인터뷰> 베르트 위넨(벨기에 건강보험공단 조사관) : "의과대학 교수건 시골 작은 도시 의사건 환자에게 요구되는 진료비는 모두 똑같다."
또 매년 초면 과거 진료비 평균을 감안한 1년 진료비 총액이 질병마다 정해지다보니 의사들도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됐습니다.
덴마크에선 의사가 특정 약 이름을 쓰지 않고 성분명을 처방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는 같은 성분을 가진 약 가운데 가장 싼 약을 찾아 조제해야 합니다.
<인터뷰> 피어 노케어(약국 운영자) : "만약 제도를 어기면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약국이 문을 닫아야 한다"
덕분에 전체 의료비에서 약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7%로 우리나라의 1/3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유럽의 이런 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시범 사업 외에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와 약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벨기에도 의사 약사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환자도 의료계도 만족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

오수호 기자 odd@kbs.co.kr
오수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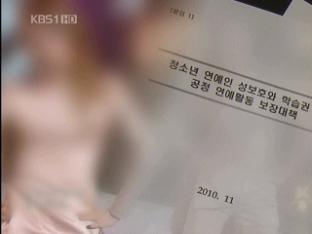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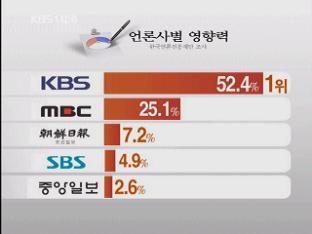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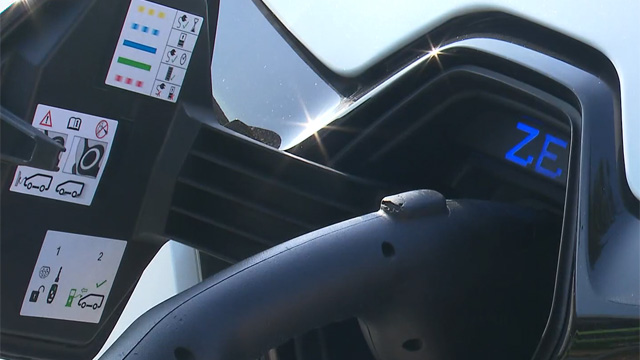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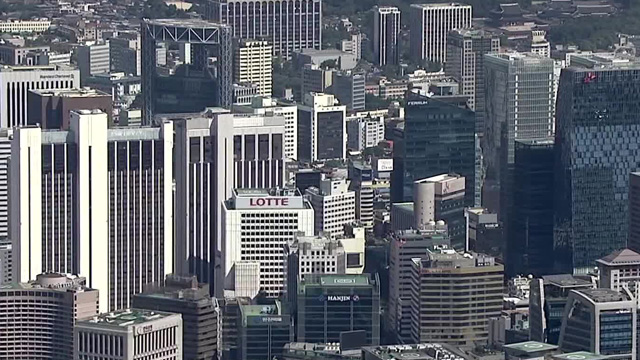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