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녹취>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사유 시설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재정적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겠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법적으로 이 모양이 아니면 무조건 다 이게 불법인가?"
<녹취> 비닐하우스 시설 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태풍이나 폭설 피해를 줄인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해진 규격과 달리 부품들이 설치되는가 하면 제대로된 기준도 없이 품질 시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해 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재해에 잘 견딘다는 이른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
8년째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임운선씨는 올해 3백 제곱미터 남짓한 비닐하우스 한 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공사비는 천여만 원, 이 돈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보조해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설이 와도 잘 견딘다는 내재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보조비를 준 것입니다.
임씨는 바닷가 지역이라 태풍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 비닐하우스는 정부가 정한 규격대로 지었다며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옛날에 골재도 약하고 그럴 때는 날라 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요즘 나오는 건 그래도 보기엔 잘 짓는 것 같아. "
새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는 지난해 지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지은 비닐하우스로, 올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부 자재 가운데 유독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을 단단하게 연결해 골격을 유지시키는 조리개인데, 지난해와 올해 쓰인 제품의 크기와 형태가 다릅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그건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우리야 모르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하는거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09년 부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서며 재해를 줄이기 위한 내재해형 규격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리개의 경우 시중에서는 정부 규격에 맞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저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우리가 실제로 다 이렇게 안 맞는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불법이냐? 우리 쪽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기네(농식품부)도 이제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못해주는 거죠."
충북지역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역시 올 봄에 지어진 내재해형이지만 조리개 갯수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폭이 6m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 조리개가 양쪽 바닥과 어깨높이,
그리고 머리 위 정 중앙 부분에 모두 5개씩 있어야 하지만 머리 위 한 곳에만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철사를 감아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값싼 일반 조리개로 처리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내재해형은 600원 정도 하고 일반형은 90원 정도 하고.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지역마다 또 보조금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이처럼 내재해형 대신 일반형을 사용할 경우 3백여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에 50여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해 조리개를 시설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닐하우스가 태풍이나 폭설에 버티는 힘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 업자) : "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버나 손으로만 해도 이렇게 밀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내재해 조리개는 많은 힘이 들어가죠. 결속하기도 더 힘들고. 훨씬 더 강도면에서는 좋죠. 강도면에서는 좋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자체에선 내재해 비닐하우스의 핵심 부품인 조리개의 중요성이나 규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원칙은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농가들이 업자들이 아마 작업 능률에서 그게 복잡한가 봐요. 그렇게 해서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리개로 보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채택하는 조리개는 아니지. 그게. "
내재해 비닐하우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정부가 설치비 절반을 보조할 뿐 아니라 재해를 당할 경우 복구비도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비닐하우스 설치 예산만 3천4백억 원,
여기에 대형 재해에 따른 복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지원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어느 정도 선에 맞으면 그냥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는건데, 태풍이 오든 눈이 와서 쓰러지든 내재해형 기준을 갖춰야지만 복구비 같은게 나가거든요. 총 30 몇억 중에 15억은 보조, 15억은 자부담이라고 봐야 돼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내재해 조리개의 경우 정부는 태풍이나 폭설에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이 밀리지 않는 조리개의 미끄럼 강도 기준치를 139킬로그램중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 강도를 충족하는 규격 비닐하우스는 지역에 따라 초당 40M의 강풍이나 35CM의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취재진은 전국 각지에서 설치된 내재해 조리개 5종류를 골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A 조리개의 경우 가로대 파이프에 하중을 가하자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4킬로그램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도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인터뷰> 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결속한 부분이 아예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품처나 매입하시는 농가분 입장에서도 단가가 싸면 좋으니까 그거를 많이들 선호하시지요."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들이 어떻게 내재해 조리개로 인정받아 곳곳에 설치되고 있을까?
한 내재해 조리개 생산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 결과 강도 기준 139킬로그램중을 훨신 넘어서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시험을 의뢰한 결과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인터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 :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해서 의뢰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자가 시료를 바꿨다거나 그러면 그 품질을 우리가 시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를 시험한 결과여서 실제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은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고시에 강도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뢰자 요구대로 시험이 진행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제품 생산자인 의뢰자 입맛대로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시험 방법에 대한 KS규격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된 규격이 없거나 그나마 있는 규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철제 대신 합성수지로 내재해 조리개를 생산했던 한 회사는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발명특허를 받고 정부 규격에 등재된 제품이었지만 비규격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데다 설치하는데 품이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은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찬호(前 조리개 생산업체 대표) : "비규격품을 써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업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싼 것을 가져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비규격품만 확산이 되고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판매가 안되니까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뭐 결국에는 파산 상태로..."
한해 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재해 예방은 커녕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이가 됐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실의 결과는 어느 때고 닥쳐올 재해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사유 시설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재정적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겠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법적으로 이 모양이 아니면 무조건 다 이게 불법인가?"
<녹취> 비닐하우스 시설 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태풍이나 폭설 피해를 줄인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해진 규격과 달리 부품들이 설치되는가 하면 제대로된 기준도 없이 품질 시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해 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재해에 잘 견딘다는 이른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
8년째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임운선씨는 올해 3백 제곱미터 남짓한 비닐하우스 한 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공사비는 천여만 원, 이 돈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보조해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설이 와도 잘 견딘다는 내재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보조비를 준 것입니다.
임씨는 바닷가 지역이라 태풍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 비닐하우스는 정부가 정한 규격대로 지었다며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옛날에 골재도 약하고 그럴 때는 날라 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요즘 나오는 건 그래도 보기엔 잘 짓는 것 같아. "
새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는 지난해 지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지은 비닐하우스로, 올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부 자재 가운데 유독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을 단단하게 연결해 골격을 유지시키는 조리개인데, 지난해와 올해 쓰인 제품의 크기와 형태가 다릅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그건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우리야 모르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하는거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09년 부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서며 재해를 줄이기 위한 내재해형 규격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리개의 경우 시중에서는 정부 규격에 맞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저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우리가 실제로 다 이렇게 안 맞는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불법이냐? 우리 쪽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기네(농식품부)도 이제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못해주는 거죠."
충북지역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역시 올 봄에 지어진 내재해형이지만 조리개 갯수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폭이 6m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 조리개가 양쪽 바닥과 어깨높이,
그리고 머리 위 정 중앙 부분에 모두 5개씩 있어야 하지만 머리 위 한 곳에만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철사를 감아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값싼 일반 조리개로 처리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내재해형은 600원 정도 하고 일반형은 90원 정도 하고.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지역마다 또 보조금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이처럼 내재해형 대신 일반형을 사용할 경우 3백여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에 50여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해 조리개를 시설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닐하우스가 태풍이나 폭설에 버티는 힘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 업자) : "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버나 손으로만 해도 이렇게 밀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내재해 조리개는 많은 힘이 들어가죠. 결속하기도 더 힘들고. 훨씬 더 강도면에서는 좋죠. 강도면에서는 좋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자체에선 내재해 비닐하우스의 핵심 부품인 조리개의 중요성이나 규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원칙은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농가들이 업자들이 아마 작업 능률에서 그게 복잡한가 봐요. 그렇게 해서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리개로 보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채택하는 조리개는 아니지. 그게. "
내재해 비닐하우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정부가 설치비 절반을 보조할 뿐 아니라 재해를 당할 경우 복구비도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비닐하우스 설치 예산만 3천4백억 원,
여기에 대형 재해에 따른 복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지원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어느 정도 선에 맞으면 그냥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는건데, 태풍이 오든 눈이 와서 쓰러지든 내재해형 기준을 갖춰야지만 복구비 같은게 나가거든요. 총 30 몇억 중에 15억은 보조, 15억은 자부담이라고 봐야 돼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내재해 조리개의 경우 정부는 태풍이나 폭설에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이 밀리지 않는 조리개의 미끄럼 강도 기준치를 139킬로그램중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 강도를 충족하는 규격 비닐하우스는 지역에 따라 초당 40M의 강풍이나 35CM의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취재진은 전국 각지에서 설치된 내재해 조리개 5종류를 골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A 조리개의 경우 가로대 파이프에 하중을 가하자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4킬로그램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도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인터뷰> 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결속한 부분이 아예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품처나 매입하시는 농가분 입장에서도 단가가 싸면 좋으니까 그거를 많이들 선호하시지요."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들이 어떻게 내재해 조리개로 인정받아 곳곳에 설치되고 있을까?
한 내재해 조리개 생산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 결과 강도 기준 139킬로그램중을 훨신 넘어서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시험을 의뢰한 결과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인터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 :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해서 의뢰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자가 시료를 바꿨다거나 그러면 그 품질을 우리가 시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를 시험한 결과여서 실제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은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고시에 강도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뢰자 요구대로 시험이 진행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제품 생산자인 의뢰자 입맛대로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시험 방법에 대한 KS규격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된 규격이 없거나 그나마 있는 규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철제 대신 합성수지로 내재해 조리개를 생산했던 한 회사는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발명특허를 받고 정부 규격에 등재된 제품이었지만 비규격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데다 설치하는데 품이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은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찬호(前 조리개 생산업체 대표) : "비규격품을 써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업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싼 것을 가져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비규격품만 확산이 되고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판매가 안되니까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뭐 결국에는 파산 상태로..."
한해 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재해 예방은 커녕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이가 됐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실의 결과는 어느 때고 닥쳐올 재해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흔들흔들’ 비닐하우스
-
- 입력 2013-07-19 23:15:31
- 수정2013-07-19 23:38:06

<프롤로그>
<녹취>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사유 시설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재정적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겠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법적으로 이 모양이 아니면 무조건 다 이게 불법인가?"
<녹취> 비닐하우스 시설 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태풍이나 폭설 피해를 줄인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해진 규격과 달리 부품들이 설치되는가 하면 제대로된 기준도 없이 품질 시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해 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재해에 잘 견딘다는 이른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
8년째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임운선씨는 올해 3백 제곱미터 남짓한 비닐하우스 한 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공사비는 천여만 원, 이 돈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보조해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설이 와도 잘 견딘다는 내재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보조비를 준 것입니다.
임씨는 바닷가 지역이라 태풍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 비닐하우스는 정부가 정한 규격대로 지었다며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옛날에 골재도 약하고 그럴 때는 날라 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요즘 나오는 건 그래도 보기엔 잘 짓는 것 같아. "
새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는 지난해 지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지은 비닐하우스로, 올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부 자재 가운데 유독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을 단단하게 연결해 골격을 유지시키는 조리개인데, 지난해와 올해 쓰인 제품의 크기와 형태가 다릅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그건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우리야 모르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하는거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09년 부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서며 재해를 줄이기 위한 내재해형 규격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리개의 경우 시중에서는 정부 규격에 맞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저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우리가 실제로 다 이렇게 안 맞는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불법이냐? 우리 쪽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기네(농식품부)도 이제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못해주는 거죠."
충북지역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역시 올 봄에 지어진 내재해형이지만 조리개 갯수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폭이 6m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 조리개가 양쪽 바닥과 어깨높이,
그리고 머리 위 정 중앙 부분에 모두 5개씩 있어야 하지만 머리 위 한 곳에만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철사를 감아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값싼 일반 조리개로 처리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내재해형은 600원 정도 하고 일반형은 90원 정도 하고.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지역마다 또 보조금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이처럼 내재해형 대신 일반형을 사용할 경우 3백여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에 50여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해 조리개를 시설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닐하우스가 태풍이나 폭설에 버티는 힘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 업자) : "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버나 손으로만 해도 이렇게 밀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내재해 조리개는 많은 힘이 들어가죠. 결속하기도 더 힘들고. 훨씬 더 강도면에서는 좋죠. 강도면에서는 좋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자체에선 내재해 비닐하우스의 핵심 부품인 조리개의 중요성이나 규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원칙은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농가들이 업자들이 아마 작업 능률에서 그게 복잡한가 봐요. 그렇게 해서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리개로 보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채택하는 조리개는 아니지. 그게. "
내재해 비닐하우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정부가 설치비 절반을 보조할 뿐 아니라 재해를 당할 경우 복구비도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비닐하우스 설치 예산만 3천4백억 원,
여기에 대형 재해에 따른 복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지원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어느 정도 선에 맞으면 그냥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는건데, 태풍이 오든 눈이 와서 쓰러지든 내재해형 기준을 갖춰야지만 복구비 같은게 나가거든요. 총 30 몇억 중에 15억은 보조, 15억은 자부담이라고 봐야 돼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내재해 조리개의 경우 정부는 태풍이나 폭설에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이 밀리지 않는 조리개의 미끄럼 강도 기준치를 139킬로그램중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 강도를 충족하는 규격 비닐하우스는 지역에 따라 초당 40M의 강풍이나 35CM의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취재진은 전국 각지에서 설치된 내재해 조리개 5종류를 골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A 조리개의 경우 가로대 파이프에 하중을 가하자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4킬로그램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도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인터뷰> 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결속한 부분이 아예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품처나 매입하시는 농가분 입장에서도 단가가 싸면 좋으니까 그거를 많이들 선호하시지요."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들이 어떻게 내재해 조리개로 인정받아 곳곳에 설치되고 있을까?
한 내재해 조리개 생산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 결과 강도 기준 139킬로그램중을 훨신 넘어서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시험을 의뢰한 결과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인터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 :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해서 의뢰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자가 시료를 바꿨다거나 그러면 그 품질을 우리가 시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를 시험한 결과여서 실제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은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고시에 강도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뢰자 요구대로 시험이 진행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제품 생산자인 의뢰자 입맛대로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시험 방법에 대한 KS규격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된 규격이 없거나 그나마 있는 규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철제 대신 합성수지로 내재해 조리개를 생산했던 한 회사는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발명특허를 받고 정부 규격에 등재된 제품이었지만 비규격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데다 설치하는데 품이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은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찬호(前 조리개 생산업체 대표) : "비규격품을 써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업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싼 것을 가져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비규격품만 확산이 되고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판매가 안되니까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뭐 결국에는 파산 상태로..."
한해 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재해 예방은 커녕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이가 됐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실의 결과는 어느 때고 닥쳐올 재해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사유 시설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재정적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겠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법적으로 이 모양이 아니면 무조건 다 이게 불법인가?"
<녹취> 비닐하우스 시설 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태풍이나 폭설 피해를 줄인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해진 규격과 달리 부품들이 설치되는가 하면 제대로된 기준도 없이 품질 시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해 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재해에 잘 견딘다는 이른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
8년째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임운선씨는 올해 3백 제곱미터 남짓한 비닐하우스 한 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공사비는 천여만 원, 이 돈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보조해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설이 와도 잘 견딘다는 내재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보조비를 준 것입니다.
임씨는 바닷가 지역이라 태풍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 비닐하우스는 정부가 정한 규격대로 지었다며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옛날에 골재도 약하고 그럴 때는 날라 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요즘 나오는 건 그래도 보기엔 잘 짓는 것 같아. "
새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는 지난해 지은 비닐하우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지은 비닐하우스로, 올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부 자재 가운데 유독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을 단단하게 연결해 골격을 유지시키는 조리개인데, 지난해와 올해 쓰인 제품의 크기와 형태가 다릅니다.
<인터뷰> 임운선(농민) : "그건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우리야 모르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하는거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09년 부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서며 재해를 줄이기 위한 내재해형 규격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리개의 경우 시중에서는 정부 규격에 맞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전국적으로 도면대로 저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 우리가 실제로 다 이렇게 안 맞는 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불법이냐? 우리 쪽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기네(농식품부)도 이제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못해주는 거죠."
충북지역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역시 올 봄에 지어진 내재해형이지만 조리개 갯수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폭이 6m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해 조리개가 양쪽 바닥과 어깨높이,
그리고 머리 위 정 중앙 부분에 모두 5개씩 있어야 하지만 머리 위 한 곳에만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철사를 감아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값싼 일반 조리개로 처리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내재해형은 600원 정도 하고 일반형은 90원 정도 하고.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지역마다 또 보조금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이처럼 내재해형 대신 일반형을 사용할 경우 3백여 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에 50여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해 조리개를 시설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닐하우스가 태풍이나 폭설에 버티는 힘은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임종대(비닐하우스 설치 업자) : "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버나 손으로만 해도 이렇게 밀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내재해 조리개는 많은 힘이 들어가죠. 결속하기도 더 힘들고. 훨씬 더 강도면에서는 좋죠. 강도면에서는 좋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자체에선 내재해 비닐하우스의 핵심 부품인 조리개의 중요성이나 규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 "원칙은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농가들이 업자들이 아마 작업 능률에서 그게 복잡한가 봐요. 그렇게 해서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조리개로 보긴 보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채택하는 조리개는 아니지. 그게. "
내재해 비닐하우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정부가 설치비 절반을 보조할 뿐 아니라 재해를 당할 경우 복구비도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비닐하우스 설치 예산만 3천4백억 원,
여기에 대형 재해에 따른 복구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지원 규모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계자: "어느 정도 선에 맞으면 그냥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는건데, 태풍이 오든 눈이 와서 쓰러지든 내재해형 기준을 갖춰야지만 복구비 같은게 나가거든요. 총 30 몇억 중에 15억은 보조, 15억은 자부담이라고 봐야 돼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내재해 조리개의 경우 정부는 태풍이나 폭설에 비닐하우스 파이프들이 밀리지 않는 조리개의 미끄럼 강도 기준치를 139킬로그램중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 강도를 충족하는 규격 비닐하우스는 지역에 따라 초당 40M의 강풍이나 35CM의 폭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취재진은 전국 각지에서 설치된 내재해 조리개 5종류를 골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해 봤습니다.
A 조리개의 경우 가로대 파이프에 하중을 가하자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4킬로그램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도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인터뷰> 비닐하우스 설치업자 : "거의 한 90%이상은 다 B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저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핀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결속한 부분이 아예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품처나 매입하시는 농가분 입장에서도 단가가 싸면 좋으니까 그거를 많이들 선호하시지요."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들이 어떻게 내재해 조리개로 인정받아 곳곳에 설치되고 있을까?
한 내재해 조리개 생산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 결과 강도 기준 139킬로그램중을 훨신 넘어서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 시험을 의뢰한 결과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인터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 : "의뢰자가 제공한 시료에 대해서 의뢰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자가 시료를 바꿨다거나 그러면 그 품질을 우리가 시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시험성적서에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를 시험한 결과여서 실제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제품 등에 대한 품질은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고시에 강도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뢰자 요구대로 시험이 진행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제품 생산자인 의뢰자 입맛대로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남규(박사/농촌진흥청) :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시험 방법에 대한 KS규격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된 규격이 없거나 그나마 있는 규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철제 대신 합성수지로 내재해 조리개를 생산했던 한 회사는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발명특허를 받고 정부 규격에 등재된 제품이었지만 비규격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데다 설치하는데 품이 더 든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은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찬호(前 조리개 생산업체 대표) : "비규격품을 써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업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싼 것을 가져다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비규격품만 확산이 되고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판매가 안되니까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뭐 결국에는 파산 상태로..."
한해 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내재해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재해 예방은 커녕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이가 됐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실의 결과는 어느 때고 닥쳐올 재해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
-

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박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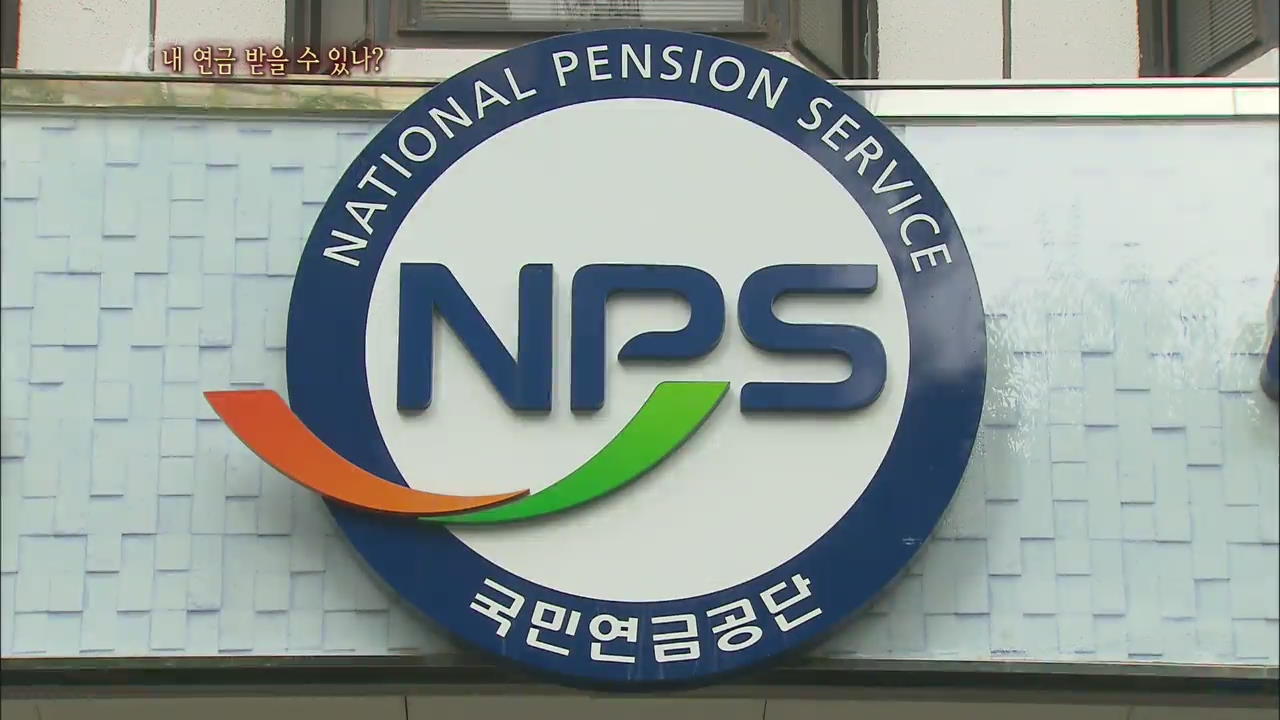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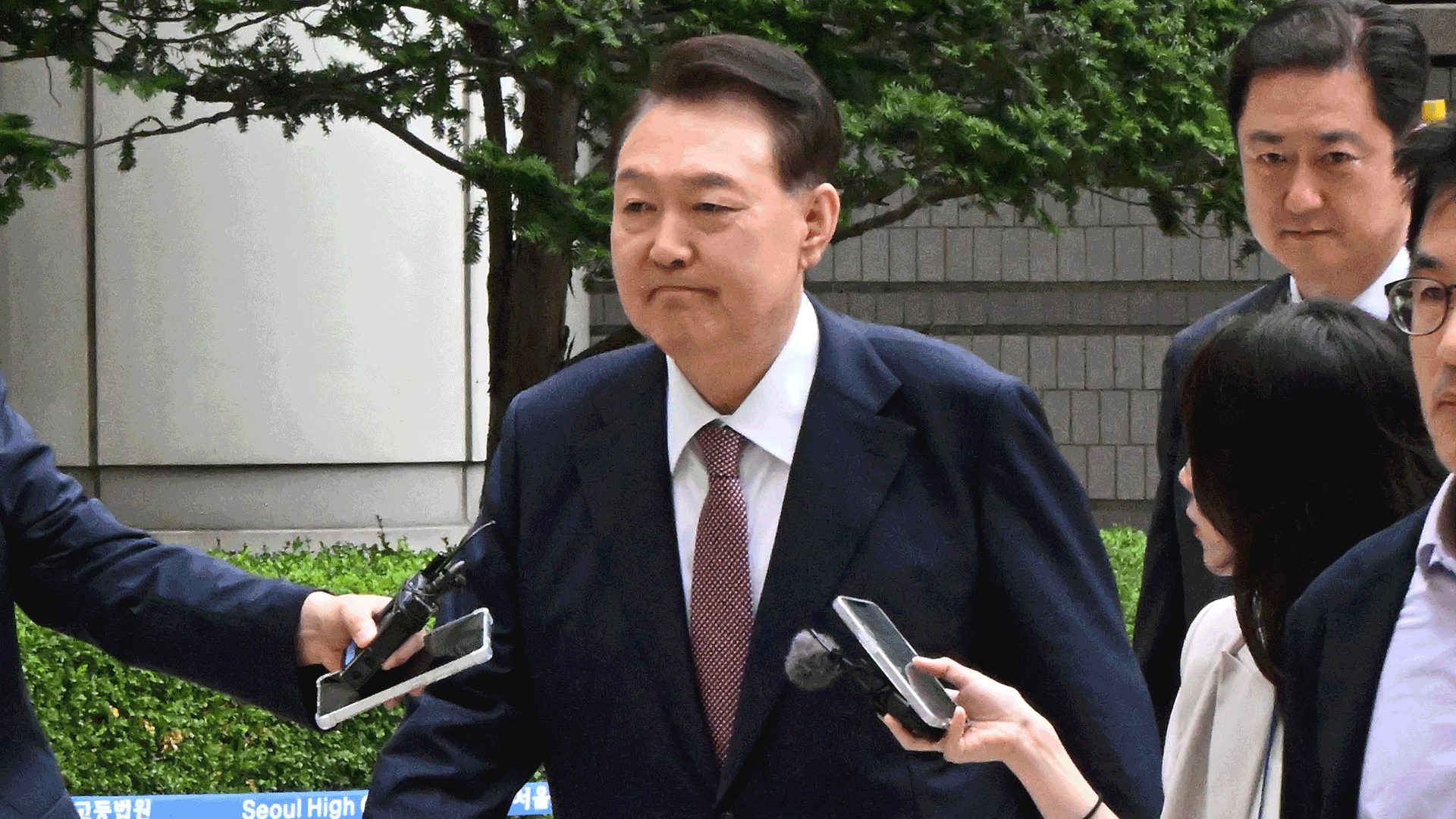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