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 여전…문제는?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통렬히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각종 안전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일어난 경기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로 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판교에선 환풍구가 무너져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양어선 501오룡호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해 60명 중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105중 추돌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을 넘어 '학습 무용론'이 나올 정도인데요.
각종 대형 사고를 겪은 뒤 사고 현장이나 유사한 현장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다시 가 본 사고 현장…위험 여전 ▼
<리포트>
환풍구 추락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사고 환풍구 주위에 철제 차단막을 세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놨습니다.
인근 환풍구들 역시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다른 곳의 환풍구들은 어떨까?
사람들로 붐비는 한 지하철 역사입니다.
울타리나 표지판 등 안전 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환풍구 덮개는 여전히 보도처럼 사용됩니다.
<녹취> 한재영(경기 광명시) : "좀 무섭긴 해요. 길이 좁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철제 덮개는 휘어지고 덜컹거리기까지 합니다.
아예 오토바이 주차장처럼 변한 환풍구도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전국 3만3천여 개 환기구를 점검하고, 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매뉴얼을 얼마나 운영을 잘 할 것이냐가 관건인 거구요.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게끔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습니다.
이 아파트와 유사한 서울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5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건물 간격이 채 2미터가 안 됩니다.
한 건물에 불이 나면 옆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구조지만 대비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건물주는 여기는(주차장) 스프링클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방에만 돼있어. 방에만"
정부는 사고 이후 불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23만여 채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반쪽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안전불감증 여전…갈 길 먼 안전 대책 ▼
<기자 멘트>
지난달 2가족 5명이 숨진 강화도 캠핑장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당시 텐트는 1분 만에 모두 타버렸는데요.
텐트 재질이 화재에 취약하고 값싼 비닐막인 탓에 불이 순식간에 텐트로 번졌습니다.
텐트 안쪽을 볼까요.
좁은 공간에 전기 장판과 TV, 냉장고 등 각종 전기 용품이 들어차 있습니다.
전기 용품이 많으면 화재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도 전기용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건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실제 지난 2013년 전국 430개 캠핑장을 조사했더니 최하 등급인 E등급이 340곳이나 됐습니다.
위험 신호는 있었지만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교통사고를 살펴볼까요.
해마다 5천명이 넘던 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4천명 대로 떨어져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미국과 독일,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떨까요?
안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해마다 사고로 2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사고가 계속되는 건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겠죠.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 ‘현장’과 ‘교육’이 해법 ▼
<리포트>
응급 환자를 옮기는 구급대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규정상 기본 출동 인원은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2명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치복(경기도 재난안전본부) : "한 명이 뒤에 타게 되는데 한 명이 현장 가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역부족입니다."
현장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안전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새로 출범하면서 현장 인력보다는 고위직과 일반직 인원을 상대적으로 더 늘렸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도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원철(한국방재안전학회 고문) : "전부 공무원들 자리 수 늘리고 정책 법안 규칙 매뉴얼 가지고 안전이 확보된다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가 안전 문제를 걱정하겠어요?"
위기 상황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실기와 체험 위주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윤미영(아파트 주민) : "비상벨이 울렸는데 아이들을 그냥 수업을 진행을 시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선 구조 인력과 체계를 현장 위주로 재편하고, 실습 중심의 범국민 안전 교육과 훈련이 조기에 정착돼야 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 여전…문제는?
-
- 입력 2015-04-14 21:18:15
- 수정2015-04-15 07:27:16

1년 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통렬히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각종 안전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일어난 경기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로 8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판교에선 환풍구가 무너져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양어선 501오룡호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해 60명 중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105중 추돌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을 넘어 '학습 무용론'이 나올 정도인데요.
각종 대형 사고를 겪은 뒤 사고 현장이나 유사한 현장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다시 가 본 사고 현장…위험 여전 ▼
<리포트>
환풍구 추락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사고 환풍구 주위에 철제 차단막을 세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놨습니다.
인근 환풍구들 역시 사람이 올라설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다른 곳의 환풍구들은 어떨까?
사람들로 붐비는 한 지하철 역사입니다.
울타리나 표지판 등 안전 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환풍구 덮개는 여전히 보도처럼 사용됩니다.
<녹취> 한재영(경기 광명시) : "좀 무섭긴 해요. 길이 좁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철제 덮개는 휘어지고 덜컹거리기까지 합니다.
아예 오토바이 주차장처럼 변한 환풍구도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이후 전국 3만3천여 개 환기구를 점검하고, 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매뉴얼을 얼마나 운영을 잘 할 것이냐가 관건인 거구요.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게끔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습니다.
이 아파트와 유사한 서울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5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건물 간격이 채 2미터가 안 됩니다.
한 건물에 불이 나면 옆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구조지만 대비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건물주는 여기는(주차장) 스프링클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방에만 돼있어. 방에만"
정부는 사고 이후 불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23만여 채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반쪽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안전불감증 여전…갈 길 먼 안전 대책 ▼
<기자 멘트>
지난달 2가족 5명이 숨진 강화도 캠핑장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당시 텐트는 1분 만에 모두 타버렸는데요.
텐트 재질이 화재에 취약하고 값싼 비닐막인 탓에 불이 순식간에 텐트로 번졌습니다.
텐트 안쪽을 볼까요.
좁은 공간에 전기 장판과 TV, 냉장고 등 각종 전기 용품이 들어차 있습니다.
전기 용품이 많으면 화재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소방당국은 당시 화재도 전기용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건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실제 지난 2013년 전국 430개 캠핑장을 조사했더니 최하 등급인 E등급이 340곳이나 됐습니다.
위험 신호는 있었지만 '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교통사고를 살펴볼까요.
해마다 5천명이 넘던 사망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4천명 대로 떨어져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미국과 독일,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떨까요?
안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해마다 사고로 2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사고가 계속되는 건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겠죠.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선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 ‘현장’과 ‘교육’이 해법 ▼
<리포트>
응급 환자를 옮기는 구급대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규정상 기본 출동 인원은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2명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치복(경기도 재난안전본부) : "한 명이 뒤에 타게 되는데 한 명이 현장 가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역부족입니다."
현장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안전 총괄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새로 출범하면서 현장 인력보다는 고위직과 일반직 인원을 상대적으로 더 늘렸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도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원철(한국방재안전학회 고문) : "전부 공무원들 자리 수 늘리고 정책 법안 규칙 매뉴얼 가지고 안전이 확보된다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가 안전 문제를 걱정하겠어요?"
위기 상황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실기와 체험 위주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윤미영(아파트 주민) : "비상벨이 울렸는데 아이들을 그냥 수업을 진행을 시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선 구조 인력과 체계를 현장 위주로 재편하고, 실습 중심의 범국민 안전 교육과 훈련이 조기에 정착돼야 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시리즈
세월호 1주기…대한민국 안전한가










![[앵커&리포트] 코스피 2100 ↑…“쌍끌이 장세” vs “과열 우려”](https://news.kbs.co.kr/data/news/2015/04/14/3056925_110.jpg)

![[이슈&뉴스] 세월호 참사 1주기…해경 해양사고 대비 ‘제자리’](/data/news/2015/04/13/3056156_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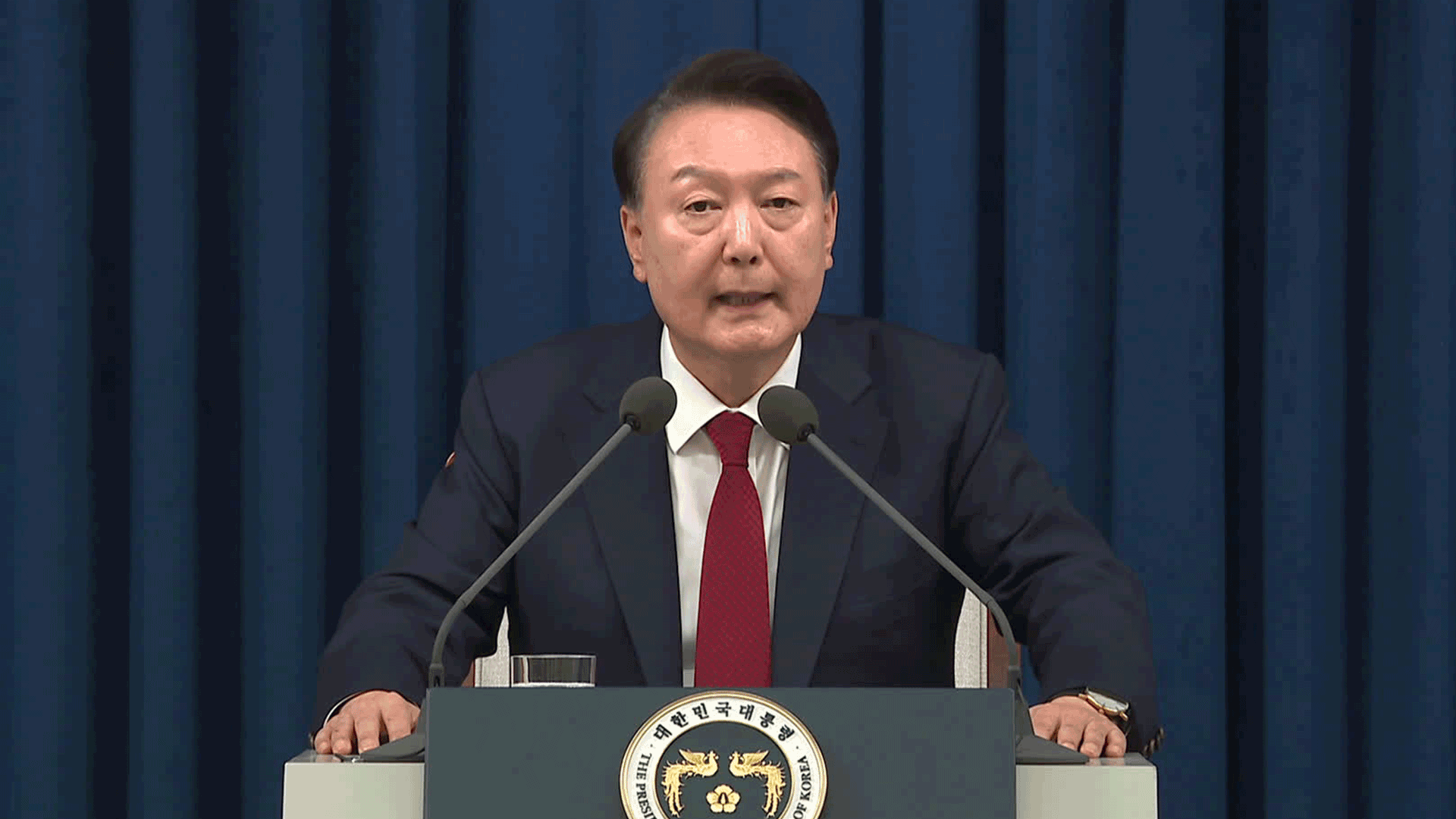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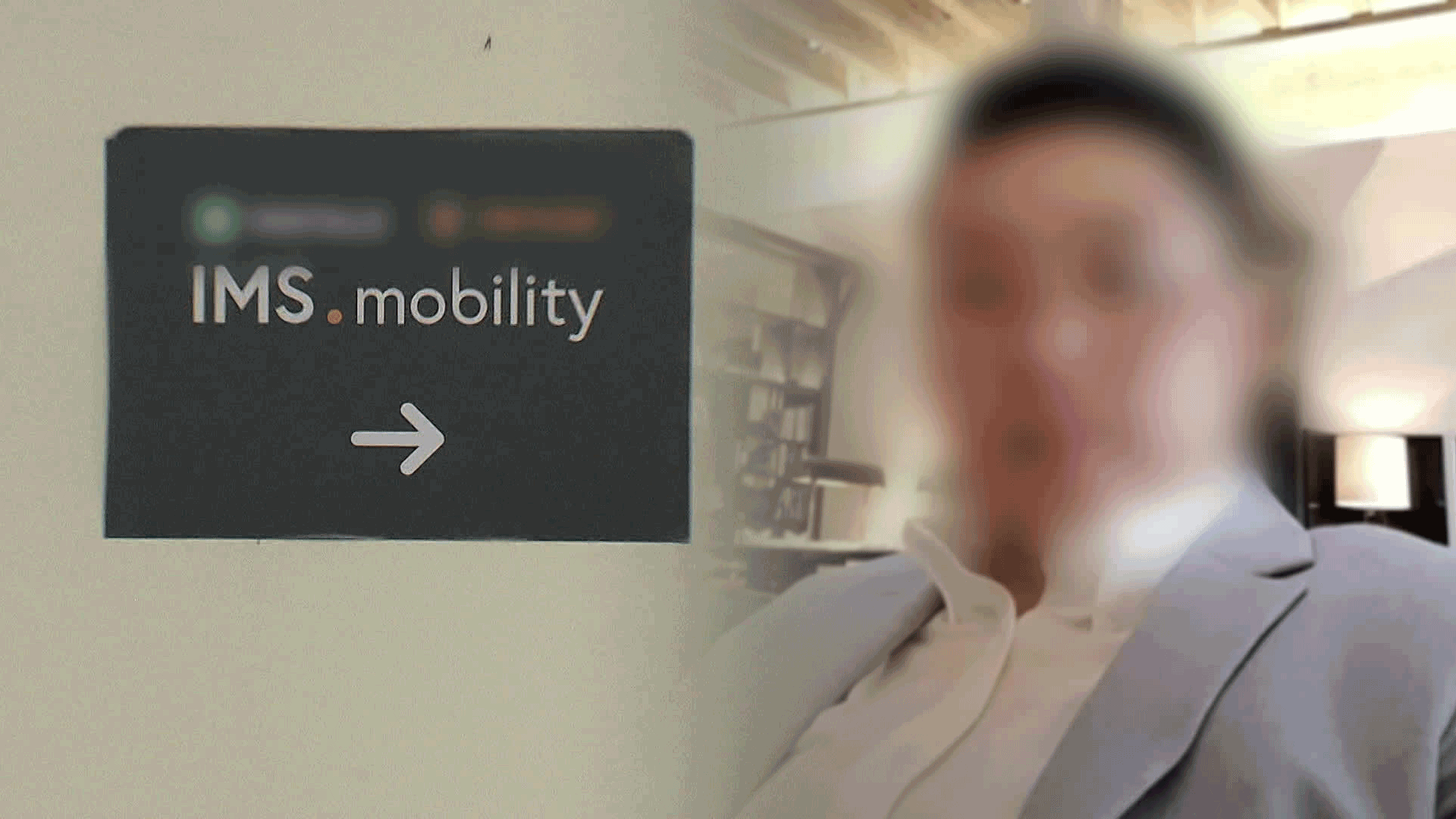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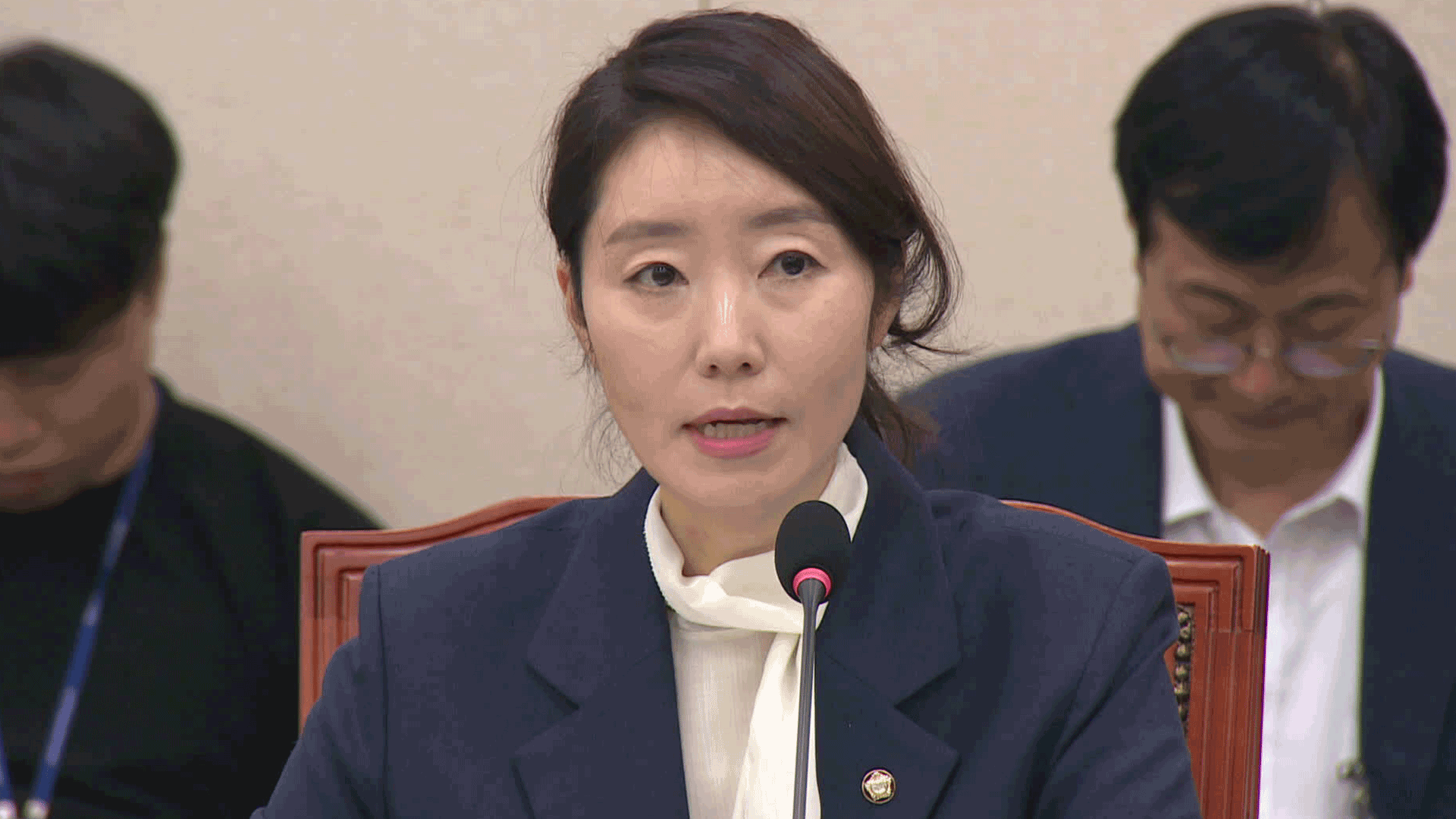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