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날개 없는 추락 ‘팀 재건 시급’
입력 2009.08.07 (13:16)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MBC 청룡을 인수해 1990년 창단한 LG는 초창기 '신바람 야구' 돌풍을 일으키며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프로야구단으로 자리 잡았다.
창단하자마자 한국시리즈 4연승으로 우승했고 1994년에도 리그를 제패한 데 이어 1997년과 1998년에는 2년 연속 준우승했다.
LG의 20년 구단 역사는 1990년대와 2000년대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2000년대에는 2002년 준우승 외에는 내놓을만한 성적이 없다.
2000∼2008년 순위는 '4-6-2-6-6-6-8-5-8'이다.
올해도 시즌 초반 2위까지 올라가며 신바람 야구를 재현할 듯했지만 수년째 이어져온 고질인 마운드가 붕괴하면서 날개 없이 추락했다.
이번 주중 KIA와 잠실 시리즈에서 3연전을 모두 내주고 7연패를 당한 LG는 6일까지 41승55패3무(승률 0.414)로 7위에 처져 있다. 4위 삼성과 이미 9.5게임 차로 벌어져 포스트시즌 진출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른바 '엘롯기 동맹'의 한 축으로 롯데, KIA와 함께 프로야구 흥행을 책임져야 할 인기 구단인 LG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몰락한 원인은 여러 루트에서 추적할 수 있다.
◇리더십 부재
김재박 LG 감독은 취임 3년차로 올해가 계약 마지막 시즌이다.
현대에서 11년 지휘봉을 잡았던 김재박 감독을 2006년 데려온 LG는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사령탑의 '검증된 리더십'을 기대했다.
그러나 창단초부터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던 현대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사상 최강 전력을 구축했던 것과 달리 4년 연속 하위권을 헤맸던 팀을 리빌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김재박 감독의 3년 임기는 결국 실패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올 시즌을 앞두고 LG는 FA(자유계약선수) 최대어 이진영, 정성훈을 영입하고 프런트 직원들까지 김 감독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교체했다.
또 펜스를 5m 당겨 'Ⅹ존'을 설치하는 등 김재박 감독이 원하는 대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해줬다.
하지만 전체 선수단에서 전력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끌어낼 카리스마를 발휘하진 못했다. 한참 불이 붙었을 때 타선에 의존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누누이 약한 고리로 지적돼온 마운드를 취임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놓지 못한 결과는 시즌 중반이 지나자 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집단 누수 현상을 가져왔다.
LG는 초대 백인천 감독부터 이광환, 천보성, 이광은, 김성근, 이순철, 김재박 감독이 차례로 사령탑에 앉은 팀이다.
돌아보면 초창기 공이 있는 백인천 감독과 1994년 전성기를 이끈 이광환 감독, 2002년 반짝 성적을 낸 김성근 감독만 성공한 사령탑으로 기록된 셈이다.
◇부조화..불운..안이한 자신감
LG는 구단 홈페이지에 작년 역사를 '외우내환'으로 점철된 한 해로 썼다.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 그 결과 모 그룹으로부터 강도 높은 경영진단과 감사까지 받았다고 자인했다.
그러나 말미에는 2008시즌을 끝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고 4강 전력을 구축했다고 나름대로 전망했다.
사실 이진영, 정성훈이 타선에 보강됐고 어렵게 붙잡은 로베르토 페타지니는 제 역할을 해줬다. 에이스 박명환이 기대대로 부활하고 크리스 옥스프링이 다치지 않았거나 대체 용병이 제대로 활약했다면 LG 구단의 2009년 장밋빛 시나리오는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조화와 불운이 겹쳐 다가왔다.
에이스 봉중근은 타선과 궁합이 맞지 않아 승수를 챙기지 못하다 결국 무리가 왔다.
시즌 초반에 성사시킨 내야수 김상현,박기남과 투수 강철민의 트레이드는 결국 날개 단 호랑이 군단에 복덩이만 안겨준 셈이 됐다.
여기다 다시 안방에 들여앉힌 포수 김정민이 중도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어렵게 버티던 투수 이범준도 나가떨어졌다.
용병 교체 시기는 한 박자씩 늦어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마운드에 과부하가 걸렸고 선발, 불펜 가릴것 없이 연쇄적으로 흔들렸다.
LG는 8개 구단 최고의 재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박명환과 강철민의 부활을 자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한지붕 라이벌' 두산이 4-5년 전부터 흙속의 진주를 캐내 이천발 '화수분 야구'를 창조했다면 LG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구리 챔피언스파크에서 지나친 자신감에 안주했던 셈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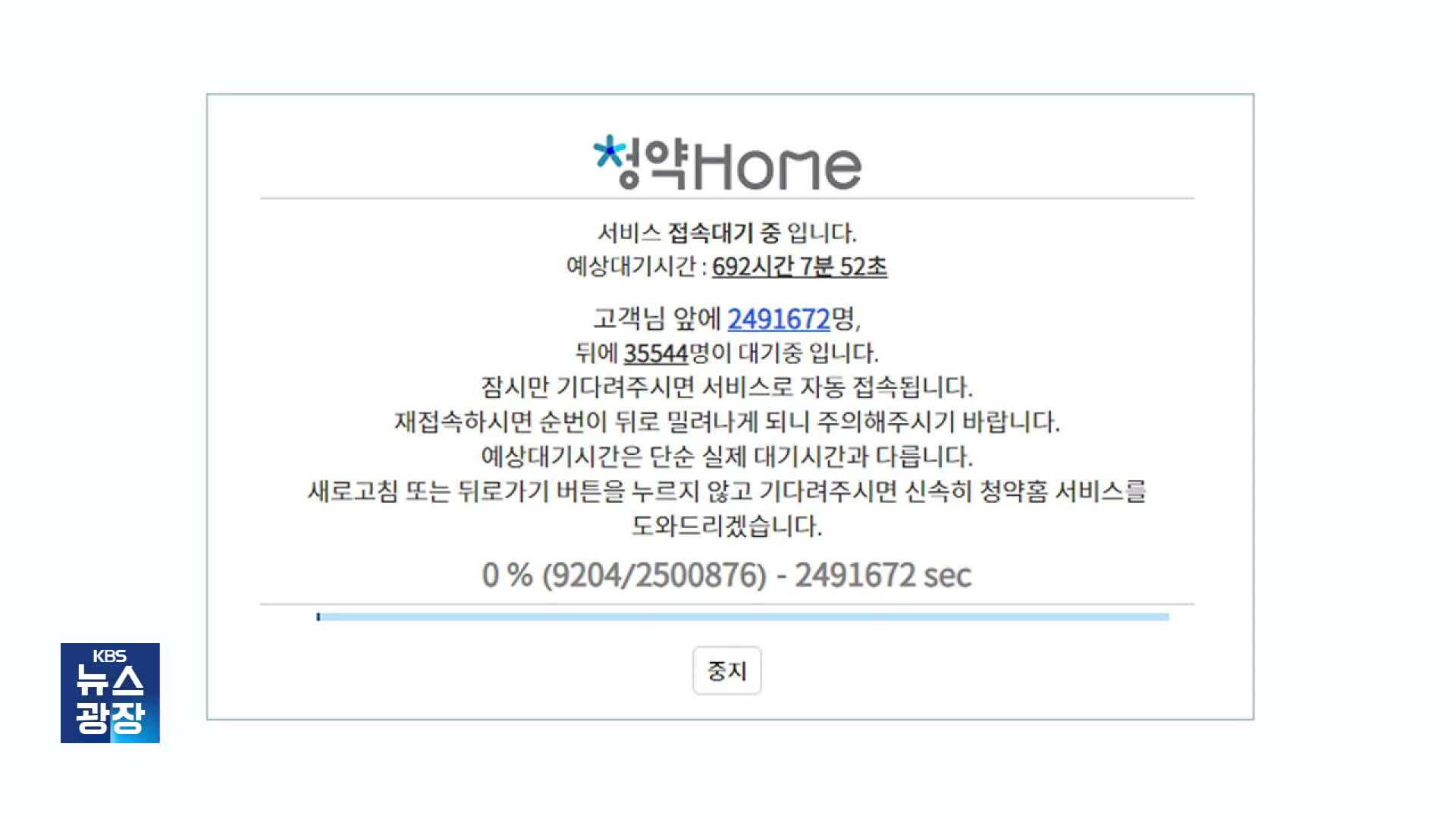

![[영상] “얼마나 아팠으면…” 중계진 속상했던 여자체조 이윤서 경기 장면](/data/news/2024/07/29/20240729_YgvLBW.jpg)



![[영상] ‘위장공격 지도’ 허미미 결승서 반칙패 은메달](/data/news/2024/07/30/20240730_L669nF.png)
![[영상] ‘텐’의 행진!…남자 양궁 단체전 3회연속 금메달](/data/news/2024/07/30/20240730_hUzN6F.png)
![[연예 수첩]송혜교 현빈 “연인 맞아요”](/newsimage2/200908/20090806/18228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