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일본의 선진영농법을 통해 연속기획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규모를 키워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민필규 기자가 우리 농가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에서 24ha로 7만 2000여 평의 농사를 짓는 47살 정진헌 씨는 벼농사만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농민의 한 해 쌀 조수입은 2억 3000여 만원, 이 가운데 경영비를 뺀 소득은 1억 4700만원에 이릅니다.
⊙정진헌(전북 익산시 함열읍): 소규모 농가가 소출은 많은데 저는 규모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훨씬 낫다고 보죠.
⊙기자: 그러나 이런 대규모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농경작면적은 평균 1.1ha, 33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농에 머물다 보니 쌀 생산비는 미국의 2.5배, 중국의 6.5배나 됩니다.
⊙정동식(농민/4500평 농지 보유): 봄되면 영농자금 대출해서 쓰고, 농자재 비용도 쓰고 가을되면 갚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기자: 경작규모를 늘리면 생산비는 점차 줄어들어 15ha 부근에서 최저생산비가 나타났습니다.
⊙조가옥(익산대 농업경영학과 교수): 5만평이 넘으면 비용이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한 15ha에서 20ha 정도 되면 그래도 규모도 최적 적정규모 아니겠느냐...
⊙기자: 그러나 한 농가가 1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경작하는 미국 등과 경쟁하려면 아직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 농민은 주변 37농가와 함께 경지를 집단화해 농작업 직접 생산비를 45%나 줄였습니다.
⊙정회헌(전북 김제시 부량면): 생산비가 그렇게 되면 거의 반 정도 는다고 봐야죠.
혼자 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 중의 하나인 전북 김제 평야입니다.
이런 평야지대의 농가들이 농지 규모를 늘리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 등 산간지역의 경우 1필지 1200의 소작료가 6가마에 불과하지만 평야지대는 그 2배에 이릅니다.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농지값도 규모화의 장애물입니다.
⊙김완배(서울대 농생대 교수): 정부의 농지정책을 보면 농지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규모화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기자: 영농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외국 쌀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야말로 쌀개방 시대에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오늘은 농지규모를 키워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민필규 기자가 우리 농가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에서 24ha로 7만 2000여 평의 농사를 짓는 47살 정진헌 씨는 벼농사만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농민의 한 해 쌀 조수입은 2억 3000여 만원, 이 가운데 경영비를 뺀 소득은 1억 4700만원에 이릅니다.
⊙정진헌(전북 익산시 함열읍): 소규모 농가가 소출은 많은데 저는 규모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훨씬 낫다고 보죠.
⊙기자: 그러나 이런 대규모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농경작면적은 평균 1.1ha, 33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농에 머물다 보니 쌀 생산비는 미국의 2.5배, 중국의 6.5배나 됩니다.
⊙정동식(농민/4500평 농지 보유): 봄되면 영농자금 대출해서 쓰고, 농자재 비용도 쓰고 가을되면 갚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기자: 경작규모를 늘리면 생산비는 점차 줄어들어 15ha 부근에서 최저생산비가 나타났습니다.
⊙조가옥(익산대 농업경영학과 교수): 5만평이 넘으면 비용이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한 15ha에서 20ha 정도 되면 그래도 규모도 최적 적정규모 아니겠느냐...
⊙기자: 그러나 한 농가가 1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경작하는 미국 등과 경쟁하려면 아직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 농민은 주변 37농가와 함께 경지를 집단화해 농작업 직접 생산비를 45%나 줄였습니다.
⊙정회헌(전북 김제시 부량면): 생산비가 그렇게 되면 거의 반 정도 는다고 봐야죠.
혼자 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 중의 하나인 전북 김제 평야입니다.
이런 평야지대의 농가들이 농지 규모를 늘리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 등 산간지역의 경우 1필지 1200의 소작료가 6가마에 불과하지만 평야지대는 그 2배에 이릅니다.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농지값도 규모화의 장애물입니다.
⊙김완배(서울대 농생대 교수): 정부의 농지정책을 보면 농지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규모화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기자: 영농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외국 쌀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야말로 쌀개방 시대에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쌀, 소규모로는 안된다
-
- 입력 2005-02-09 21:29: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일본의 선진영농법을 통해 연속기획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규모를 키워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민필규 기자가 우리 농가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에서 24ha로 7만 2000여 평의 농사를 짓는 47살 정진헌 씨는 벼농사만으로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농민의 한 해 쌀 조수입은 2억 3000여 만원, 이 가운데 경영비를 뺀 소득은 1억 4700만원에 이릅니다.
⊙정진헌(전북 익산시 함열읍): 소규모 농가가 소출은 많은데 저는 규모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훨씬 낫다고 보죠.
⊙기자: 그러나 이런 대규모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농경작면적은 평균 1.1ha, 3300여 평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농에 머물다 보니 쌀 생산비는 미국의 2.5배, 중국의 6.5배나 됩니다.
⊙정동식(농민/4500평 농지 보유): 봄되면 영농자금 대출해서 쓰고, 농자재 비용도 쓰고 가을되면 갚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기자: 경작규모를 늘리면 생산비는 점차 줄어들어 15ha 부근에서 최저생산비가 나타났습니다.
⊙조가옥(익산대 농업경영학과 교수): 5만평이 넘으면 비용이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한 15ha에서 20ha 정도 되면 그래도 규모도 최적 적정규모 아니겠느냐...
⊙기자: 그러나 한 농가가 1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경작하는 미국 등과 경쟁하려면 아직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 농민은 주변 37농가와 함께 경지를 집단화해 농작업 직접 생산비를 45%나 줄였습니다.
⊙정회헌(전북 김제시 부량면): 생산비가 그렇게 되면 거의 반 정도 는다고 봐야죠.
혼자 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기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 중의 하나인 전북 김제 평야입니다.
이런 평야지대의 농가들이 농지 규모를 늘리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 등 산간지역의 경우 1필지 1200의 소작료가 6가마에 불과하지만 평야지대는 그 2배에 이릅니다.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농지값도 규모화의 장애물입니다.
⊙김완배(서울대 농생대 교수): 정부의 농지정책을 보면 농지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규모화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기자: 영농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외국 쌀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농규모화야말로 쌀개방 시대에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시리즈
쌀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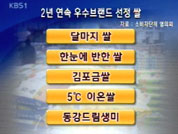




![[여론조사] 영남 표심 흔들?…국민의힘 ‘비상’·<br>민주당 ‘외연확장’](/data/news/2025/05/16/20250516_RZdJiY.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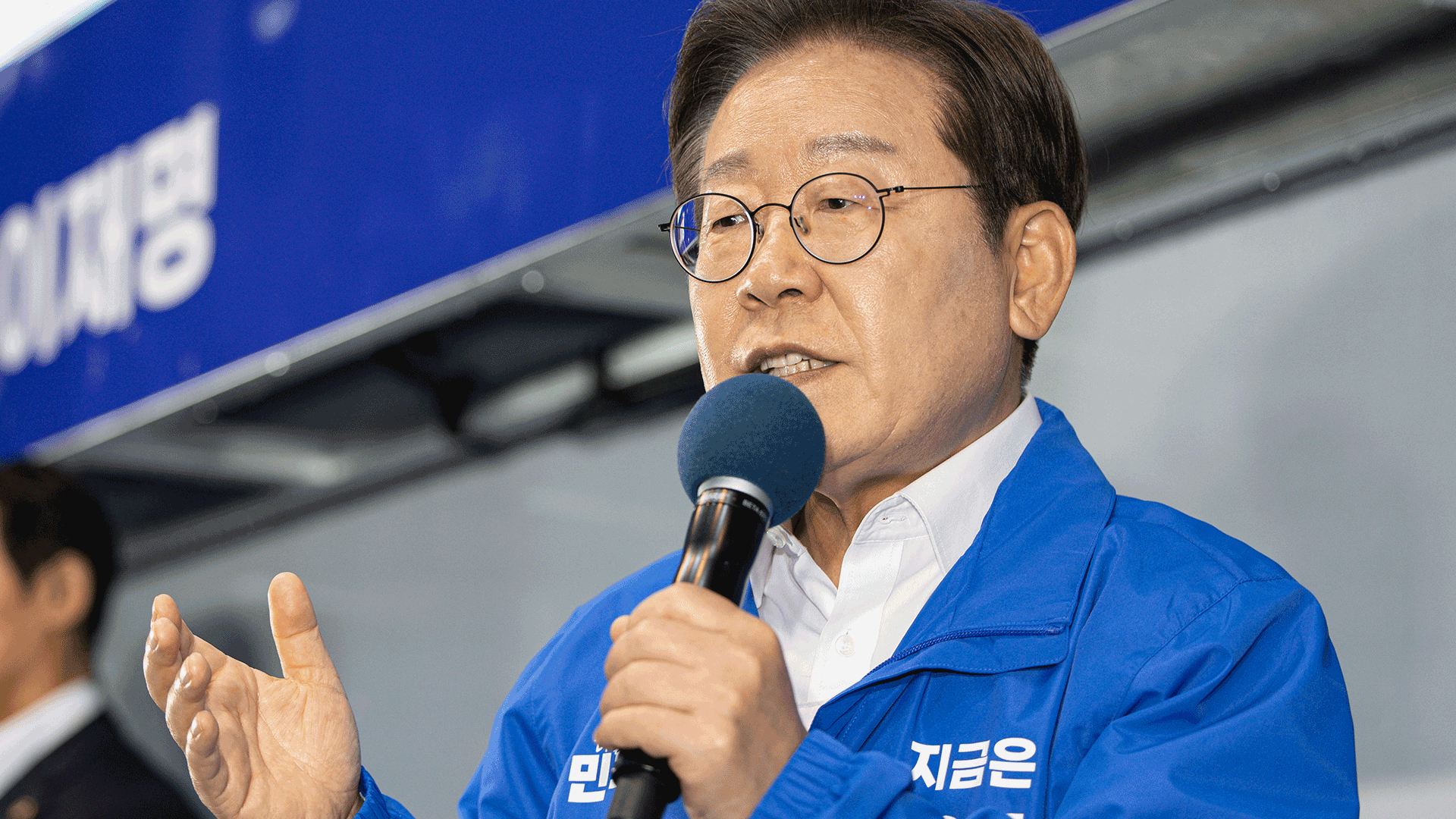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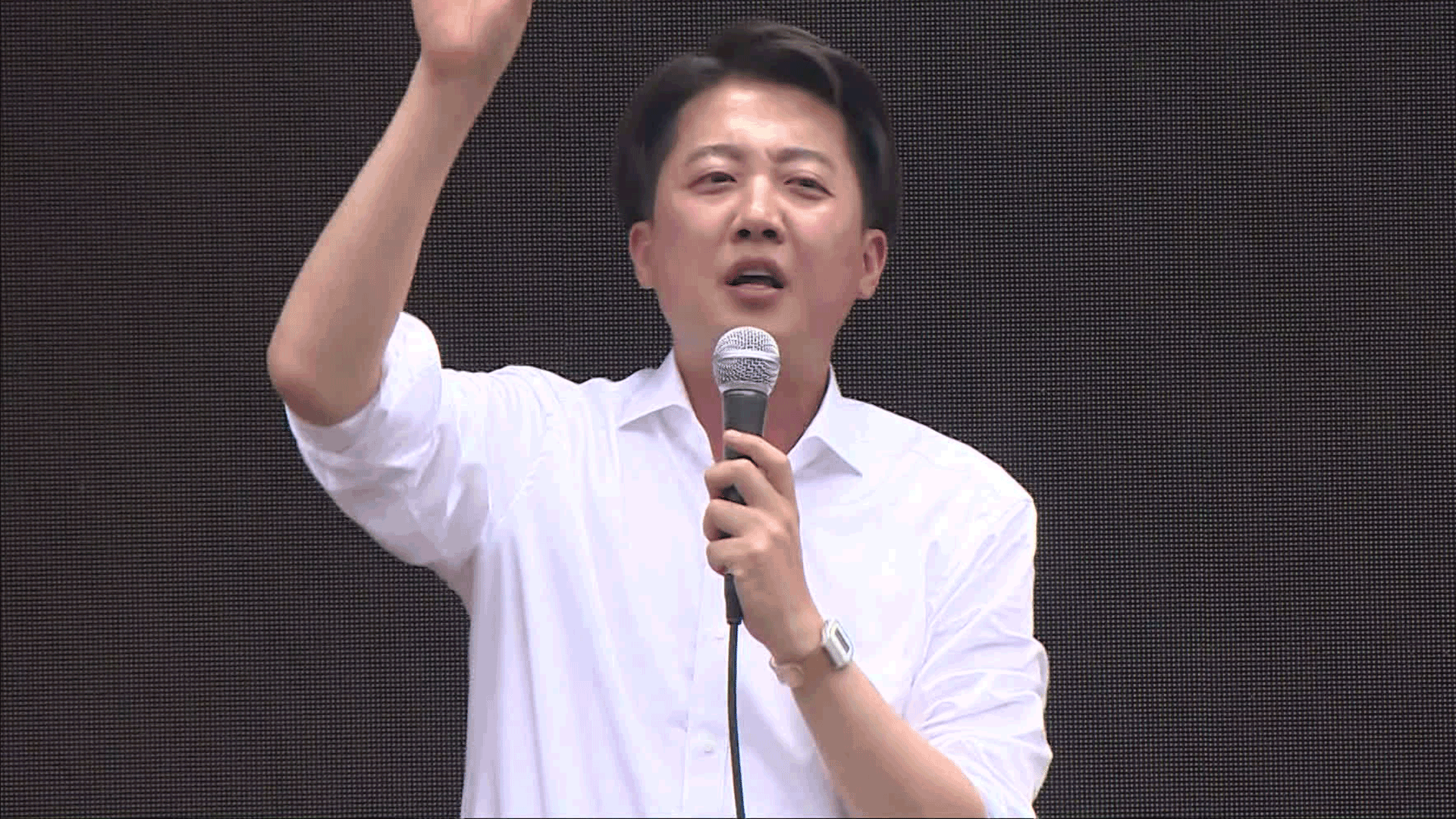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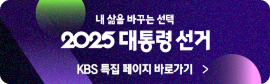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