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기후 난민 실태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섬 투발루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때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남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투발루, 그러나 옛 명성이 무색하게 섬 곳곳은 쓰레기더미가 됐습니다.
<인터뷰> 아모스 : "비만 오면 이곳이 다 잠깁니다. 또 물에 잠길텐데 쓰레기를 치워서 뭐합니까."
킹-타이드라 불리는 만조가 닥치면 바닷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평균 해발고도는 1.8미터, 물웅덩이 위, 기둥을 세워 수상 가옥을 지어 삽니다.
<인터뷰> 뉴 : "섬이 평평하고 언덕도 없어서 (물이 차면) 대피할 곳도 없습니다."
나무들은 하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파도에 흙이 쓸리고 바닷물에 잠기면서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농사는 포기한 지 이미 오랩니다.
<인터뷰> 타바우 테이(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 "과일까지 사라지면 우리는 식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바닷속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죽어버린 산호들로 바닷속은 사막이 됐습니다.
해마다 5.9mm씩 해수면이 올라가는 투발루, 50년 뒤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7년 전 온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간 파티파티씨 부부, 자녀만이라도 투발루를 떠나보낼 마음에 이민간 친척에게 세 자녀를 입양시켰습니다.
<인터뷰> 파티파티 : "아이들을 못 본 지 오래됐죠. 편지나 전화로 연락합니다."
투발루 인구 5명 가운데 한명꼴인 2천여 명이 해마다 이 곳 푸나푸티 공항을 통해 투발루를 떠납니다.
대부분 가족 방문이 이유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투발루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돼 이민온 파티파티씨 아이들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8명이 살다보니 비좁아 주차장까지 거실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투발루를 떠난 아이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인터뷰> 타우상아(13살/투발루인 이주자) : "투발루에서 사는 건... 별로예요. 휴가지로는 가겠지만."
뉴질랜드의 투발루 이주자는 3천여 명, 투발루 전체 인구의 1/4이 넘습니다.
이주자가 급격히 늘자 뉴질랜드는 한 해에 젊은 노동자 75명만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티마이오(투발루인 이주자) : "나이 들었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민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2개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울먹이는 투발루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녹취> 이안 프라이(투발루 대표) : "아침에 일어나 울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됐다지만,(조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제 투발루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투발루의 유일한 광장인 활주로,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 북적입니다.
이런 평화로움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을지는 인류가 기후문제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동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기후 난민 실태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섬 투발루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때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남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투발루, 그러나 옛 명성이 무색하게 섬 곳곳은 쓰레기더미가 됐습니다.
<인터뷰> 아모스 : "비만 오면 이곳이 다 잠깁니다. 또 물에 잠길텐데 쓰레기를 치워서 뭐합니까."
킹-타이드라 불리는 만조가 닥치면 바닷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평균 해발고도는 1.8미터, 물웅덩이 위, 기둥을 세워 수상 가옥을 지어 삽니다.
<인터뷰> 뉴 : "섬이 평평하고 언덕도 없어서 (물이 차면) 대피할 곳도 없습니다."
나무들은 하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파도에 흙이 쓸리고 바닷물에 잠기면서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농사는 포기한 지 이미 오랩니다.
<인터뷰> 타바우 테이(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 "과일까지 사라지면 우리는 식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바닷속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죽어버린 산호들로 바닷속은 사막이 됐습니다.
해마다 5.9mm씩 해수면이 올라가는 투발루, 50년 뒤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7년 전 온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간 파티파티씨 부부, 자녀만이라도 투발루를 떠나보낼 마음에 이민간 친척에게 세 자녀를 입양시켰습니다.
<인터뷰> 파티파티 : "아이들을 못 본 지 오래됐죠. 편지나 전화로 연락합니다."
투발루 인구 5명 가운데 한명꼴인 2천여 명이 해마다 이 곳 푸나푸티 공항을 통해 투발루를 떠납니다.
대부분 가족 방문이 이유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투발루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돼 이민온 파티파티씨 아이들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8명이 살다보니 비좁아 주차장까지 거실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투발루를 떠난 아이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인터뷰> 타우상아(13살/투발루인 이주자) : "투발루에서 사는 건... 별로예요. 휴가지로는 가겠지만."
뉴질랜드의 투발루 이주자는 3천여 명, 투발루 전체 인구의 1/4이 넘습니다.
이주자가 급격히 늘자 뉴질랜드는 한 해에 젊은 노동자 75명만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티마이오(투발루인 이주자) : "나이 들었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민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2개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울먹이는 투발루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녹취> 이안 프라이(투발루 대표) : "아침에 일어나 울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됐다지만,(조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제 투발루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투발루의 유일한 광장인 활주로,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 북적입니다.
이런 평화로움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을지는 인류가 기후문제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동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몰 위기’ 투발루, 떠나는 국민
-
- 입력 2010-01-08 22:01:42

<앵커 멘트>
기후 난민 실태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섬 투발루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때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남태평양의 작은 산호섬 투발루, 그러나 옛 명성이 무색하게 섬 곳곳은 쓰레기더미가 됐습니다.
<인터뷰> 아모스 : "비만 오면 이곳이 다 잠깁니다. 또 물에 잠길텐데 쓰레기를 치워서 뭐합니까."
킹-타이드라 불리는 만조가 닥치면 바닷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평균 해발고도는 1.8미터, 물웅덩이 위, 기둥을 세워 수상 가옥을 지어 삽니다.
<인터뷰> 뉴 : "섬이 평평하고 언덕도 없어서 (물이 차면) 대피할 곳도 없습니다."
나무들은 하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파도에 흙이 쓸리고 바닷물에 잠기면서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농사는 포기한 지 이미 오랩니다.
<인터뷰> 타바우 테이(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 : "과일까지 사라지면 우리는 식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바닷속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죽어버린 산호들로 바닷속은 사막이 됐습니다.
해마다 5.9mm씩 해수면이 올라가는 투발루, 50년 뒤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7년 전 온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간 파티파티씨 부부, 자녀만이라도 투발루를 떠나보낼 마음에 이민간 친척에게 세 자녀를 입양시켰습니다.
<인터뷰> 파티파티 : "아이들을 못 본 지 오래됐죠. 편지나 전화로 연락합니다."
투발루 인구 5명 가운데 한명꼴인 2천여 명이 해마다 이 곳 푸나푸티 공항을 통해 투발루를 떠납니다.
대부분 가족 방문이 이유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투발루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돼 이민온 파티파티씨 아이들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8명이 살다보니 비좁아 주차장까지 거실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투발루를 떠난 아이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인터뷰> 타우상아(13살/투발루인 이주자) : "투발루에서 사는 건... 별로예요. 휴가지로는 가겠지만."
뉴질랜드의 투발루 이주자는 3천여 명, 투발루 전체 인구의 1/4이 넘습니다.
이주자가 급격히 늘자 뉴질랜드는 한 해에 젊은 노동자 75명만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티마이오(투발루인 이주자) : "나이 들었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민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92개국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
울먹이는 투발루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녹취> 이안 프라이(투발루 대표) : "아침에 일어나 울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른이 됐다지만,(조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제 투발루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투발루의 유일한 광장인 활주로, 민속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 북적입니다.
이런 평화로움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을지는 인류가 기후문제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동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
-

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구경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시리즈
기후난민…현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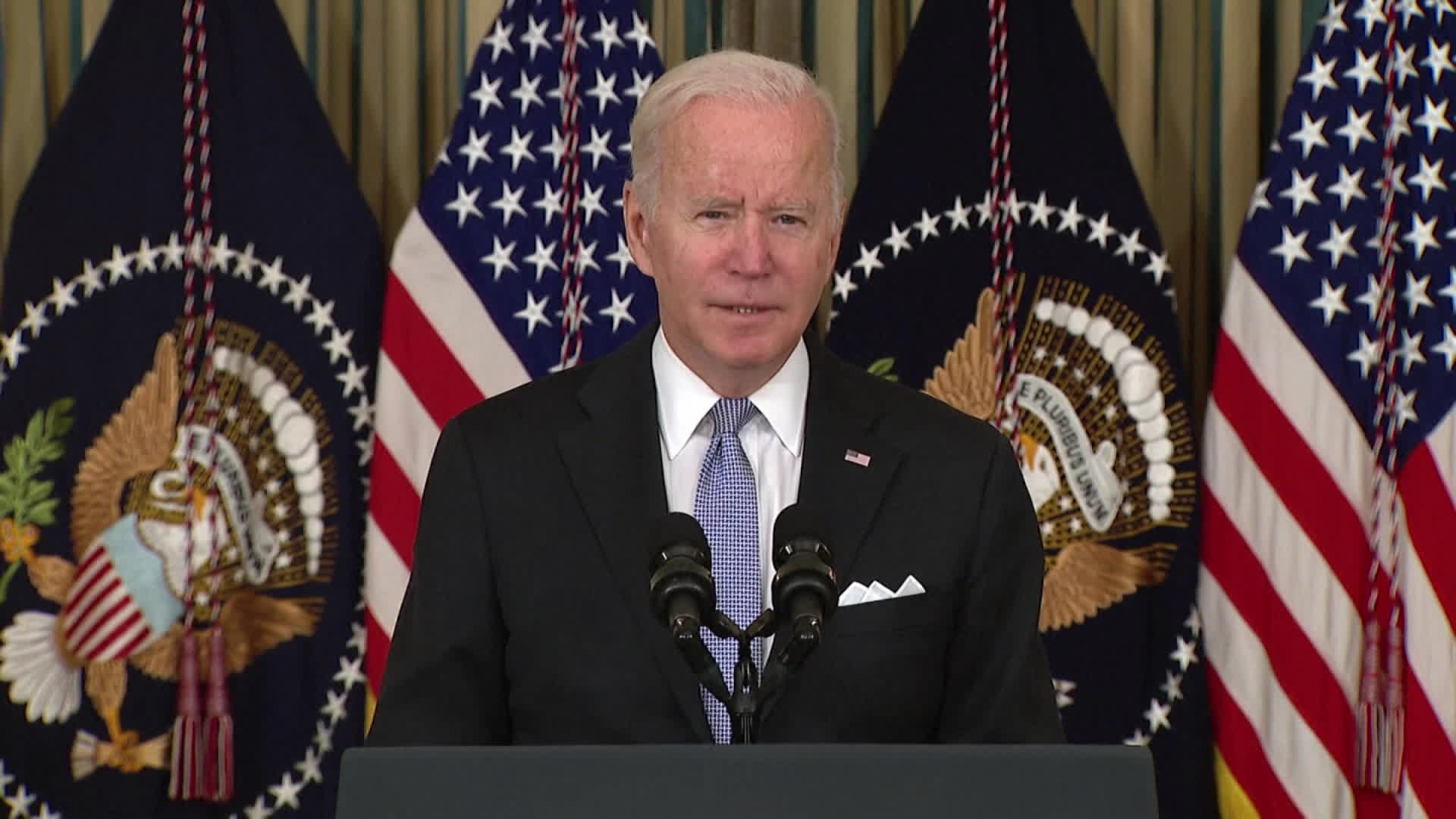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