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빙속 팀 추월 사상 첫 메달 ‘겹경사’
입력 2013.03.25 (08:24)
수정 2013.03.25 (09:27)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2013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겹경사'를 맞았다.
이상화(서울시청), 모태범(대한항공)이 남녀 500m에서 나란히 첫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팀 추월에서도 사상 첫 메달을 두 개나 휩쓴 것이다.
24일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 스케이팅 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녀 팀 추월 대표팀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화와 모태범의 업적에 가려 아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에 중요한 계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회 전까지 한국은 팀 추월에서 한 번도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장거리 종목으로 분류되는 팀 추월은 2005년부터 종별선수권대회 정식 종목으로 열렸으나 늘 네덜란드 등 유럽 선수들의 독무대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여자 팀 추월 동메달을 두 차례 획득한 것이 전부다. 남자부에서는 아시아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본 적도 없다.
게다가 한국은 이규혁(서울시청), 이강석(의정부시청) 등 오랫동안 단거리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 아예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를 내보내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한국이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종별세계선수권대회 팀 추월에 대표팀을 내보냈다.
당시 남자 대표팀은 8팀 중 7위, 여자 대표팀은 8팀 중 6위에 그쳤다.
불과 1년 사이에 남자는 2위, 여자는 3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쇼트트랙에서 종목을 바꾼 이승훈(대한항공)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불모지'이던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에도 본격적으로 르네상스가 열린 것이 그 배경이다.
이날 팀 추월 경기에 나선 김철민, 주형준, 김보름, 박도영 등이 모두 한국체대에 다니는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신예'들의 기세가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훈과 노선영(용인시청) 등 장거리의 명맥을 이어 온 선수들이 중심을 잡는 가운데 '새싹'들이 쑥쑥 자라나면서 한국은 사상 첫 팀 추월 메달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낼 수 있었다.
여전히 대표팀 내에서도 실력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적어도 한두 명의 선수가 외로운 레이스를 벌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불어넣을 만큼의 저변이 마련됐다.
지난달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서정수(단국대)가 37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는 등 어린 선수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선수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한국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르네상스'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상화(서울시청), 모태범(대한항공)이 남녀 500m에서 나란히 첫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팀 추월에서도 사상 첫 메달을 두 개나 휩쓴 것이다.
24일 러시아 소치 아들레르 아레나 스케이팅 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녀 팀 추월 대표팀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화와 모태범의 업적에 가려 아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에 중요한 계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회 전까지 한국은 팀 추월에서 한 번도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 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장거리 종목으로 분류되는 팀 추월은 2005년부터 종별선수권대회 정식 종목으로 열렸으나 늘 네덜란드 등 유럽 선수들의 독무대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여자 팀 추월 동메달을 두 차례 획득한 것이 전부다. 남자부에서는 아시아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 본 적도 없다.
게다가 한국은 이규혁(서울시청), 이강석(의정부시청) 등 오랫동안 단거리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 아예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를 내보내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한국이 지난해에야 처음으로 종별세계선수권대회 팀 추월에 대표팀을 내보냈다.
당시 남자 대표팀은 8팀 중 7위, 여자 대표팀은 8팀 중 6위에 그쳤다.
불과 1년 사이에 남자는 2위, 여자는 3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쇼트트랙에서 종목을 바꾼 이승훈(대한항공)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불모지'이던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에도 본격적으로 르네상스가 열린 것이 그 배경이다.
이날 팀 추월 경기에 나선 김철민, 주형준, 김보름, 박도영 등이 모두 한국체대에 다니는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신예'들의 기세가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훈과 노선영(용인시청) 등 장거리의 명맥을 이어 온 선수들이 중심을 잡는 가운데 '새싹'들이 쑥쑥 자라나면서 한국은 사상 첫 팀 추월 메달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낼 수 있었다.
여전히 대표팀 내에서도 실력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적어도 한두 명의 선수가 외로운 레이스를 벌이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불어넣을 만큼의 저변이 마련됐다.
지난달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서정수(단국대)가 37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는 등 어린 선수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선수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한국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르네상스'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단독] 명태균, 영장청구 다음날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data/news/2024/11/14/20241114_tCymG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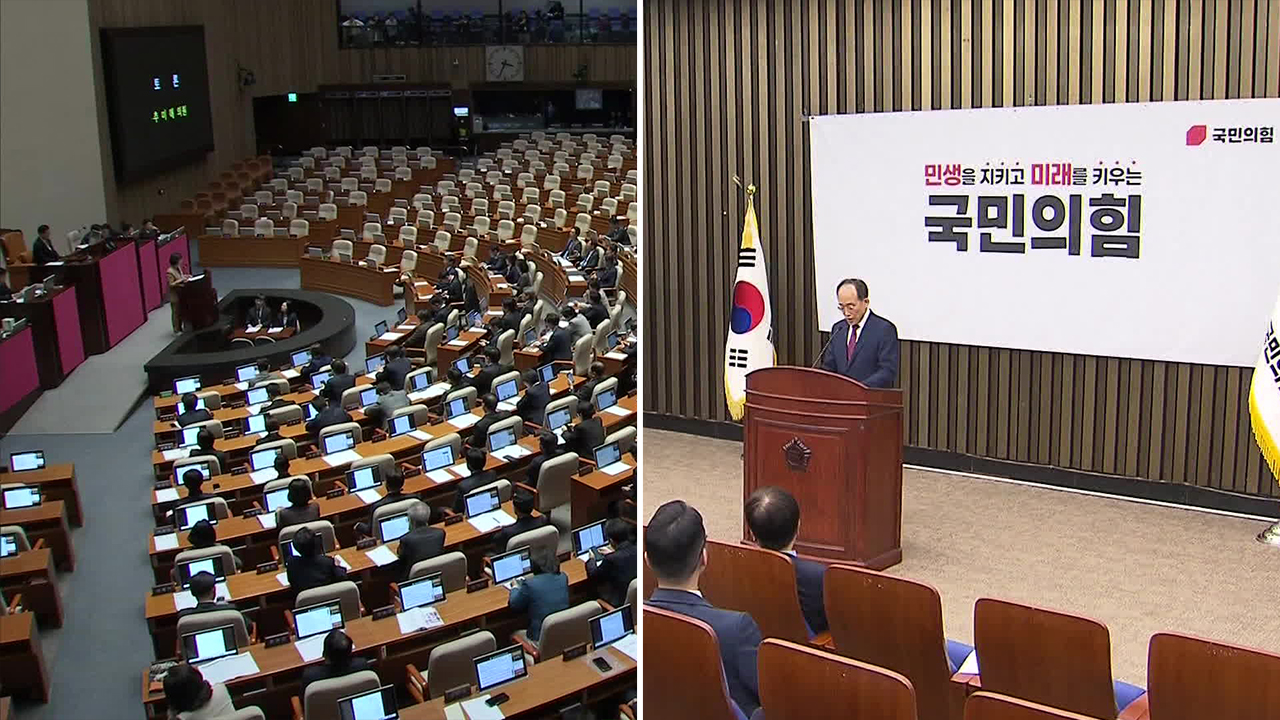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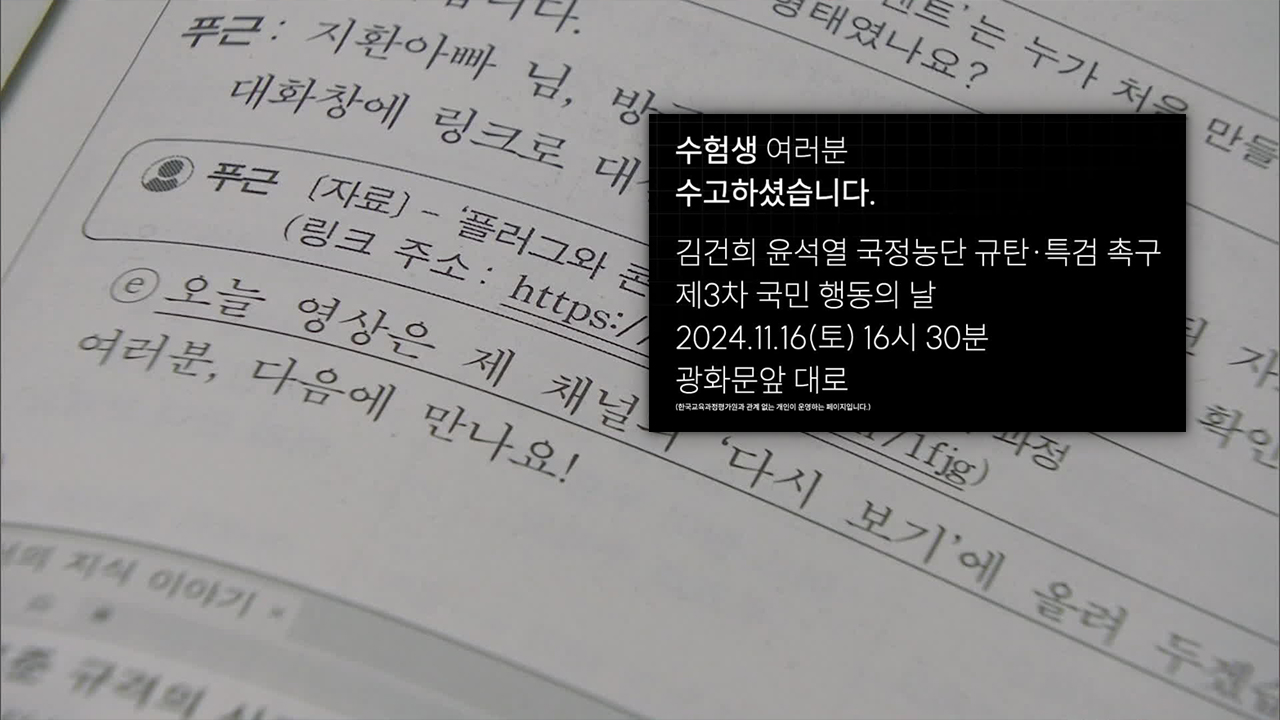

![[단독] “집 안도 들여다본다”…러시아 해커 동맹, IP 카메라 해킹](/data/news/2024/11/14/20241114_q3hjrg.jpg)

![[단독] 롯데월드에서 여성들 불법 촬영한 군인 검거](/data/news/2024/11/14/20241114_DRx1hx.jpg)
![[단독] ‘부하직원 성폭력’ 혐의 ‘김가네’ 회장, 횡령 혐의 추가 입건](/data/news/2024/11/14/20241114_43p0LU.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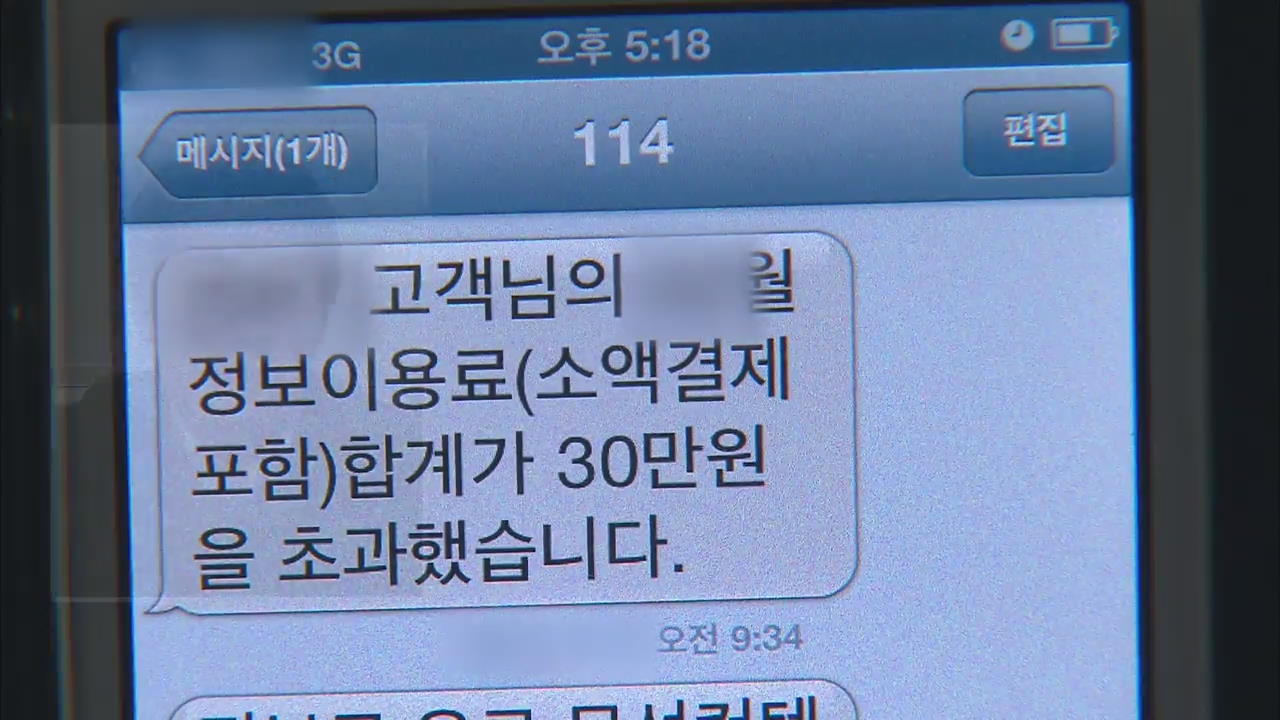

![[뉴스따라잡기] ‘쌍꺼풀 수술’ 받던 여대생, 8일 만에 숨져](/data/news/2013/03/29/2634599_1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