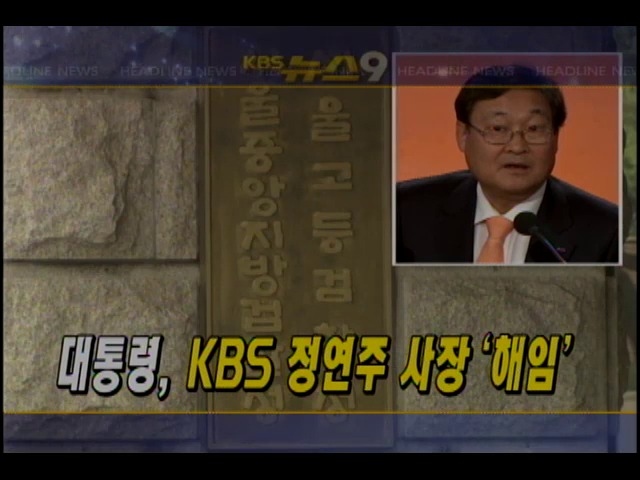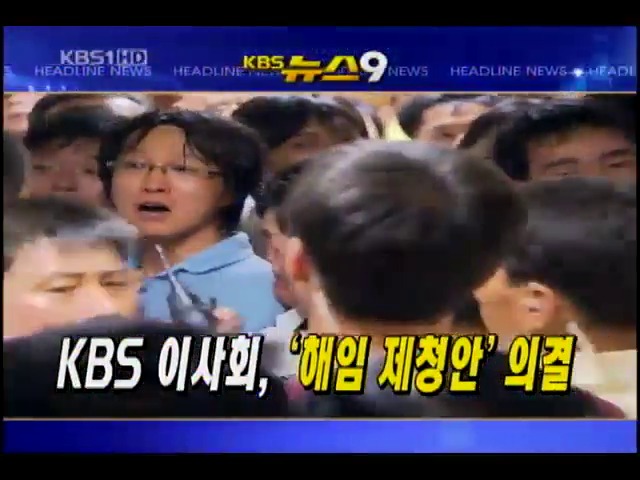‘남매 금 합창’ 양궁, 세계 최강 비결은?
입력 2008.08.11 (18:40)
수정 2008.08.11 (18:47)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한국 남녀 양궁이 또 한 번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남녀 동반 금메달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래 세번째다.
한국은 왜 활을 잘 쏠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타고났다"는 것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 기술이 좋다"는 등 설(說)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활을 쏘기 시작하는 시기, 정신력, 피 말리는 경쟁 등을 꼽는다.
한국과 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 활을 잡는 시점이다.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양궁부에서 활을 쏘는 반면,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 만 16세 이후에야 활을 만진다. 양궁에 필요한 기본 골격과 자세가 중학교 시절 대부분 형성되는 반면, 외국 선수들은 뒤늦게 활쏘기에 뛰어드는 셈이다.
정신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퍼펙트 골드' 주인공 김경욱 SBS 해설위원은 "양궁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하는 종목"이라며 "한국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돼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어린 선수들이 점점 서구식 개인주의에 물들어가는 걸 양궁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특유의 피 말리는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10년 가까이 여자는 나탈리아 발리바(39), 남자는 일라리오 디 부오(43)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애틀랜타대회부터 3회 연속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두 개나 목에 건 장용호(32.예천군청)나 2000년 시드니와 2004년 아테네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윤미진(24.수원시청)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6개월에 걸친 긴 국가대표 선발 레이스는 올림픽대표를 걸러내는 마지막 리트머스 시험지다.
남녀 1천500여명 선수가 그 대상이다. 10일 여자단체 준결승 프랑스전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0점을 잇따라 명중시키는 태극낭자들의 모습을 보면 "비 올 때에도 훈련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황도하 양궁협회 부회장은 "초겨울부터 초여름에 걸쳐 악천후 속에 6개월이나 선발전을 치르니 따로 눈비에 대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남녀 엘리트 선수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친 남녀 3명씩 6명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신력 훈련을 시키고, 매일 밤 11시까지 활을 쏘게 하니 단체전 금메달은 떼어놓은 당상인 셈이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한국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양궁 선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 등은 한국을 배워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베이징 태극남매의 금메달 행진에 환호하는 동안 현장 지도자나 선수들은 벌써 2012년 런던올림픽 걱정을 하고 있다.
남녀 동반 금메달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래 세번째다.
한국은 왜 활을 잘 쏠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타고났다"는 것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 기술이 좋다"는 등 설(說)이 분분하지만 전문가들은 활을 쏘기 시작하는 시기, 정신력, 피 말리는 경쟁 등을 꼽는다.
한국과 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처음 활을 잡는 시점이다.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양궁부에서 활을 쏘는 반면,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 만 16세 이후에야 활을 만진다. 양궁에 필요한 기본 골격과 자세가 중학교 시절 대부분 형성되는 반면, 외국 선수들은 뒤늦게 활쏘기에 뛰어드는 셈이다.
정신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퍼펙트 골드' 주인공 김경욱 SBS 해설위원은 "양궁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하는 종목"이라며 "한국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돼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어린 선수들이 점점 서구식 개인주의에 물들어가는 걸 양궁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특유의 피 말리는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10년 가까이 여자는 나탈리아 발리바(39), 남자는 일라리오 디 부오(43)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애틀랜타대회부터 3회 연속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두 개나 목에 건 장용호(32.예천군청)나 2000년 시드니와 2004년 아테네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윤미진(24.수원시청)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6개월에 걸친 긴 국가대표 선발 레이스는 올림픽대표를 걸러내는 마지막 리트머스 시험지다.
남녀 1천500여명 선수가 그 대상이다. 10일 여자단체 준결승 프랑스전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10점을 잇따라 명중시키는 태극낭자들의 모습을 보면 "비 올 때에도 훈련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황도하 양궁협회 부회장은 "초겨울부터 초여름에 걸쳐 악천후 속에 6개월이나 선발전을 치르니 따로 눈비에 대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남녀 엘리트 선수 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친 남녀 3명씩 6명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신력 훈련을 시키고, 매일 밤 11시까지 활을 쏘게 하니 단체전 금메달은 떼어놓은 당상인 셈이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한국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양궁 선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 등은 한국을 배워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베이징 태극남매의 금메달 행진에 환호하는 동안 현장 지도자나 선수들은 벌써 2012년 런던올림픽 걱정을 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2008 올림픽…가자 베이징으로!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단독] 명태균, 영장청구 다음날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data/news/2024/11/14/20241114_tCymG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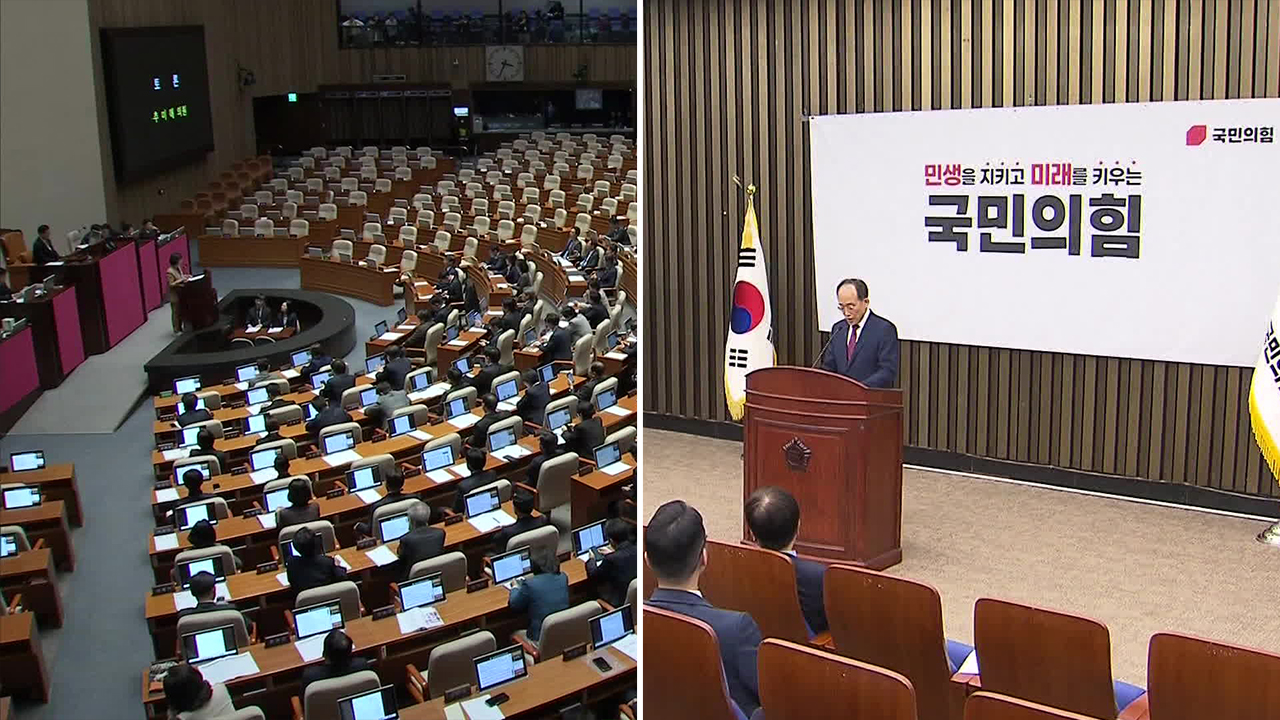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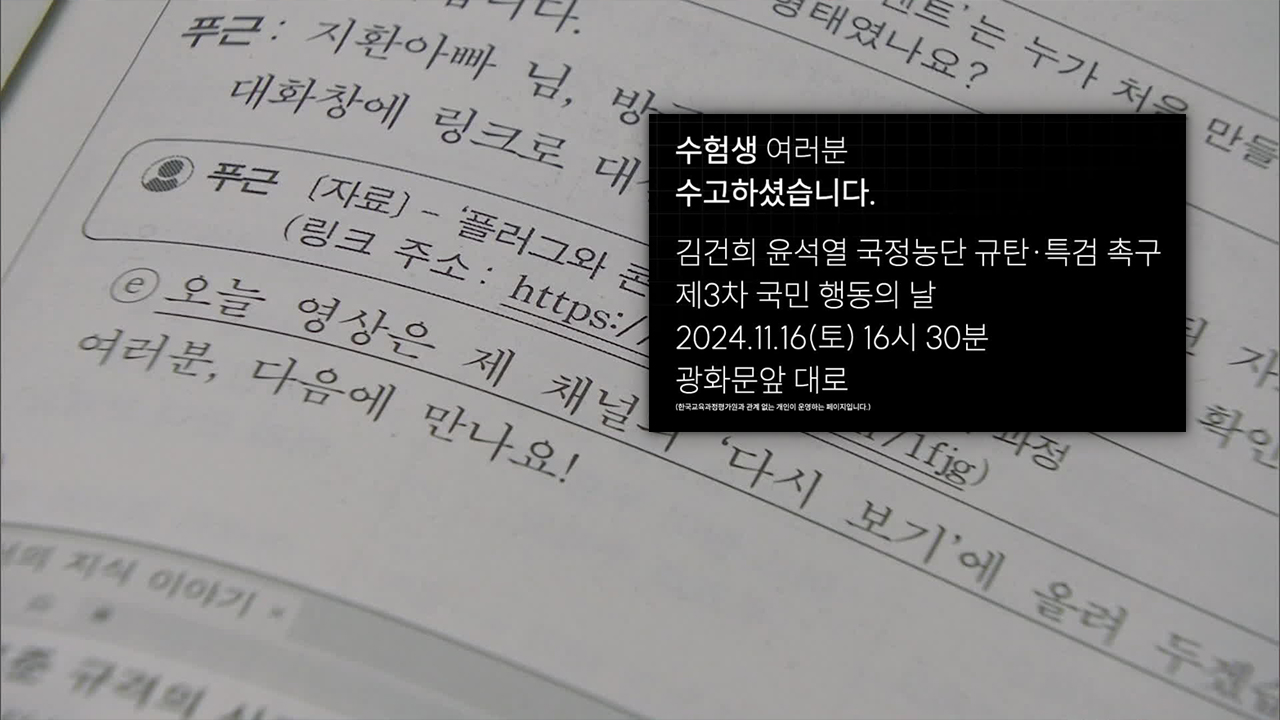

![[단독] “집 안도 들여다본다”…러시아 해커 동맹, IP 카메라 해킹](/data/news/2024/11/14/20241114_q3hjrg.jpg)

![[단독] 롯데월드에서 여성들 불법 촬영한 군인 검거](/data/news/2024/11/14/20241114_DRx1hx.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