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강점’ 로이스터 야구 진화
입력 2009.07.04 (07:25)
수정 2009.07.04 (15:31)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로이스터는 "팬들이 내 야구를 보고 흥분된 기분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월이 1년 반 흘렀다.
지난 시즌 롯데는 2000년대 만년 하위에 처져있던 팀 분위기를 바꾸고 8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가을잔치 초대장을 받았다.
올 시즌에는 개막 이후 꼴찌로 추락했다가 6월 한 달 최고 승률을 기록하며 어느덧 4강권까지 치고 올라가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희망의 불빛을 밝히고 있다.
로이스터는 롯데에서 200경기 넘게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한국 야구를 접했다. 1973∼1988년까지 애틀랜타 등에서 내야수로 뛰었던 로이스터는 2002년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 감독을 포함해 마이너리그 코치, 감독까지 10년 가까이 지도자로 생활했다.
경력을 놓고 보면 로이스터는 유일하게 '한미 프로야구 합작 실험'을 진행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로이스터의 눈에 비친 한국식 야구와 미국식 야구는 무엇일까.
◇ 미국식 야구는 좋은 야구(?)
로이스터는 한국에 온 뒤 롯데 더그아웃 알림판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말을 써놓았다.
7,8위를 전전했던 롯데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한국 야구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마운드와 타석, 수비 위치에서 소극적인 플레이로 일관한다는 생각이었다. 그가 처음 챙겨간 한국 야구 DVD에서 한 경기에 두 세번씩 번트대는 장면이 나오자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뛰다 죽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도루 시도를 머뭇거리고 병살타를 쳐서는 안 된다는 압박 때문에 제대로 된 스윙을 보여주지 못하는 장면에 대한 지적이었다. 위기에서 올라간 구원투수들이 상대 강타자와 정면 승부를 피하다 볼넷을 남발하고 자멸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로이스터는 입만 열면 '좋은 야구'를 역설했다. 그래서 경기 후 평가는 늘 '오늘 우리는 좋은 야구를 보여줬다', '오늘은 좋지 못한 야구를 했다'는 말로 압축됐다.
즉 좋은 야구란 두려움이 없는 적극적인 플레이로 해석됐다.
타석에서는 볼을 골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볼을 때리고 나가는 것이 정석이라는 미국식 야구의 전형을 강조한 셈이다. 롯데 타자들은 지난 시즌 '3구내 타격'을 기본으로 공격 성향을 높였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상품 가치를 높여 빅 리그로 올라가야 하는 마이너리그 타자들의 극단적인 공격 성향을 주입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 ‘미국식 사고는 나쁠 수도 있다’
로이스터는 지난 1일 잠실구장에서 "미국식 사고는 타자들에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비도 공격적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타석에 들어서는 자세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공격 철학'을 내비쳤다.
작년 타점왕을 차지했던 외국인 타자 카림 가르시아가 초구부터 나쁜 공에 마구 헛방망이질을 해대면서 타율을 까먹고 롯데 타자들의 4사구 점유율이 4,5월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득점 생산력이 극도로 저하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로이스터의 머릿속에는 공격적인 미국식 야구를 접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있다.
로이스터는 주전 포수 강민호가 주자를 1루에 두고 진루타를 치기 위해 툭 갖다대는 스윙을 하자 "어떤 상황이든 두려움없이 자신있게 휘둘러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하지만 한국 야구가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내로라하는 메이저리그 스타들로 구성된 강팀들을 연파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하자 한국식 야구를 달리 보게 된 면도 있다.
WBC에서 한국 야구는 철저한 관리형 플레이로 대표되는 일본의 '스몰볼'과 달리 메이저리그식 '빅볼'을 혼합한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
◇ 로이스터의 한국식 야구
로이스터는 지난달 대구구장 더그아웃에서 '지금 우리 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 통할 투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라고 묻자 "10명쯤은 된다"고 답했다. 한국 야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는 볼카운트 스리볼에서 치는 타자들이 제법 많다", "한국 투수들이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변했다. 타자를 지배하면서 던지는 투수들이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로이스터는 여전히 '공격적'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경기에 임하지만 작전 지시는 확실히 변했다.
요즘에는 서너점 차이로 앞서고 있어도 무사에 주자가 출루하면 종종 희생번트 지시를 내린다. 작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거의 변화없는 선발 라인업을 짰던 작년과 달리 상대 선발이 좌투수일 때 라인업은 거의 모조리 우타자로 바뀐다. 7,8회에 앞서고 있을 때면 내.외야수를 수비가 좋은 선수로 죄다 바꾸는 교체 전술도 쓴다.
로이스터의 좋은 야구는 미국식 야구에서 '득점을 생산하는 야구', '이기는 야구'로 바뀌고 있다.
로이스터는 이번 시즌 롯데로 옮겨온 FA(자유계약선수) 이적생 홍성흔에 대해 시즌 초 "우리 야구 철학을 이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흔은 이른바 '갈매기 타법'이라는 독특한 준비동작을 취하면서 우중간을 타격 목표점으로 삼았다. 자신의 타율을 높이면서 주자가 있을 때 한 루라도 더 진루시키고, 단타로 1루 주자를 3루까지 보내겠다는 전략이 섞인 자세이다.
로이스터는 두 달 후 "홍성흔이 우리 야구에 적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로이스터의 눈에는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미국식 야구와 한국식 야구의 차이가 남은 게 아니라 두 개념이 혼합된 좋은 야구만 남은 느낌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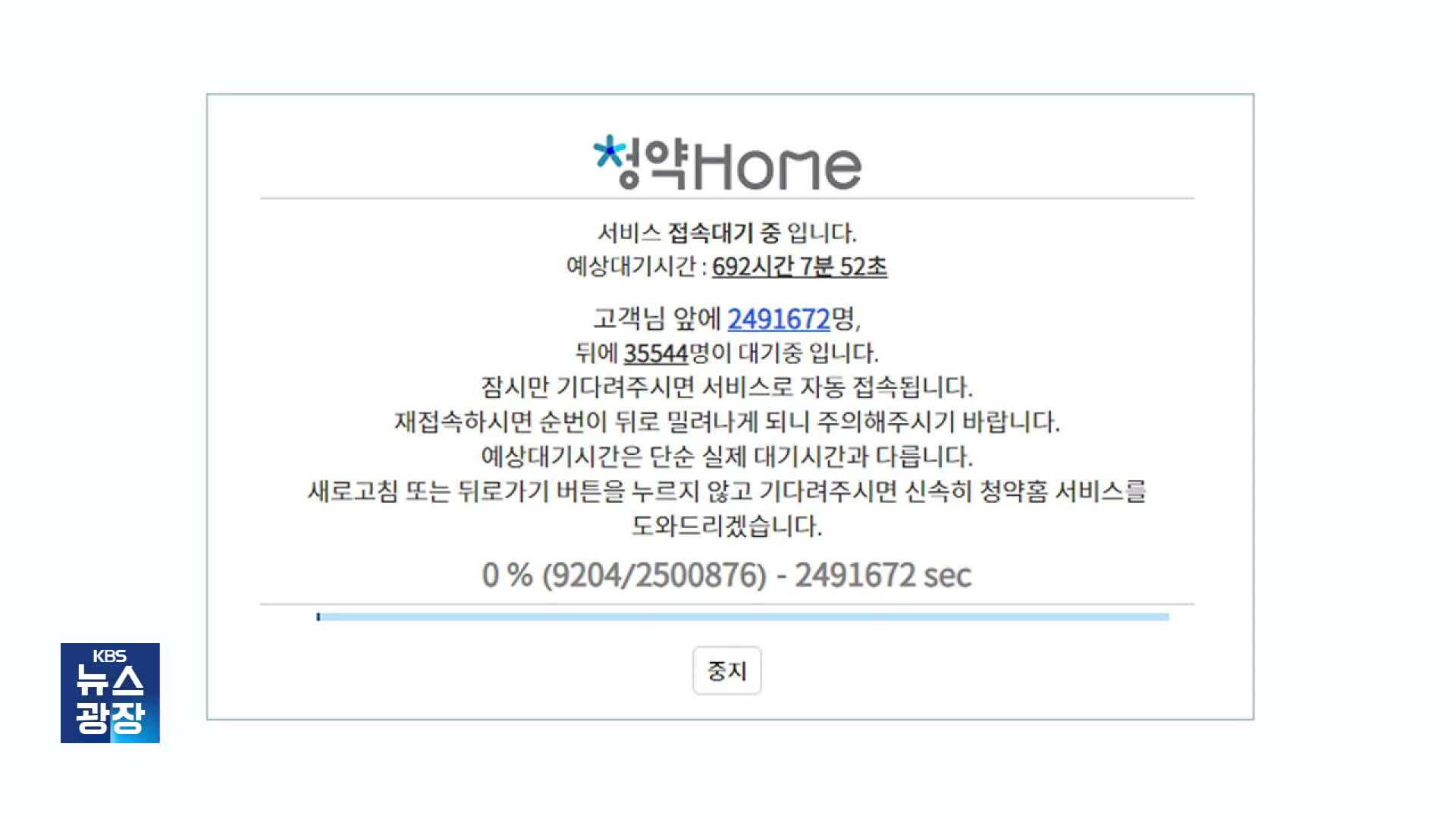


![[영상] “얼마나 아팠으면…” 중계진 속상했던 여자체조 이윤서 경기 장면](/data/news/2024/07/29/20240729_YgvLBW.jpg)

![[영상] ‘위장공격 지도’ 허미미 결승서 반칙패 은메달](/data/news/2024/07/30/20240730_L669nF.png)

![[영상] ‘텐’의 행진!…남자 양궁 단체전 3회연속 금메달](/data/news/2024/07/30/20240730_hUzN6F.png)
![[취재현장] 공무원 ‘비과세 수당’ 특혜](/newsimage2/200907/20090701/1803327.jpg)
![[현장] 불황의 그늘 ‘자녀 양육 포기’ 급증](/newsimage2/200907/20090708/18066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