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화 한화행…감독과 고향이야기
입력 2009.09.26 (07:39)
수정 2009.09.26 (09:06)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983년 대전 연고 OB에서 데뷔한 한 감독은 고향에 제7구단 빙그레가 생기자 '트레이드 해달라'며 임의탈퇴 소동까지 일으켰지만 1986년 호남 연고의 해태로 옮겼고 전화위복이 돼 1993년까지 한국시리즈에서 6차례나 우승하며 선수생활의 전성기를 누렸다.
서울팀 LG로 옮긴 1994년에도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은 한 감독은 1997년 전북 연고의 쌍방울에서 은퇴했다. 고향 복귀는 23년 만이다.
한화가 전신 빙그레 시절 포함, 선수로 1년도 뛰지 않은 한 감독에게 새 지휘봉을 맡긴 건 지역을 대표하는 간판스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 감독이 동국대 감독 시절 유망주와 소통하는 법을 터득해 육성에도 일가견이 있고 한화가 성적에서 수년간 크게 밀렸던 삼성 수석코치 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대전의 얼굴'이라는 점이 더 큰 매력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펴낸 연감에 따르면 역대 프로야구 28년간 사령탑 또는 감독 대행을 지낸 이는 작년까지 52명이었다.
이들 중 고향팀을 지휘한 감독은 20명이 채 안 된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뒤 선수로 뛰었던 세대가 지도자가 되면서 고향팀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용희 전 롯데, 이광은 LG, 서정환 전 삼성, 김성한 전 KIA, 양상문 전 롯데 감독 등이 주인공이다.
유달리 지역성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프로야구도 예외는 아니다.
그 지역이 배출한 특급스타는 영웅으로 추앙받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연고팀 사령탑에 앉을 '우선권'을 얻는 게 현실이다. 팬들의 충성도도 다른 지역 지도자보다 더 높다.
엄청난 팬들의 기대와 지지를 등에 업고 팀을 잘 꾸려간다면 감독으로 장수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팬들의 실망도 크기에 나중에 다른 구단의 러브콜을 받기 어렵다는 복잡한 구석도 있다.
감독의 연고도 중요하나 팬과 구단은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현재 좋은 성적을 안겨다 주는 감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롯데를 맡았던 김용희 전 감독은 2002년 롯데 감독 대행을 끝으로 재야에 머무르고 있다. 이광은 전 LG 감독은 2002년 중도 퇴진한 뒤 모교 연세대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김성한 전 감독도 2004년 물러난 뒤 방송 해설위원을 거쳤고 지금은 미국에서 선진 야구를 배우는 중이다. 양상문 전 감독만 2005년 말 지휘봉을 놓고 2006년 해설위원, 2007~2008년 LG 투수코치를 거쳐 올해부터 롯데 2군 감독을 맡아 현역을 지키고 있다.
한대화 신임 한화 감독도 '양날의 칼'을 쥐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
한 감독은 "당장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말보다는 세대교체를 통해 마운드, 주루 능력 등 떨어지는 전력을 끌어올려 팀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향 팬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영상] “결국 해내네요” 여자 사격 반효진 금메달…마지막 한발이 뒤집었다](/data/news/2024/07/29/20240729_AGHNzR.png)
[영상] “결국 해내네요” 여자 사격 반효진 금메달…마지막 한발이 뒤집었다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잡는다…출산가구는 공공임대 ‘1순위’
![[영상] “가족들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쐈습니다”…반효진 KBS 단독 인터뷰](/data/news/2024/07/29/20240729_7PfKKX.jpg)
[영상] “가족들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쐈습니다”…반효진 KBS 단독 인터뷰
![[영상] “울산 팬들께 죄송…10년 전과는 다르다” 각오 밝힌 홍명보 감독](/data/fckeditor/vod/2024/07/29/320341722266820158.jpg)
[영상] “울산 팬들께 죄송…10년 전과는 다르다” 각오 밝힌 홍명보 감독

열흘 사이 경찰관 세 명이 숨졌다…“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술 취해 전 여친 ‘스토킹’ 30대 구속…상담치료 강제 못해

부산도 ‘7말 8초’ 휴가철 돌입…피서객 ‘밀물·썰물’
![[영상] “감독님 코피, 죄송합니다!”…‘도마 요정’ 여서정 선수가 사과한 이유](/data/fckeditor/vod/2024/07/29/308531722262091976.png)
[영상] “감독님 코피, 죄송합니다!”…‘도마 요정’ 여서정 선수가 사과한 이유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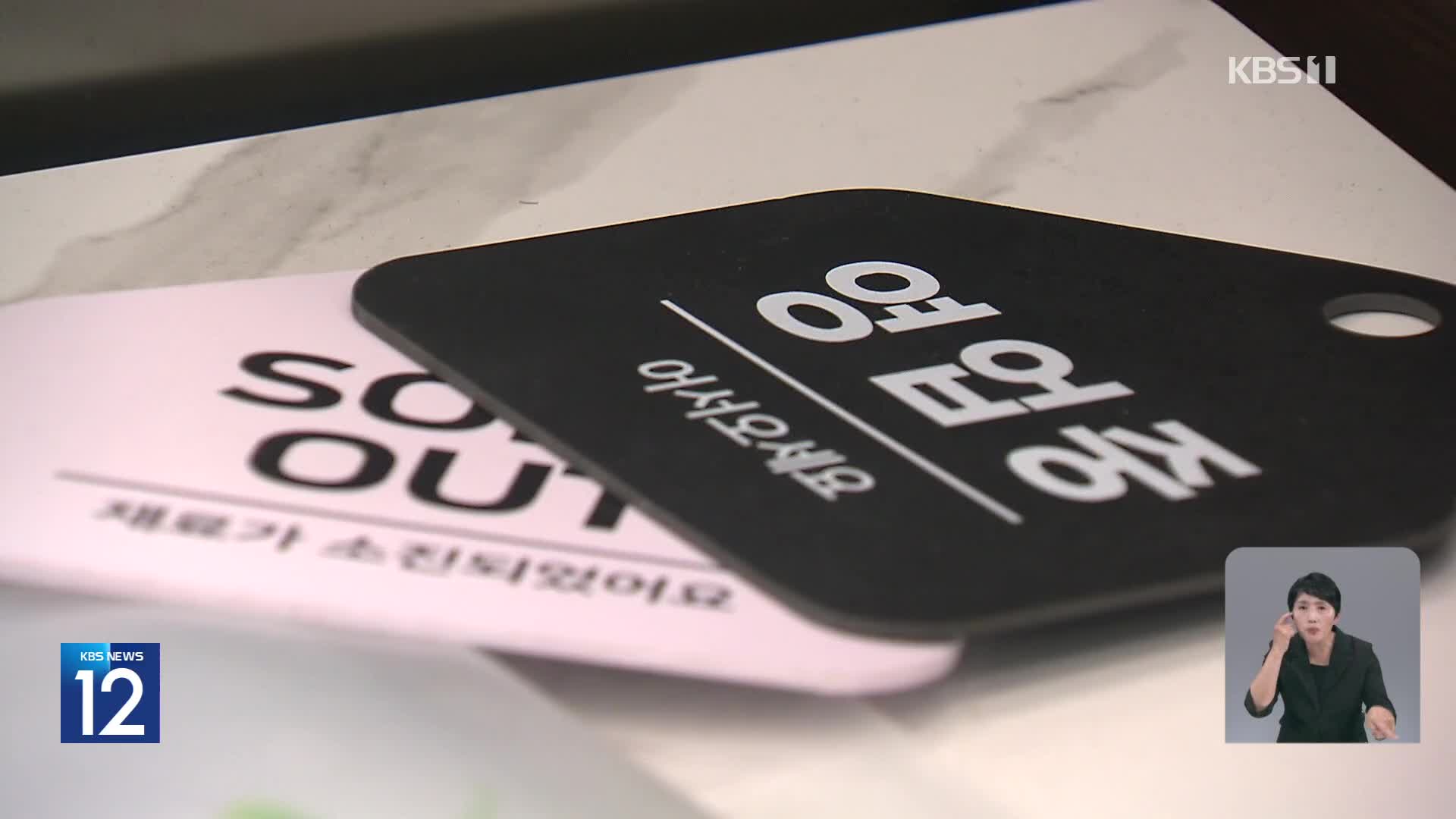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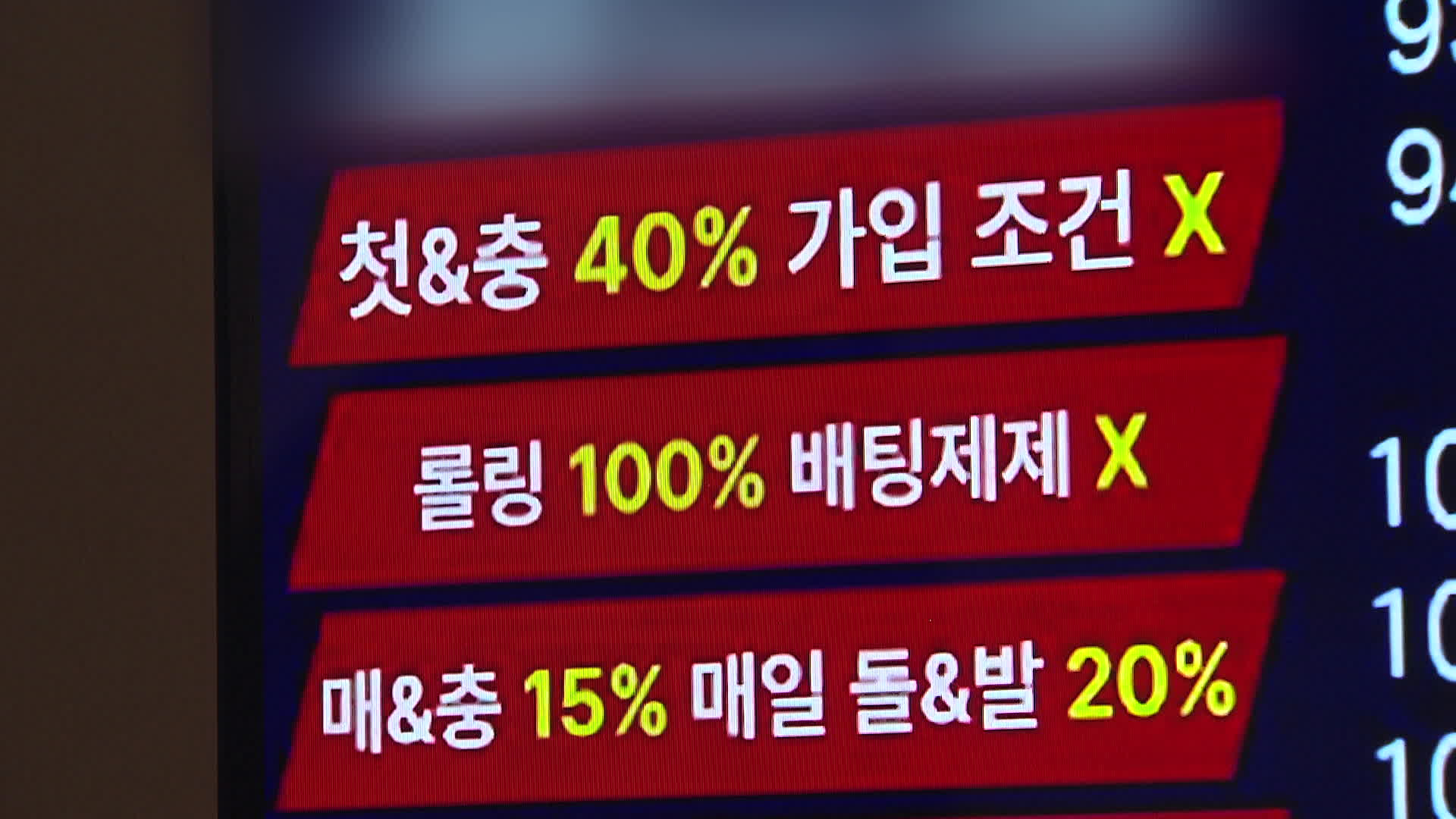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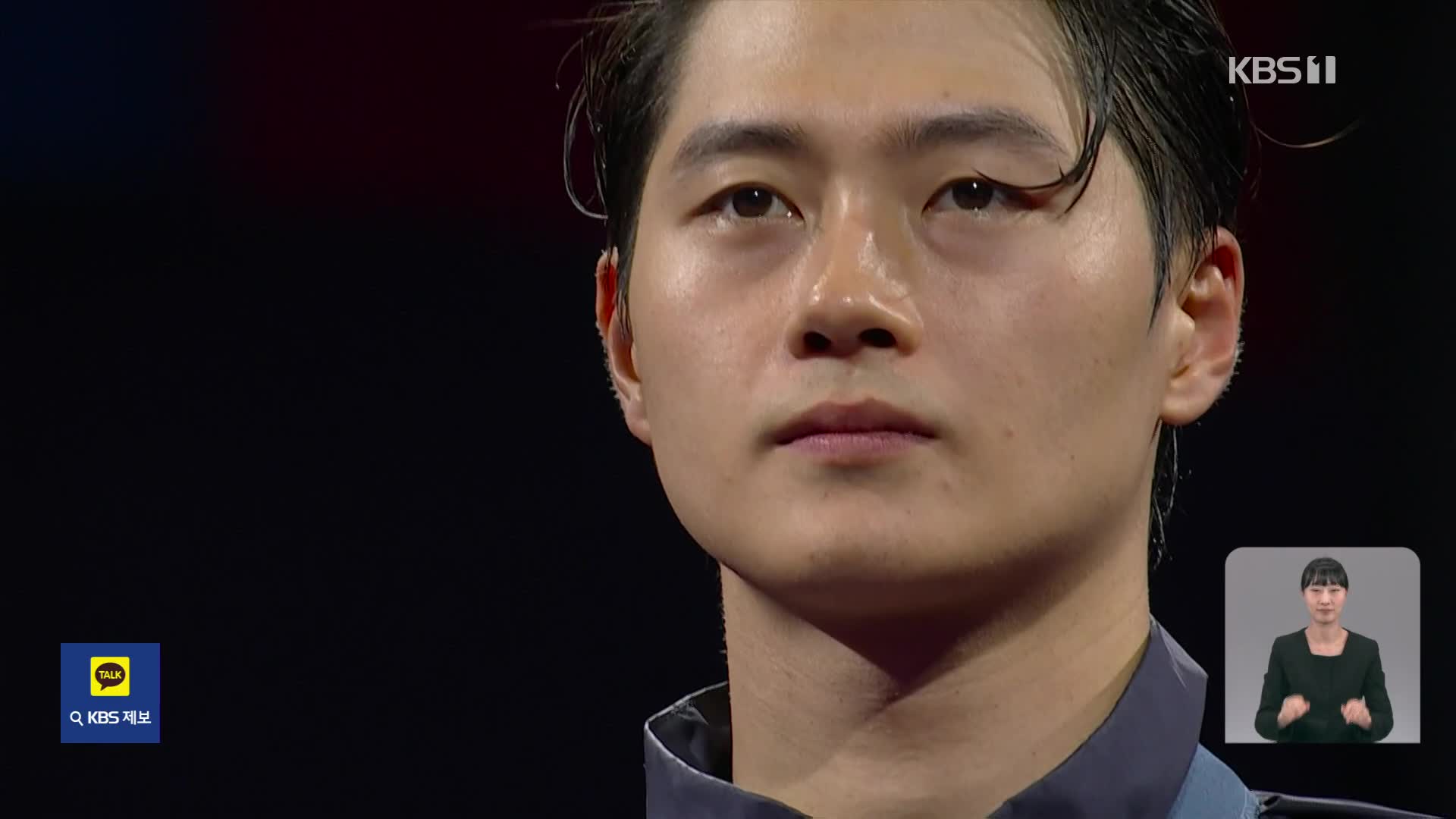



![[클릭 세계속으로] 태국 미혼모 문제 심각](/newsimage2/200909/20090914/18457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