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신의 승리’ 김성근, 빈틈없는 2연패
입력 2008.10.31 (21:59)
수정 2008.11.01 (17:06)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SK 와이번스 김성근(66) 감독이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 위업을 이뤘다. 프로야구 27년 역사상 2연패 영광을 누린 건 해태(1986-1989, 1996-1997), 현대(2003-2004), 삼성(2005-2006) 뿐이었다. 김응룡, 김재박, 선동열 감독만 오른 고지를 등정한 것이다.
2연패는 그만큼 쉽지 않다. 롯데는 1984년에 우승하고 나서 8년이 지난 1992년에야 우승 꿈을 이뤘고, 두산은 2001년 이후로는 우승 문턱에만 두 번 갔을 뿐이다.
연패 목표를 이루고자 김성근 감독은 우선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여야 했다.
시즌 초부터 1승 후 LG와 롯데에 3연패를 당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김 감독은 나중에 이때를 떠올리며 "정말 미칠 것 같더라. 코치든 누구든 붙잡고 소주나 한잔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싶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할 때에도 선수는 물론, 코치와 겸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독특한 소신이다. 사적(私的)인 자리를 만들면 반드시 약한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뒷말이나 파벌 같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려운 순간을 혼자서 이겨냈다. 경기에 질 때면 숙소까지 혼자 걸어가며 그날 패인을 분석했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타순을 짰다가 지우길 반복했다. 대신 선수들에게도 끊임없는 훈련을 요구했고, 4월말 선두로 올라선 뒤로는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시련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6월15일 문학 KIA전에서 빚어진 `윤길현 파문' 여파는 더욱 크고 거셌다. SK 투수 윤길현(25)이 경기 도중 KIA 최경환(36)에게 머리 쪽 볼을 던지고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등 매너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게 파문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고, 그 칼끝은 김감독을 향했다. `강하면 약자를 괴롭혀도 되는거냐'라는 게 팬들이 SK에 던진 의문이었다. 팬들이 자신에게 던진 화두를 이해한 김감독은 같은달 1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머리를 숙였고, 그날 경기에 자진 결장했다. 감독 생활 24년 만에 처음 맛본 쓰라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감독과 SK는 그날 하루로 동요를 끝냈고, 이후 7연승 행진을 벌였다.
그 후론 비교적 순조로웠다.
9월4일 문학 히어로즈전에선 감독 통산 1천승 고지를 돌파했다. 1984년 OB 사령탑으로 프로야구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지 25년만. 김응용 삼성 사장이 감독 시절에 거둔 1천476승(1천138패65무)에 이어 역대 두번째였다. 하지만 1천승보다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준 건 쌍방울 레이더스 감독 시절이던 1998년 신장암에 걸려 한쪽 신장을 제거했지만 이를 숨기고 야구에만 매진해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였다.
자신과 처절한 싸움의 결과는 정규리그 2년 연속 우승과 한국시리즈 2연패로 나타났고, 구단은 계약기간 3년에 국내 감독 최고 대우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무한신뢰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다. 김감독이 올해 내건 목표는 아시아시리즈 우승. 그걸 이루고 나면 내년엔 승운으로 경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는 완벽 우승에 도전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고자 2군 선수 단련에 들어간 지 오래다.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김성근식 야구에 대해 야구계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물러서면 죽는다'는 김감독의 철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선 그를 야구장에서 넘어야 한다. 김감독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뒤에서 비난할 게 아니라 정면에서 맞붙어 이겨야 한다"는 김감독의 말을 따라야 한다. 김감독이 내년에 세 번 웃을까,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출현할까. 김성근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먼저 중단하지 않는 한 그보다 더 치열하게 자신과 싸울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해야만 "김성근이 틀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가을의 전설’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주요장면] SK, 2년 연속 정상 등극](https://news.kbs.co.kr/newsimage2/200811/20081101/1661417.jpg)

![[단독] 우크라 국방장관 “북한군과 전면전 아닌 소규모 교전 발발” (인터뷰 전문)](/data/fckeditor/new/image/2024/11/05/302341730760780673.jpg)
![[단독] U대회 마스코트 ‘흥이나유’…공개되자마자 ‘유사성 논란’](/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4/11/05/90_80989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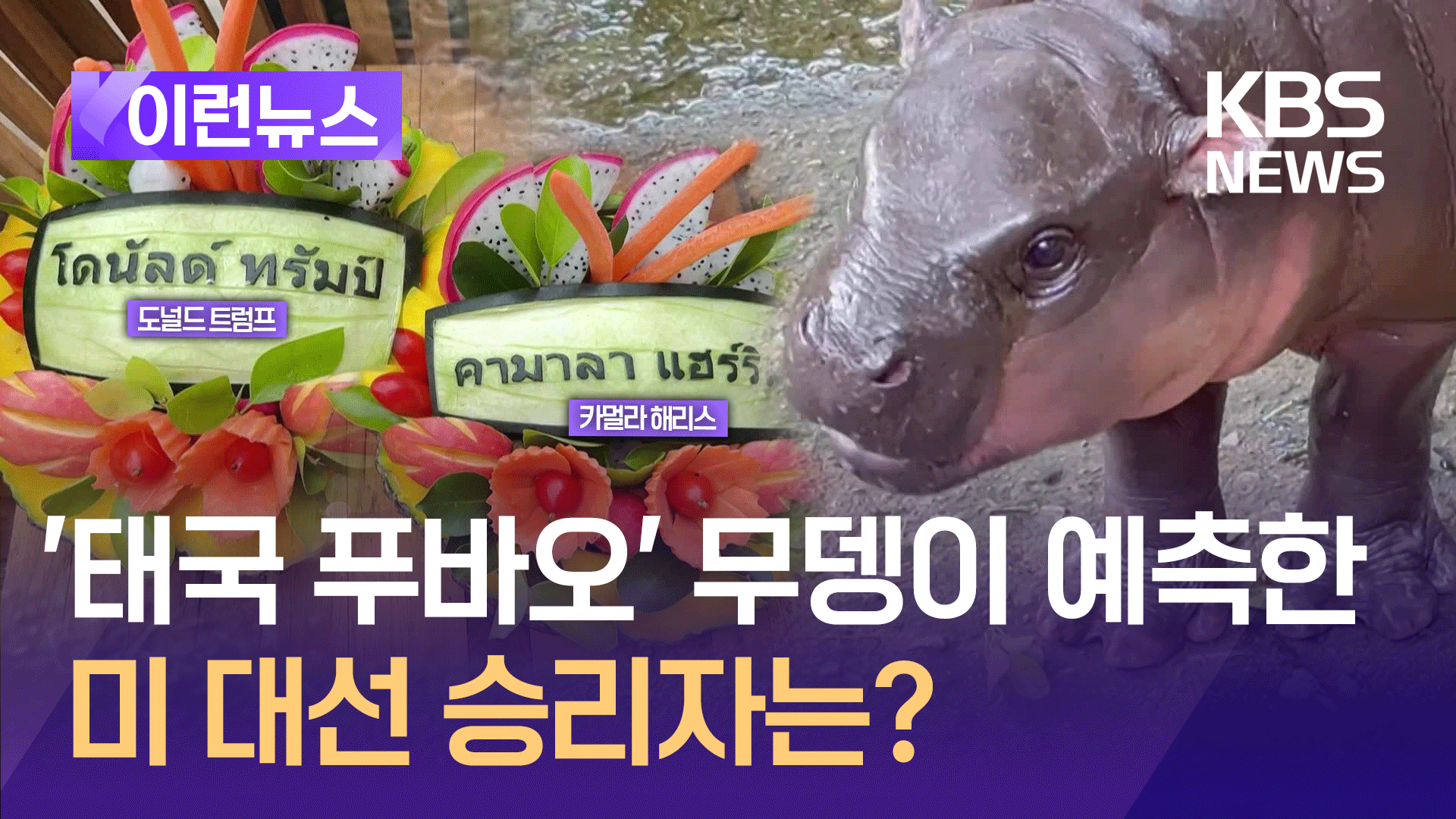


![[영상] KBS라 가능한 소환 ‘슛돌이 시절 이강인-이태석 황금왼발’](/data/fckeditor/vod/2024/11/05/kn1053917308029403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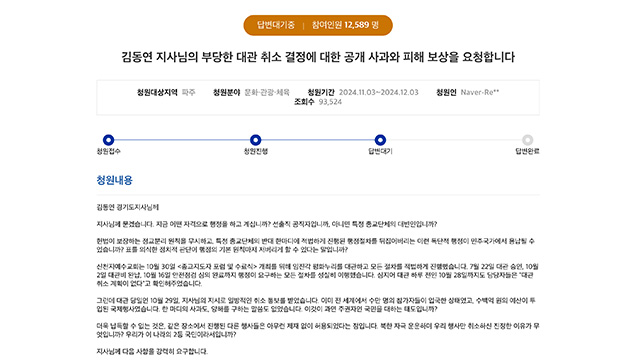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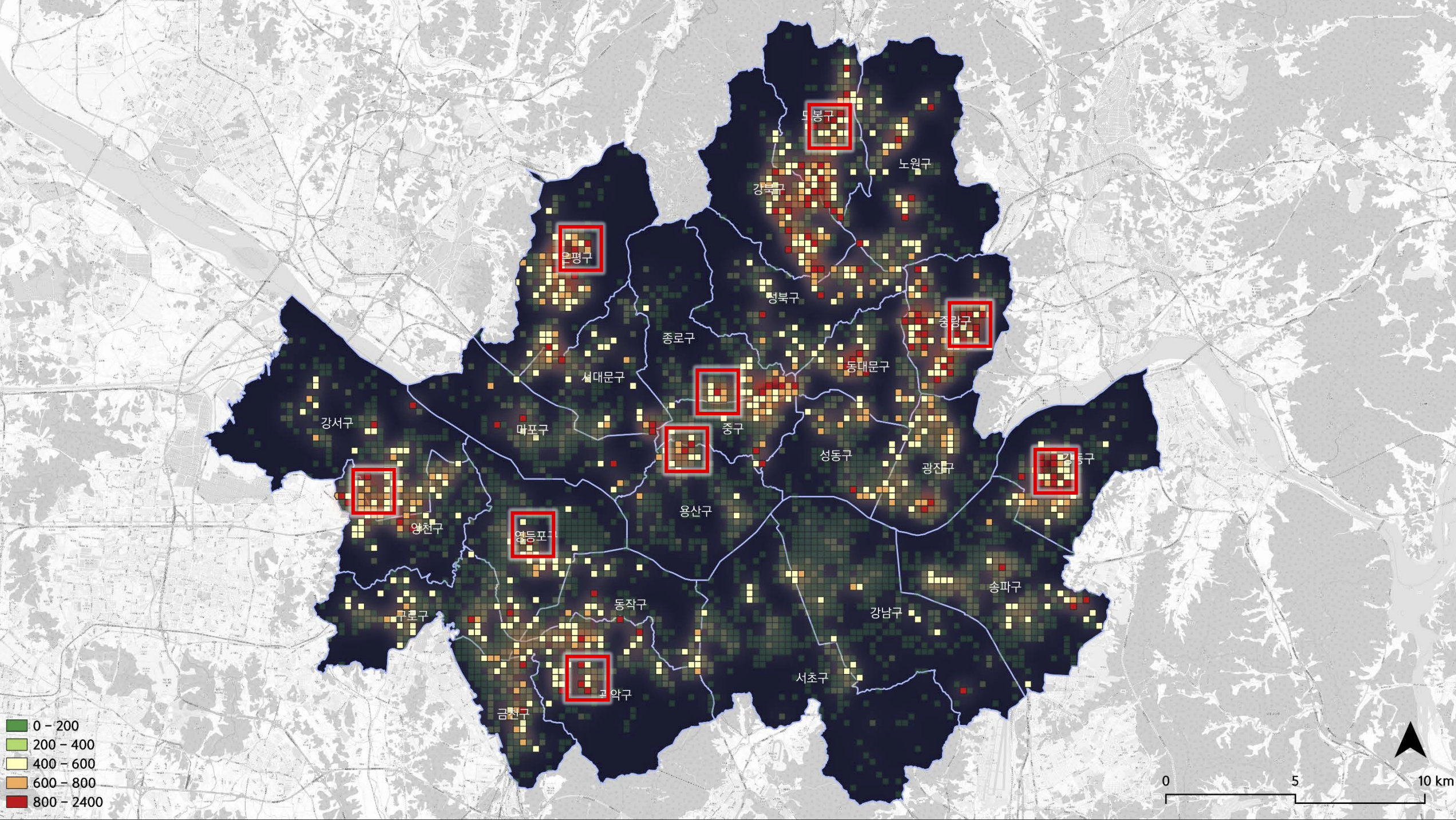


![[이슈&비평] ②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해야 하나](/newsimage2/200811/20081101/1661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