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의 감동 남긴 두산 ‘화수분’ 야구
입력 2013.11.01 (22:38)
수정 2013.11.01 (22:38)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써도 써도 재물이 닳지 않고 새로 샘솟는다는 뜻의 화수분에서 따온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화수분 야구'.
두산은 1일 대구구장에서 끝난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3-7로 패해 12년 만에 정상을 탈환할 찬스를 아쉽게 놓쳤다.
정규리그 4위팀 첫 우승이라는 비원도 이루지 못했으나 준플레이오프(5경기), 플레이오프(4경기)를 포함해 역대 포스트시즌 최다인 16경기를 치르며 두산 선수단이 남긴 투혼과 감동은 오랫동안 야구팬들의 가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삼성과 격돌한 포스트시즌에서 늘 언더독(약팀)으로 평가받았다.
상위 세 팀과 달리 확실한 소방수 투수가 없고 선발진도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두산은 마운드의 약점을 끈끈한 팀워크와 두꺼운 야수 전력으로 메워가며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기나긴 여정을 이어왔다.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A라는 선수의 공백을 B라는 선수가 티없이 메워주는 두산의 전력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
주전 포수 양의지를 대신해 출전한 최재훈이 강한 어깨와 과감한 투수 리드로 큰 힘을 보탰다.
유격수 손시헌과 허벅지 근육통을 앓은 2루수 오재원의 빈자리는 김재호가, 3루수 이원석의 공백은 허경민이 실수 없이 메웠다.
든 자리와 난 자리의 차이를 알아챌 수 없는 두산의 야수 전력이야말로 다른 팀의 부러움을 샀다.
이렇게 팀 전력을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단 프런트의 몫이다.
2004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팀을 지도하며 투지 넘친 플레이를 강조해 두산을 완전히 개조한 김경문 감독(현 NC 감독)의 공로도 크지만 기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끌어모은 수뇌부의 안목이 남다른 덕분이다.
두산이 유망주를 영입, 발굴해 주전으로 육성하기까지 성공적인 한국형 팜(farm)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던 데에는 야구단에서 잔뼈가 굵은 김승영(55) 두산 베어스 사장과 김태룡(54) 단장의 공로가 컸다.
김 사장과 김 단장은 두산 베어스에서만 23년째 한솥밥을 먹는 야구단 운영 전문 경영진이다.
야구를 모르는 모기업의 '낙하산' 인사들이 사장, 단장을 맡는 여타 구단과는 수뇌부 구성 자체가 다르다.
부산고-동아대를 나온 야구 선수 출신 김 단장은 매니저(1995년)와 선수단 실무를 책임지는 운영팀장(2001년)으로 두산의 우승을 경험했다.
비야구인 출신이나 야구인에 버금가는 시각을 갖춘 김 사장은 마케팅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김 사장과 김 단장은 세밀하지 못하고 감각에 의존하는 야구를 펼친 탓에 번번이 포스트시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두산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였다.
일본프로야구에서 선수와 명감독으로 이름을 날린 이토 쓰토무(현 지바 롯데 감독)씨를 2012년 수석코치로 데려왔고 올해에는 황병일 수석, 강성우 배터리, 조원우 주루, 김민재 수비코치 등 다른 구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사들로 코치진을 꾸려 두산의 약점을 메우고자 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2군 구장 베어스필드와 잠실구장을 분주히 오가는 김 단장은 유망주 발굴과 육성, 선수들의 입대를 직접 담당해 전력 누수 없이 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손을 쓰고 있다.
그 결과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한 신고선수 김현수가 대선수로 성장하고, 불펜에 머물던 유희관이 선발 투수로서 기량을 꽃피웠다.
공격과 수비, 주루에서 국가대표급 야수진을 보유한 두산은 이제 마운드에서도 '화수분'을 이뤄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았다.
특히 위력적인 왼손 불펜이 없어 우승 일보 직전에서 삼성에 쓴맛을 본만큼 올겨울 약점을 메울 복안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은 1일 대구구장에서 끝난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3-7로 패해 12년 만에 정상을 탈환할 찬스를 아쉽게 놓쳤다.
정규리그 4위팀 첫 우승이라는 비원도 이루지 못했으나 준플레이오프(5경기), 플레이오프(4경기)를 포함해 역대 포스트시즌 최다인 16경기를 치르며 두산 선수단이 남긴 투혼과 감동은 오랫동안 야구팬들의 가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삼성과 격돌한 포스트시즌에서 늘 언더독(약팀)으로 평가받았다.
상위 세 팀과 달리 확실한 소방수 투수가 없고 선발진도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두산은 마운드의 약점을 끈끈한 팀워크와 두꺼운 야수 전력으로 메워가며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기나긴 여정을 이어왔다.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A라는 선수의 공백을 B라는 선수가 티없이 메워주는 두산의 전력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
주전 포수 양의지를 대신해 출전한 최재훈이 강한 어깨와 과감한 투수 리드로 큰 힘을 보탰다.
유격수 손시헌과 허벅지 근육통을 앓은 2루수 오재원의 빈자리는 김재호가, 3루수 이원석의 공백은 허경민이 실수 없이 메웠다.
든 자리와 난 자리의 차이를 알아챌 수 없는 두산의 야수 전력이야말로 다른 팀의 부러움을 샀다.
이렇게 팀 전력을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단 프런트의 몫이다.
2004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팀을 지도하며 투지 넘친 플레이를 강조해 두산을 완전히 개조한 김경문 감독(현 NC 감독)의 공로도 크지만 기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끌어모은 수뇌부의 안목이 남다른 덕분이다.
두산이 유망주를 영입, 발굴해 주전으로 육성하기까지 성공적인 한국형 팜(farm)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던 데에는 야구단에서 잔뼈가 굵은 김승영(55) 두산 베어스 사장과 김태룡(54) 단장의 공로가 컸다.
김 사장과 김 단장은 두산 베어스에서만 23년째 한솥밥을 먹는 야구단 운영 전문 경영진이다.
야구를 모르는 모기업의 '낙하산' 인사들이 사장, 단장을 맡는 여타 구단과는 수뇌부 구성 자체가 다르다.
부산고-동아대를 나온 야구 선수 출신 김 단장은 매니저(1995년)와 선수단 실무를 책임지는 운영팀장(2001년)으로 두산의 우승을 경험했다.
비야구인 출신이나 야구인에 버금가는 시각을 갖춘 김 사장은 마케팅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김 사장과 김 단장은 세밀하지 못하고 감각에 의존하는 야구를 펼친 탓에 번번이 포스트시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두산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였다.
일본프로야구에서 선수와 명감독으로 이름을 날린 이토 쓰토무(현 지바 롯데 감독)씨를 2012년 수석코치로 데려왔고 올해에는 황병일 수석, 강성우 배터리, 조원우 주루, 김민재 수비코치 등 다른 구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사들로 코치진을 꾸려 두산의 약점을 메우고자 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2군 구장 베어스필드와 잠실구장을 분주히 오가는 김 단장은 유망주 발굴과 육성, 선수들의 입대를 직접 담당해 전력 누수 없이 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손을 쓰고 있다.
그 결과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한 신고선수 김현수가 대선수로 성장하고, 불펜에 머물던 유희관이 선발 투수로서 기량을 꽃피웠다.
공격과 수비, 주루에서 국가대표급 야수진을 보유한 두산은 이제 마운드에서도 '화수분'을 이뤄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았다.
특히 위력적인 왼손 불펜이 없어 우승 일보 직전에서 삼성에 쓴맛을 본만큼 올겨울 약점을 메울 복안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2013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포스트시즌 베스트 5] 삼성, 우승 느낌 아니까~](https://news.kbs.co.kr/data/news/2013/11/05/2750100_oC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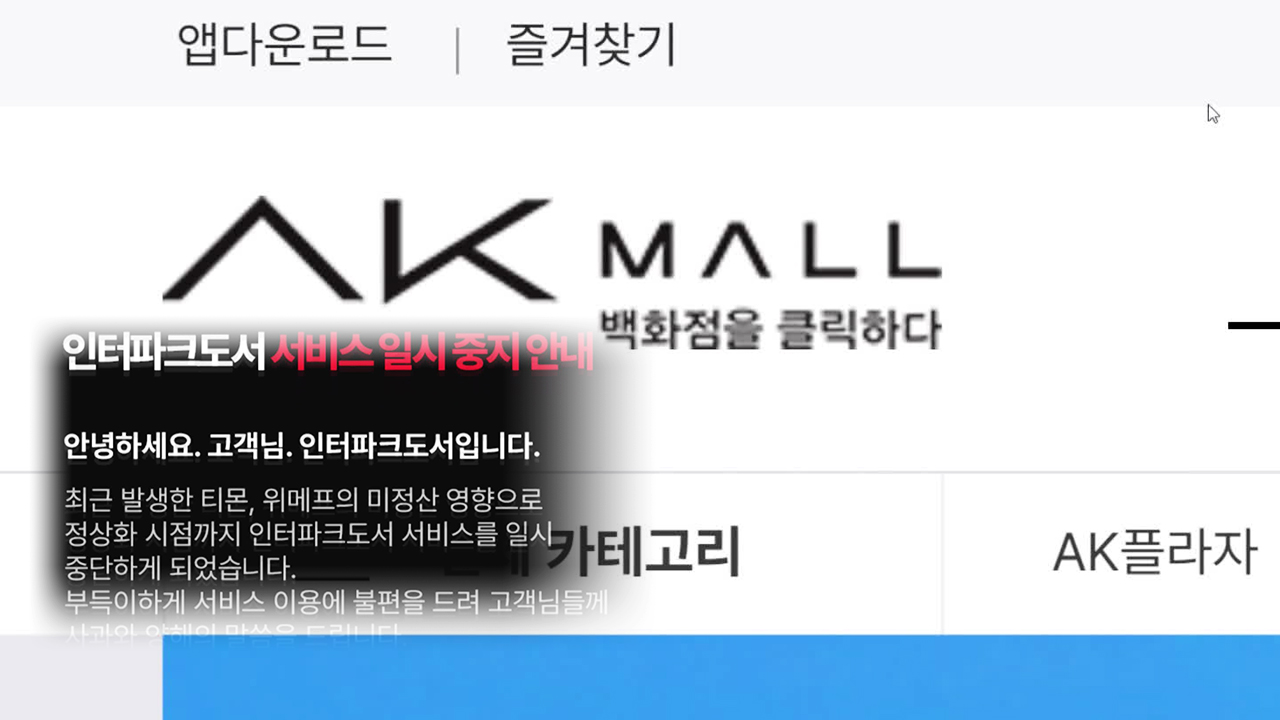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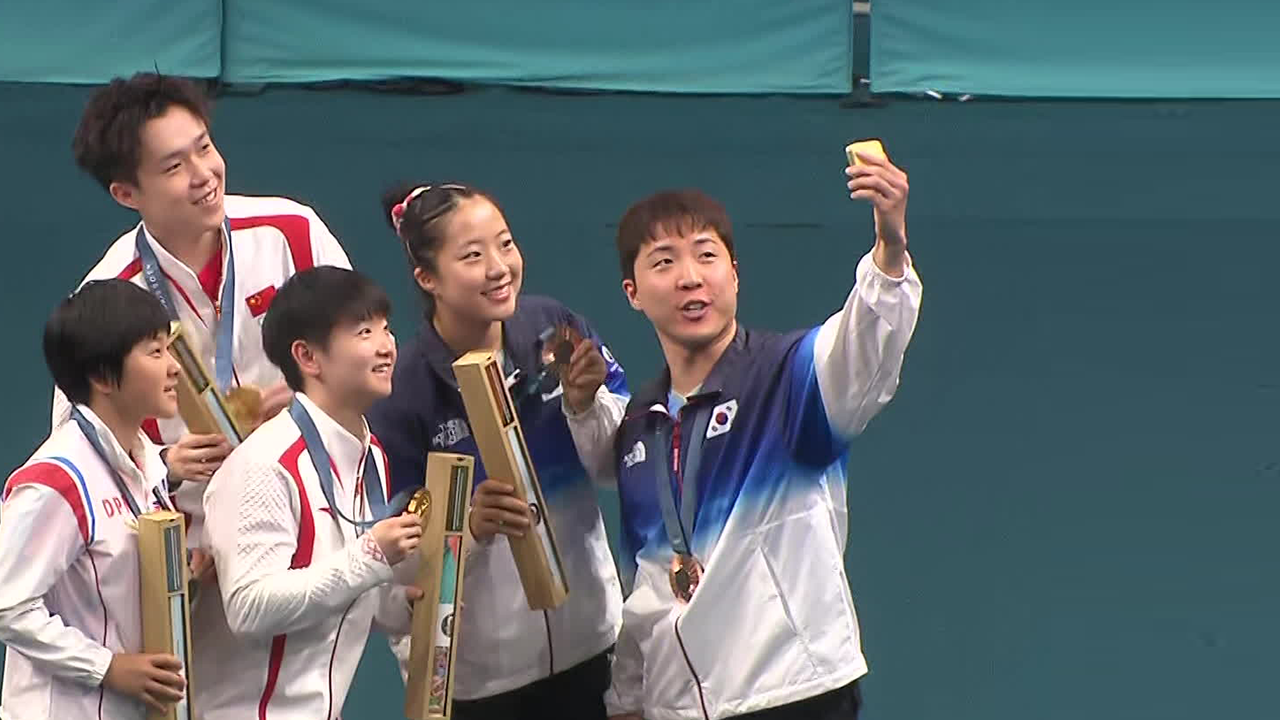
![[인터뷰] 신유빈 “과정이 중요해요…목표는 메달입니다”](/data/news/2024/08/01/20240801_MgdhjX.png)





![[영상]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올림픽 3연패’ 한국 펜싱 새 역사](/data/news/2024/08/01/20240801_wxUtMX.png)

![[화제포착] 욕설·비속어에 중독된 청소년들](/data/news/2013/10/24/2743985_90.jpg)
![[활력충전] 식품건조기 써보니…장·단점은?](/data/news/2013/11/13/2754433_130.jpg)
